
자신의 쓰기에 대해 쓰는 일은 기쁠까, 어려울까. 기쁘고도 어렵겠지. 힘들고 따뜻하겠지. 울적하고 벅차겠지. 이렇게 서로 다른 말들이 붙는 순간 나는 종종 행복감을 느끼곤 하는데, 그것이 문학이고 그래서 문학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 입체적이고 복잡한 것, 문학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곳간을 채운 농부처럼 마음이 넉넉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이다. 정반대의 단어를 붙이면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그곳에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의미가 담긴다. 작가가 쓰는 일기 형식의 문학론 에세이 시리즈를 준비하며, 어울리는 시리즈명을 고민하면서도 이런 취향이 반영되었던 것 같다. ‘매일과 영원’이라는 단어의 조합은 함께 시리즈를 기획한 정기현 편집자의 아이디어였다.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듯한 우리의 매일와,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인 영원을 나란히 놓아두자 그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의미가 생겼다. 매일을 한 장 한 장 채워가다 보면 영원을 담은 책 한 권이 된다는 의미가 그때 우리 사이에 고였다. 순간과 영원을 모두 경험하게 하는 것은 문학뿐이다! 다른 건 없어! 우리는 손뼉을 치며 우리의 에세이 시리즈명을 결정했다.
에세이 시리즈의 상을 그려 나가고, 원고를 편집하면서 동시에 새해에 바삐 준비했던 책은 바로 박완서 작가의 타계 10주기 특별판이었다. 민음사에서 오늘의 작가 총서로 출간되고 있는 『나목/도둑맞은 가난』을 다시 내는 작업이었다. 언제나 박완서 작가의 글과 말과 태도를 좋아하고 새기던 독자로서, 한국문학의 귀한 자산인 박완서의 초기 대표작 선집을 새로이 편집할 기회를 받아든 편집자로서, 나는 지난 12월과 올해 1월내내 ‘박완서 읽기’를 하며 보냈다. 박완서의 첫 소설 「나목」부터 「도둑맞은 가난」. 「지렁이 울음소리」, 「부처님 근처」,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카메라와 워커」, 「이별의 김포공항」까지. 작가 박완서가 등단 초기에 써낸 작품들을 따라 읽으며 함께 읽은 것은 작가의 다른 소설보다는 작가가 쓴 에세이와 남긴 인터뷰였다. 작가가 그려낸 문학의 세계와 그 세계를 그리는 작가가 살아가는 현실과 태도를 나란히 읽는 경험은 서로 상관없는 단어를 나란히 두는 것과 비슷했다. 작가의 소설과 작가의 말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그 둘이 느슨하고 질긴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생겼다. 그 공간 안에 내가 오도카니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든든하고 안전한 느낌이었다.
“내 기억의 창고도 정리 안 한 사진 더미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건 뒤죽박죽이고 어둠 속에 방치되어 있고 나라는 촉수가 닿지 않으면 영원히 무의미한 것들이다. 그중에는 나 자신도 판독 불가능한 것이 있지만 나라는 촉수가 닿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빛을 발하는 것들이 있다. 아무리 어두운 기억도 세월이 연마한 고통에는 광채가 따르는 법이다. 또한 행복의 절정처럼 빛나는 순간도 그걸 예비한 건 불길한 운명이었다는 게 빤히 보여 소스라치게 되는 것도 묵은 사진첩을 이르집기 두려운 까닭이다. 당시에는 안 보이던 사물의 이중성과 명암, 비의가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묵은 사진첩을 뒤지다가 느닷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공포이자 전율이다. 나라는 촉수는 바로 현실이라는 시점이 아닐까. 이미 지나간 영상을 불러내서 상상력의 입김을 불어넣고 남의 관심까지 끌고 싶은 기억에의 애착이야말로 나의 글쓰기의 원동력이자 한계 같은 것이 아닐까, 요즘 문득문득 생각한다.”
-『세상에 예쁜 것』, 115~116쪽

작가가 에세이에서, 인터뷰에서 남긴 말들 중 가장 멋지다고 여겼던 부분은 자신의 쓰기를 정확하게 말하는 부분이었다. 꾸미고 보태는 말도, 변명하고 미루는 말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할 수 있는 말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단호한 동시에 너그럽다고 느꼈고, 그런 태도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써낸 글에 대해 변명도 포장도 없이. 쓰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썼다고 말하는 태도. 바로 이런 사람이 문학을 가장 진지하게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이지 않나 하고 생각했다. 자신의 소설에 대해 말하는 박완서의 말과 태도를 읽으면 작가가 얼마나 문학을, 소설을 사랑하는지 느끼게 된다. 문학이 가장 중요한 삶도 있다고, 소설을 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삶인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면 벅차고 벅차다.(이번만은 정반대의 단어를 놓지 않기로 한다. 문학을 중요하다고 말하는 일은 언제나 좋고 좋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문학론-일기 콘셉트의 ‘매일과 영원’ 시리즈도 후에, 영원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미래의 독자들에게 읽히며 그런 독서의 감각을 제공한다면 좋겠다. 그 글을 읽으면 문학을 사랑하는 작가의 마음이, 그 태도가 읽는 이에게 전해져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페이지에 오래 눈길을 두게 하는 에세이였으면. 문학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소박하고 위대한 마음이 들게끔 하는 책이 된다면 좋겠다.
2021/1/26
작품집에 실린 ‘작가의 말’이나 산문집 혹은 인터뷰집에서 박완서 작가의 말을 읽을 때면, 그가 자주 자신의 쓰기에 대해 ‘내가 쓸 수 있는 것만을 쓴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면 박완서가 그린 인물은 무척이나 작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고, 나는 작가의 소설을 통해 아주 어렴풋이 작가를 그려 본다. 생의 이런저런 아름다움에는 빠짐없이 눈길을 줬을 테지만 손에 펜을 들고 있을 때는 어떤 수런거림에 단호히 고개를 돌렸을 모습을 상상한다. 자신이 보는 쪽을 흔들림 없이 보는 작가가 귀하다는 것을, 써야 한다고 믿는 것을 솔직하게 쓰는 일이 대단하고 대범한 용기인 것을 안다.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나목·도둑맞은 가난
출판사 | 민음사
나목.도둑맞은 가난 - 오늘의 작가 총서 11
출판사 | 민음사

김화진
2021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나주에 대하여」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나주에 대하여』, 연작소설 『공룡의 이동 경로』, 장편소설 『동경』, 단편소설 『개를 데리고 다니는 남자』, 『개구리가 되고 싶어』 등이 있다. 『나주에 대하여』로 제47회 오늘의작가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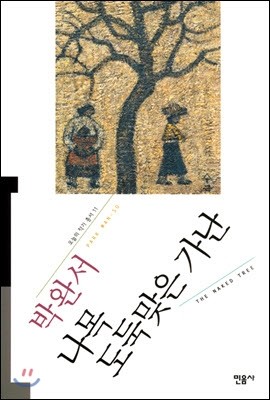
![[김화진의 선택 일기] 쓰는 것도 만드는 것도 처음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6/d/a/7/6da7769b62b5fe21db432669fcfcc35f.jpg)
![[김화진의 선택 일기] 취향과 사귀는 일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a/7/8/a/a78ad7c2cf87efb94fb381be13f90b30.jpg)
![[한승혜의 꽤 괜찮은 책] 불편함과 부당함의 사이에서 - 『가해자들』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9/7/9/b/979bc9cc1169131ca51bc0b0b062d17b.jpg)

![[취미 발견 프로젝트] 11월이라니 갑작스러운데, 2025년 취소해도 돼?](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30-b2d627fe.jpg)


![[이벤트 종료] 새로워진 채널예스 기대평을 작성해주세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6-81642dcc.jpg)
![[Read with me] 트와이스 다현 “책을 덮으면 오늘을 잘 살아보자는 목표가 생겨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05-c776e13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