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에 가서 책을 사고 시간이 나면 그때마다 거의 습관적으로 하는 짓이 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유명한 고전 작품 하나를 골라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 보는 거다. 잠깐씩 재미로 하는 짓이라 번역본을 통째로 비교할 수는 없고 유명한 구절이나 독특한 문장을 비교하는 편이다. 보통은 원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하고 각 번역본별로 흥미로운 차이가 보이면 원문을 찾아본다.
예를 들자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뒤적거리다가 미스 왓슨 댁 흑인 노예의 대사가 독특하게 번역된 것을 보고 다른 번역본들을 뒤져보는 식이다. 여담이지만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미스 왓슨 댁 흑인 노예는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 억양이 굉장히 강한 미국 남부 사투리를 그렇게 표현했으리라. 다섯 개 출판사에서 나온 번역본을 비교했지만 모두 전라도 사투리였고 경상도나 충청도 사투리로 번역한 역자는 없었다. 최초 역자의 영향인지, 내게만 보이지 않는 언어적 유사성 때문인지, 혹은 짐작도 못 할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방법이 없지만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발견이긴 했다.
작년 말 영화 <작은 아씨들>을 번역할 즈음 국내에 『작은 아씨들』 새 번역본 두 권이 출판됐다. 이번엔 나도 역자의 한 명이라 더 개인적인 이유에서 번역을 비교해 봤다. 영화와 원작은 대사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서 특정 단어나 유명한 구절을 위주로 살폈다. 역시나 역자별로 차이가 꽤 컸다. 당연한 얘기다. 역자마다 번역관이 다르니까.
“번역문의 자연스러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원작자의 의도를 문장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내 번역관의 밑돌과도 같은 명제다. 너무도 상식적이고 상투적인 말이지만 매번 원문과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결국 필연적으로 패배하는 역자 입장에서는 저것 하나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다. 원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져도 그 교묘한 뉘앙스를 끝내 살리지 못해 패배감과 자괴감을 느끼는 일이 얼마나 많고 또 흔한지.
원작자가 의도한 표현이나 단어, 문장 속 뉘앙스를 번역문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옳다구나 하고 냉큼 쓰기 바쁘다. 문장마다 그렇게 원망스럽던 원작자가 이럴 땐 감사하기까지 하다.
내친김에 『작은 아씨들』을 네 권 비교해 봤다. 최근 번역본 두 권과 기존 번역본 두 권. 관심 있게 본 부분은 다름 아닌 “Post Office”라는 명사와 “Natural”이라는 형용사였다. 『작은 아씨들』 책이나 영화를 본 사람은 알겠지만 네 자매(마치 가족)의 옆집에 사는 남자 주인공 로리는 네 자매의 연극 클럽에 합류하며 친분을 다지게 된다. 이때 로리의 장난스러운 대사는 다음과 같다.
“작은 감사의 표시로, 이웃나라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해 이 열쇠를 바치겠소. 숲속 연못 옆에 세운 우체국 열쇠요.”
여기서 말하는 우체국은 양쪽 집 사이에 만든 작은 우편함을 뜻한다. 양쪽 집을 나라(Nation)에 빗대고 그사이에 우체국(Post Office)을 세웠다는 위트 있는 대사다. 번역가로서 흥미로운 점은 “우체국”보다 “우편함”으로, “나라”보다 “집”으로 옮긴 번역본이 더 많다는 것이다. 내가 비교한 네 권 중 세 권은 우편함, 한 권은 우체국으로 옮겨져 있다.
내가 우체국으로 옮긴 까닭은 우선 원문 자체가 우체국이고, 나라 사이에 세운 거라면 우편함보다는 우체국 건물을 세웠다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원작에서 마치 자매의 막내 베스를 우체국장(Postmistress: 여자 우체국장)으로 표현한 문장도 있기 때문이다. 그 작은 우편함을 우체국으로 부르며 놀았다니 참 귀엽고 재밌는 설정이다. 이런 원문의 뉘앙스는 큰 고민 없이 번역문에 그대로 살릴 수 있어서 위에 말한 “감사한(성은이 망극한)” 경우에 속한다.
두 번째, 에이미와 로리가 투닥거리는 장면에서 아래와 같은 대사가 오간다.
로리: 천생 방탕아라서?
에이미: 천생 게으름뱅이겠지
로리의 성격을 말하는 대사인데 여기서 “천생”으로 옮긴 원문은 말 그대로 “Natural”이다. 연속된 두 대사에 같은 형용사를 넣어서 에이미가 로리의 말을 받아치는 흔하지만 재밌는 구조다. 이 문장을 위처럼 같은 표현으로 받게끔 번역한 책은 네 권 중 두 권이었다. 나머지 두 권은 반복된 형용사를 번역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럴 땐 번역가로서 아쉬움이 드는 게 사실이다. 원작자의 뉘앙스를 반영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면 응당 이해하고도 남겠지만 위 예들은 직역만으로도 뉘앙스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
영화를 볼 때 무지막지한, 잔인한, 원작자의 손모가지를 비틀고 싶은 초고난도의 언어유희가 나오면 저걸 살릴 수가 없어서 한탄했을 번역가의 심정에 이입한다. 그 무리한 도전에 성공한 자막을 보면 존경심이 든다. 반대로 직역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살릴 수 있는 문장이 전혀 다른 표현으로 쓰인 걸 보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다.
물론 여기까지는 모두 내 번역관으로 판단한 것이고 각자의 번역관에 따라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번역문의 소비층이나 직관성을 더 중시한다거나 편집자와의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이라거나. 내가 가장 신뢰하는 번역가 중 한 명(베테랑 번역가인 아내)도 “우편함”이 더 직관적이라 그쪽 손을 들고 싶다고 말해 남편을 삐치게 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번역가의 말이라 일부 수긍하지만...
그래도 흥. 칫.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황석희(영화번역가)
번역가이자 남편, 아빠이다 2005년부터 번역을 시작하여 주로 영화를 번역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보헤미안 랩소디>, <캐롤>, <데드풀>,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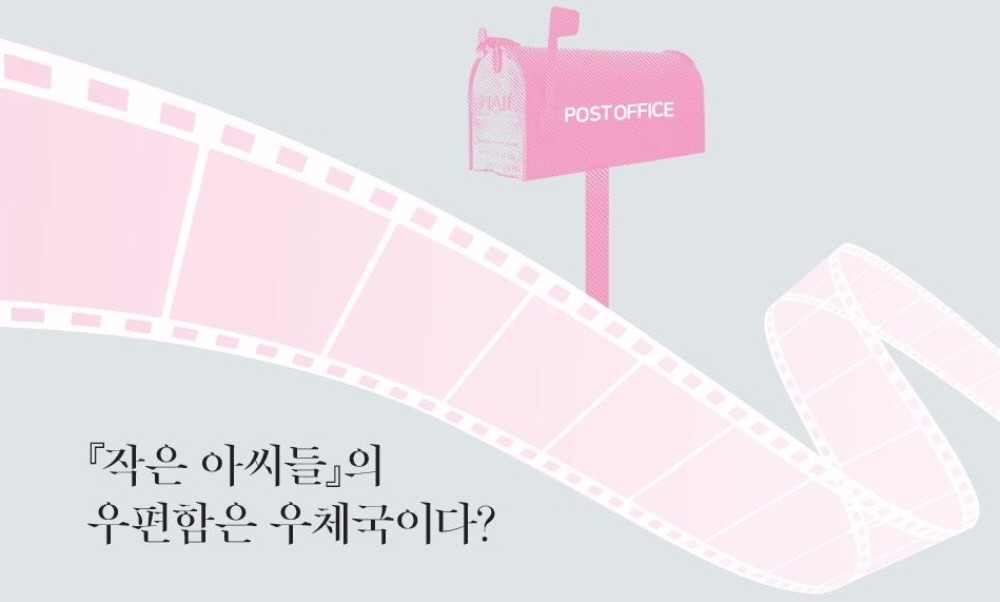
![[황석희 칼럼] 영화번역가가 드라마 주인공이 되는 날이 오다니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1/5/7/a/157a1ba13ebacc5aa128c6230297088c.jpg)
![[황석희 칼럼] 번역가님, 몇 개 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9/1/a/e/91ae1e96a6eb0e318c5a34c8af01ff7e.jpg)
![[황석희 칼럼] 영화 재번역과 고대 유물 발굴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3/6/5/9/3659ee51eb183e3aead699d23818445c.jpg)


![[더뮤지컬] 임태현, 진심의 가치](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14-c10f7d4d.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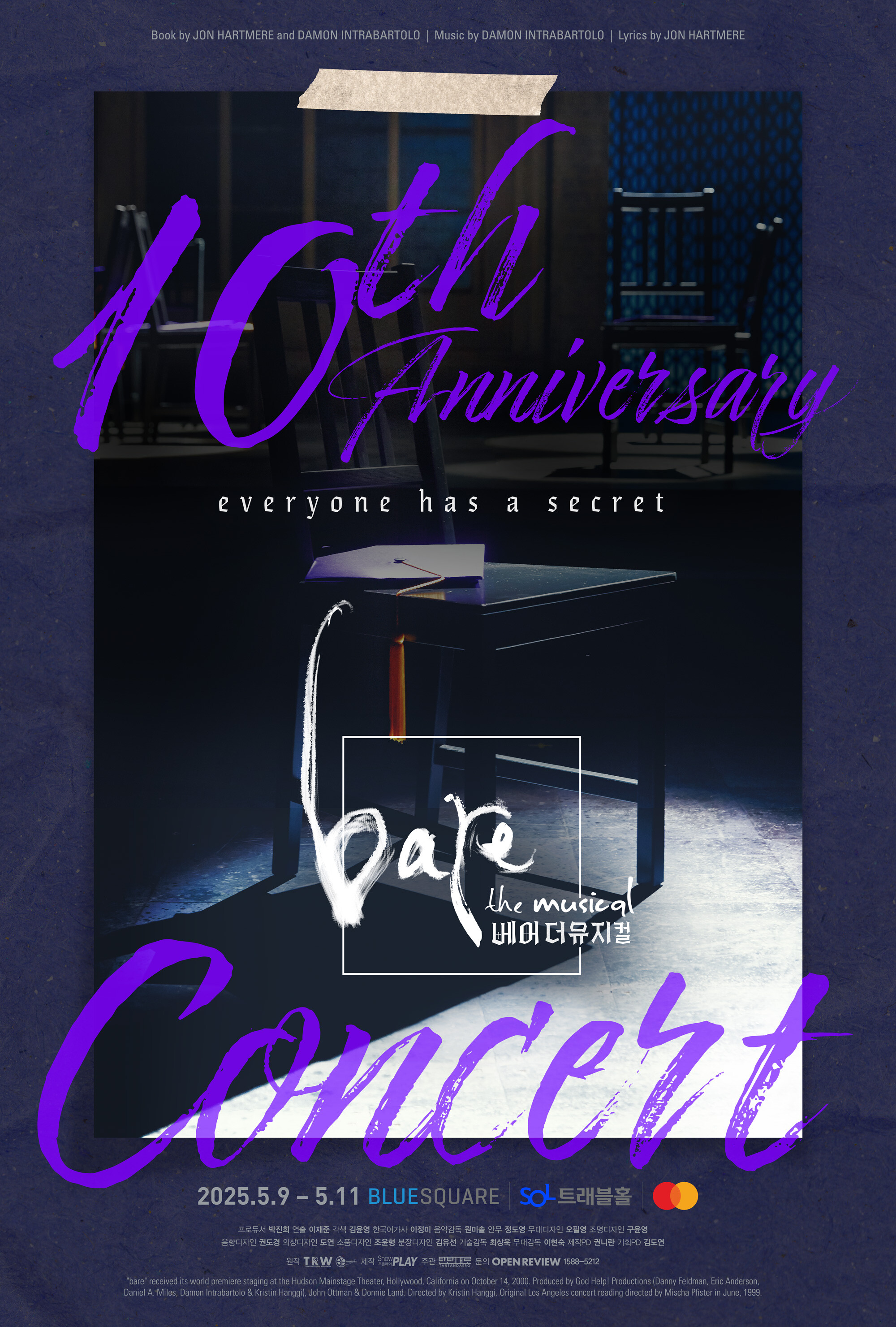

![[Read with me] 더보이즈 주연 “성장하고 싶을 때 책을 읽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19-0fe5295b.jpg)






kayoumi
2020.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