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실공히 스토리텔링의 시대다. 각종 상업 광고는 물론 공공기관 캠페인, 선거운동, 국가 정책을 홍보할 때조차 ‘이야기’로 풀어내지 않은 콘셉트는 구시대적인 구호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요즘 사람들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으면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야기’ 하면 아일랜드를 빼놓을 수 없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아일랜드는 제임스 조이스, 오스카 와일드, W. B. 예이츠, 사뮈엘 베케트, 조지 버나드 쇼 등 누구나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았을 문학의 거장들을 배출한 나라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들의 문학적 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큰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내가 정말 부러운 것은 이러한 고전을 케케묵은 이야기로 남기지 않고 현재의 예술로 끊임없이 재생시키는 그들의 노력과 그것을 보통 사람들의 축제로 승화시키는 힘이다.
사뮈엘 베케트 시어터에서는 일 년 내내 베케트의 작품들을 무대화한 공연이 오르고, 1871년에 문을 연 게이어티 시어터(Gaiety Theatre)를 비롯해 게이트 시어터(Gate Theatre), 애비 시어터(Abbey Theatre) 등 더블린의 유서 깊은 극장들도 수시로 유명한 고전 작품들을 재공연한다. 신기한 점은 그렇게 같은 작품을 여러 번 공연하는데도 항상 무대가 가득 찬다는 것이다.

더블린의 유서 깊은 극장인 게이어티 시어터와 게이트 시어터.
이야기의 나라답게 아일랜드에서는 일 년 내내 문학과 도서를 테마로 한 페스티벌이 곳곳에서 열린다. 참여 작가가 자신의 소설을 바탕으로 하나의 주제를 정해 청중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뮤지션의 음악과 시인이나 소설가의 낭독이 함께하는 콘서트, 소설의 배경이 된 거리와 장소를 직접 다니며 소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워킹 투어 등 그 내용도 다양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별, 직업, 나이도 다양하다. 한마디로 동네 축제처럼 문턱이 낮지만 행사 내용의 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 무엇보다 작가가 종이 위에 써내려간 이야기를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낭독’이라는 아날로그적인 이야기 향유 방식은 현재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아일랜드 스토리텔링의 특징이다.


리피 강변에 위치한 와인딩 스테어 서점.
아일랜드 사람들의 문학 사랑을 보여주는 독특한 축제로 ‘블룸스 데이(Blooms Day)’가 있다. 아일랜드가 배출한 20세기 최고의 작가인 제임스 조이스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블룸’은 그의 대표작 『율리시스』 의 주인공 레오폴드 블룸(Leopold Bloom)의 이름에서 가져왔다. 『율리시스』 는 1904년 6월 16일 더블린을 방랑하는 블룸의 하루를 방대한 분량으로 담아낸 소설이다. 소설 속 배경이 된 6월 16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축제로 즐기기 시작한 것이 1954년. 그해부터 매년 6월 16일, 더블리너들은 『율리시스』 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소설에서 블룸이 먹었던 음식을 똑같이 먹으며, 블룸이 갔던 장소에서 그 장소를 배경으로 쓴 소설의 일부를 낭독한다. 또는 소설의 일부를 노래나 연극으로 만들어 공연을 하기도 한다. 그렇게 그날 하루 더블린 거리 전체가 1900년대 초를 배경으로 한 영화 세트장이 된다.
하지만 『율리시스』 를 꼭 읽어야만 블룸스 데이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치마폭이 풍성한 드레스에 화려한 깃털 모자, 중절모에 체크무늬 조끼와 멜빵바지로 한껏 멋을 낸 사람들 사이에서 1904년 당시의 더블린을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부풀어 오른다. 제임스 조이스가 자주 갔던 펍에서 그가 즐겼던 레드 와인과 고르곤졸라 샌드위치를 먹어보고, 샌디코브(Sandycove)의 제임스 조이스 타워에 올라 그가 엿새 동안 살았던 공간을 둘러보는 것, 타워 옥탑에서 열리는 낭독회에 참여해 샌디코브 해변을 내려다보며 『율리시스』 의 구절들을 감상해보는 것…… 이것으로 『율리시스』 를 전부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당시의 더블린 사회를 제임스 조이스의 시선으로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블룸스 데이가 되면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율리시스』 의 주인공 블룸이 더블린 곳곳에 출현한다.
또 한 가지, 아일랜드의 스토리텔링 전통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구전되어 내려온 동화, 전설 또는 신화다. ‘신화’라고 하면 그리스 신화가 가장 유명하지만, 아일랜드에도 자신들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신, 요정, 천사 등 친밀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동화가 풍부하다. 실제로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실재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들을 신과 인간의 중간적인 존재, 즉 자연령으로 설명한다. 그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아일랜드의 상징색인 초록색 옷을 입은 ‘레프리콘(Leprechaun)’이다.
레프리콘은 보통 초록색 옷에 초록색 모자와 신발, 붉은 머리카락과 턱수염, 키가 어린아이만큼 작은 장난꾸러기 남자 노인의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 에 나오는 난쟁이와도 비슷하다. 어쩌면 그 상상력의 근원이 같은 곳에 닿아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조금은 기이한 모습의 이 요정은 언젠가부터 아일랜드의 기념품 상점은 물론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등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축제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다양한 크기의 레프리콘 모형을 대문 앞이나 정원의 작은 나무 곁에 놓아두는 것을 좋아한다. 정원이 넓은 시골집을 지날 때면 더 쉽게 볼 수 있지만 붉은 벽돌집들이 모여 있는 더블린 주거 지역에서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내가 맨 처음 레프리콘 모형을 본 것도 더블린의 한 조지언 양식의 집을 지날 때였다. 색색의 천을 늘어뜨려 장식한 유리창을 보니 아이리시 트래블러가 사는 집인 듯했다.
알록달록한 장식물과 웃자란 풀들이 가득한 정원 한편에, 그리고 대문 양옆으로도 하나씩, 초록색 옷을 입은 레프리콘이 서 있었다. 장난스러운 얼굴이 어딘가 심술궂어 보였다. 사랑스러운 아기 천사도 있는데 왜 굳이 심술 난 할아버지일까? 늘 살짝 꼬인 블랙 유머를 좋아하는 아이리시들의 유희 정신은 여기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난다.
레프리콘에 대해 생각하다가 문득 궁금해진 곳이 있었다. 시내 중심에 있어서 자주 지나다니면서도 늘 무심하게 스쳐 갔던 ‘내셔널 레프리콘 뮤지엄’이다. 구전되어온 아일랜드의 전설과 동화를 소개하는 박물관으로, 2010년 3월 더블린 시내 중심지인 저비스(Jervis) 스트리트에 문을 열었다.
박물관을 찾은 날은 가을빛이 가득한 토요일이었다. 오전 11시터 1시간 간격으로 가이드 투어가 진행되는데, 나는 가장 이른 투어에 참여했다. 레프리콘이 최초로 등장한 오래된 책과 작가들의 사진, 세월이 묻어나는 레프리콘 장식품들 사이에 어린아이 사이즈의 갈색 양복 재킷과 검정 구두 한 짝이 눈에 띄었다.
“원래 레프리콘은 초록색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통 레프리콘이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금을 캐러 다닌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구두를 만드는 슈메이커랍니다. 구두를 팔고 그 대가로 금을 받지요. 무지개를 따라가면 그 끝에 레프리콘이 금을 모아둔 항아리가 있대요.”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전시된 그림책을 다시 보니 정말 레프리콘들이 갈색 양복에 검정 구두, 빨간 모자를 쓰고 있다. 빨간색 유니폼의 산타클로스처럼 레프리콘도 현대 상술의 입김으로 초록색 옷을 입게 된 것일까.


레프리콘 뮤지엄에 전시되어 있는 레프리콘 장식품과 레프리콘이 등장하는 책, 그리고 레프리콘이 입고 신었다는 옷과 신발.
이제 우리는 예닐곱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상상의 공간으로 들어간다. 레프리콘의 눈으로 본 인간의 거실, 캄캄한 숲속, 금 항아리가 놓인 비밀의 방……. 각기 다른 연극무대처럼 디자인된 방들을 이동하며 가이드는 각 공간의 배경과 분위기에 어울리는 레프리콘의 전설을 실감나는 목소리 연기로 들려주었다. 박물관을 나와서도 나는 어디선가 진짜 레프리콘을 만날 것만 같은 동심에 종일 가슴이 울렁였다.
그리고 몇 년 후 우연히 레프리콘에 대한 책 한 권을 읽게 되었다. 아이리시 작가 타니스 헬리웰Tanis Helliwell이 쓴 『레프리콘과 함께한 여름(Summer with the Leprechauns)』 이라는 책으로, 1985년 아일랜드의 한 오두막에서 여름을 보내는 동안 레프리콘을 직접 보았다는 작가의 경험담이 담겨 있었다.
솔직히 난 이 책의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하지만 자연령이 존재한다고 믿는 아이리시들의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그 존재들을 우리의 삶 속에 초대해 희로애락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려는 꿈은 얼마나 발칙하고 자연 친화적인가. 이렇듯 이야기가 곧 삶이 되고 삶이 곧 이야기가 되는 아일랜드의 스토리텔링은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다.
-
초록빛 힐링의 섬 아일랜드에서 멈추다이현구 저 | 모요사
우리가 모르는 아일랜드의 숨은 속살은 무엇일까? 요리하고 기타 치는 아일랜드 남자를 만나 아일랜드에 정착한 지 9년. 그녀가 들려주는 아일랜드 이야기는 흔한 가이드북에서는 만날 수 없는 속 깊은 이야기들이다.
초록빛 힐링의 섬 아일랜드에서 멈추다
출판사 | 모요사

이현구
아일랜드에 살면서 느끼고 경험한 일상과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마야 리Maya Lee’라는 필명으로 카카오 브런치를 통해 다른 이들과 나누고 있다. 극본 번역가로서 동시대 아일랜드 연극을 한국어로 번역해 무대에 소개하는 작업도 한다. 현재 기타 치고 요리하는 아이리시 남편과 함께 여행 같은 삶을 꿈꾸며, 더블린 근교의 바닷가 마을 브레이에 살고 있다.











![[더뮤지컬] <생계형 연출가 이기쁨의 생존기> 예상치 못한 질문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27-c8d7850b.jpg)
![[더뮤지컬] 잠들 수 없는 호텔, 유령이 되어 볼 기회...<슬립노모어 서울>](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01-2dd33b8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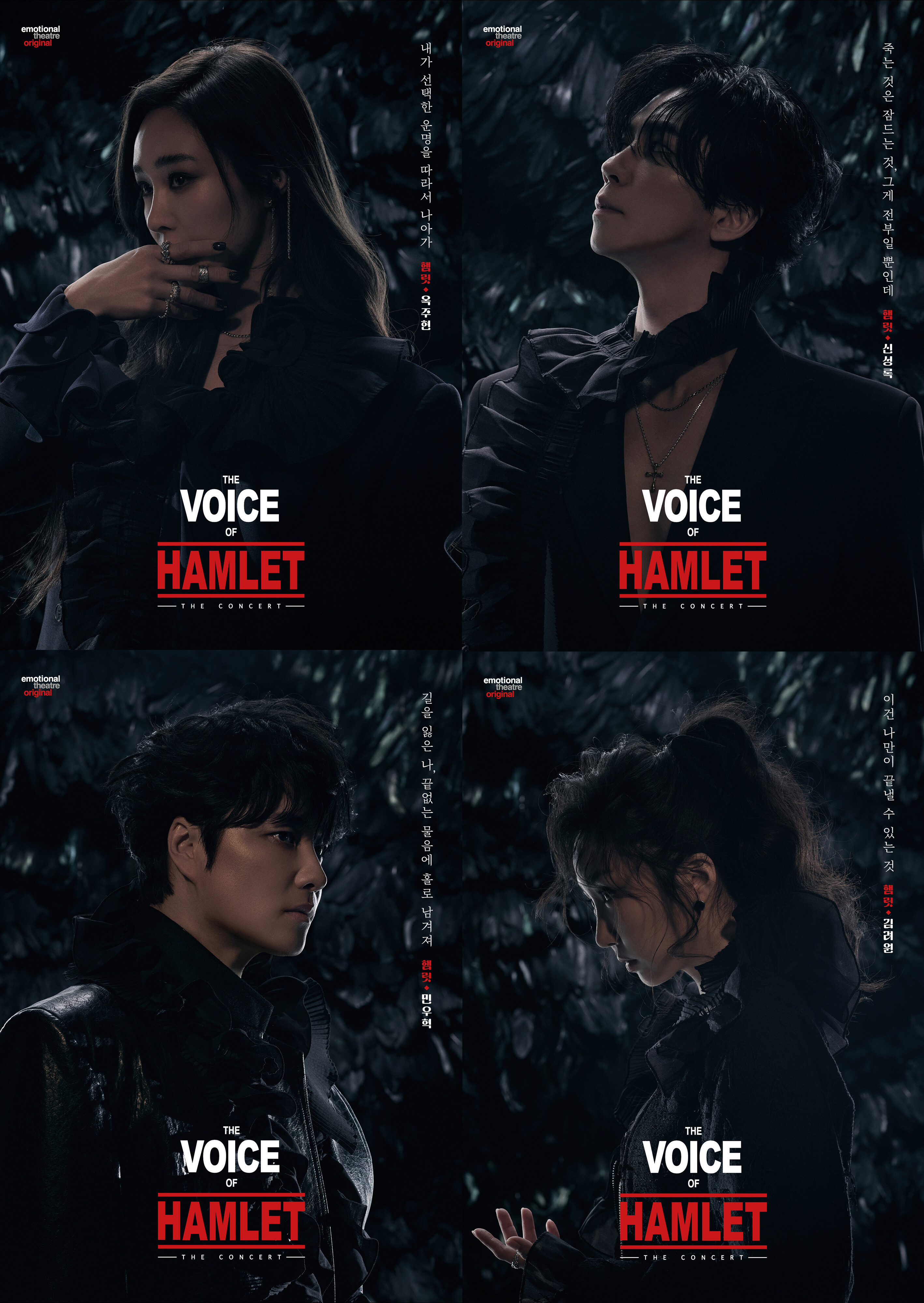
![[Read with me] 더보이즈 주연 “성장하고 싶을 때 책을 읽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19-0fe5295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