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스플래쉬
믿어지니?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갔다는 것
박상수 지음, 『오늘 같이 있어』 중 「극야(極夜)」 부분
아니 잘 안 믿어진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건 너무 어렵다.
나는 따뜻하고 귀여운 구석도 있지만 그만큼 어둡고 별스러울 때가 많다. 화가 나면 공격적으로 굴 때도 자주 있다. 얼마 전엔 영화를 보러 갔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려서 조용히 좀 하라고 소리를 질러 버렸다. 그 후부터 웃긴 장면이 나와도 아무도 웃지 않았다. 아니 분명히 웃을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데? 계속해서 아무도 웃지 않았고 영화관에는 정적이 흘렀다. 나는 너무 웃고 싶었는데도 손을 꽉 붙들고 웃음을 참아야 했다….
어제도 무례한 사람에게 화가 났고 인터넷 기사를 읽으며 화가 났다. 결국 누군가에게 한 소리를 하고 돌아와서는 나 자신한테 화가 났다. 사실 아무도 미워하지 않은 날에도 기어코 나 자신을 미워하기에 평온한 날이 별로 없다.
오늘은 정말이지 아무도 미워하고 싶지 않은 날이었다. 그래서 어제의 미움을 겨우겨우 떼어 내고 아침을 맞았다. 일어나자마자 고양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고 잠든 강아지들 품에 파고들어 냄새를 맡았다. 하품하는 입 냄새를 맡고 고소한 발 냄새도 맡았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두 번째로는 산책하면서 가을 풍경을 감상했고 돌아와서는 청소와 빨래를 시작했다. 청소기로 바닥을 밀고 먼지떨이로 온갖 먼지를 털고 갓 빨아서 깨끗한 냄새를 풍기는 빨래를 탁탁 털어 건조대에 널어 놓으니 마음이 좀 보송해진 기분이었다.
그다음에는 씻었다. 기름진 머리와 땀 흘린 몸을 씻어 내니 개운해졌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가 내 노력의 전부였다. 이런 작업을 매번 반복해도 시간이 지나면 잠들었던 화가 다시 깨어나 날뛰기 시작했다. 아무리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해도 화는 마구 뛰어 대고, 그러다 보면 ‘왜 참아야 하지?’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버리고 만다. 그러면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따지고 나 자신을 싫어하고.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어서 책을 읽지만 사실 내가 읽는 책들은 나한테든 남한테든 화와 슬픔, 무기력 따위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세상이, 사람이, 내가 얼마나 못되고 잔인한지만 잔뜩 느끼게 된다. 충동적으로 어제 읽던 책이 아닌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그림책 하나를 꺼냈다. 『도서관』 이라는 책이다. 이 책 안에는 가족의 이야기도 학교나 일, 연애, 결혼, 돈에 관한 이야기도 없다. 그저 여주인공과 책과 고양이만 잔뜩 있을 뿐이다. 특히 책은 아주 아주 아주 많다. 주인공은 집이 도서관이 될 정도로 책을 사랑하는 엄청 귀여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세계에서 다른 것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는다.
새삼 신기했다. 이 책 속엔 타인에 의한 사건이나 감정이 보이지 않는구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왠지 마음이 상쾌하고 가벼워졌다.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집 앞 놀이터로 나갔다.
가끔 답답하면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을 때가 있다. 마음이 피곤해서 멍하니 있다가 정신이 들면 다시 들어오고. 보이는 것들을 그냥 보기만 하면서 앉아 있었다.
이번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자세히 관찰했다. 눈이 마주친 아이들을 보며 웃었는데 어떤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놀이터 주위를 빙빙 돌고, 어떤 아이는 엄마 쪽으로 뛰어갔다. 서로 그네를 밀어 주고, 킥보드를 타고 길 위를 누비고, 넘어지면 바로 울어 버리고. 그 누구보다 신나게 놀다가 엄마가 데리러 나오자 “야, 내일 보자” 하면서 쿨하게 뒤돌아서는 아이도 있었다. 강아지들을 산책시킬 때면 말 걸던 아이들이 떠올랐다. “멍멍이다! 강아지가 참 귀엽네요?” “만져 봐도 돼요? 몇 살이에요?” “열여섯 살이야” 답했더니 “아이고 형님!” 했던 아이도….
내 영혼이 조용한 진동으로 흔들리기를, 나라는 집으로 드나들던 모든 나쁜 영혼이 다 떠나 버리기를, 그래 이런 날도 있단다
박상수 지음, 『오늘 같이 있어』 중 「극야(極夜)」 부분
진짜 귀여웠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그림책 말고는 아무것도 읽지 않고 스마트폰도 보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 ‘아, 이거였구나’ 싶었다.
순수하고 귀여운 게 필요했다. 그런 책과 풍경을 보고 싶었다. 문에 빗장을 걸고 무언가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열어 보이는 것들이. 마음에 아무것도 채워 넣지 않고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나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로부터 잠시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그림책은 딱 그런 책이었고 놀이터의 아이들도 그랬다.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지 못한 채 마음껏 소리 지르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은 이야기를 떠벌리고 더우면 옷을 마구 벗어젖히고. 마음이 체에 담아 여러 번 걸러 낸 것처럼 깨끗해졌다. 몸을 씻듯이 마음을 씻어 낸 기분이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은 하루였다.
그리고 밤이 왔다. 베란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머리가 휘날리고 이 시를 찾아 읽으며 생각했다. 마음에 바람이 자주 불어서 드나드는 나쁜 미움들이 다 떠나 버리기를, 그런 날이 자주 있기를.
순수한 글과 아이들이 필요하다. 읽어야 하고 보아야 한다고 느낀다. 그렇게 마음을 자주 씻어 내고 언젠가는 아주 맑은 글을 쓰고 싶다.
-
오늘 같이 있어박상수 저 | 문학동네
비평과 시작(詩作)이 별개의 작업은 아닐 것이나, 그의 시 속에서 우리는 한결 더 자유롭고, 과감하고, 풍부한 감정과 목소리로 말하는 시인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물론 여일하게 날카롭고, 다정하고, 재미있다!
오늘 같이 있어
출판사 | 문학동네
오늘 같이 있어 - 문학동네시인선 109
출판사 | 문학동네

백세희(작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5년간 일했습니다. 10년 넘게 기분부전장애(경도의 우울증)와 불안장애를 앓으며 정신과를 전전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를 지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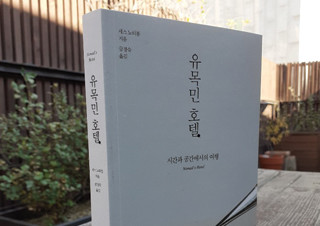
![[큐레이션] 추천하지 못했던 책들을 고백합니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6-fea78c13.jpg)
![[추천핑] 여름밤에는 외계인, 토마토, 모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22-8ece4fb3.jpg)

![[취미 발견 프로젝트] 독서하고 싶은 공간 만들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26-346177ac.png)
![[큐레이션] 잠들면 안 돼! 정월 밤의 시집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11-03a0c11d.jpg)





tjdud4378
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