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젠가 읽은 세스 노터봄의 『산티아고 가는 길』, 더 전에 읽은 라인홀드 메스너의 『검은 고독 흰 고독』 , 그즈음 읽었던 장 그르니에의 『섬』 . 내가 좋아하는 이 책들은 모두 어딘가에 관해 쓴 글이다. 산이기도, 섬이기도, 사막이기도, 강이기도 한 그곳. 그 책들의 더 근본적인 공통점은 더할 수 없이 문학적인 글이라는 것. 나는 『검은 고독 흰 고독』의 한 구절을 책상 벽에 오랫동안 붙여 놓았었고, 괜찮은 사람을 알게 되면 『섬』 을 선물하곤 했다. 『산티아고 가는 길』은 아껴가며 읽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섭렵하고 여러 언어를 해독할 줄 알고 스페인을 제2의 고향이라 할 정도로 좋아하는 세스 노터봄이 쓴 스페인 여행기는 특별했다. 여행과 문학은 그렇게 오랫동안 나의 주제였고, 책을 만들고 있는 지금도 나는 그런 책이 더 많이 출간되기를 기다린다.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문학적 여행가들의 글을.
편집자로서 책을 만드는 일보다 독자로서 책을 읽는 일이 훨씬 즐겁다는 걸 책 만드는 일을 시작하고 바로 깨달았다. 그러나 그 밑지는 느낌을 은근히 풀어주는 처방이 있으니, 바로 ‘내가 이 책을 독자들에게 소개했다’는 뿌듯함이다. 그런 점에서 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책이 세스 노터봄의 여행서들이었고, 어느 날 문득, 나 같은 독자들이 노터봄의 책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노터봄의 여행서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했고, 네덜란드어를 우리말로 바로 옮기고 싶었던 참에 다행히 네덜란드에 사는 번역가와 의기가 통했다. 우리는 노터봄이 쓴 여러 권의 여행서 중 『유목민 호텔』 을 첫 책으로 정했다. 그가 수십 년에 걸쳐 여행한 장소들이 매우 흥미로웠고, 특히 아프리카와 페르시아에 대한 그의 관찰이 궁금했기에.
소설가이자 시인인 세스 노터봄은 여행 경험이 많은 작가다. 1950년대에 고향 네덜란드에서 남미의 수리남까지 운항하는 장거리 선박의 선원으로 첫 장기여행을 한 후부터 지금까지 여행을 멈춘 적이 없다고 한다.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체험한 경험들은 작품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 발표한 아홉 권의 소설과 여러 권의 여행서에 다양한 주제로 담겨 있다. 이 책 『유목민 호텔』 역시 그가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와 호주에 걸친 여러 공간과 시간을 여행하며, 그곳에서 보고 느끼고 만난 모든 것을 언어로 돌아본 글이다.
『유목민 호텔』 에서의 노터봄은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게 없고, 어디에 반드시 당도해야 한다는 조바심 따위는 애초에 가져본 적이 없고, 혹시나 일정이 꼬여도 ‘길은 멀리 있다’고 여유를 부리는 참된 여행자의 모습이다. 그는 한없는 고요함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온통 시끌벅적한 시장 한복판에서는 무한한 호기심을 느끼며 모래 먼지 가득한 사막을 달리면서도 불평할 줄을 모른다. 알베르토 망구엘의 표현대로 그는 “양말과 치약보다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그의 짐을 더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고, “기억 속의 책들과 사랑하는 작가들을 한 꾸러미 짊어지고 길을 떠난 작가”들 중 한 명이다.
편집자라는 역할이 좋을 때가 가끔 있다. 기다렸던 글을 제일 먼저 읽고, 기대했던 만큼 좋은 글이어서 눈이 빠지게 교정을 보면서도 일이 지루하지 않을 때, “예전과 다름없는 똑같은 짜릿함.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보는 일, 읽을 수 없는 표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실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종교, 당신을 밀어내는 풍경, 공유할 수 없는 삶. 나는 요즘 그런 것들을, 이상한 말이긴 한데, 축복으로 여긴다. 완전히 낯선 것이 주는 충격에는 은은한 관능이 있다” 같은 문장을 나 혼자 읽고 음미할 때.
모노 톤의 표지에 싸인 『유목민 호텔』 을 다시 한 번 읽다 보니 아, 세스 노터봄이 시인이기도 하지, 하는 생각이 새삼 떠올랐다. 곳곳에 시인의 감성이 담긴 아름다운 문장들이 참 많다. 누군가의 흔적이 남아 있거나 누군가가 사는 그곳의 바람과 냄새를 느끼고, 그곳에 사는 얼굴들을 보고, 그들의 눈빛을 읽고, 눈빛이 다 전하지 못한 말을 헤아려보고, 내 안과 밖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낸 시인인 소설가의 산문. 그의 시선 덕택에 아프리카와 사하라의 가장자리와 페르시아를 다르게 느낄 수 있었다. 쉽게 가기는 어렵지만 잘못 알기는 쉬운 곳들이기에.
창을 통해 12월의 햇빛을 바라보고 있자니 올해는 참으로 길었다 싶다. 시작점으로 돌아갈까 싶어 자주 뒤를 돌아봤었다. 이제는, 여기까지 왔으니 그 세월을 가볍게 걸치고 더 걸어보자는 생각이 든다. 노터봄의 말대로 ‘길은 멀리 있고’, 이미 내 안에 들어온 풍경을 나는 거역하지 못할 것이다.
-
유목민 호텔세스 노터봄 저/금경숙 역 | 뮤진트리
모르는 게 없는 듯한 노터봄의, 오래된 장소를 읽는 관찰자로서의 경이로운 재능과 독서와 학문의 풍요로움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어디에서건 이방인으로 존재하는 짜릿함을 즐기고, 진정한 이방인의 시선으로 그곳을 관찰하며, 자신이 본 것의 언저리를 언어로 돌아보고자 했던 작가이다.

박남주(뮤진트리 편집자)
‘일희일비하지 말자’를 일상의 지침으로 삼고, 책을 고르고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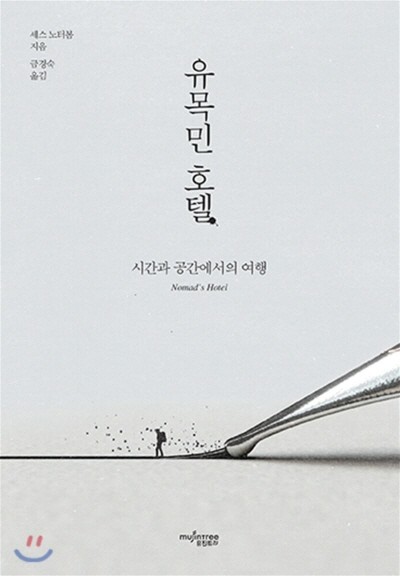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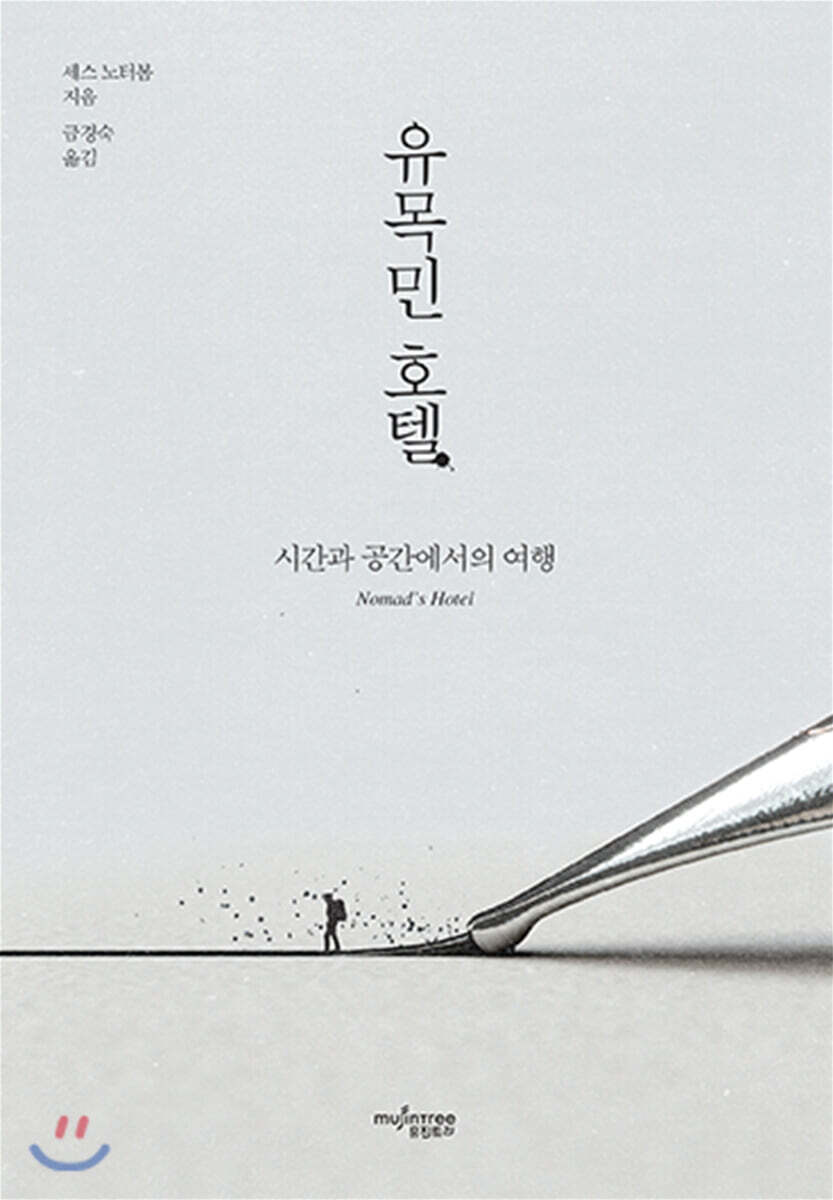




![[이상하고 아름다운 책] 새로운 사람 되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21-3535c16f.jpg)

![[비움을 시작합니다] 네가 변해야 모든 게 변한다 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1-ebeed89d.jpg)
![[취미 발견 프로젝트] 여행을 떠나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2-9133ca15.jpg)
![[예스24 리뷰] ‘미친 매지’에서 연쇄살인마까지, 여성의 괴물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02-fe92630f.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