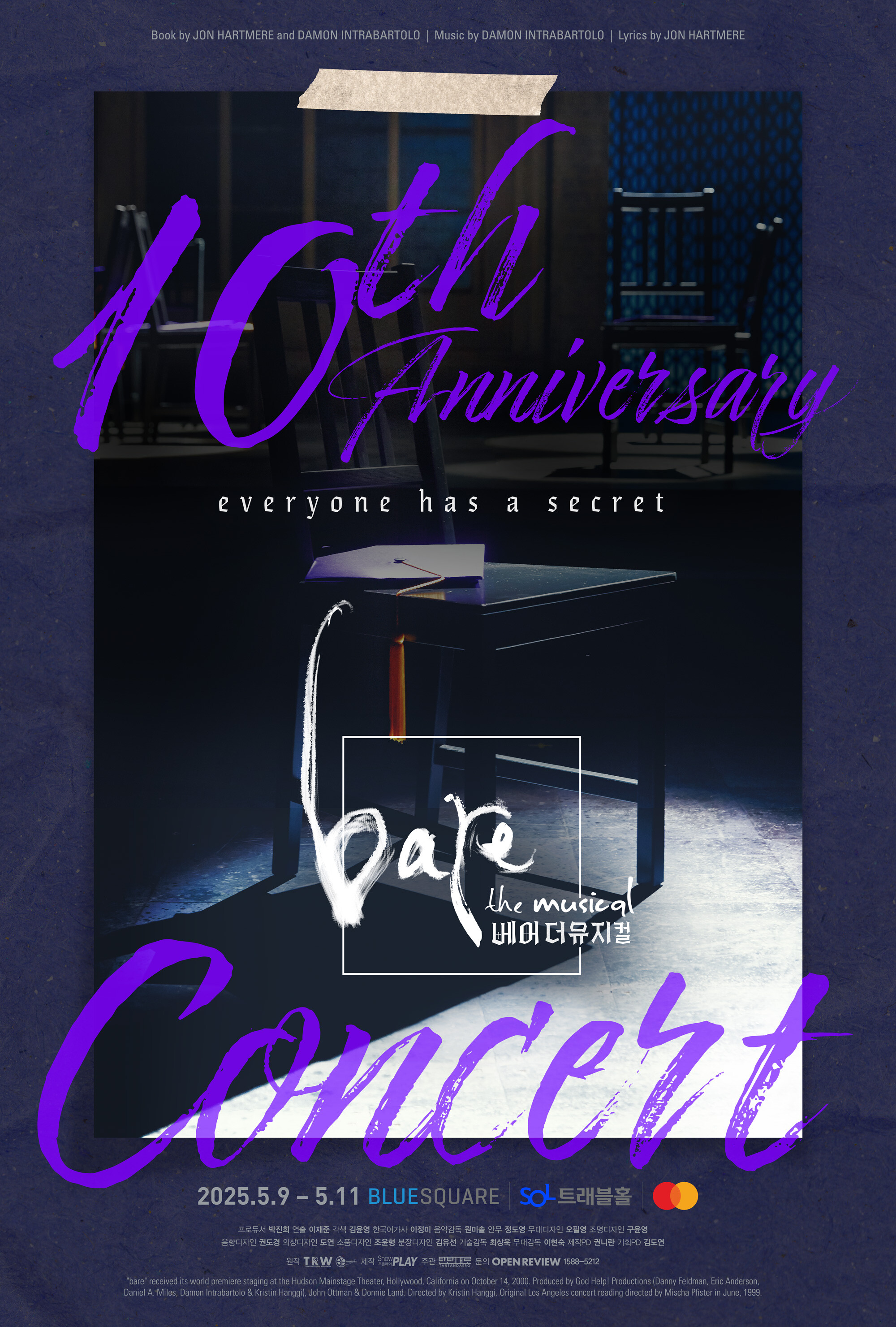영화 <살아남은 아이>(2017)의 첫 장면은 가정집 천장을 뜯어내는 인테리어 업자 성철(최무성)의 얼굴로 시작한다. 마감재를 뜯어내 그 안쪽을 들여다보는 일은 고단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뜯어보지 않으면 어디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스는지 알 수 없다. 아마 영화 전체의 줄거리를 상징적으로 축약한 오프닝일 것이다. <살아남은 아이> 또한 보기 좋은 거짓말로 간신히 덮어둔 비극의 포장을 뜯어내어 상처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영화니까. 대사 한 마디 없이 진행되는 이 장면에서 감정이라 할 만한 걸 보여주는 건 성철의 얼굴뿐이다. 쇠지렛대에 힘을 싣는 성철의 얼굴엔 익숙한 피로와 다소간의 짜증이 어려 있는데, 내장재 안쪽에 가득한 습기와 곰팡이를 보며 내뱉는 그의 탄식은 영화의 앞날을 예고한다. 그의 속내도 사실 이처럼 걷잡을 수 없는 비탄에 젖어 있음을 곧 발견하게 될 테니. 복잡한 속내와 불길한 예감을, 최무성은 입 한 번 안 떼고도 얼굴만으로 표현해낸다.
그런 얼굴들이 있다. 온갖 극적인 요소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마치 확성기처럼 증폭시키는 얼굴. 최무성의 얼굴 또한 그렇다. 끝이 날렵하게 빠진 눈은 그 빛이 제법 매서우나, 필요하다면 섬세하게 진 쌍꺼풀로 누그러뜨릴 수 있다. 작은 입은 굳게 닫는 순간 집요해 보이지만, 부피감이 있는 입술 덕에 조금만 웃어 보여도 인상은 드라마틱하게 푸근해진다. 강인한 턱과 단단한 하관이 인물의 감정을 지탱해주는 가운데, 깎은 듯한 광대가 인상에 무게를 실어준다. 그리고 그 모든 요소들은, 얼굴 한가운데를 굵고 힘있게 가로지르는 그의 콧대를 통해 관객의 시야에 꽂힌다. 일말의 주저도 없이 일직선으로 시원하게 뻗은 그 콧대는, 인물이 느끼는 희로애락을 정면으로 쏘아 올리는 위력을 지녔다. 그의 초반 필모그래피가 <세븐 데이즈>(2007)나 <악마를 보았다>(2010) 등의 소름 끼치는 악역들에 몰려 있던 것도, tvN <응답하라 1988>(2015-2016)의 택이 아버지가 유달리 대사가 적었던 것도 아마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성능 좋은 확성기와 같은 얼굴의 위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어느 연출자라고 떨쳐낼 수 있었을까?
SBS <녹두꽃>이 5척 단신의 작은 키 탓에 별명이 ‘녹두’였던 전봉준 역할을 굳이 키 182 cm의 거구 최무성에게 맡긴 것 또한 그 때문일 것이다. 고부 장터 약재상에서 말없이 작두로 약재를 썰던 첫 등장부터, 혁명의 동지들과 함께 거사의 방향을 논하는 장면들에서, 이 단호하고 타협을 모르는 혁명가는 입을 닫고 있는 순간조차 온 얼굴로 제 뜻을 웅변한다. 선운사 앞마당에 구름처럼 몰려들어 부패한 관군을 무찌르는 혁명군을 가리키며 전봉준은 말한다. “보시오, 새 세상이오.” 확신과 신념으로 가득 찬 전봉준의 말이 최무성의 얼굴을 통해 육화되는 순간, 시청자들은 동학농민혁명이 어떻게 끝났는 줄 알면서도 그의 말을 믿게 되는 것이다. 신념을 향해 한치의 의심 없이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저 직선적인 콧대의 사내를, 뉘라고 쉬이 거부하겠는가.

이승한(TV 칼럼니스트)
TV를 보고 글을 썼습니다. 한때 '땡땡'이란 이름으로 <채널예스>에서 첫 칼럼인 '땡땡의 요주의 인물'을 연재했고, <텐아시아>와 <한겨레>, <시사인> 등에 글을 썼습니다. 고향에 돌아오니 좋네요.











![[더뮤지컬] "숨통 트이는 공간" 뮤지컬 무대 돌아온 황정민…<미세스 다웃파이어> 제작발표회](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10-bdb9df6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