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스플래쉬
실제로 나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했다기 보다는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은 쪽에 가깝다. 내 쪽에서는 가끔 사람들이 왜 아이를 낳기로 마음먹는지 진심으로 궁금하기도 하다. 아이를 낳겠다는 결정은 지금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선택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낳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껏 살던 대로 사는 쪽이 기본값이 아닐까.
- 제현주, 『일하는 마음』 7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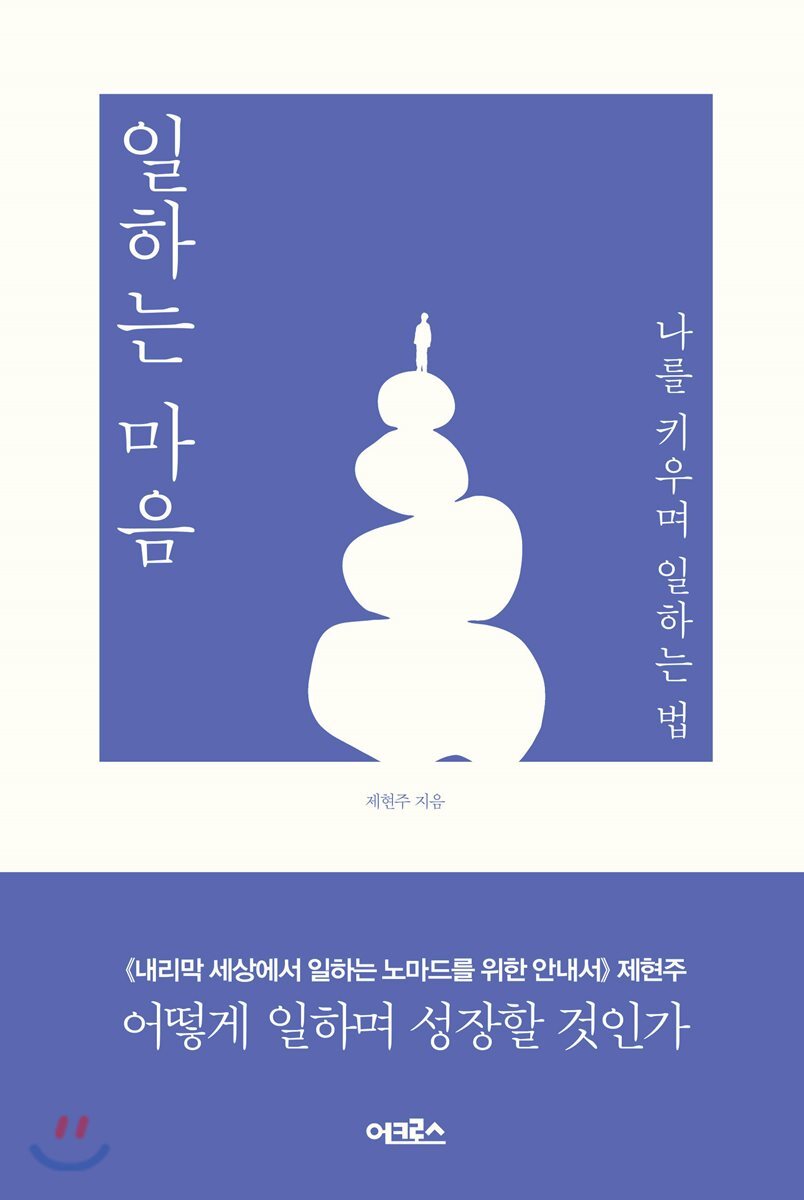 |
 |
동의한다. 사랑한다고 결혼해야 하는 것도, 결혼한다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도 더 이상 상식은 아니다. 당연하게 거쳐야 할 스텝이란 건 인생에 없다. 내면의 목소리, 각자가 처한 조건들을 잘 살펴보면서 저마다의 길을 저마다의 시기에 걸으면 된다.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는 질문은 상대방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존중하지 않는 질문이다. 결혼을 하기로 한, 아이를 낳기로 한 마음을 묻는 일이 자연스럽다.
아이를 낳는 일에 잘 다듬어진 이유를 댈 수 있다는 건 아니다. 결혼의 경우, 눈 앞에 아내가 있고 아내와 함께한 추억이 있고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부분적으로라도) 알았다. 생각이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눈 앞에 없고, 아이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막연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나의 진짜 마음을 알기 힘들었다. 아내도 그렇다고 했다. 아이가 없는 데 아이에 대해 생각한다는 건 불가능했다. 둘의 삶이 만족스러웠으므로 굳이 생활에 변화를 줄 필요도 없었다.
“아이를 꼭 낳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건 확실하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아니라는 걸 결코 간과할 수 없었다. 아이에 관한 우리의 생각들은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그렇다면 일단 둘의 생활을 유지하는 게 옳았을 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쩐지 가능성의 문은 열어두고 싶었다. 숙고해도 결정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양쪽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자연스레 그 삶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이는 찾아왔다.
나는 늘 숙고(熟考)하고, 장고(長考)한다. 숙고하고 결정하기를 항상 원해왔다. 역사를 전공으로 택한 것도, 스물 여섯에야 입대를 한 것도, 책의 주변에서 일을 하기로 한 것도 모두 깊이 그리고 오래 생각한 후에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생각이 먼저 있고 결정이 뒤에 있다고 해서 결정이 생각의 결과인 건 아니다. 대체로 나의 숙고는 하나의 명쾌한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각각의 선택지들 저마다의 이유만 빽빽하게 늘어나는 형태였다.
결정은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했다. 역사 이야기가 재밌어서 전공을 택했고, 대학생활이 재밌어서 오래 머물다 보니 입대가 늦었다. 책을 둘러싼 낭만적 기운이 나의 진로를 결정지었다. 마음을 따랐을 때 발생할 문제들이 늘 예상되기 마련이었지만, 나름의 큰 결정을 내릴 땐 결국 마음의 힘이 세게 작용했다. 물론 긴 생각의 결과, 마음을 따라도 아주 큰 리스크는 없다는 점은 판별되었기 때문이겠지만.
아내에게 청혼하는 것도 그랬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꼭 결혼이라는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오래 품었고, 결혼이라는 제도가 ‘두 사람의 온전한 결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늘 의식하고 있었지만, 아내와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어서) 나아가고 싶고 우리는 여러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으리란 어떤 고양된 마음이 나를 움직였다.
아이를 낳는다는 결정도 결국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한 것 같다. 생각하고 생각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 문제를 “아이를 낳는다는 가능성을 닫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이 결정한 것 같다. “아이를 꼭 낳고 싶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 중 어느 쪽이 내게 가까운 마음일까를 생각할 때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가능성을 닫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힘 센 마음이었다. 왜 ‘낳고 싶다’라는 분명한 욕망으로 드러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마음의 힘이 ‘숙고’로는 넘을 수 없는 문턱을 넘게 만든 것 아닐까.
그러니 왜 아이를 낳기로 했냐는 질문에 대해, 나는 선명한 답을 내놓을 수가 없다. 다만 어떤 문턱을 넘는 것은 꼭 ‘생각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정도의 답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마음의, 설명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도 어떤 길에 들어서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뿐이다.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게 존재했던 나의 마음이 나를 부모로 만들었다고. 이런 똑 부러지지 않은 답으로도 부모가 된다.
아이라는, 책임이 막중한 존재에 대해 생각하는 일을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얻을 때까지 더 많이 생각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어쩌면 옳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인생사란 생각한다고 모두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많은 것들이 생각대로 결정되지는 않고, 그게 바로 사람과 세상의 난해함이자 매력이자 본질이라 말한다면 너무 합리화 하는 걸까.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대상에게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감은 애초부터 그걸 소유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내가 그렇게나 좋아해 마지않는 개 고양이를 10년째 기르지 않는 이유이며, 늦었지만 이제야 그 목록에 식물이 추가되었다.
- 이석원, 『우리가 보낸 가장 긴 밤』 68쪽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최대한의 책임감이라는 말을, 이미 아이를 낳은 상황에서 (낳은 게 소유는 아니지만) 읽는다. 그 말에 깃든 마음에 완전히 동의한다. 아이가 우리에게 온 직후 자주 곱씹었다. 내겐 낳지 않는 선택지는 지나갔고, 책임을 진다는 선택지만 남았다는 사실을. 혹여 더 숙고를 했어야 했다면, 나는 앞으로의 삶으로 부족한 숙고를 메워보겠다는 다짐을.
똑 부러진 답 없이도 문턱을 넘는 건 허용될 수 있지만, 문턱을 넘어 놓고 책임지지 않는 삶은 허용될 수 없다. 아이를 왜 낳기로 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모호했지만, 아이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답은 모호해선 안 된다. 본격적인 숙고의 질문은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는 순간이 아니라, 아이가 오고 나서 내게 왔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
우리가 보낸 가장 긴 밤이석원 저 | 달
변함없이 감탄을 자아내는 일상의 절묘한 포착과 그만의 친근하면서도 날카로운 언어로 감동을 자아내고 어느 때보다 고요히 자신과 세상의 삶을 응시한다.

김성광
다행히도, 책 읽는 게 점점 더 좋습니다.











![[에디터의 장바구니] 『과학하는 마음』 『영릉에서』 외](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22-a6af176f.jpg)
![[인터뷰] 손원평, 젊음의 나라에서 자유로이 탐색하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6-50882152.jpg)
![[더뮤지컬] <쇼맨> 수아, 미래에서 오늘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14-d81fb2c1.jpg)

![[리뷰] 멈추고 바라보는 연습](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23-0c8ad84b.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