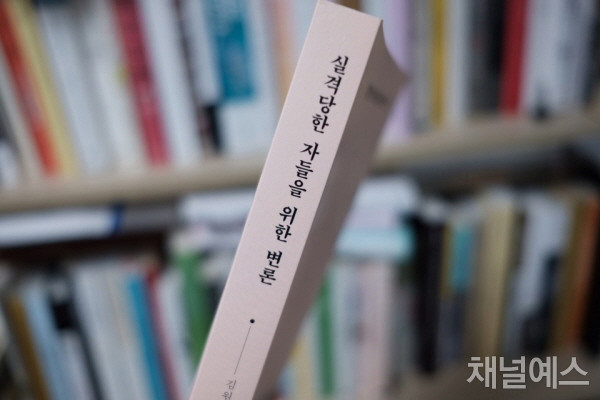
책 한 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작은 이야기가 하나씩 보태지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 또 한 편의 후기를 쓴다. 저자 김원영과 나는 2009년 중반쯤에 처음 만났다. 당시 나는 푸른숲 출판사에 다니던 4년차 편집자였다. 여느 때처럼 조금은 귀찮은 마음으로 투고 메일을 하나씩 열어보는데, “저는 서울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지체장애인입니다”라는 대단히 전략적인 멘트(후에 그도 전략이었음을 고백했다)로 시작하는 메일이 있었다. 그 전략은 보기 좋게 적중하여 나는 다소 들뜬 마음으로 파일을 열었다. ‘아, 드디어 나도 베스트셀러 편집자가 되는 것인가!’ 그런 기대는 채 한 페이지를 읽기도 전에 깨져버렸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편집자 이전에 언제나 그의 새 글을 기다리는 성실한 애독자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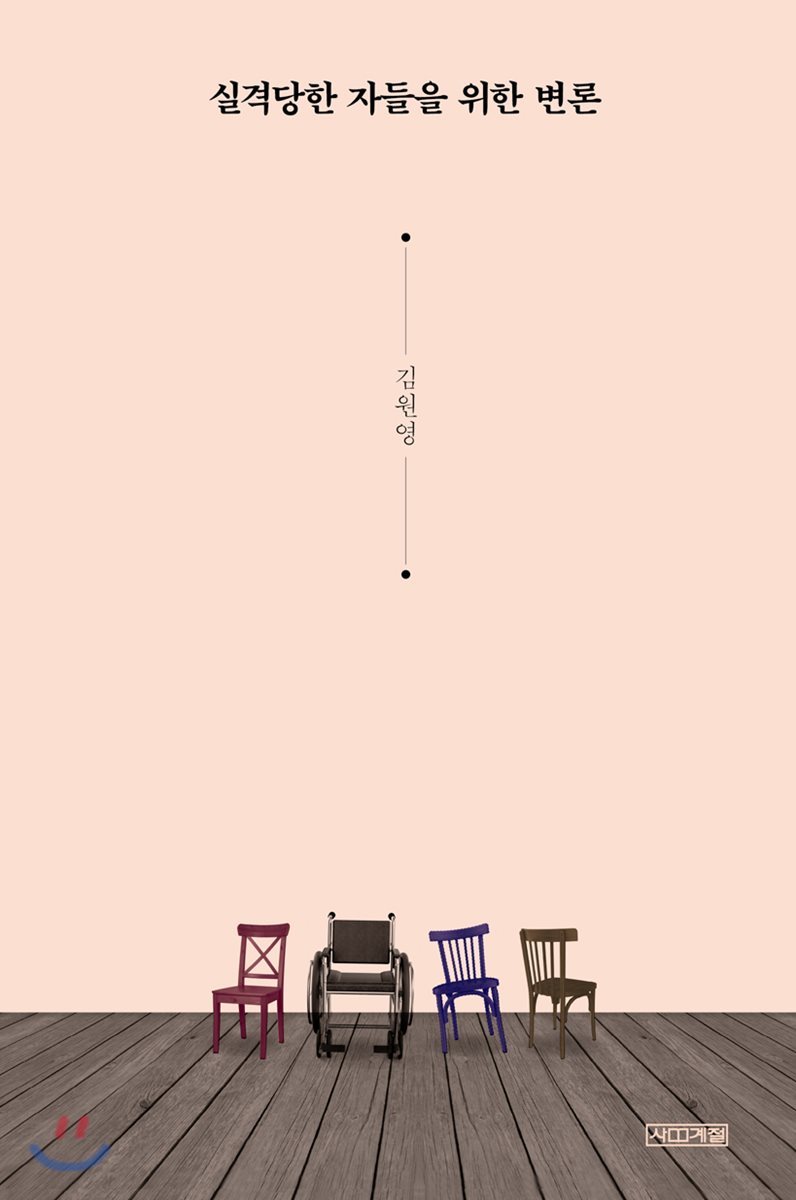 |
 |
가난한 집에서, 수시로 뼈가 부러지는 골형성부전증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는 열다섯 살까지 집 안에서만 살았다. 그러다 장애인 특수학교와 일반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에 진학했고, 투고 메일을 보낸 시점에는 서울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이런 입지전적인 경력의 소유자가 “나는 단 한 번도 장애를 극복한 적이 없다.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될 생각은 없다. 나는 야한 장애인, 뜨거운 인간이 되고자 한다!”라는 분노 섞인 외침을 담아 한 권 분량의 글을 보내온 것이다. 처음에 눈에 띈 것은 분노였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여전히 걷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20대 청년의 뜨거운 마음이었다.
그를 처음 만나러 가던 길이 생각난다. 휠체어를 탄 사람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기는 처음이었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지? 혹시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머릿속으로 온갖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막상 그와 마주 앉은 동안에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까맣게 잊었다. 그렇게 우리는 원고 작업을 시작했고, 어떤 책에나 있을 법한 산통을 겪은 뒤 이듬해 4월 책이 나왔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저자가 저자인 만큼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로도 장애, 인권 분야에서 꾸준히 읽히는 책이 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나는 줄곧 미진한 느낌이 들었다. 당시의 나로서는 최선이었지만, 책을 연출하고 알리는 내 능력이 그의 글에 미치지 못한다는 느낌이었다.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그가 지금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좋은 글을 더 많이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채감 같은 게 마음에 남았다.
그해 12월에 나는 첫 아이를 낳으며 휴직에 들어갔고, 1년 후 퇴사를 하면서 자의반 타의반 3년 넘게 일을 쉬었다. 내가 두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그는 변호사가 되고 가끔은 연극도 하며 나름대로 자기 세계를 만들어나갔을 것이다. 일을 쉬는 동안에도 나는 틈틈이 검색창에 그의 이름을 쳐서 새 글을 찾아 읽곤 했다. 그때는 편집자로서의 자존감이 바닥인 상태였기 때문에 과연 언젠가 그의 글을 모아 또 한 권의 책을 낼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었다. 그냥 애독자여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 후 편집자가 아닌 다른 일을 상상해내지 못한 나는 사계절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고, 어느 정도 회사에 적응한 뒤 그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두 번째 책을 낼 때가 되었다고. 자기 안에 아직 할 말이 쌓이지 않았다느니, 첫 책을 낸 회사와의 의리는 어쩌냐느니 등등 온갖 핑계를 대며 그는 책 쓸 결심을 뒤로 미루었다. 변호사가 되었고, 국가기관에서 장애인 차별 문제를 다루어온 경험이 있는데 할 말이 쌓이지 않았다니! 의리? 의리는 나한테 지켜야지! 긴 설득 끝에 결국 2016년의 어느 날, 그가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가기 직전에 가까스로 계약서를 주고받았다. 드디어 내 오랜 부채감을 덜어낼 기회가 왔다.
첫 책의 에필로그에서 그는 자신과 같은 소수자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준 용기 있는 사람들의 자유와 연대의 힘을 증언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30대에는 증언이 아니라 변론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번 책은 바로 그 변론을 담았다. 장애나 질병, 가난, 볼품없는 외모, 다른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실격당한 인생이라 여겨지는 이들도 그 존재 자체로 존엄하고 매력적임을 증명해 보이는 작업이었다. 첫 책과 마찬가지로 자전적 이야기가 한 편을 흐르긴 하지만, 그에 더해 그동안 법률가이자 연구자로서 수집해온 법적, 사회적, 철학적, 경험적 증거들을 모아 한 편의 긴 변론서를 작성했다.
초고부터 마지막 OK지까지 읽을 때마다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울컥하곤 했다. 한 번은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안팎으로 쉴 틈 없이 싸워온 그의 마음이 되어, 또 한 번은 걷지 못하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맘 편히 쉬지 못했을 그의 엄마 마음이 되어, 또 어떤 때는 자신의 어떤 특성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못해 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는 누군가의 혹은 나 자신의 마음이 되어... 그가 이 변론을 완수해내기 위해 힘겹게 쌓아 올렸을 논리, 그 긴 사유의 과정, 괴로움의 시간이 상상이 되어 어떤 날은 그에게 원고를 독촉해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기도 했다.
어렵사리 마감을 하고 돌아보니, 나는 아직 그 오랜 부채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내 실력이 조금은 늘었으리라 생각했지만, 여전히 나는 그의 글에 충분히 가닿지 못한 느낌이다.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 각자 조금씩은 아쉬운 마음이 남았다는 걸 서로 잘 알고 있다. 그가 책의 맨 뒤에 적었듯이, 20대가 끝나갈 무렵에 첫 책을 함께 한 우리는 30대의 끝자락에 또 한 권의 책을 낸다. 여기서 남은 부채감과 아쉬움이 40대에 또 한 권의 책을 만들 원동력이 되려나. 아무래도 좋다.
서문에서부터 나를 울컥하게 한 문장이 있다. “장애에 대해서, 내 존재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게 더 이상 쉽지 않았다. 나도 다른 이들처럼 인공지능이나 부동산 투자, 드론의 원리에 대해 공부하고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증언도 변론도 모두 마친 40대의 김원영과는 더 이상 장애나 인권, 소수자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드론의 원리에 대한 책을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김원영 저 | 사계절
어떤 특징과 경험과 선호와 고통을 가진 사람인지를 드러낼 무대가 주어진다면, 소수자들 스스로가 ‘인간 실격’이라는 낙인에 맞서 자신을 변론할 수 있으리란 전망을 제시한다.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출판사 | 사계절

이진(사계절출판사 인문팀장)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채널예스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인터뷰] 손원평, 젊음의 나라에서 자유로이 탐색하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6-50882152.jpg)
![[김승일의 시 수업] 시 창작의 방어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9-9a04de6c.png)
![[리뷰] 로봇의 반란](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23-cfc8159f.jpg)
![[예스24 취미 발견 프로젝트] 다채롭게 세계를 감각하는 법](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02-e3231ede.jpg)
![[큐레이션] 저속 노화에 관심 있다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13-df64f2c6.jpg)



young13579
2018.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