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 제의를 받을 때 채널예스 미남 담당자가 했던 말이 오늘 문득 떠올랐다.
‘간혹 잘 알려지지 않은 음악을 소개해도 좋아요.’
그래 이때다. 그동안 잘 알려진 아티스트를 이야기해온 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이 칼럼도 두 달쯤 지났으니 바로 그 ‘간혹’에 해당한다고 해도 되겠지. 그래서 오늘은 이탈리아 롹 밴드 데르디앙(Derdian)에 대한 얘기를 꺼내련다. (아아, 다 아는 뮤지션이면 어쩌지)

십년 전에 이탈리아에 갔었는데 그때 제 점수는요, 굉장히 저렴했다. 사람들의 인간성이 개떡 같았기 때문이었다. 길에서 생선을 메고 가는 남자도 화보일 정도로 비주얼이 뛰어났으나 반대로 내면은 아주 못생긴 사람들이라는 표본을 잔뜩 수집할 수 있었다. 운이 나빴는지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혈질이고, 갖은 지랄로 내게 까칠함을 선사했다. 성질 더러우면서 잘생긴 걸로는 나 역시 한반도에서 만만치 않았는데도 이탈리아 반도에선 오징어 신세였다.
그런데 웬일인가. 작년에 다시 이탈리아에 갔을 때는 그 성질머리들 다 전학 갔나 싶을 만큼 분위기가 싹 달랐다. 만나는 사람들이 죄다 착하고 살가웠다. 아니 무슨, 길을 묻는데 잘 안내해 주질 않나, 물건을 살 때 고맙다는 말을 하질 않나, 심지어 숙소의 리셉션 여직원은 내가 지나갈 때마다 상큼한 뻐꾸기까지 날려줬다. 이게 뭐지? 내가 이탈리아 말고 삼탈리아에 잘못 왔나?
아마도 십 년 전엔 내가 돈 안 쓰게 생겼고, 꼬질꼬질한 냄새가 나는 백패커라서 배척당했던 건인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바뀐 세대가 기성세대의 격심한 까칠함에 시달리다 못해 자신들은 안 그럴 테다, 하고 반항하며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한 건지도. 다만 사람들의 비주얼은 예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보였다. 외면을 포기하고 인격의 아름다움을 신장한 걸로 보였다.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나로선 받아들이기 참 요상했다. 운이 좋았을 뿐, 이탈리아에서라면 분명 어디선가 잘생긴 생양아치들이 대기하고 있다 보란 듯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러나 이탈리아를 한 달 넘게 여행하도록 까칠한 경험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 다만 피렌체에서 아앙, 그 아름다운 피렌체에서 만난 한 할머니만 내 기대를 충족(?) 시켜줬다.
나는 싼 숙소를 찾아 피렌체 외곽의 스칸디치라는 곳에 묵었다. 사람이 별로 없고, 매표소도 없는 트램 역이 하나 있는 동네였다. 플랫폼에는 십대 양아치로 보이는 남자애들 서넛이 섀도복싱을 하며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티켓을 끊는 유일한 기계는 영문 지원이 안 돼 나는 그 앞에 서서 잠시 연구를 해보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한 할머니가 이탈리아 축구선수 발로텔리처럼 공간을 파고들며 나를 밀쳤다.
“요 버튼 누르고, 돈 넣으란 말이야! 이러면 표가 나오잖아!! 이게 어려워?!!”
이탈리아어였지만 딱 그런 얘기가 아닐 수 없는 행동과 말투였다. 할머니는 엔터키에 해당하는 버튼을 누를 땐 주먹으로 뻑 때리기까지 했다. 발로 차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을 만큼 맹렬한 분노였다.
“오호, 역시! 이래야 이탈리아지!”
나도 모르게 환호가 나왔다. 그녀는 표를 뽑고 나서도 계속 씩씩거렸다. 할머니 입장에선 트램이 곧 들어올 텐데 내가 버퍼링 중이라 마음이 다급해진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전광판을 보자 5분이 남았다고 적혀 있었다. 혹시 그 할머니는 소싯적에 글로벌 소개팅 나갔다가 동양 남자한테 대차게 바람맞은 적이라도 있는 걸까. 난 평생 굼뜬 사람 취급받은 적이 없는데 그 아날로그 기계를 현지인처럼 사용하지 못한다고 욕먹은 게 좀 억울했다. 십대 남자애들은 섀도복싱을 멈추고 나와 할머니를 빤히 쳐다봤다. 나는 할머니에게 따져보고 싶었다.
“거 모를 수도 있지, 화부터 내다니 너무한 거 아니오? 한국에 초대할 테니 지하철 표나 제대로 끊는지 한 번 봅시다.”
그렇지만 자기네 동네 할머니에게 응전한다고 판단하면 껄렁한 십대들이 개입할까봐 나는 꾹 참았다. 그런데 다시 표를 끊기 위해 이탈리아어 스캔 어플을 켜는 내게 남자애들이 슬금슬금 다가왔다. 어우 젠장, 피렌체 외곽의 칙칙한 동네에서 뭔가 투닥투닥 소리가 나겠다는 걱정이 밀려왔다. 거 참 액션 활극 찍기 딱 좋은 날씨였다. 한데 십대들 중 하나가 띄엄띄엄 영어를 썼다.
“우리가 도와드릴게. 어디까지 가?”
“산타마리아 누벨라.”
“그럼 이거 누르고, 여기 1.20유로 투입.”
가까이서 보니 아주 착한 눈빛을 가진 친구들이었다.
“고마워. 너희 엄청 친절한데?”
“됐다고. 할머니 대신 우리가 사과할게. 부디 잊고 즐거운 여행 하는 걸로.”
그 친구들은 내가 트램을 타자 창밖에서 손까지 흔들어줬다. 아아 여기가 이탈리아 맞나. 애들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그렇다. 이탈리아가 정말로 뭔가 달라진 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내게 이탈리아란 호감이 많이 가는 나라다. 오래전 이탈리아 프로그래시브 롹밴드들의 빠돌이었고, 이탈리아 음식은 뭘 먹어도 혓바닥이 감탄사를 내지르며,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장소가 넘치는 나라다. 예쁘고 감각적인 물건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죄다 만드는 데다 이제는 유일한 단점이었던 성질머리도 착해지는 추세인 것이다.
피렌체를 떠날 무렵 사람들의 친절과, 특히 그 십대 청소년들의 미소를 떠올리자 이탈리아 밴드의 음악을 듣고 싶어졌다. 나는 한 와이파이 빠방한 카페에 앉아 페로니를 마시며 데르디앙의 음악을 기분 좋게 들었다.
데르디앙은 힘 있고, 시끄럽고, 빠르고, 묵직한 음악을 하는 메탈밴드다. 헤비메탈을 하는 친구들답게 일단 생양아치 같은 인상을 쓰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다들 눈빛이 선하다. 패션은 전혀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느낌이 안 들만큼 촌스럽게 입었으나 좋아하다보니 나름 감각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그들의 음악은 강력한데도 쉽고 친절하고 신나는 뉘앙스를 품고 있다. 분명 쓰래쉬/파워/스피드메탈을 추구하는데 멜로디가 뚜렷하고, 일말의 서정성도 번뜩인다. 아래 소개할 뮤직 비디오에는 기타 치는 폼이 웃겨서 유머감각까지 담겨 있다. 굳이 무슨 카테고리를 대입해 이 친구들은 무슨 장르를 하는 밴드다, 그렇게 규정하는 게 어렵다. 사실 그러는 게 의미도 없고. 그냥 데르디앙의 음악 안에는 여러 종류의 음악적, 감각적 센스들이 녹아들어 있는데 이탈리아 음식들처럼 유난히 내 입맛에 다 맛있는 소리라는 생각이다.
그들의 음악 중에서 나는 흑장미Black Rose 라는 곡을 가장 좋아한다. 백문이 불여일청, 링크로 소개하고 오늘의 턴테이블을 마칠까 한다.
어우, 노래도 영어로 부르네. 거 참 친절하죠?
[관련 기사]
- 박상 “웃기고 싶은 욕구는 변하지 않아”
- 스뽀오츠 정신과 부드러움이 필요한 시대
- 드레스덴 축제의 매혹적인 단조
- 감상적인 플랫폼과 대치하다
- 다프트 펑크 「겟 럭키」와 스페인 이비자 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박상 (소설가)
소설가. 장편소설 『15번 진짜 안 와』, 『말이 되냐』,『예테보리 쌍쌍바』와 소설집 『이원식 씨의 타격폼』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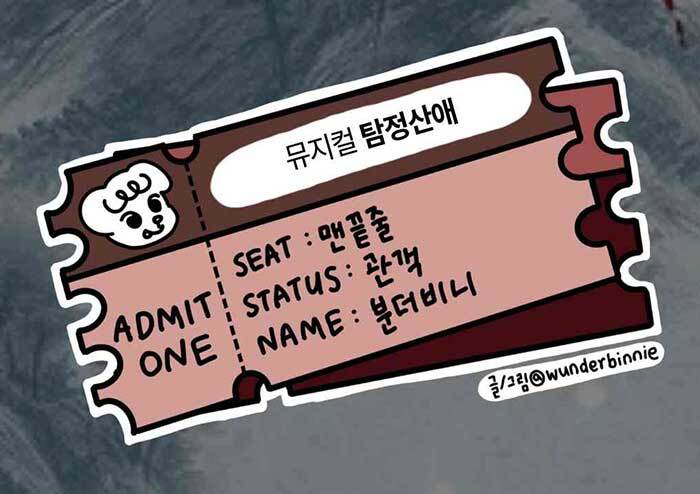
![[리뷰]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08-1a283524.jpg)
![[미술 전시] 론 뮤익 개론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30-49a532fe.jpg)

![[더뮤지컬] <천 개의 파랑> 진호·효정, 행복의 곁에 서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27-59f5387a.png)








앙ㅋ
2015.02.15
kenziner
20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