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년, 그 해 중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원로 비평가 김윤식이 ‘라이벌 의식’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한국문학사의 주요 장면과 한국문학사에 ‘창조력’을 공급한 문제적 개인들을 그려낸 『문학사의 라이벌 의식』 , 사상 최대의 아사자가 발생한 1942년 중국 허난의 대기근에 대해 낱낱이 파헤친 『1942 대기근』 까지… 최근에 산 책들을 소개합니다.
2013.09.23
 |
김윤식 저 | 그린비
‘라이벌 의식’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본 한국문학사의 장면과 장면들
한국에서 가장 왕성한 필력을 가진 저자를 뽑으라면 김윤식씨를 뽑고 싶습니다. 왕성한 집필력과 더불어 독서량 또한 굉장하신 분인데요, 이번에 나온 <문학사의 라이벌 의식>은 한국 문학사를 다섯가지 유형의 라이벌 의식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김수영 시인과 이어령 평론가 사이에서 벌어진 불온시 논쟁, 문학과지성사와 창작과비평 두 출판사의 라이벌 의식, 또한 저자 자신과 김현 평론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겨 있습니다.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스스로를 실증주의적 정신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김현 평론가에 대해서는 실존적 정신 분석 이라고 정의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몹시 궁금해지는 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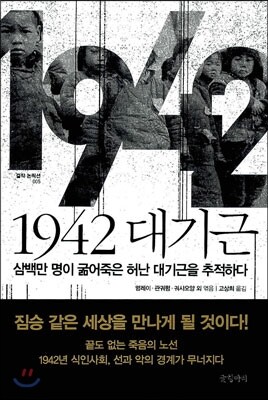 |
멍레이,관궈펑,궈샤오양 등저/고상희 역 | 글항아리
중국 정부가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던 대참사, 뼛속 깊이 새겨진 기억을 복원하다
중국 역사상 최악의 기근이었다는 1942년 허난성 대기근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1942년 대기근에 무려 300만명이 아사했다고 하죠. 실제 소설가 류전위인의 <1942년을 돌아보다>를 원작으로한 펑샤오강 감독의 영화가 작년에 개봉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사건이 화제가 되다보니까 그 시절의 자료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허난성 지역의 저널리스트들이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역사의 공백기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였고 그 내용이 담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책의 띠지에는 ‘짐슴같은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끝도없는 죽음의 노선. 1942년 식인 사회.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지다.‘라는 엄청난 문장이 담겨 있는데, 책을 넘기다보니 이 문장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읽기에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제대로 담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막스 피카르트 저/배수아 역 | 봄날의책
말과 언어, 그리고 인간에 관한 매우 아름다우며 시적인 운율의 명상록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세계>를 좋아하시는 독자 분들이 많으시죠. 막스 피카르트는 <침묵의 세계>에서 ‘침묵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실체’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서술하는 막스 피카르트의 문장 자체가 아름답고 인상적인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국내에 소개되는 막스 피카르트의 두 번째 작품 입니다. 이 책의 한국어 번역판 서문을 저자의 손자가 직접 썼는데 “막스 피카르트의 작품 중 대표작이면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일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미가 당기고 있는데요, 말의 본질과 언어의 본질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몇 쪽씩 명상하듯이 곱씹으며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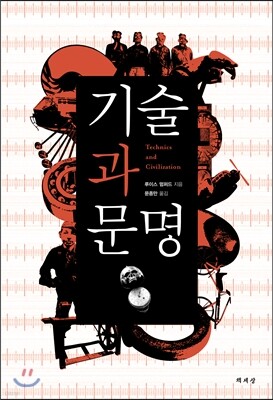 |
루이스 멈포드 저/문종만 역 | 책세상
기계의 드라마를 통해 본 기술과 문명의 역사
사회학자, 도시학자, 철학자, 문명 비평가, 사회운동가이기도 한 루이스 멈포드의 책입니다. 타이틀이 많다는 것 자체가 제도권에서 나누어놓은 학문 분야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는 것을 뜻할 텐데요, 저자는 그런 방식으로 기술의 역사에 대해 방대한 고전에 해당하는 기술과 문명을 쓰게 됩니다. 말하자면 문명사 적인 관점으로 기술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통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기술 발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산업혁명 이후의 시기를 생각하는데, 이 책은 산업혁명 이전의 시기에 산업혁명이 등장할 수 있었던 원기술 같은 것이 선행되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80페이지나 되는 하드커버의 책이지만 제대로 한 번 읽어 보고 싶어지는 책입니다.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0개의 댓글
추천 기사
추천 상품
필자

이동진
어찌어찌 하다보니 ‘신문사 기자’ 생활을 십 수년간 했고, 또 어찌어찌 하다보니 ‘영화평론가’로 불리게 됐다. 영화를 너무나 좋아했지만 한 번도 꿈꾸진 않았던 ‘영화 전문가’가 됐고, 글쓰기에 대한 절망의 끝에서 ‘글쟁이’가 됐다. 꿈이 없었다기보다는 꿈을 지탱할 만한 의지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삶에서 꿈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되물으며 변명한다.






![[더뮤지컬] <데카브리> 김찬종, 눈 속에 박힌 불씨](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17-b216a615.jpg)
![[더뮤지컬] <Born With Teeth> 역사와 픽션이 깃펜으로, 아니 이빨로 맞선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25-b63ce830.jpg)

![[미술 전시] 론 뮤익 개론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30-49a532f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