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세상을 그저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살다보면 세상의 부조리함에 치를 떠는 경우도 있고, 그 불평등함에 화를 낼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말입니다. 펑크는 바로 이런 ‘세태에 대한 불평’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 뿌리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이 앨범이지요. 이번 주는 비타협과 반항의 끝을 달리는 섹스 피스톨즈의 문제작, < Never Mind The Bollocks ... >를 만나보겠습니다.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 < Never Mind The Bollocks .. Here's The Sex Pistols > (1977)
그것은 통쾌하고 후련한 카운터 펀치였다. 당시 팝계를 제패하고 있던 ‘제도권’의 아늑한 음악은 그 일격에 고목처럼 쓰러지고 말았다. 그것은 혁명의 도래였고 그 주체는 섹스 피스톨스(Sex Pistols)라는 이름의 ‘요물’이었다. IMF체제로 들어간 1976년과 1977년 영국은 갑자기 그들과 그들의 사운드트랙인 펑크의 세상이 되었다.
펑크(punk)는 베이비붐 세대가 듣고 있었던 세련되고 기업화하고 있던 록 음악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 전위대인 섹스 피스톨스는 “제도권의 록은 죽은 음악이며 그렇다면 그것은 록일 수 없다”고 고함을 질렀다. 록은 절대로 고급에 길들여지거나 차분해서는 안 되며 기업적 형태에 물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음악은 차라리 소음이었다. 기타리스트 스티브 존스는 자신의 기타 사운드를 필 스펙터에 빗대어 ‘소음의 벽’(wall of noise)이라 했다. 그것은 고삐 풀린 광기의 에너지였고 신랄한 공격과 오만불손한 언어들의 잔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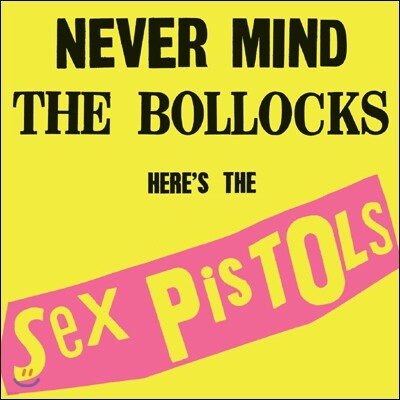 |
 |
섹스 피스톨스의 혜성 같은 출현은 다름 아닌 영국의 시대상황이 요청한(?) 것이었다. 70년대 중반 영국의 경제는 노동당 정부의 정책실패로 실업률이 20%까지 치솟는 등 파탄지경에 달했다. 당시 노동당 캘러헌 정부는 급기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 39억 달러를 지원 받기에 이른다.
고용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한 젊은이들은 좌절했고 허탈해 했으며 급기야 그 정서는 분노로 급변했다. 펑크는 바로 그 저항의 에너지를 토해내는 출구였고 섹스 피스톨스는 그 기수가 되어 단숨에 ‘반역집단’으로 부상한 것이었다.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에게 아름다운 사랑노래와 고급스런 록은 의미가 없었다. 이 때문에 그룹의 리더 자니 로튼은 “실업자들에게 러브송은 필요가 없다”고 외쳤다. 섹스 피스톨스는 기껏 사랑 또는 자신들의 문제만을 노래하는 롤링 스톤스(The Rolling Stones)나 후(The 쫴) 같은 ‘부자그룹’과 그들에 의해 움직이는 음악계의 스타 시스템에 출사표를 던졌다.
자니 로튼이 섹스 피스톨스의 오디션을 보게 되었을 때의 일화는 유명하다. 핑크 플로이드의 마크가 새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던 그는 거기에 ‘I Hate’란 말을 휘갈겨 써 ‘난 플로이드를 증오한다’는 메시지를 드러냈다. 매니저 말콤 맥라렌은 셔츠에 담긴 펑크의 정신과 자세를 즉각 확인했다.
핑크 플로이드는 딱히 비난을 받을 그룹은 아니었다. 명반 < Dark Side Of The Moon >에 수록된 곡 「Money」가 웅변하듯 사회에 비판적 시각을 투영한 음악을 했다. 그러나 IMF 체제로 실업자가 된 젊은이들에게 그들은 제도권에서 유유자적하는 부자그룹일 뿐이었다.
예전에는 그들이 영국이 자랑하는 존재들이었을지라도 지금은 경제 현실로 볼 때는 사치스러운 그룹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핑크 플로이드, 롤링 스톤스, 후만이 아니라 폴 매카트니, 로트 스튜어트, 엘튼 존, 에릭 클랩튼도 그러했고 레드 제플린과 퀸도 펑크 밴드의 눈에 ‘록 엘리트’이기는 마찬가지였다.
| |||||||||||||
섹스 피스톨스는 이들 부자와 엘리트에 의해 영국의 음악계가 신인들에게 빗장을 걸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음악 판 자체를 바꿔야 했다. 그들이 꿈꾸는 이상향이 ‘무정부’인 것은 필연적이었다.
76년 발표되어 영국을 발칵 뒤집어놓은 「Anarchy in the UK」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반(反)그리스도이며 무정부주의자라고 천명했다. 이 싱글을 발표한 EMI 레코드사는 이 같은 도발적 이념을 문제 삼아 그들과의 계약을 해제했다.
그들은 곧바로 A&M레코드사와 계약을 맺었으나 역시 깨졌고 결국 신생 레코드사인 버진에 의해 구제되어 이 음반을 출반하게 된다. 앨범의 마지막 곡이 「EMI」인 이유가 그래서다. 여기서 그들은 자신들을 버린 음악 기업을 마음껏 조롱하고 질타한다.
역시 문제작인 「God save the Queen」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영국 왕실과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노골적인 비아냥이었다. 「Holidays in the sun」과 「Pretty and vacant」는 이런 분노를 가져오게 한 원인, 이를테면 IMF로 인한 실업을 소재로 다뤘다. 「Anarchy in the UK」와 함께 이 3곡은 싱글로 발표되어 게릴라가 진지를 격파하듯 영국 차트를 강타했다.
나머지 곡들도 대부분 기존체계와 제도권에 대한 공격 일색이다. 제도권은 「Liar」에서 믿을 수 없는 거짓말쟁이로 비하되고 「Problems」에선 ‘문제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자리도 주지 못하는 썩어빠진 너희들’로 욕먹는다. 「New York」은 미국에 대한 적의를 담은 곡이다. 노랫말엔 점잖은 체면으로는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난무한다. 이 곡들에서 자니 로튼은 뇌를 쭈뼛거리게 할 정도의 감전(感電)성 보컬을 들려준다.
고전적인 틀로 이 앨범 수록곡들의 음악성을 재단하는 것은 펑크의 정신적 측면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곡들의 구조가 너무 단순하다는 것, 일방적인 소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연주력이 형편없다는 것 등의 평가들이다. 이러한 점들보다는 그들이 뛰어난 실력을 구비한 엘리트가 아니라 평민이고 더구나 분노한 하층민 젊은이들임을 전제해야 한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3코드 음악을 했고 발라드를 배격했으며 ‘평민답게’ 기타 솔로를 없애고 ‘배킹’을 내세운 연주에 충실했다. 섹스 피스톨스는 이를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anyone can do it!)는 평등과 ‘스스로 하라’(do it yourself!)는 독립의 정신을 확립했다. 이제 록 음악은 스타들의 제도권 록 그리고 비주류와 반주류의 언더그라운드 록으로 갈라서게 되었다. 이 앨범은 이처럼 언더그라운드 록의 시작이라는 점에서도 전설의 위상에 위치한다.
80년대 말 미국 시애틀의 언더그라운드를 전전하던 커트 코베인은 이 앨범의 우수성을 일찍이 간파했다. 이 앨범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프로듀스가 잘 된 음반이라고 여겼다. 이 앨범의 타이틀을 빌어 그는 91년 < Nevermind > 앨범을 발표했다. 이 작품으로 세상은 섹스 피스톨즈가 그랬듯 또 한 차례 하층민 청춘들의 언더그라운드 록의 세상으로 재편되었다. 언론에서는 그의 음악을 얼터너티브 록이라고 일컬었다. 90년대의 록이라는 얼터너티브가 실은 펑크의 후예라는 얘기다.
얼터너티브 록 이전으로 돌아가도 70년대 말 이래 출현한 모든 강성의 록이나 언더그라운드 록은 섹스 피스톨스의 대해 일정량의 빚을 진다. 하드 코어는 물론이요 영국의 새로운 헤비 메탈(NWOBHM)이나 스래시 메탈도 그렇다. < Never Mind The Bollocks ... >가 록 역사의 명반으로 우뚝 서는 이유가 이 같은 시공을 초월한 영향력과 확산력에 있다.
섹스 피스톨스는 이 앨범의 수록곡 「Seventeen」에서 ‘우린 소음을 좋아하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했다. 그들은 펑크를 선택하여 원기(元氣)를 바란 록 음악계와 젊은 세대의 선택을 받았다. 또한 이 앨범은 최고의 록 음반이라는 불변의 그리고 아낌없는 ‘역사의 선택’을 받았다.

이즘
이즘(www.izm.co.kr)은 음악 평론가 임진모를 주축으로 운영되는 대중음악 웹진이다. 2001년 8월에 오픈한 이래로 매주 가요, 팝, 영화음악에 대한 리뷰를 게재해 오고 있다. 초기에는 한국의 ‘올뮤직가이드’를 목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썼으나 지금은 인터뷰와 리뷰 중심의 웹진에 비중을 두고 있다. 풍부한 자료가 구비된 음악 라이브러리와 필자 개개인의 관점이 살아 있는 비평 사이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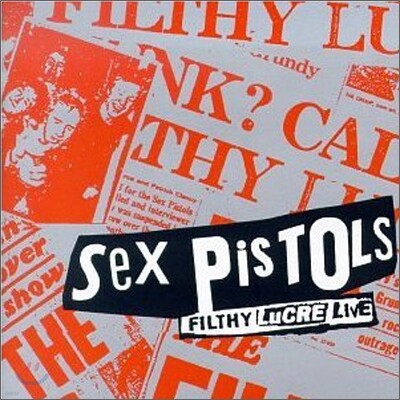

![[취미 발견 프로젝트] 집 사랑꾼을 위한 여름 바캉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29-c9b8f183.jpg)

![[케이팝] 데이식스 : 노래가 이끈 지금](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23-c5d9f9dd.png)
![[케이팝] 누구도 에스파를 막을 수 없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9/4/4/a/944a07c54cac7ad65dddd8ebe0c974c0.jpg)





![Nirvana (너바나) - Nevermind [Deluxe Edition]](https://image.yes24.com/goods/5719904?104x141)




did826
2012.10.13
ssal0218
2012.10.09
“실업자들에게 사랑 노래 따위는 필요 없다!” - 섹스 피스톨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