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 시티(Owl City)의 < All Things Bright And Beautiful >(2011)
 |
 |
첫 싱글을 잘못 선택했다. 작곡과 피처링에 등재된 래퍼 숀 크라이스토퍼(Shawn Chrystopher)를 배려한 첫 싱글 「Alligator sky」의 실패는 예상이 가능했다. 2009년 전미 차트 정상을 차지한 「Fireflies」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아울 시티(Owl City)는 신선함이 퇴색하고 멜로디가 작위적인 「Alligator sky」에 이어 곧바로 흥겨운 「Galaxies」와 1980년대 파워 팝을 떠올리는 경쾌한 「Deer in the headlights」를 후속 싱글로 연달아 공개했다. 재빠른 결정이다.
‘2011년에 들려주는 1980년대의 신스 팝’이라는 새로움으로 승부를 건 아울 시티는 이미 30여 년 전에 전자음악이 인간적이지 않다는 비판 받은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는 참신하지 못할 < All Things Bright And Beautiful >를 위해 전작 < Ocean Eyes >보다 선명한 멜로디와 밝은 리듬 그리고 힘을 불어넣었다. 「Deer in the headlights」와 「Galaxies」, 「Honey and the bee」는 향상된 선율을, 「Kamikaze」와 「Dreams don't turn to dust」는 파워가 넘친다.
하늘을 선망하는 몽상가식의 노랫말과 파스텔 톤 사운드라는 아울 시티의 기본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자살 특공대처럼 혜성이 자기에게 떨어진다는 「Kamikaze」와 은하수를 소재로 한 「Galaxies」,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챌린저호 폭발의 추도사를 그대로 수록한 「January 28, 1986」 그리고 아이튠 일렉트로닉 송 차트 정상에 오른 「Alligator sky」까지 그의 노래는 하늘과 구름, 우주를 그리고 탐미한다.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팝 버전이다. 동시에 「The real world」와 「Angels」는 두 발을 땅에 붙여 현실과 초 현실을 넘나들며 뜬 구름 잡는 노랫말이라는 세인들의 비판에서 면죄부를 청구한다.
「Kamikaze」와 「Alligator sky」, 「Dreams don't turn to dust」에서는 바이올린과 첼로 연주를 동원해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했고 「Dreams don't turn to dust」는 드럼 사운드를 강조했다. 캐나다의 싱어 송라이터 다냐 매닝(Danya Manning)의 음색과 비슷한 미국 미네소타 출신의 브리앤 뒤렌(Breanne Duren)과 듀엣으로 부른 포크와 뉴웨이브의 퓨전 넘버 「Honey and the bee」 모두는 자신의 이미지 고착화를 방지하듯 방부제를 친 노래들.
「Fireflies」가 수록된 < Ocean Eyes >의 성공으로 파트타임 뮤지션에서 전업 아티스트가 된 원맨 밴드 아울 시티의 이 음반은 빌보드 앨범차트 6위까지 상승했지만 하늘을 보며 꿈을 꾸고 이상(理想)을 갖자는 건전가요 식의 가사는 확실하지 못한 미래를 걱정하는 보통 사람들에겐 깊이 와 닿지 않는다. 아울 시티의 세 번째 정규앨범 < All Things Bright And Beautiful >는 ‘21세기의 어린 왕자’ 같은 앨범이다.
 |
 |
초콜렛 무스처럼 진하다. 흑인 여성 싱어 송라이터 레디시(Ledisi)의 다섯 번째 앨범 < Pieces Of Me >는 정통 소울과 네오 소울, 리듬 앤 블루스, 재즈, 블루스, 힙합 등 다양한 흑인 음악을 프리즘처럼 펼친다. 2000년대 판 블랙 뮤직의 백화점이다.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을 이용하듯 자유롭게 저음과 고음을 왕래하는 타이틀 곡 「Pieces of me」와 「I gotta get to you」에서는 매리 제이 블라이즈(Mary J. Blige)의 풍부한 성량과 감정 전달을, 「Hate me」에서는 ‘소울의 여왕’ 아레사 프랭클린(Aretha Franklin)의 드라마틱한 격정을 그리고 자하임(Jaheim)과 입을 맞춘 미드템포 발라드 「Stay together」와 레트로 알앤비 넘버 「BGTY」는 샤카칸(Chaka Khan)의 기교와 파워를 재현한다. 레디시(Ledisi)의 가창력은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소울 싱어들 중에서 동급 최고다. 그의 보컬에는 이론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경험과 허세를 지배하는 진정성이 살아있다.
1995년에 자신의 이름 애니베이브(Anibabe)에서 활동을 시작한 레디시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4장의 앨범을 공개하며 빌보드 R&B 앨범차트 정상과 그래미 후보로 지명되는 등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추출했다. 2년 만에 발표한 5집 < Pieces Of Me >는 이 모든 축약된 기대감을 거침없이 폭발시킨다. 모든 것을 쏟아 부은 레디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담은 이 작품으로 한 단계 상승을 기대했지만 사랑과 당당함, 구슬픔과 청승을 오가며 과부하에 걸려버린 솔직함은 감정의 과잉으로 전이되며 음반 전체를 부담스럽게 포장하고 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영화 < 컬러 퍼플 >의 여주인공을 염두에 두고 작업에 임했다는 레디시는 강한 자의식을 드러낸 「Pieces of me」나 슬로우 넘버 「Hate me」와 「I gotta get to you」 같은 곡들보다는 단순한 사랑 타령이나 「Shut up」, 「Shine」 같은 그루브 넘버들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 감정 기복의 폭을 줄였어야 했다. 자기 안으로 깊이 침잠한 내면을 대중들이 공유하기엔 거리감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떠나 레디시의 < Pieces Of Me >는 가창력이 모든 것을 말하는 진한 에스프레소 커피 같은 ‘보컬 앨범’이다.
 |
 |
음악 이야기에 앞서 안타까운(그렇지만 남자이기에 당연하기도 한) 소식을 먼저 전해야 할 것 같다. 그룹?서 기타를 담당하고 있는 정욱재의 군 입대로 인해 노 리플라이가 향후 몇 년간 활동을 잠시 중단한다는 소식이다. 휴지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내는 앨범이기에 제목도 쉼표(Comma)라 지었다.
인사를 전하는 데 변화를 보인다거나, 다른 고민을 담을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두 남자는 평소와 크게 다를 것 없이 (그렇지만 힘은 살짝 뺀) 감성을 자극하는 말랑한 다섯 트랙을 선물한다. 기다림을 강요한다거나 추억을 환기시킨다거나, 그룹의 현재 상황과 관련된 직접적인 메시지를 넣지도 않았다. 작별의 앨범임에도 한? 편안하게 와 닿는 것은 그런 연유다. 언제나처럼, 이들의 음악은 ‘억지 감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콘트라베이스가 나른함을 더해주는 「Comma」를 지나면 권순관의 촉촉한 가성이 돋보이는 「바라만 봐도 좋은데」가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악기를 활용해 탄탄한 멜로디를 만드는 감각은 역시 여러 싱어송라이터들 중에서도 발군. 처음 듣는 순간 뇌리에 박혀, 이내 흥얼거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낡은 배낭을 메고」는 여행길의 고됨과 보람을 함께 이야기하는 노래로, 가벼운 편곡으로 인해 앨범에서 가장 단출해진 넘버다.「널 지울 수는 없는지」는 침잠하는 어쿠스틱 기타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이며, 마지막에 자리한 「미안해」는 휘파람 소리가 공기를 지배하는 곡으로, 그 쓸쓸한 멜로디 때문에 시디가 멈춘 후에도 진한 여운이 남는 매력적인 트랙이다.
걱정은 없다. 말 그대로 쉼표 한 번 찍은 것뿐이니까. 못 다한 이야기는 빈 칸 한 번 띄우고 다시 써 내려가면 그만이니까. 그 쉼표 뒤로 다시 전할 음악들은 성숙한 남자의 감성이 지배하고 있을까, 혹은 여전히 여린 감성의 소년다움이 돋보이고 있을까. 자못 궁금해지는 것은 일부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제공: IZM
제공: IZM(www.izm.co.kr/)

채널예스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김미래의 만화절경] 서울의 공원과 고스트 월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22-2c09f7a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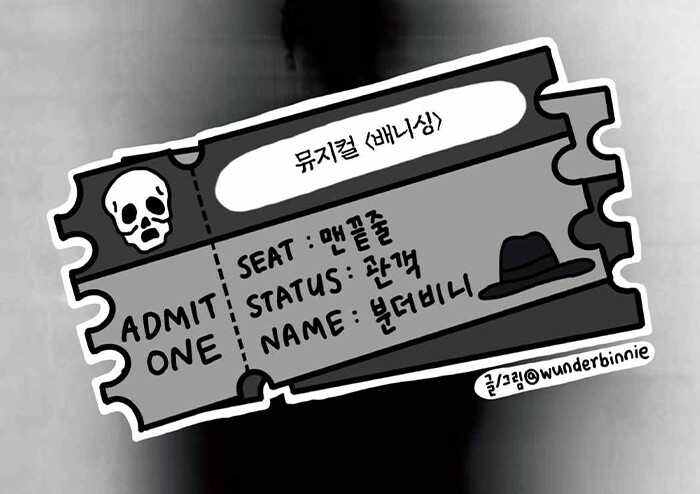

![[더뮤지컬] 이지영 연출가, 새로운 여정의 시작](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20-194e9297.jpg)





책읽는 낭만푸우
2012.05.06
앙ㅋ
2011.10.26
천사
201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