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와의 만남]‘언니, 우리 언니’가 들려주는 깨알 같은 이야기 - 『여자공감』 안은영
오래 기자를 한 저자가 4년 전에 『여자생활백서』라는 첫 책으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그 책의 2권도 내고, 소설도 하나 쓴 다음 다시 ‘세상 좀 살아 본 언니의 충고’ 콘셉트인 이 책 『여자공감』을 들고 나왔다.
2010.04.01
책 표지의 안은영 저자는 아나운서 같은 이미지로 웃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행사장인 레스토랑 마노 디 셰프 삼성점에 나타난 저자는 그야말로 기자의 이미지를 풍겼다(아는 사람은 다 알듯이 저자는 메트로 신문사에서 일한다). 어느 쪽이 나았는가 하면 후자다. 아나운서와는 커피만 마셔야 할 것 같고, 기자와는 커피도 마시고, 술도 한잔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화하기 좋은, 대화하고 싶은 기자의 느낌을 그녀는 풍겼다.
우리가 기자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 중 하나는 까칠함일 것이다.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실 어느 정도는 그렇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자의 특성은 대화하기 좋은 상대라는 거다. 기자는 낯선 사람과 말하고, 그와 동화되고, 우호적인 감정을 이끌어 내는 데 선수다. 그래야 기자를 오래 한다. 기자는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므로.
오래 기자를 한 저자가 4년 전에 『여자생활백서』라는 첫 책으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그 책의 2권도 내고, 소설도 하나 쓴 다음 다시 ‘세상 좀 살아 본 언니의 충고’ 콘셉트인 이 책 『여자공감』을 들고 나왔다. 마른 체형과 맏언니는 그리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만, 책 뒤표지에 표현된 것처럼 그녀는 맏언니 같은 포스를 지녔는데, 마른 체형이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언니’의 이미지는 『작은아씨들』의 메그, 『스우 언니』의 한없이 헌신적인 스우인데, 실제로 네 자매의 맏언니인 나는 생각만큼 언니답지 않아서 좀 좌절. 그런데 안은영 저자의 ‘언니다움’은 책 속에서 정말 진하게 풍긴다. 후배인 J에게 쓴 솔직한 편지 글을 읽노라면 그녀보다 나이 많은 나도, 그녀를 붙들고 “언니, 있잖아. 시간 돼? 커피 한잔 사주라. 광화문 커피전문점 2층 창가로 나와”라는 소리를 막 하고 싶어진다.
‘세상 좀 살아 본 언니의 충고’ 콘셉트의 『여자공감』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언니’가 갖고 싶다. 엄마가 못 해 주는 몇 가지 것들, 이를테면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해소법, 미운 상사와 더 얄미운 부하 직원을 효율적으로 ‘씹는 법’ 등의 팁을, 언니는 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엄마한테처럼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개갤 수 있는 것이 언니다. 잘생긴 배우가 나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뮤지컬을 함께 보러 갈 수 있고, 스파게티를 맛있게 하는 집을 알아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수다를 떨 수 있다. 그런데, 언니는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누구의 언니가 되어 주려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고, 모두가 동생이 되고 싶어 한다. 눈 초롱거리며 누군가에게 “사 줘” “들어 줘” “닦아 줘” 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 안은영 저자가 자진해서 언니가 되어 주겠다는 이 책, 참 반갑고 고맙지 않을 수 없다.
저자와의 만남을 위해 삼성동까지, 가깝지 않은 길을 전철 타고 가던 날은 봄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우산을 챙겨 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눈길을 우산을 쓰고 걸으면서 저자처럼, 아주 어린 인생 후배 J를 떠올렸다. 내 이름이 저자와 공교롭게도 같아서 나는 꼭 저자가 된 듯한 심정으로 J에게 이런저런 혼잣말을 했다.
그래, J야. 만만한 사람이 돼라. “누가 너를 만만히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과정’이라고 생각해. 그때마다 발끈해서 “나는 정말로 괜찮은 인간이고, 당신 따위에게 무시당할 수는 없거든요!”라고 얼굴 붉히느니 좀 더 넓어져 있을 너의 미래를 생각하며 마음으로 무시하는 게 현명해.”(p.104) “누군가에게 만만하고 눈물겨우면서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p.107)
하긴 내가 아는 너는 이 일을 나보다도 만 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안심이다. 지금처럼만 해라. 그럼 넌 적어도 외로움에 질식되지는 않을 거고, 더 오래 네 길에서 빛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J야. 힘들 때는 엄마한테 기대라. 엄마란, 언니와는 다르지만 뼛속까지 네 편인 세상 유일의 존재야. 어린 날보다는 엄마를 찾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새삼스럽게 엄마를 어떻게 찾아가?’ 따위의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라. ‘세상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말란 이야기야. 어떤 경우에도.
“엄마, 나야!” “누구? 은영이냐?” “어, 문 열어줘.”(p.123)
이 부분에서 왜 내가 눈물이 나는지. 그저 이름이 같을 뿐인데. 언젠가부터 누구의 엄마이기만 한 것 같은 내가 누구의 딸이라는 새삼스러운 느낌. 넌 내 심정 좀 이해해 주겠지? 다정한 너니까. 꼭 기억해라. J야.
“이 시간에 웬일이냐, 무슨 일 있냐.”라는 말 대신 “터미널에서 전화하지 뭐 하러 택시 타고 와. 막내 보내면 될 걸.”(p.123)이라는 사람, 바로 엄마야.
“밤길에 더듬더듬 서울에서 전주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딸의 마음을 위해, 터미널에서 집까지 오는 고작 5분 남짓한 거리를 지켜주기 위해, 뭔가 복잡한 마음으로 내려왔을 터, 짧은 거리나마 따뜻하게 데려오고 싶은 엄마의 마음. 하마터면 울 뻔 했지만 나는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은 채 “밥 좀 줘. 배고파”라고 생떼를 부렸다.”(p.123)라고 저자는 적고 있어. 너도 그래라. 아무 때나 불쑥 찾아가 밥 달라고 하란 말이야. 괜찮단다. 엄마는.
“싫은 일은 하지 마라. 미운 사람은 만나지 마라. 가기 싫은 자리 가지 말고, 먹기 싫은 건 먹지 마라. 엄마가 살아보니 인생은 짧더라. 경우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너 자신에게 먼저 집중하고 살아라.”(p.124) 그래. 그렇더라. 정말 그래, J야. 중요한 건 네 행복이거든.
어떤 이야기든, 누구와도 나눌 수 있는 내공
참 맛깔스러운 글의 느낌. 그리고 저자의 말의 느낌도 맛깔스러웠다. 강호동이 <무릎팍도사>에서 강렬하면서도 진솔한 태도로 상대의 속 이야기를 끌어낸 것과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그녀는 조근조근 진솔한 표정과 말투로 어떤 말이나 다 하고 싶게 만들었다. 꽤 비싸 보이는, 다양한 서양 요리와 음료를 배부르게 먹고 난 뒤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모인 사람들은 모두 눈을 빛내며 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장소가 생각보다 커서 조근조근 한 말이 잘 들리지 않아 조바심이 날 정도였다.
“후배 세 명이 J라는 이니셜로 합쳐졌다. 정말 후배들을 향해 쓴 편지라서 진실한 글들이다. 거의 일기 수준이다. 너무 밝혔나 싶을 정도. 감성적이고 시니컬하기도 한데 그게 내 모습이다”라고 그녀는 말문을 열었고, 이후 누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막힘이 없었다. 미리 준비된 듯 매끄럽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참 많은 생각을 했고, 참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만날 때마다 글로 정리해 왔고, 많은 경험을 해 왔고, 그만큼 많은 카운슬링을 해 주었기에 그녀는 어떤 이야기든, 누구와도 나눌 수 있는 내공을 지니고 있었다.
독자들은 나이가 들쑥날쑥했지만 모두가 저자의 동생으로 화해 있었다. 연애에 대한 질문에는 자신의 아팠던 연애담을 들려주며 대답을 했고, 저절로 낮아지는 눈을 일부러 낮추지 말라고도 했다. 서른 살이 되는 일을 고민하는 독자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나 자신의 삼십 대에 더 한껏 농염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삼십 대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다. 괜찮은 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회사 내 남자 후배와의 관계’ ‘여자로 살기’ 등등에 관한 질문이 꽤 긴 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았다. 우리 모두, 뭔가 물어보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마땅한 사람이 그렇게나 없었구나, 하는 느낌이 행사를 지켜보면서 들었다.
안은영 저자는 자신이 작가가 된 것에 감사했고, 독자와 소통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그게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표현됐다. 어쩌면 수년의 시간 동안 작가로 지내왔음에도, 그녀에게는 초심이 진하게 남아 있었다. 그건, 내내 글을 써왔지만, 그 글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자 생활을 거친 사람만 가지는 느낌일까, 아닐까, 잠깐 생각해 보았다. 기자로서의 글쓰기와 작가로서의 글쓰기는 매우,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독자나 저자나 헤어지기 아쉬워 미적거리면서 행사는 끝났다. 이메일을 가르쳐 주며 소통하자고 하는데, 진심이 느껴졌다. 그런 진심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정곡을 찌르는 재치 있고 알싸한 글쓰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언제 차 한잔 혹은 술 한잔할까요?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끼리? 쓰신다고 한 절절하고 아픈 연애 소설, 그거 탈고하고 나서?”
 |
오래 기자를 한 저자가 4년 전에 『여자생활백서』라는 첫 책으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그 책의 2권도 내고, 소설도 하나 쓴 다음 다시 ‘세상 좀 살아 본 언니의 충고’ 콘셉트인 이 책 『여자공감』을 들고 나왔다. 마른 체형과 맏언니는 그리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만, 책 뒤표지에 표현된 것처럼 그녀는 맏언니 같은 포스를 지녔는데, 마른 체형이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언니’의 이미지는 『작은아씨들』의 메그, 『스우 언니』의 한없이 헌신적인 스우인데, 실제로 네 자매의 맏언니인 나는 생각만큼 언니답지 않아서 좀 좌절. 그런데 안은영 저자의 ‘언니다움’은 책 속에서 정말 진하게 풍긴다. 후배인 J에게 쓴 솔직한 편지 글을 읽노라면 그녀보다 나이 많은 나도, 그녀를 붙들고 “언니, 있잖아. 시간 돼? 커피 한잔 사주라. 광화문 커피전문점 2층 창가로 나와”라는 소리를 막 하고 싶어진다.
‘세상 좀 살아 본 언니의 충고’ 콘셉트의 『여자공감』
|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언니’가 갖고 싶다. 엄마가 못 해 주는 몇 가지 것들, 이를테면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해소법, 미운 상사와 더 얄미운 부하 직원을 효율적으로 ‘씹는 법’ 등의 팁을, 언니는 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엄마한테처럼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개갤 수 있는 것이 언니다. 잘생긴 배우가 나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뮤지컬을 함께 보러 갈 수 있고, 스파게티를 맛있게 하는 집을 알아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수다를 떨 수 있다. 그런데, 언니는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누구의 언니가 되어 주려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고, 모두가 동생이 되고 싶어 한다. 눈 초롱거리며 누군가에게 “사 줘” “들어 줘” “닦아 줘” 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 안은영 저자가 자진해서 언니가 되어 주겠다는 이 책, 참 반갑고 고맙지 않을 수 없다.
저자와의 만남을 위해 삼성동까지, 가깝지 않은 길을 전철 타고 가던 날은 봄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우산을 챙겨 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눈길을 우산을 쓰고 걸으면서 저자처럼, 아주 어린 인생 후배 J를 떠올렸다. 내 이름이 저자와 공교롭게도 같아서 나는 꼭 저자가 된 듯한 심정으로 J에게 이런저런 혼잣말을 했다.
그래, J야. 만만한 사람이 돼라. “누가 너를 만만히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과정’이라고 생각해. 그때마다 발끈해서 “나는 정말로 괜찮은 인간이고, 당신 따위에게 무시당할 수는 없거든요!”라고 얼굴 붉히느니 좀 더 넓어져 있을 너의 미래를 생각하며 마음으로 무시하는 게 현명해.”(p.104) “누군가에게 만만하고 눈물겨우면서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p.107)
하긴 내가 아는 너는 이 일을 나보다도 만 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안심이다. 지금처럼만 해라. 그럼 넌 적어도 외로움에 질식되지는 않을 거고, 더 오래 네 길에서 빛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J야. 힘들 때는 엄마한테 기대라. 엄마란, 언니와는 다르지만 뼛속까지 네 편인 세상 유일의 존재야. 어린 날보다는 엄마를 찾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새삼스럽게 엄마를 어떻게 찾아가?’ 따위의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라. ‘세상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말란 이야기야. 어떤 경우에도.
“엄마, 나야!” “누구? 은영이냐?” “어, 문 열어줘.”(p.123)
이 부분에서 왜 내가 눈물이 나는지. 그저 이름이 같을 뿐인데. 언젠가부터 누구의 엄마이기만 한 것 같은 내가 누구의 딸이라는 새삼스러운 느낌. 넌 내 심정 좀 이해해 주겠지? 다정한 너니까. 꼭 기억해라. J야.
“이 시간에 웬일이냐, 무슨 일 있냐.”라는 말 대신 “터미널에서 전화하지 뭐 하러 택시 타고 와. 막내 보내면 될 걸.”(p.123)이라는 사람, 바로 엄마야.
“밤길에 더듬더듬 서울에서 전주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딸의 마음을 위해, 터미널에서 집까지 오는 고작 5분 남짓한 거리를 지켜주기 위해, 뭔가 복잡한 마음으로 내려왔을 터, 짧은 거리나마 따뜻하게 데려오고 싶은 엄마의 마음. 하마터면 울 뻔 했지만 나는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은 채 “밥 좀 줘. 배고파”라고 생떼를 부렸다.”(p.123)라고 저자는 적고 있어. 너도 그래라. 아무 때나 불쑥 찾아가 밥 달라고 하란 말이야. 괜찮단다. 엄마는.
“싫은 일은 하지 마라. 미운 사람은 만나지 마라. 가기 싫은 자리 가지 말고, 먹기 싫은 건 먹지 마라. 엄마가 살아보니 인생은 짧더라. 경우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너 자신에게 먼저 집중하고 살아라.”(p.124) 그래. 그렇더라. 정말 그래, J야. 중요한 건 네 행복이거든.
어떤 이야기든, 누구와도 나눌 수 있는 내공
|
참 맛깔스러운 글의 느낌. 그리고 저자의 말의 느낌도 맛깔스러웠다. 강호동이 <무릎팍도사>에서 강렬하면서도 진솔한 태도로 상대의 속 이야기를 끌어낸 것과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그녀는 조근조근 진솔한 표정과 말투로 어떤 말이나 다 하고 싶게 만들었다. 꽤 비싸 보이는, 다양한 서양 요리와 음료를 배부르게 먹고 난 뒤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모인 사람들은 모두 눈을 빛내며 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장소가 생각보다 커서 조근조근 한 말이 잘 들리지 않아 조바심이 날 정도였다.
“후배 세 명이 J라는 이니셜로 합쳐졌다. 정말 후배들을 향해 쓴 편지라서 진실한 글들이다. 거의 일기 수준이다. 너무 밝혔나 싶을 정도. 감성적이고 시니컬하기도 한데 그게 내 모습이다”라고 그녀는 말문을 열었고, 이후 누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막힘이 없었다. 미리 준비된 듯 매끄럽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참 많은 생각을 했고, 참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만날 때마다 글로 정리해 왔고, 많은 경험을 해 왔고, 그만큼 많은 카운슬링을 해 주었기에 그녀는 어떤 이야기든, 누구와도 나눌 수 있는 내공을 지니고 있었다.
독자들은 나이가 들쑥날쑥했지만 모두가 저자의 동생으로 화해 있었다. 연애에 대한 질문에는 자신의 아팠던 연애담을 들려주며 대답을 했고, 저절로 낮아지는 눈을 일부러 낮추지 말라고도 했다. 서른 살이 되는 일을 고민하는 독자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나 자신의 삼십 대에 더 한껏 농염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삼십 대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다. 괜찮은 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회사 내 남자 후배와의 관계’ ‘여자로 살기’ 등등에 관한 질문이 꽤 긴 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았다. 우리 모두, 뭔가 물어보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마땅한 사람이 그렇게나 없었구나, 하는 느낌이 행사를 지켜보면서 들었다.
안은영 저자는 자신이 작가가 된 것에 감사했고, 독자와 소통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그게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표현됐다. 어쩌면 수년의 시간 동안 작가로 지내왔음에도, 그녀에게는 초심이 진하게 남아 있었다. 그건, 내내 글을 써왔지만, 그 글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자 생활을 거친 사람만 가지는 느낌일까, 아닐까, 잠깐 생각해 보았다. 기자로서의 글쓰기와 작가로서의 글쓰기는 매우,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독자나 저자나 헤어지기 아쉬워 미적거리면서 행사는 끝났다. 이메일을 가르쳐 주며 소통하자고 하는데, 진심이 느껴졌다. 그런 진심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정곡을 찌르는 재치 있고 알싸한 글쓰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언제 차 한잔 혹은 술 한잔할까요?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끼리? 쓰신다고 한 절절하고 아픈 연애 소설, 그거 탈고하고 나서?”
6개의 댓글
추천 기사
추천 상품
여자공감
출판사 | 해냄
필자

채널예스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jpg)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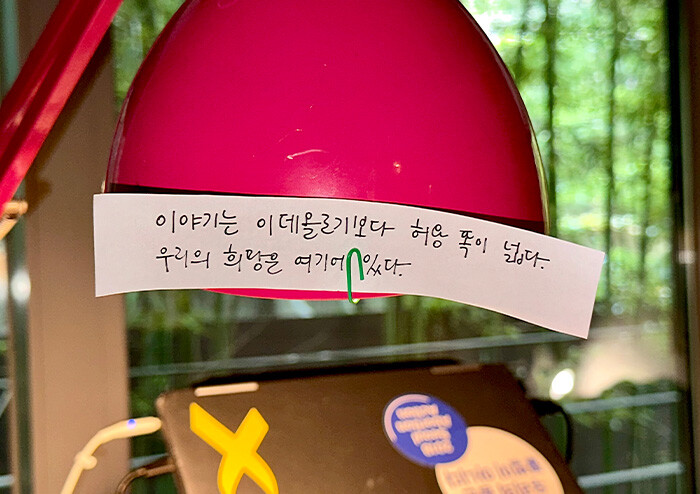
![[비움을 시작합니다] 네가 변해야 모든 게 변한다 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1-ebeed89d.jpg)


![[더뮤지컬] 애정으로 읽어낸 여성 캐릭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04-e1e5d480.jpg)




prognose
2012.05.02
앙ㅋ
2012.03.22
wnduddk27
2010.04.12
소탈하시고 편안한 언니같은^^ 다음 티타임같은 자리가 또 있다면 참석하고 싶어요 작가님 그날 만나뵙게되어서, 뼈가되고 살이 되는 말씀까지^^ 행복했어요 귀중한 시간이였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