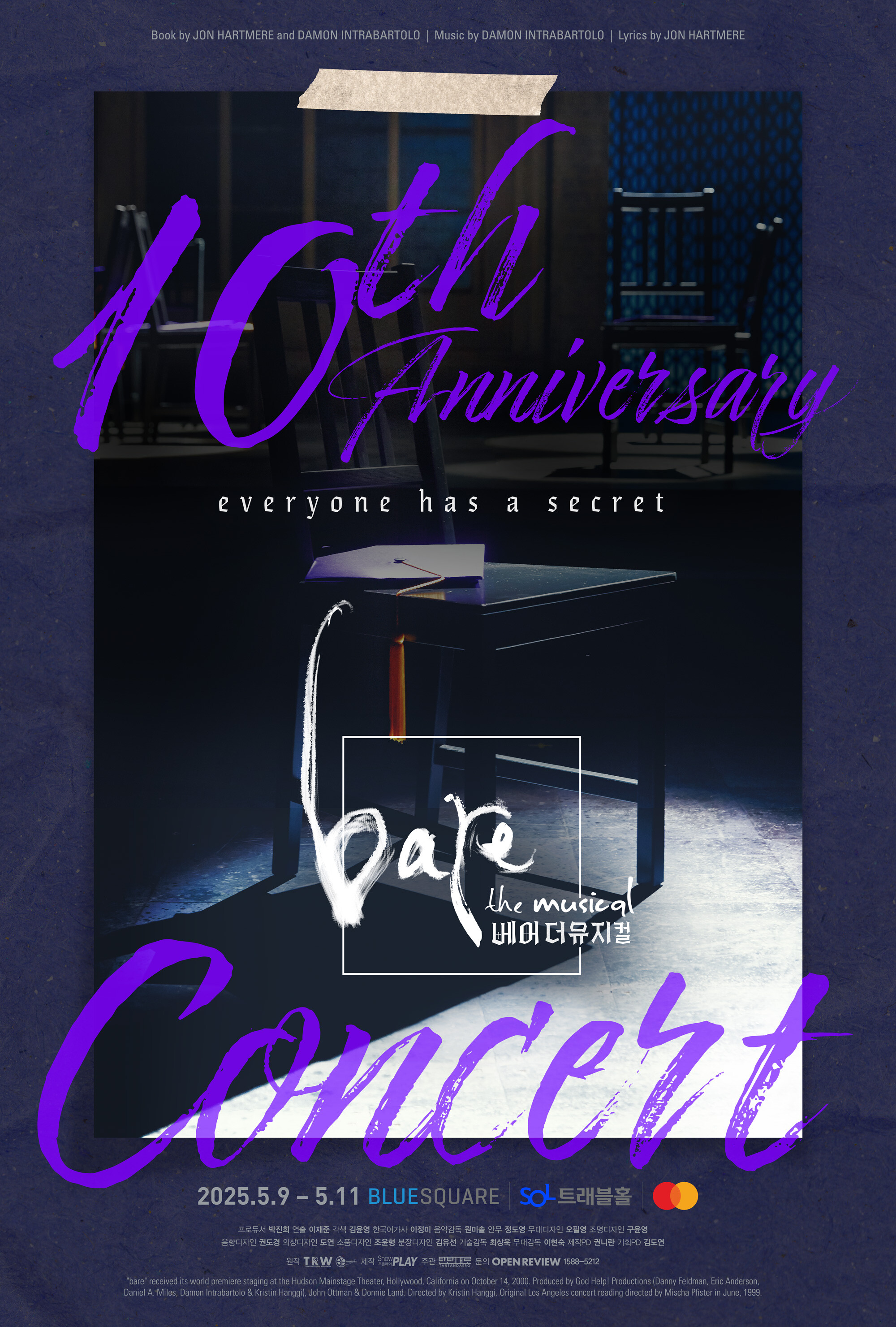"삶은 식사다. 삶은 날씨다. 소금이 엎질러진 푸른 바둑판 무늬 식탁보 위에 차린 점심이며 담배 냄새다. 브리치즈이자 노란 사과이자 자루가 된 나무로 된 나이프다."
미국 소설가 제임스 셜터는 자신의 소설에서 삶을 날씨와 식탁보와 점심과 식기 등으로 비유한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맥락 없이 엎질러져 있으며 때에 따라 급변하는, 그러나 그렇기에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과 닮아 있다고 말하는 듯하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인간은 본인의 변화를 체감하기도 하지만 타인의 변화에 아파하기도 한다. 타인과 내가 교차하는 지점들 속에서 누군가와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길이 달라지면 끝내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등을 보여야 할 때도 있다. 이렇듯 반드시 어느 순간엔 변할 수밖에 없기에, 또 어느 순간에는 각자의 삶을 홀로 살아가야 하기에 타인에 대해 또 삶에 대해 영원히 알 수 없어 문득 외로워지기도 한다. 결코 변하지 않고, 나를 알아봐 주는 그런 무언가를 찾는 건 불가능한 일일까.
영화 <콜럼버스>에는 결코 변하지 않는 건축물들로 둘러싸인 모더니즘 건축물의 도시 콜럼버스에서 우연히 서로를 마주하게 된 두 사람이 등장한다. 진과 케이시. 한국계 미국인인 '진'이 이곳에 도착한 것은 순전히 아버지 때문이다. 진은 아버지가 평생 건축에 빠져 자신을 등한시했다고 믿어왔다. 그런 진 또한 아버지를 피해 한국으로 갔음이 여러 장면에서 짐작되는데, 그렇게 평생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던 아버지였지만, 누구든 한 번은 맞이하게 되는 '죽음'이라는 삶의 변화 앞에 진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다시 마주하게 된다. 물론, 쓰러진 아버지를 대신해 진을 맞이한 것은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도시의 건축물들이다. 한 사람의 삶이 스러져가는 중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말이다. 물론 진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진이 후에 케이시에게 말했듯, '너무 익숙해지면 그 가치를 알 수 없게 되어서' 그런 걸까. 진에게 콜럼버스의 건축물들이란 어떤 가치가 아니라 자신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간 존재이며, 또 그만큼이나 익숙하게 들어온 '일상'일 뿐이니까.
이런 진과는 달리 콜럼버스의 건축물을 통해 삶을 위로받았던 한 사람이 있다. 약물 중독인 어머니의 모습이 건축물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느꼈던 어린 시절부터 비슷비슷하게 생긴 건물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색채를 잡고 서 있는 콜럼버스의 건축물을 사랑하게 되고, 이윽고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한 사람. 스무 살의 케이시의 말을 빌리자면 '무질서 속의 균형'을 잡는 콜럼버스의 건축물은 그녀에게 위로이자 삶 그 자체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케이시는 이제 그 사랑하는 건축을 계속하기 위해서 콜럼버스와 어머니를 떠나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건축을 전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원치 않는 삶의 변화 앞에 놓인 진과 케이시. 그들은 콜럼버스의 건축물을 매개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진이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건축물들은 케이시의 입을 빌려 진에게 전달되고, 케이시가 그렇게 놓지 못해 잡으려 하는 삶의 순간들은 진을 통해 역설적으로 케이시가 떠나야만 하는 당위를 마련해 준다. 진과 함께 할수록 케이시는 자신이 얼마나 건축을 사랑하는지, 사실은 얼마나 자신의 꿈을 향해 가고 싶은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케이시는 이제 진이 있는 콜럼버스에 더욱 남고 싶기도 하다. 나를 알아봐 준 한 사람이 그곳에 있으므로. 결국, 케이시는 콜럼버스에 남겠다고 하지만 진은 케이시가 자신과 함께 하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그녀의 삶에 찾아온 변화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낀다. 아버지를 결코 이해할 수 없었고, 그의 건축물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던 진이 결국 다시 콜럼버스의 아버지 곁으로 돌아온 것처럼 이제 그는 삶의 변화와 예측 불가함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영화의 말미, 콜럼버스를 떠나게 된 케이시가 꼭 다시 만나자며 울먹이자 진은 대답 대신 씁쓸하고도 옅은 미소를 떠올린다. 아마 케이시는 콜럼버스에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고 또 돌아오더라도 그땐 진이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은 그 가능성이 또 열려있기 때문에. 물론 진은 그 이별이 슬프면서도 한편으론 언젠가 케이시가 자신의 이 씁쓸하고 옅은 미소를 이해할 날이 올 거라는 것 또한 알고 있기에 끝내는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필연적으로 떠나야만 하는 사람과 머물러야만 하는 사람이 교차하는 곳, 콜럼버스. 인간의 작은 삶들이 스쳐가는 사이에도 건축물만은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아마 인류가 계속되는 동안 삶이 교차되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보다 빨리 늙어갈 것이다. 그러니 이 영화 <콜럼버스>는 그 자체로 작은 인생을 보여주는 듯 하다.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였을까.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인류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무언가에 그토록 집착했던 것 말이다.

뜬금없지만 난 이 영화를 보면서 다른 두 영화 장면들을 떠올렸다. 변하지 않는, 진짜의 나를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들에 대한 영화들.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의 죽음 이후 오히려 그 사람의 진짜 직업(AV배우)과 가족을 알게 된 <립반윙클의 신부> 속 등장인물들이 그녀의 죽음 앞에서야 옷을 벗어 던지며 '진짜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규했던 장면이 우선 그것이다. 타인 앞에 나를 드러내기 혹은 누군가의 진실을 바라보기. 이것은 AV배우의 어머니가 옷을 벗으며 "남 앞에서 이렇게 벗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라고 했던 말처럼, 아주 짧은 순간의 솔직함일지라도 누군가에겐 한없이 어렵고 쑥스럽기만 한 것이다. 역으로 그런 불가능함이 실제 존재한다고 믿게 되는 순간엔 어떨까. <렛미인> 속 주인공들은 서로를 알아보는 타인 앞에 인간과 비인간의 존재를 지우고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마저 역행해 버린다.
"넌 누구야?"
"난 너야."
이런 말을 내게 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 그것은 몇 백 년을 죽지 못하고 살아온 뱀파이어에게도 낯선 존재이다. 하물며 짧은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그것은 얼마나 귀할 것인가. 나를 알아주는 단 하나의 존재를 위해 인간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인간적'인 변화들을 스스로 제거하며 필연적인 이별이 보장된 뱀파이어와 함께 하는 선택한다. 심지어 자신보다 앞서 이 뱀파이어를 사랑한 인간의 죽음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알면서도. 결국 자신 또한 뱀파이어보다 먼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필사의 노력. 변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모두가 변하기에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타인과의 삶 속에서 나를 알아보는 누군가를 찾기, 혹은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하기. 모든 변화는 결국 우리 모두가 죽음이라는 결말을 가지고 있기에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도 인간은 앞으로도 끝없이 찾아내지 않을까. '어떤 변화의 격랑 속에서도 자신을 이해하고 온전히 진실되어 보일 수 있는 한 존재를 찾는 일' 말이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한정현(소설가)
한정현 소설가. 장편소설 『줄리아나 도쿄』, 소설집 『소녀 연예인 이보나』 등을 썼다.






![[한정현의 영화적인 순간] 죽거나 죽기 직전 누굴 죽여야 하거나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d/a/2/3/da23fc2ba0fa65d215c0b6f3363d9018.jpg)
![[한정현의 영화적인 순간] 그러고 나서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5/c/d/8/5cd85f547a9fd778c5958a59badd9cfa.jpg)
![[한정현의 영화적인 순간] 끔찍하게 행복한 라짜로, 아니 너와 나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b/f/e/e/bfeef317a0adfe15d1f2862a49cdbef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