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을지 몰라도 '왜 저런 착한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야?'라든가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이람?'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경험. 이런 생각 정도는 아마 모두가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린 시절의 나는 신을 찾아다녔다. 내 어린 시절에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해, 아니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미쳐버린 내 주변 사람들이 갖는 고통을 되묻기 위해서. 미쳐버린 내 주변 사람들은 딱히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째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가. 하지만 돌아온 답은 항상 그것이 신의 뜻이라는 것이었다. 모두들 그렇게 누군가를 보내고 또 살아가고 또... 그때마다 나는 되물었다.
"그러고 난 다음엔요?"
누군가가 떠나고 잊히고 또 누군가를 알게 되고 새로운 기쁨이 생기고 그런 것이 삶이라면, 그게 신의 뜻이라면 그리고 그 다음엔? 그 다음엔 무엇이 남았나요? 그 역시 신의 뜻이라는 그 말, 종내 나는 그 말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 소설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세계에 신은 없지만...
이런 나와 달리 이 영화 속 주인공 '이다'는 신의 존재에 별다른 의문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다는 태어나 보니 어느 교회에 던져지듯 버려져 있었고, 오로지 그곳에서 자신의 쓰임을 인정받으며 자라왔다. 이다에게 신이란 태어난 순간 갖춰진 요람 같은 것. 그런 이다가 수녀가 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순서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망할 신의 뜻은 이다의 인생에 처음으로 균열을 가져온다. 수녀가 되는 서원식을 하기 전, 이다는 교회 사람들의 권유로 이모를 만나기 위해 교회 밖으로 나선다. 항상 술과 남자에 취해있는 듯 어딘가 공허한 표정의 이모. 이다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궁금했을 뿐이었는데, 그런 이모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낸다. 이다가 유대인이며 그의 부모는 돌봐주었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해 무덤조차 찾지 못할 어느 곳에 매장되었을 거라는 이야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를 찾아보겠다는 이다에게 이모는 알 듯 모를 듯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남긴다.
"그러다 너의 신을 의심하게 되면?"
그러나 하나뿐인 조카 이다가 안타까웠던 걸까. 이모는 이다와 함께 이다의 부모이자 이모의 여동생이며 전쟁 당시 무차별 죽임을 당했던 한 유대인 부부의 흔적을 찾아 나선다. 물론 그 흔적의 추적 과정은 모두가 예상한 그대로다. 전쟁 중 죽임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아주길 바라는 가해자들. 모든 것이 지나간 일이니 자신들에게 땅을 주면 시신을 매장한 장소를 알려주겠다는 뻔뻔함까지 갖춘 가해자들. 그 가해자들의 얼굴은 너무나 선하고 또 가난하고 보잘것없은 '보통' 사람의 모습이기까지 하다. 누군가, 저 멀리서 그 장면을 본다면 어리숙한 농부를 착취하는 수녀와 귀부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기이하게도 그런 강압적인 표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다와 이모는 그런 '보통' 사람의 가엾은 얼굴의 한 가해자가 땅을 파는 동안 그저 망연히 앉아 조금씩 드러나는 학살의 장소를 바라볼 뿐이다.
그리고 이내 드러난 백골들. 가장 작은 두개골은 이모의 어린 자식이었다. 이모는 이다의 부모에게 자신의 어린 아들을 맡기고 전쟁터로 나간 것이다.
"누굴 위한 전쟁이었는지..."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한 어린 아들의 백골을 품에 안은 이모의 말처럼, '단지 유대인이어서' 죽였다는 가해자의 말처럼 대체 그 전쟁이 불러온 참상은 과연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이뤄진 것이었을까. 자신이 죽인 사람들을 묻은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수녀가 되려는 이다에게 죄를 고백하는 가해자의 지독하게 평범한 얼굴 앞에서 이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로 돌아갈 준비를 할 뿐이다. 그러나 교회로 돌아간 이다는 선뜻 서원식을 하겠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 이다가 그렇게 알 수 없는 머뭇거림 속에 있을 때, 이모는 평소처럼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하고 알지 못하는 남자와 하룻밤을 보낸 뒤, 여느 때처럼 일어나 아침을 먹는다.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음악을 잘 켜둔 다음,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모는 창문으로 뛰어내린다.
그래, 그러고 나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나서 이모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뿐이니까.
영화 속 생전 이모의 마지막 말은 "숨겨둔 머리칼이 참 예뻤는데 항상 가리고 다닌다"는 거였다. 그게 대체 누구냐는 남자의 질문에 이모는 '이다'라고만 짧게 말한다. 죽기 직전까지 자신을 걱정해준 단 한 사람마저 잃게 된 이다는 처음을 머리칼을 드러내고 이모의 하이힐을 꺼내 신고 드레스업을 한 후 담배를 피운다. 생전 이다가 질색했던 이모의 모습처럼 술을 잔뜩 마시고 남자와 춤을 추고 하룻밤을 보낸다. 아니, 적어도 이다는 그 남자를 사랑했으니까 이모와는 다른 걸까.
남자는 이다에게 기대감에 찬 말투로 자신이 공연을 하는 곳으로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한다. 그곳에서 해변도 걷고 함께 지내자고 말하는 남자. 이다는 그런 남자를 보며 미소를 띄운 채 묻는다. 그러고 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강아지도 키우자는 남자. 이다는 계속 물을 뿐이다.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나는 이다가 남자가 아닌 신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요? 더는 할 수 있는 용서가 없고 이해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러고 나서는요?

이다가 남자에게 혹은 그 어떤 존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다만, 아침이 밝아오자 이다는 다시 수녀복 차림을 하고 길을 나선다. 이다가 교회로 돌아갔을까. 그것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다가 그러고 나서 창문으로 뛰어내리지 않았다는 것만은 안다. 이다가 교회 밖에서든 안에서든 자신의 일상을, 삶을 살아가기 위해 걸었다는 것만은 안다.
그러고 나서 이다는 어떻게 되었을까. 또, 이 영화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것 또한 모를 일이다.
이 영화를 칼럼으로 쓰겠다고 생각하며 다시 본 그날, 공교롭게도 나는 친구와 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어린 시절의 나와 마찬가지로 "그런 고통을 겪을 때, 그 답을 바랄 때 신은 거기 없었던 것 같은데"라고 말했고, 친구는 "신은 그런 답을 해주는 존재가 아니니까"라고 답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어린 시절과 달리 친구에게, 그 누군가에게 "그 다음엔? 그럼 그 다음엔? 신이 그러면 그다음엔?"하고 묻지 않았다. 화가 나지도, 분에 차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친구와의 대화 끝에 결국 하하, 진심으로 웃어버렸을 뿐이다. 나는 신이 존재하냐, 하지 않느냐보다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 그 자체가 더 좋았으니까.
그러니 영화 속에서 어쩌면 "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던 이다의 이모가 신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이다보다 더욱 신을 믿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모는 그래서 끝내 답을 하지 않는 신을 찾아 창문으로 뛰어내렸을 것이다. 나와 이다는 어떨까. 폴란드의 국민 영웅이라는 텅 빈 칭송이 울리는 이모의 장례식에서 그 헌사보다 건너편 나무에 기대어 있던 사랑하는 남자의 존재로 위안을 받았던 이다, 그런 이다는 어떨까. 신이 없다 한들 이다는 또 살아가겠지. 그러니 하나는 알 수 있었다. 이다 또한, 나 또한 창문이 아닌 문을 열고 계속 눈길을 걸으리라는 것, 그거 하나는 이 영화 끝에 알 수 있었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한정현(소설가)
한정현 소설가. 장편소설 『줄리아나 도쿄』, 소설집 『소녀 연예인 이보나』 등을 썼다.






![[한정현의 영화적인 순간] 끔찍하게 행복한 라짜로, 아니 너와 나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b/f/e/e/bfeef317a0adfe15d1f2862a49cdbef8.jpg)
![[한정현의 영화적인 순간] 기꺼이, 행복한 우리들의 붕괴의 시간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d/5/1/5/d515c40c412961ea1e516d84a59e4d9b.jpg)
![[한정현의 영화적인 순간] 나의 내장을 줄게, 너의 기억을 다오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4/7/b/b/47bbce62ae221d9c8030f7c83d5b201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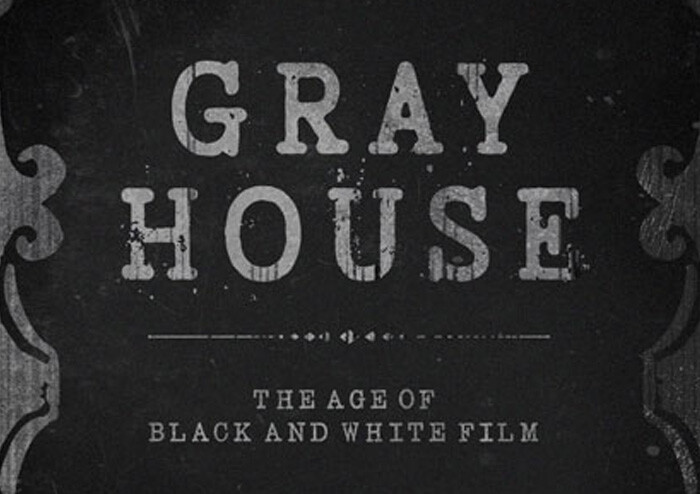

![[더뮤지컬] "1인극, 하루하루가 도전의 연속" 연극 <지킬앤하이드> 프레스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13-bc1ffabd.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