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첫날 밤 10시에 나는 안젤름 키퍼의 신작 그림 앞에 서 있었다. 아트 페어 '프리즈'가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열리는 것을 기념하는 일종의 개막 전야제로 한남동 일대 갤러리가 자정까지 열려 있었다. 이름하여 '한남 나이트'. 밤의 미술관은 처음이었다. 웰컴 드링크로 건네받은 도수 높은 칵테일을 마시며 그림을 코앞에서 감상했다. 취한다 싶으면 다음 갤러리까지 걸으며 깼다. 이날은 어디든 티켓을 끊을 필요가 없었으므로 길을 걷다 미술관에 들어가는 일 사이에 어떤 문턱도 없었다.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가 흐려졌다. 밤이 그것을 증폭시켰다.
『밤에 우리 영혼은』이라는 제목의 소설도 있듯, 밤은 영혼들의 시간이다. 분주하게 움직이던 낮의 이성(理性)은 일몰과 함께 긴장을 늦추고, 우리의 영혼은 이제 서서히 충만해진다. 밤의 고요가 오감을 깨운다. 내가 할 일은 온갖 자극을 그대로 누리는 일. 그림을 보고 나와 다시 현실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다. 내가 누구이고 여기가 어디인지 긴장한 채 자각할 필요도 없었다. 언제까지고 여운에 잠겨 있어도 되었다.
안젤름 키퍼의 작품은 이날의 다섯 번째 갤러리 '타데우스 로팍'에서 만났다. 그의 작품에 전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실제로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독일의 대표적인 전후(戰後) 미술가로, 파울 첼란과 잉에보르크 바흐만 같은 현대 작가들의 다양한 문학 작품도 적극적으로 참조해 온 키퍼. 이번 전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회화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러고 보면 릴케 역시 화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했다. 로댕의 조수로 일했고 세잔의 작품을 탐닉했다. 100년 전의 일. 시간을 건너 키퍼의 이번 최신작들은 릴케의 시 가운데 「가을」과 「가을날」 그리고 「가을의 마지막」 세 편의 시에서 기인했다. 햇볕에 익은 나뭇잎과 떨어져 쌓여가는 낙엽, 점점 회색조를 띠는 나무가 주조를 이루었다.
주여, 가을이 왔습니다. 여름이 참으로 길었습니다.
(…)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이후에도 오래 고독하게 살면서
잠자지 않고, 읽고, 그리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날릴 때, 불안스레
이리저리 가로수길을 헤맬 것입니다.
_「가을날」 중 (라이너 마리아 릴케 지음, 송영택 옮김, 『릴케 시집』, 문예출판사, 2014)
대형 캔버스에 납과 금박으로 표현된 낙엽은 큼직하고 묵직하게 고정된 채 빛났다. 바람이 분다고 훅 날아가 버릴 것 같지 않았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온다고 말하지만 사실 진정으로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라지는 것은 없다. 고이고 쌓인다. 시간이 그렇다. 그렇게 쌓인 시간이 역사가 된다. 그리고 순환한다. 가을과 겨울의 폐허에 무엇이 재건되고 재탄생할지 우리는 잘 지켜보고 잘 살아내야 한다... 우두커니 서서 그런 생각들을 했다. 고독한 누군가가 가로수길을 헤맬지라도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 있어, 이 낙하를 / 한없이 너그러이 두 손에 받아들인다'(릴케, 「가을」 중)고도.
좋은 예술 작품이 대개 그러하듯 릴케의 시도 키퍼의 회화도 한 개인의 특출한 재능에서 시작되어 시공간을 뛰어넘었다. 그렇게 어느 가을의 초입, 직전의 8월과는 완전히 달라진 밤바람을 묻히고 갤러리로 들어온 나에게로 도착하였다. 이제 곧 내 세계의 나뭇잎들도 햇볕에 그을리고 바싹 말라 떨어져 쌓일 것이다. 나는 그 스산한 풍경 앞에서 이날 만난 두 '폐허의 파수꾼'을 떠올리며 조금 다른 가을을 나게 될까? 무너져 쌓이고 사라져가는 것들 너머를, 그 후의 생명력을 고대하며 겸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
한동안 내 인생이 너무 단조로워지는 것 같아 착잡했다. 바쁘고 일 많고 마음의 여유는 없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이 모든 게 거대한 바퀴가 되어 무심히 굴러가는 기분이 들었다. 평일에는 책 편집, 주말에는 영상 편집으로 꽉 찬 일상. 결과물들이 차근차근 쌓이는 걸 보면 뿌듯한 마음이 드는 한편, 숨이 막히기도 했다. 그것들이 시야를 가려 눈앞의 새로운 풍경을 놓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그 밤, 평일의 피로를 그대로 안고서 한남동까지 갈 결심을 한 것인지도 몰랐다. 마주할 거라 예상 못 한 것을 마주하고, 예상 못 한 웃음을 터뜨리고, 예상 못 한 경이로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일상의 여기저기에 구멍을 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밤의 미술관에서 그렇게 나는 새로운 호흡기를 얻었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강윤정(문학 편집자, 유튜브 채널 <편집자K> 운영자)
『문학책 만드는 법』을 썼고 유튜브 채널 <편집자 K>를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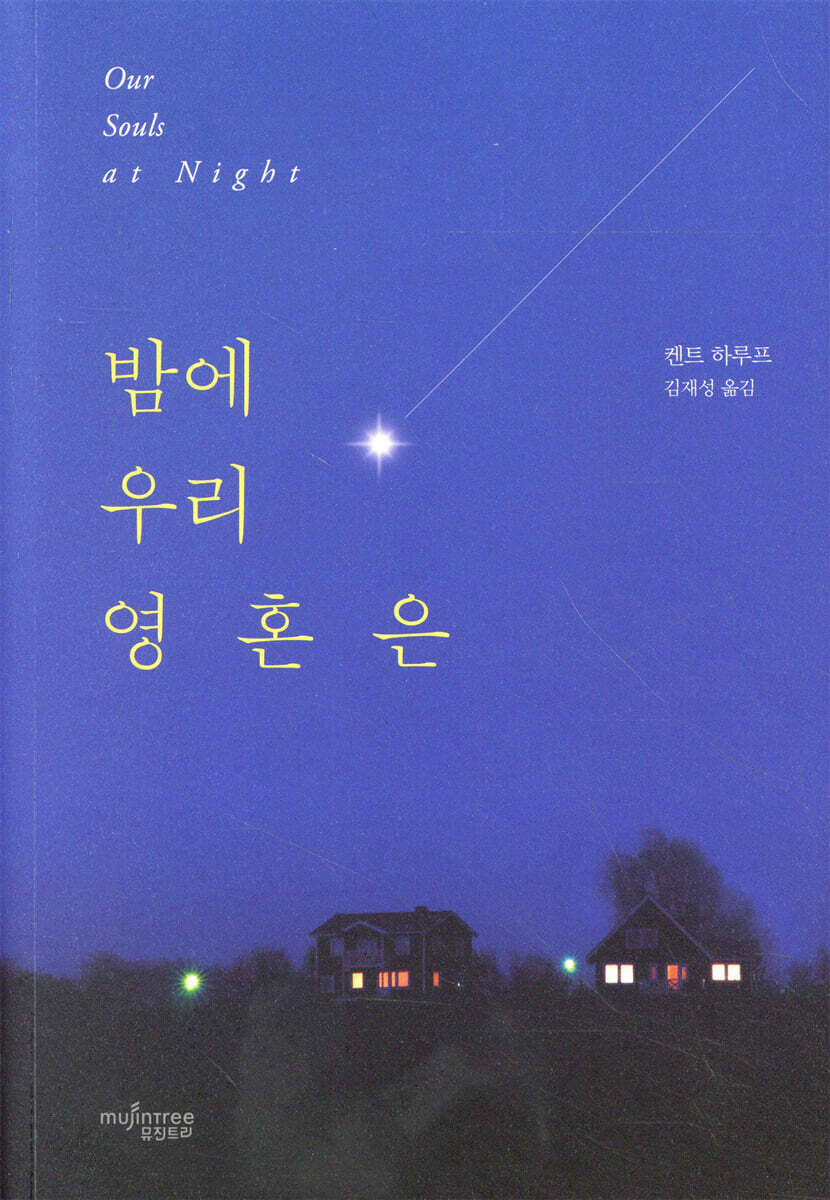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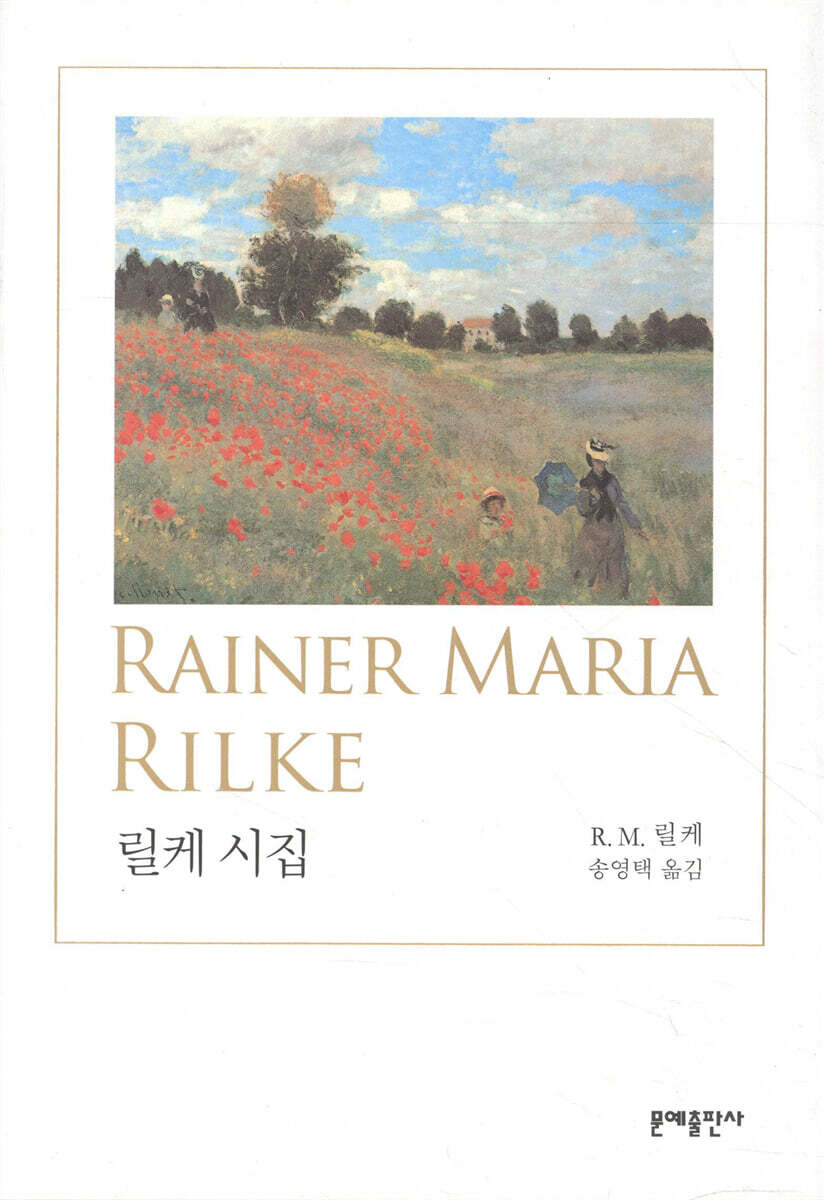
![[편집자K의 반쯤 빈 서재] 나의 최초의 타인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d/d/b/9/ddb9b8e143925af8c82a74b090528511.jpg)
![[편집자K의 반쯤 빈 서재] 책에 드러난다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6/9/2/4/6924b768080b3e79d8c45abcdcf958c3.jpg)
![[편집자K의 반쯤 빈 서재] 책과 커피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f/3/a/1/f3a1ab4d26a669c3e6f5f71b0ab94728.jpg)




![[이벤트 종료] 새로워진 채널예스 기대평을 작성해주세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6-81642dcc.jpg)








봄봄봄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