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찬일 영화평론가
전찬일 영화평론가
박찬욱 감독이 탕웨이와 박해일 등과 함께 빚어낸 <헤어질 결심>에 감독상을, <어느 가족>으로 2018년에 황금종려상을 안은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송강호 강동원 이지은(아이유) 배두나 이주영 등을 기용해 연출한 한국영화 <브로커>에 남우주연상(송강호)을 안기면서, 제75회 칸 영화제가 29일 새벽(한국 시간) 12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황금종려상은 루벤 외스틀룬드 감독의 <슬픔의 삼각형>에 안겼다. 호화 유람선을 무대로 펼쳐지는 잔혹하면서도 통렬한 계급 풍자 코미디다. 외스틀룬드는 봉준호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옥자>가 초청됐던 2017년, <더 스퀘어>로 칸 최고 영예를 안은 바 있다.
경쟁작 수상 결과로만 판단하면 올 칸은 과거의 세 영화 변방, 한국과 스웨덴, 벨기에의 완승, 미국의 대참패, 프랑스의 체면 유지로 요약된다. 총 21편의 경쟁작 가운데 두 편인 것도 단연 괄목할 만한 성취거늘 7개에 불과한 본상에서 두 개나 받았으니, 어찌 ‘완승’이라 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영화 사상 최초임은 물론이다.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이 처음으로 칸 경쟁 부문에 초청된 것이 2000년이고, <취화선>의 감독상 수상이 2002년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격세지감이라 일컫지 않을 수 없다.
 <슬픔의 삼각형>으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루벤 외스틀룬드 감독
<슬픔의 삼각형>으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루벤 외스틀룬드 감독
세계 영화사의 거장 중 거장인 잉마르 베리만의 나라(<제7의 봉인, 1957>, <화니와 알렉산더, 1982>) 스웨덴도 마찬가지다. 최고상 외에도 각본상까지 가져갔다. 지난 4월 국내 개봉된 <더 컨트랙터>의 타릭 살레가 감독한 <천국에서 온 소년>이다. <로제타>와 <더 차일드>로 1999년과 2005년에 이미 칸 정상에 오른 형제 감독 장-피에르 & 뤽 다르덴의 나라 벨기에는 어떤가. 그 형제 감독이 75주년 특별상을 안은 것 외에도, <걸>로 2018년에 황금카메라상(신인감독상)을 거머쥐었던 신성 루카스 돈트가 <클로즈>로 2등상 격인 심사위원대상을, 샤를로트 반더메르쉬 & 펠릭스 반 그뢰닝엔의 이탈리아-벨기에-프랑스-영국의 합작물 <여덟 개의 산>이 심사위원상을 가져갔다.
미국영화의 수모에도 눈길이 가지 않기란 힘들다. 명색이 ‘영화왕국’이라면서 제임스 그레이(<애드 아스트라, 2019>)의 <아마겟돈 타임>과 <퍼스트 카우>(2019)의 명장 켈리 라이카트의 <쇼잉 업> 두 편 다 빈손으로 돌아갔다. 경쟁작이 두 편밖에 안 된다는 것부터가 ‘망신’이었거늘 말이다. “프랑스의 체면 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말을 꺼내기조차 부끄럽다. 주 제작국 기준으로 올 칸은 자국 영화 5편을 21편 안에 포함시켰다. 2021년에는 24편 중 9편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적은 수치다. 그 5편 중 한 편, <하이 라이프>(2018), <렛 더 선샤인>(2017) 등의 명장 클레어 드니가 연출한 <정오의 별들>이 <클로즈>와 공동으로 심사위원대상을 안았을 따름이다. 지난해엔 쥘리아 뒤쿠르노의 <티탄>이 황금종려상을, 레오 카락스의 <아네트>가 감독상을 차지했거늘 말이다. 70대 중반의 노장인 데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성 감독에 대한 배려라 이해하고는 있으나, 영화의 수준이 너무 바닥인 지라 너무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차라리 다른 영화가 수상을 했더라면, 덜 부끄러웠지 않았을까 싶다. 레오노르 세라이으의 <마더 앤 선>이나 스페인 감독 알베르 세라의 <퍼시픽션> 같은 영화들은 칸 현지에서 가장 널리 참고되는 데일리 스크린 인터내셔널(이하 스크린) 10인 평가단으로부터 종합 평점 2.4점과 2.6점으로, 1.9점의 <정오의 별들>보다 한결 더 나은 호평을 받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한국 영화가 거둔 역사적 성취라는 점에서 올 칸은 그 어느 해보다 기분 좋고 신나는 영화제로 기억, 기록될 것이다. 결국 올 칸은 한국 영화가 살리고 ‘구원’한 셈이다. ‘국뽕’ 아니냐고 핀잔을 듣더라도, 평소 자처해온 ‘코스모폴리탄적 아나키스트’로서 진심이다.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 두 경쟁작 외에도 공식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부문에서 첫 선을 보인 이정재 감독·주연의 <헌트>도 그렇고, 비공식 병행 섹션 중 하나인 비평가 주간에서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폐막작으로 월드 프리미어된 <다음 소희>(정주리 감독), 수상엔 실패했으나 국산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로 단편 경쟁 부문에 부름을 받은 <각질>(문수진)도 한국영화의 어떤 수준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었다(는 것이 중평이다).
캄보디아계 프랑스 감독 데비 슈가, 연기 경험이 전무하다는 설치 미술가 박지민을 비롯해 오광록과 김선영, 허진 등 관록의 한국 배우들과 함께 만들어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서 선보인 프랑스 영화 <리턴 투 서울>도, ‘영화 한류’의 연장선상에서 자리매김될 법한 귀한 성과를 입증했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박기용)가 제작 지원을 했다는 영화는, 어린 나이에 입양된 25세 프랑스 여성이 자신이 태어난 조국을 방문했다가 친부모를 찾으며 8년에 걸쳐 성장?성숙해가는 과정을 그리는데, 영화를 관통하는 정서가 어찌나 ‘한국적’인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꽃잎’부터 ‘아름다운 강산’, ‘봄비’ 등 신중현이 만든 인기 대중가요들을 활용한 음악 효과도 그렇거니와, 여주인공의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한 캐릭터 내면의 풍경은 일품인 바, 해당 부문에서 수상은 못했어도 ‘올 칸의 발견’으로 손색없다.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영화 <헤어질 결심> 포스터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영화 <헤어질 결심> 포스터
스크린 평점에서 유일하게 3점을 넘어서만은 아니다. 최종 결정이야 심사위원단 마음대로이긴 하나 <헤어질 결심>은 영화 보기 50여 년, 영화 스터디 40년, 영화 글쓰기 30여 년의 이력으로 판단컨대, 단연 최강 황금종려상 감이었다. <슬픔의 삼각형>이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두 영화의 수준차는, 권투로 치자면 헤비급과 미들급 간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의도와 상관없이, <헤어질 결심>은 영화 역사의 최거장 알프레드 히치콕에서 시작해 히치콕으로 끝나는 영화다. 감독은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랑만큼 중요하고, 인간성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경험은 드물다”면서, “자기 욕망에 충실하면서도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의 로맨스”라고 영화를 소개했는데, 영화는 그야말로 치명적 매혹을 뽐낸다.
영화 <브로커>는 <헤어질 결심>에 비해 심심하리마치 담백한 편이다. 베이비 박스를 둘러싸고 의도치 않은 관계를 맺게 되는 인물들의 예기치 못한 특별한 여정을 그린, 가슴 따듯한 휴먼 드라마다. 송강호의 수상이 ‘의외’로 비쳐진다면 연기를 못해서가 아니라, 강동원 이지은 배두나 등 좋은 배우들이 워낙 즐비한 터라, 그의 연기가 그다지 강렬하게 다가서지 않기 때문이다. 상생의 연기를 펼쳤다고 할까. 전도연을 ‘칸의 여왕’에 등극시켰던, 이창동의 <밀양>(2007)처럼.
이정재의 연출 역량은 예상 이상이다. 200억 원에 달한다는 큰 제작비가 투하된 대작을 연출 초짜가 그렇게 유려하게 요리하다니, 감독으로서 그의 미래가 기대된다. 배우 출신 감독으로는 한국 영화사의 새장을 열었다. “상업 오락 영화에, 한국 현대사의 숱한 그늘들을 적절히 배합시킨 문제의식은 큰 주목에 값한다. 전반적 연출 리듬도 합격점을 줄 만하다. 개별 연기는 말할 것 없고 이정재-정우성 투 톱의 연기 ‘케미’도 좋다. 성격화들도 인상적이다. 특히 주지훈, 황정민, 이성민 등 정상급 배우들의 카메오 연기는 영화 보기의 재미를 배가시킨다. 스타 캐스팅이 얼마나 험난한지 익히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의 깜짝 출연만으로도 영화는 흥미진진하다.”
<다음 소희>는 “칸의 숨은 보석”으로 소개한 할리우드 리포터의 평가가 영화의 수준을 단적으로 예시한다. 이 정도만으로도 한국영화가 2022년 칸 영화제를 살렸다, 는 필자의 주장은 과장이 아니지 않을까.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전찬일(영화평론가)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앤솔러지 특집] 다른 나라는 어떻게 묶을까?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8/f/c/c/8fcc87c2a5a009363dde29b458110477.jpg)
![[앤솔로지 특집] 언젠가는 읽고 싶다, 이런 앤솔러지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7/f/1/2/7f12a27ae2370b85f2d5d29b2c101fba.jpg)
![[앤솔로지 특집] 번뜩이는 기획, 이렇게도 묶을 수 있다고?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2/6/3/5/26356bdc522ddaec22555228cdc96798.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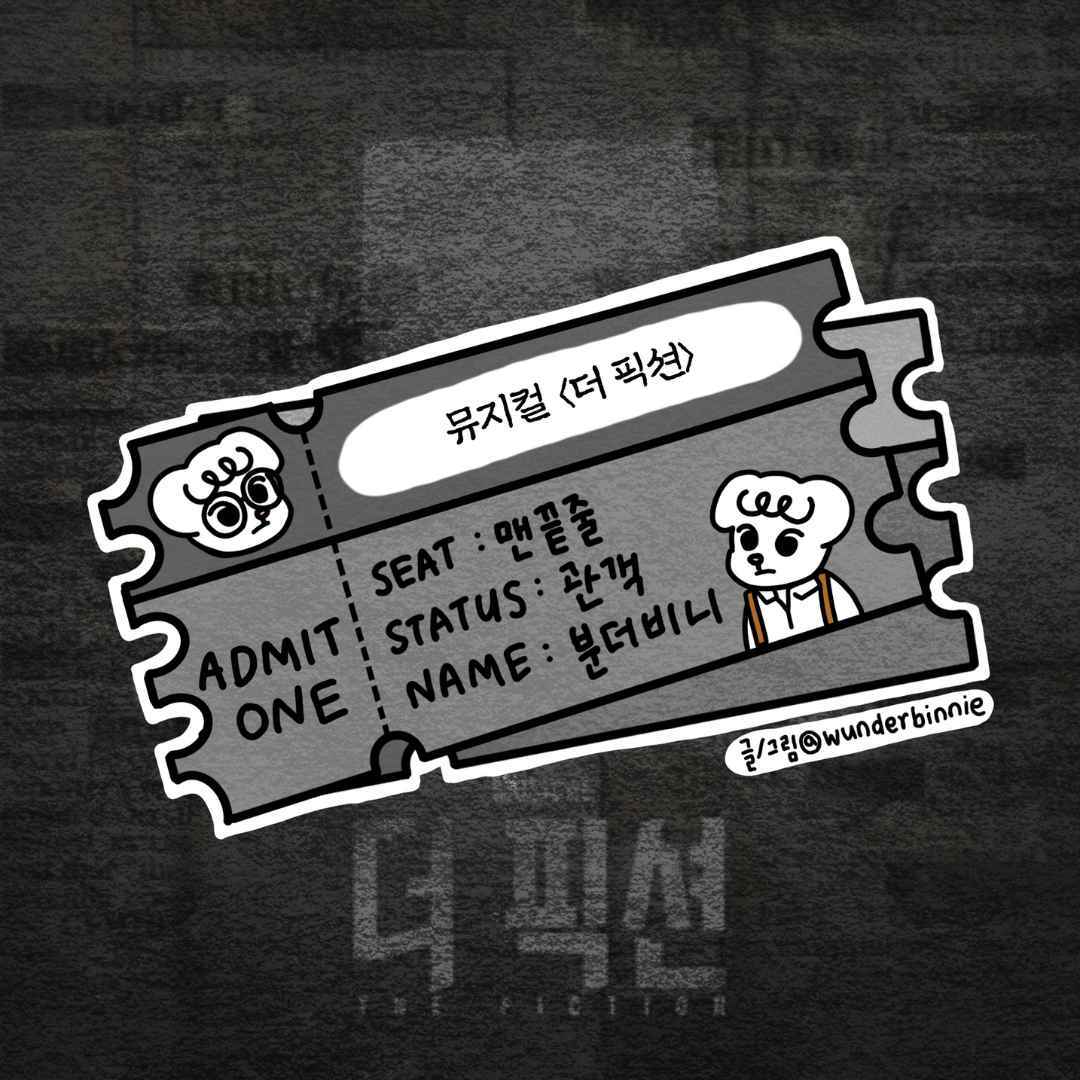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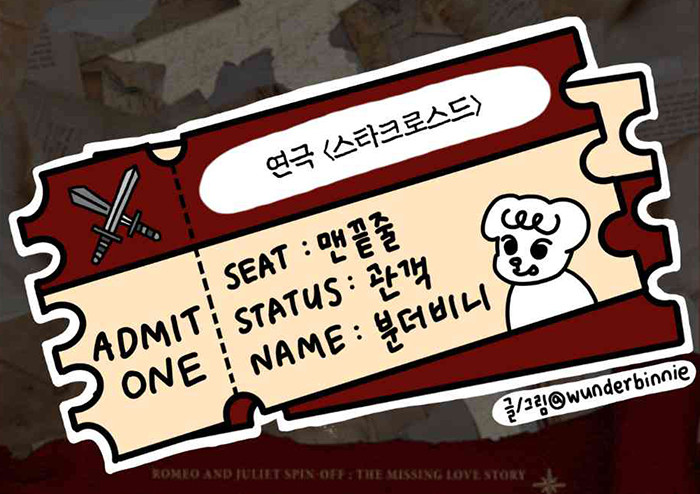
![[이벤트 종료] 새로워진 채널예스 기대평을 작성해주세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6-81642dc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