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24가 진행하는 글쓰기 공모전 ‘나도, 에세이스트’ 대상 수상자들이 에세이를 연재합니다. 에세이스트의 일상에서 발견한 빛나는 문장을 따라가 보세요. |
 언스플래쉬
언스플래쉬
빨래를 개는 중이었다. 어른 둘, 아이 셋! 하루에도 3~4번의 빨래를 하다 보니 빨래 개는 속도가 쌓이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거실에 거대한 산을 만들었다. 오늘은 기필코 빨래 더미와의 전쟁을 끝내자고 다짐한 뒤 한참을 옷가지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잠시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자 붉은색 노을을 머금은 해가 뉘엿뉘엿 서쪽 하늘을 향해 기울고 있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이제 곧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끙~” 한동안 구부렸던 무릎을 펴자 나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 나왔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오늘은 뭘 해 먹나?' 주부의 고민은 텅 빈 냉장고를 보면서 시작된다. 삼시 세끼 밥상을 차리다가 하루가 가고, 또 다른 하루가 온다. 하필이면 며칠 전 만들어 두었던 반찬까지 똑 떨어지면서 먹을 만한 것이 없었다. “후~”깊은 한숨을 몰아쉬었다. 이번에는 냉동실로 시선을 옮겼다. 반드시 저녁거리가 될 만한 무언가를 발견해야만 했다. 그러다가 냉동실 구석에서 하얗게 빛나고 있는 봉투를 발견했다.
"밥할 때 같이 넣어서 먹어봐. 밤이 아주 달고 맛있더라."
며칠 전 친정 부모님께서 챙겨주신 알밤이었다.
“네~ 그럴게요.”
이제 막 기어 다니는 재미를 알게 된 셋째가 거실을 종횡무진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아이를 챙기느라 건성으로 대답했었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밤이 이것이었나보다. 애 셋을 돌보면서 밤 깔 시간이 어디 있겠냐고 미리 껍질까지 까주신 알밤이 한 움큼 묵직하게 잡혔다. 물에 설설 헹궈서 그대로 밥 위에 살포시 얹어주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야말로 친정 엄마표 밀키트다.
‘그래, 밤밥을 해 먹자.’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 생각지도 못했던 알밤의 등장에 기분이 들떴다.
‘밥맛만 좋으면 한 그릇 뚝딱하겠지.’
찰찰찰, 촐촐촐. 쌀 그릇에 가득 담긴 쌀알들이 손길을 따라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신나게 춤췄다. 잠시 뒤, 뽀얀 물을 벗은 쌀을 전기밥솥에 넣고, 그 위에 알밤을 가득 얹었다. '취사' 버튼을 누르자 전기밥솥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작동했다.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자 붉은색 노을 끝자락이 하늘에 걸려 있었다. 하늘을 바라본 것! 그것도 노을 진 하늘을 바라본 것이 참 오랜만이었다.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냉장고에서 달걀을 꺼내 계란말이를 했다. 김치 냉장고에서는 1년 내내 든든하게 자리 잡은 김장 김치를 꺼냈다. 마지막으로 어제 먹다가 남은 된장국을 꺼내 밥상을 차리니 그런대로 구색이 갖춰지는 듯했다. 잠시 뒤, “치지직~ 칙~~~”소리와 함께 밥이 완성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깜빡이는 주황색 불빛을 따라서 내 마음도 반짝였다. 이제 곧 하얀 김과 함께 노오란 알밤이 모습을 드러내리라.
“딸깍!” 전기밥솥의 상냥한 안내를 따라서 밥솥을 열자 뽀얀 김이 공중으로 흩어졌다. 알밤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밥을 저은 후 밥그릇에 후한 인심을 더해 하나 가득 담았다. 갓 지은 쌀밥 위에 살포시 얹어진 알밤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식탁 위에 달님이 내려앉은 것만 같았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을‘호호’ 불며 하나 가득 입안에 담는다.
“와~ 밥 맛있다”
노랗고 포슬포슬한 밤밥의 맛에 아이들이 맛있다고 아우성친다. “후~”하고 뜨거운 김을 날린 뒤, 한입 가득 밤밥을 물자 그 안에 어린 시절의 내가 있었다. 그때 먹었던 밤밥과 지금 먹고 있는 밤밥의 맛이 어쩜 이렇게나 똑같을 수 있는지 나도 모르게 스르르 눈이 감겼다. 그 순간, 허리를 구부리고 손가락이 얼얼해질 때까지 날밤을 까셨을 친정엄마가 떠올랐다.
‘하나도 까기 힘든 밤을 이렇게나 많이….’
갑자기 목구멍이 뜨거워졌다. 분명 입 안의 알밤은 달큰하고 포슬포슬한데 더는 밥을 삼킬 수가 없었다. 한나절 동안 날밤을 까시느라 손가락과 허리가 아프셨을 친정엄마와 그 밤을 손주들에게 먹이시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시는 친정 아빠의 마음이 느껴졌다. 힘드셔서 어떡하냐는 말에 너희들이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는 두 분의 얼굴에 곱게 핀 주름이 내 마음을 시리게 한다.
“오늘 수원에 가려고 하는데, 뭐 먹고 싶은 것 있니?”
휴대전화 너머로 정겨운 목소리가 들린다. 부스럭거리며 반찬 챙기는 소리와 뭘 더 챙겨갈까 이야기 나누시는 두 분의 소소한 대화가 들린다.
‘홀쭉해진 우리 집 냉장고가 오랜만에 포만감을 느끼겠구나.’
입가에 미소가 떠오른다. 친정 부모님이 오신다. 양손 가득 든 반찬과 함께 그 안에 사랑을 담아서 오신다. 오늘은 밤밥을 먹는 날이다. 사랑을 먹는 날이다.
*손서윤 일상이 빛나는 글을 씁니다. |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손서윤(나도, 에세이스트)
일상이 빛나는 글을 씁니다.






![[에세이스트의 하루] 자가격리자의 변 - 한지형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4/c/7/6/4c76c7d71869dc9804e7c5a92c07cea6.jpg)
![[에세이스트의 하루] 모든 순간이 좋은 때 - 생강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e/1/1/7/e117f58376a8f2511f2a1f43352ef665.jpg)
![[에세이스트의 하루] 서툴게 전하는 진심 - 김혜진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b/7/a/7/b7a7b63db52d0573e901c718d588577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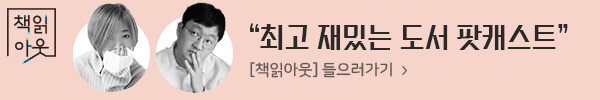
![[인터뷰] 오은 “산문은 수렴하듯 쓰고, 시는 발산하듯 쓰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11-ea2210ec.jpg)
![[김미래의 만화 절경] 더께 밑의 우리, 더께 너머의 우리](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30-d1bcfc30.png)


![[이벤트 종료] 새로워진 채널예스 기대평을 작성해주세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6-81642dc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