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부터인가, 트렌디하고 힙한 지인들이 인스타그램에 캠핑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 녹색 계열의아웃도어 소품과 패션, dope한 분위기. 부러웠다. 캠핑 자체라기보다 예쁜 물건과 분위기를 갖고 싶었다. 하지만 취미란 건 최소한의 장비가 갖춰져야 가능한 법. 그 중에서도 캠핑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 보여 벽이 느껴졌다. 언젠가는 나도 할 수 있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진을 쓸어 올렸다.
유튜브가 문제다. 2차 백신을 맞은 날, 자리에 누워 왜 추천하는지 모를 캠핑 영상을 하나 틀었다가 그 댓가로 알고리즘의 지옥에 빠져들었다. '#솔로캠핑', '#감성캠핑', '#미니멀캠핑' 등 취향을 저격하는 키워드 사이에서 혼을 빼앗겼다. chill한 음악을 배경으로 멋진 아웃도어 브랜드 옷을 입은 채 망치를 똥땅(경쾌한 마찰음이 핵심이다) 두드려 텐트를 설치하고, 랜턴 조명 아래에서 캠핑 의자에 앉아 등유 난로를 쬐며 코펠과 버너로 음식을 해 먹는 사람들. 어느새 그건 나여야 하고, 저 장비와 분위기는 내 것이야 했다. 그래서 뭘 사면 된다고?
그렇게 광기 어린 소비의 날이 시작되었다. 밤마다 나는 각종 아웃도어 브랜드의 가볍고 기능적이면서도 세련된 물건들을 섭렵했다. 가성비를 따지다가는 나중에 결국 중복 구매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에 설득되어 S사, H사 등 아웃도어계의 명품 브랜드 숍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헛웃음이 나오는 가격인데도 왠지 저 값을 받는 마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내게도 문제가 있다. 솔직히 말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텐트에서 시작된 장비질은 머릿속 시뮬레이션을 거쳐 디테일한 물건들까지로 옮겨갔다.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라고! 밥을 해 먹으려면 테이블도 있어야 하고 불도 있어야 하고 코펠도 있어야 하고 그릇도, 커트러리도, 컵도, 이것들을 담을 카고 박스도, 그 박스를 놓을 받침대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결제를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나는 소액 대출을 받고 있었다. 이 정도는 금방 갚을 수 있다고 변명하며.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현관 앞에는 택배 박스가 산을 이루다 못해 옆집 문 앞까지 침범해 있었다. 왠지 이웃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재빨리 박스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언박싱의 즐거움보다는 이걸 언제 다 정리하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작은 방 안에 장비들을 몰아 넣고 나니 이렇게 구질구질할 수가 없었다. 아, 미니멀이 인테리어 컨셉이었는데. 잘 포개 놓으면 나을까 싶어서 ‘수납 랙’을 검색했다. 물건을 사고 또 사다가 수납을 위한 가구까지 사게 되는 악순환. 나만 그런 건 아니라고 해 줬으면 좋겠다.
지난 주말, 드디어 첫 캠핑을 다녀왔다. 시작부터 난관이었다. 나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4층에 살고 있다. 짐을 내려서 차에다 싣는 것부터가 일이었다. 개별적으로는 가벼운 것들도 모이니 꽤나 무거웠다. 왜 초경량 장비를 추구하는지 알 것 같았다. 출발하기 전부터 허리가 뻐근했다. 그래도 날이 좋으면 다 용서가 되는데 하필 최악의 미세먼지가 뿌옇게 시야를 가로막았다.
유튜브에서는 혼자서도 잘만 텐트를 치던데. 내가 산 거실형 텐트는 1인이 쓰기에는 생각보다 컸고,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자꾸 중심을 못 잡고 쓰러졌다. 두 시간쯤 걸려 텐트를 고정시키고 나니 벌써 집에 가고 싶어졌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본전은 뽑아야지. 겨우 바닥 공사를 하고 잠자리를 마련하고 다른 물건들을 세팅하고 나니 벌써 어스름했다. 계곡 풍경을 보며 드립 커피를 마시는 게 소원이었어서 원두를 갈고 커피를 내리고 나니, 밖은 잘 보이지도 않았다. 그래도 뭔가를 해치웠다는 만족감 때문인지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이래서 다들 캠핑을 오나 봐.
사실 대부분의 캠핑은 육식 파티, 쓰레기 파티라는 점 때문에 거부감도 있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한 나만의 컨셉은 비건 캠핑.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비건 음식만 먹는 캠핑 콘텐츠를 올리겠다는 야심도 품었다. 이걸 보고 누가 먼저 만들면 안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준비한 메뉴는 버섯 감바스와 토마토 야채 카레와 냄비 밥과 샤인 머스켓과 파타고니아 맥주. (그 파타고니아랑 전혀 상관없는 브랜드지만 괜히 어울린다.) 강염 버너 위에서 달그락달그락 양파와 감자와 당근을 볶으니 기분이 좋아졌다. 예쁘게 플레이팅을 하고 사진을 수십 장 찍었다. 그래, 이건 다 인스타에 올리기 위한 거야.
포스팅을 올리고 나서야 다 식어버린 밥을 한 숟갈 떴다. 맥주를 들이켜니 고단했던 탓인지 피로가 몰려왔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 설거지를 하고 샤워를 하고 왔다. 이대로 밤을 흘려 보낼 수는 없다며 와인을 땄다. 술을 마시러 온 건가? 취기가 더 도니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었다. 사실 제일 걱정했던 건 추위였는데 등유 난로를 켜고 전기장판을 깔아 두니 오히려 땀이 날 정도로 더웠다. 그렇게 하루가 갔다. 캠핑, 생각보다 어렵지 않군.
8시에 일어나서 씻고 라면을 끓여먹고 설거지를 하니 벌써 철수를 할 때가 되었다. 체크아웃은 11시. 두 시간이면 넉넉하겠지. 오산이었다. 진짜 캠핑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세팅보다 철수가 더 힘든 거라고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나. 패키지에 그렇게 오밀조밀하게 들어있던 물건들이 하룻밤 사이 두 배는 불어난 것처럼 도통 들어가지 않았다. 짐은 왜 그렇게 많이 가져 와서 넣어도 넣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피로가 다 풀리지 않았는지 컨디션은 최악이었다. 텐트를 죽일 듯이 눌러서 겨우 가방에 넣고 나니 정확히 11시가 되었다.
근처를 둘러보고 여유롭게 돌아갈까 했던 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그저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팠다. 다른 것도 아닌 선지 해장국이 먹고 싶었다. 한동안 비거니즘을 잘 실천해 왔는데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나. 집 근처에서 소의 피와 내장을 우걱우걱 집어 삼키고는 빌라 주차장에 돌아왔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많은 짐을 4층까지 걸어서 올려야만 했다. 당장 옮기지 않아도 되는 걸 제외하고도, 이고 지고 세 번을 오르락내리락 했다. 압축적인 이사였다.
세탁해야 하는 옷들을 빼고, 말리거나 다시 설거지해야 하는 물건들을 빼고, 침낭과 담요를 펼쳐 놓고, 세면 도구도 집어 넣고, 비몽사몽으로 최소한의 정리를 하고 씻지도 않은 채 소파에 몸을 던졌다. 눈을 뜨니 밤이었다.
모든 취미 활동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즐겁기만 하지 않다. 처음이라 헤맸던 탓도 있을 거고 적응되고 노하우가 쌓이면 나을 수도 있다. 그래도 이건 참 고생스러웠다. 뭘 위해서 하는 거지? 라는 근본적인 고민도 들었다. 캠핑이 이렇게 고단한 거라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잖아. 겉모습만 보고 홀랑 빠져 든 내 잘못도 있지만.
그래도 구매한 물건이 아까워서라도 한 번은 더 가지 않을까 싶다. 혼자라서 더 심심하고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서 함께할 친구를 모으는 중이기도 하다. 다음 캠핑은 부디 수월하기를. 비건 캠핑도 실패하지 않기를. 유튜브 채널 꼭 만들기를.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김상훈
나답게 읽고 쓰고 말하기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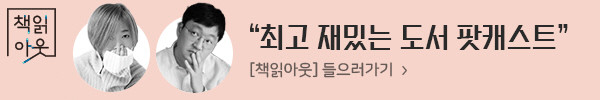


![[서점 직원의 선택] 만우절 추천 도서 - 거짓이 당신을 속일지라도](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01-8d5a7a7c.jpg)
![[큐레이션] 자궁근종인의 식탁에는 고기가 없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13-acdded89.jpg)
![[이벤트 종료] 새로워진 채널예스 기대평을 작성해주세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6-81642dcc.jpg)


튜브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