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지프, Franz von Stuck, 1920.
시지프, Franz von Stuck, 1920.
시지프의 신화의 경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거대한 바위를 들어 산비탈로 굴려 올리기를 끊임없이 되풀이하느라 팽팽하게 긴장한 육체의 노력 뿐이다. 일그러진 얼굴, 바위에 바짝 갖다 붙인 뺨, 진흙 투성이 바위를 받치는 한쪽 어깨와 그 어깨를 지탱하는 한쪽 발, 쭉 뻗어 다시 바위를 받아 드는 팔, 흙투성이 두 손에서 순전히 인간적인 확신이 보인다. 하늘 없는 공간과 깊이 없는 시간을 통해 가늠되는 이 기나긴 노력 끝에 목표는 이루어진다. 이때 시지프는 바위가 순식간에 저 아래 세계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바라본다. 그 아래로부터 바위를 다시 들어 정상으로 밀어 올려야 하는 것이다. 그는 평지로 다시 내려간다. 시지프가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아래로 되돌아가는 그 시간, 그 짧은 휴식 시간 동안이다.
-알베르 까뮈, 『시지프 신화』 중에서
출구 없는 고속도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 출구가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을 때, 클래식 음악 전문 라디오에서 사뮤엘 바버(1910-1981)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1936)»를 들었습니다.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삶과 고단한 저녁 운전, 지는 해로 붉게 물든 노을이 짙푸른 밤하늘로 멀리 연결되고 있던 그 시간, 홀로 있는 차 내부를 가득 채운 «아다지오»를 들으며 누군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들리는 것은 현악 앙상블이 연주하는 부드럽고, 풍성한 색채 뿐인데 숨 막히게 고조되는 긴장감은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사뮤엘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는 현악 합주단이 연주하는 느리고 긴 호흡으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멜로디 선율이 4분음표로 조금씩 상승하는 동안, 그 선율을 받치는 화성은 느리게 움직이며 귀로 들어서는 쉽게 마디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박자를 길게 늘입니다. 하늘에 넓게 뻗은 노을처럼 시간의 경계가 지워집니다. 그리고, 느린 음표 사이에서 우리는 길을 잃지요. 인간의 호흡보다 훨씬 길게 음을 유지할 수 있는 현악기의 위력이 발휘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음악을 들으며 노래와 함께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싶어 하는 우리는, 길게 늘어지는 현악기 노래에 편히 숨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소리가 끊어진다 해도, 불협화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숨은 편히 내뱉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높은 음을 향하는 끝없는 크레셴도(점점 크게)는 단 한 번도 편안하게 해결되지 않는 불협화음과 함께, 듣는 이의 심장을 서서히 조이며 긴장을 높입니다.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1867-1957)가 이끄는 미국의 NBC 교향악단은 1938년, 뉴욕에서 바버의 «아다지오»를 초연했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의 끝자락에 있었고, 토스카니니는 이탈리아 무솔리니 독재 정권을 피해 미국에 정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기억하는 세대가 아직 살아있는데 또다시 전쟁으로 세상을 몰아가는 히틀러로 인해 전 세계가 긴장을 높이고 있던 때였습니다. 연주하는 이도, 듣는 이도 방향을 잃은 세상에서 출구 없는 불안을 느끼고 있었을 늦가을 저녁, 그날의 «아다지오»는 공통의 불안감을 음악으로 터뜨려 내며, 함께 들은 모든 이의 머릿속에 지독한 감정의 극치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 이후, 사람들은 슬픔을 나누어야 할 때마다 이 곡을 찾았습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과 A. 아인슈타인의 장례식에서, 그리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소식을 전하는 라디오 방송에서도 «아다지오»를 배경 음악으로 틀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가 난 이후, 희생자를 추모하는 음악회에서도 아다지오의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 많이 연주되어 이제는 닳고 닳았나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정교하게 짜인 바버의 음악 구조는 언제 들어도 다시 그 상태, 발을 디딜 땅을 놓쳐 버린 황망함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이지요. 바이올린에서 비올라로, 그리고 첼로로 멜로디가 옮겨 가는 동안 작품의 첫 음이었던 시♭음은 무거운 돌을 온몸으로 밀어 올리는 시지프처럼 두 옥타브가 높은 시♭까지 힘겹게 올라갑니다. 온 힘을 다해 포르테시모(ff)로 고조되던 긴장은 절정에서 둑이 터지듯 파열되며 끊어집니다. 힘겹고 고통스럽게 꼭대기에 오른 후, 또다시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바라보아야 하는 절망과 동시에 찾아오는 약간의 휴식과도 같은 침묵. 바위를 찾으러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시지프가 그렇듯, 절정의 포르테시모가 지난 후 음악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느리게 자신을 들여다볼 여유를 얻습니다.
또다시 4월이 돌아왔습니다. 2014년의 4월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상투적으로 들린다면 바버의 «아다지오»를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너무나 많이 인용되어 의미를 상실한 듯한 음악이 귀에 들릴 때, 각자의 삶에 지쳐 잊고 있던 무엇인가가 메마른 가슴을 직접 울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고, 아픔도 치유되지 않았고, 다른 어느 곳에서 또 다른 무고한 죽음이 반복되지만, 슬픔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이니까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여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절정을 향해 느리고, 쉼없이 진행하는 바버의 아다지오처럼, 우리가 버티고 살아가는 삶처럼요. 하지만, 카뮈는 ‘돌덩이의 부스러기 하나하나, 그 캄캄한 산의 광물 조각 하나도’ 시지프에게는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왜냐면, 산꼭대기를 향하는 투쟁이 인간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때문이랍니다. 끝없는 고행과 절망의 끝에서 누리는 찰나의 자유, 그리고 다시 시작, 삶을 견디고 함께 기억하고 위로하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의미입니다.
조명이 꺼지고, 누가 나에게 ‘다 끝났다’라고 말을 해도, 무대로부터
공허함이 잿빛 바람과 더불어 밀려온다 해도,
그리고 말 없는 조상들 중 누구 하나 함께 없어도, 어느 여인도,
심지어 갈색의 그 사팔눈 소년마저 거기 없어도
나는 남아 있으리라. 끊임없이 응시하며.[…]
제4 비가 중에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 『두이노의 비가』 중에서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송은혜
음악 선생. 한국, 미국, 프랑스에서 피아노, 오르간, 하프시코드, 반주, 음악학을 공부한 후 프랑스의 렌느 2대학, 렌느 시립 음악원에 재직 중이다. 음악 에세이 『음악의 언어』를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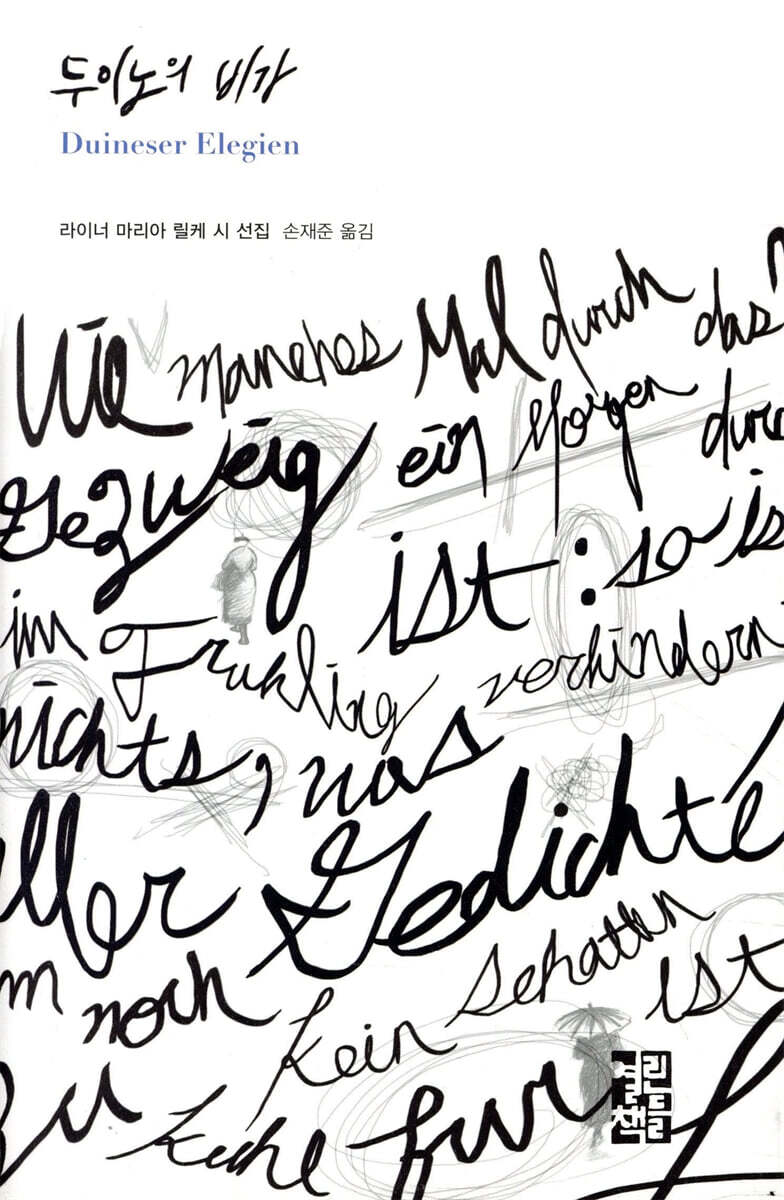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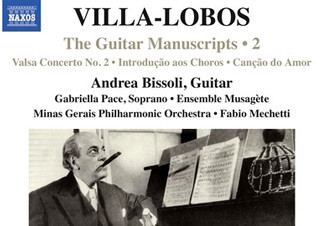



![[클래식] 제19회 쇼팽 콩쿠르, 젊은 거장들의 무대](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17-0a60ec3c.jpg)
![[클래식] 침묵 다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12-7949c6f9.jpg)

![[여성의 날] 여성이 여성에게 메아리로 전달하는 책](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05-9919a514.png)
![[클래식] 클래식 음악 차트 1위는 누구?](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21-e904d06e.jpg)







shinya02
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