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4시 반쯤이면 이미 어둑해지는 곳에 산 적이 있다. 이국이었으며 나갈 데가 여의치 않았기에 방에 있고 또 있다 보면 마음도 어둑해졌다. 그 어둑함을 자책하며 더 어둑해졌다. 누군가가 이런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말해주어 온라인 몰에 접속했더니, 계절성 정서 장애(Seasonal Affective Disorder, 줄여서 SAD)를 줄여주는 빛들을 팔고 있었다. 일몰 때 강한 빛을 쬐어 몸을 (아직 낮이라) 속이거나, 해처럼 뜨고 지는 조명을 이용해 방 속의 낮을 더 길게 만드는 것이었다.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데 이 덕분에 우울함이 많이 가셨어,” “알래스카에 있는데 이 인공 빛으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와 같은 온세계 북녘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위안이 되었었다. 내 속의 어둑함이 내 탓만은 아니고 지구를 압도하는 어둠의 힘 때문이기도 함을 깨달았기에 덜 자책하게 되었었다.
잠들면 너는 허물어 사라지고
어둠은 여려진 빛을 삼키고
손 닿을 듯 너는 아득히 멀어지면
모든 게 멈춰진 듯해
두 눈에 담긴 skyline, 그 찬란
난 눈을 떼지 못해 또 사라지기 전에
멈춰진 skyline, 그 찰나
그 안에 담긴 모든 게 더 빛이 나기를
- 세정 ‘Skyline’ (앨범 <화분>, 젤리피쉬, 2020) 중에서
압도하는 어둠은 뚫을 수가 없으니 받아내고 삼켜질 수밖에는 없다. 노래를 들으면서, 이국의 나와 노르웨이, 알래스카의 동지들을 포함한 온세계 스카이라인 속 사람들이 각기 또 같이, 돌아가며 애써 빛의 전선(戰線)을 밀어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애틋해진다. 물리적 어둠이든 내면의 비유적 어둠이든, 잠겼다가 살아났다가 하면서 또 하루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찬란하다고 말하고, 더 빛이 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일은 뭉클하다.
하지만 반대로 내부가 이미 어둠으로 차, 오는 빛을 모조리 밀어낼 수도 있는 것이다. 심리치료사의 번아웃 및 우울증 경험담 『나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에는 “삶의 안개” 라는 원제와 또 본문 속 여기저기 안개와 갬, 어둠과 빛의 비유들이 나타난다.
‘안개 속을 걷는 듯 이상해.’ 그런 생각이 들었다.
바깥은 찬란한 여름이었지만 그 뜨거운 햇볕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작은 것에 기뻐하려고 노력했다. 나무 밑에 떨어진 도토리, 처음 봤을 땐 초록이었지만 며칠 새 노랗게 익어 나무에 매달려 있던 자두……. 그러나 내겐 생존이 전부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얼른 오늘이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노라 마리 엘러마이어(장혜경 옮김), 『나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84쪽
몸으로 비추어오는 찬란함, 뜨거움, 초록과 노랑과 아침을 통째 튕겨낸다. 둘러싼 안개가 빛의 투과를 막아선다. 이러한 어둔 시절을 한 번, 두 번 겪고 난 뒤 그는 작은 행복들을 “귀한 보석처럼 소중히 간직”하게 되었는데, 이는 “다시 안개가 짙은 날에 그 보석들을 꺼내 보며 마음을 다독일 수 있을 터”(194쪽)이기 때문이라 말한다. 다시 어두워지는 일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어둠 속에서 과거의 빛(을 영롱히 반사해내던 세상)을 되새기며 어둠이 지나갈 것을 확신하고 또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 또 그럴 뿐이라 말하는 듯하다.
어둠이 지나간다면, 그 어둠은 빛과 빛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이제 나 무얼 노래하려나
너무 많은 후렴
밖은 다 지난 계절의 외투
다들 몸을 떤다
나는 알아 내가 찾은 별로 가자
finally i found
달을 썰어 이 밤을 먹어치우자
it’s gonna be fine
자유로운 날
- 새소년 ‘자유’ (앨범 <자유>,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2021) 중에서
어둠은 옛 빛으로부터의 해방이자 새 빛으로 향하는 건널목이다. “지난 계절의 외투”를 떨어제끼고픈 내가 저 먼 별을 정확히 보고 향할 수 있으려면 어둠을 보아야 한다. 어둠 속으로 뛰어가야 한다. 밤에 몸을 담근 뒤 밤을 먹어 치워 저기로 닿아야 한다. 아래의 시에서도 보듯, 등 뒤의 빛과 완전히 이별해야 한다. 그 빛을 나의 현재로부터 벗어내어야 한다. “어둠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아예 가는일” 이 가능해진다. 어두운 눈으로 새로이 가야 한다. 어디라고는 적혀 있지 않다.
(전략)
눈 밝은 세상과 눈 환한 이들에게 질려
어둠을 찾는다.
나는 떠나고 있다.
항상 아예 가는 것이다.
운명의 신 같은 게 있다면
그는 장님이리.
가는 자는, 언제나 눈이 어두워야 하는 법이다.
- 성윤석 「길」 중에서 (『밤의 화학식』, 90-91쪽)
때로 삼켜지고, 버티거나 건너가고, 찾고 또 뛰어들면서 우리는 어둠을, 보다 정확히 말하면 빛과 어둠의 번갈아옴을 살아간다. 새 빛이 옛 빛이 아니듯, 다가올 어둠은 전의 어둠과는 다를 것이다. 불안과 설렘 사이에서 우리는 내내 어둠을, 빛을, 그 둘의 사이를 건넌다. 건너는 각자가 흔적으로 세계에 적힌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박종현(뮤지션)
음악가. 1인 프로젝트 ‘생각의 여름’으로 곡을 쓰고, 이따금 글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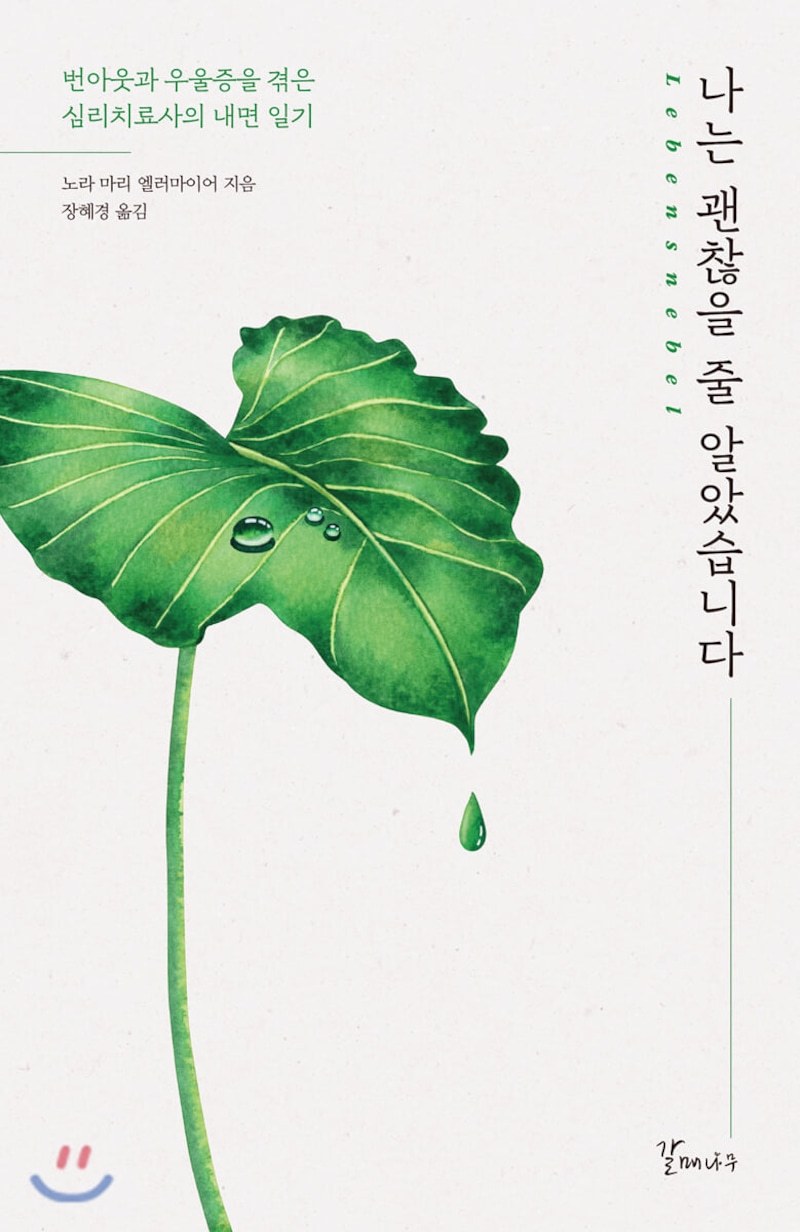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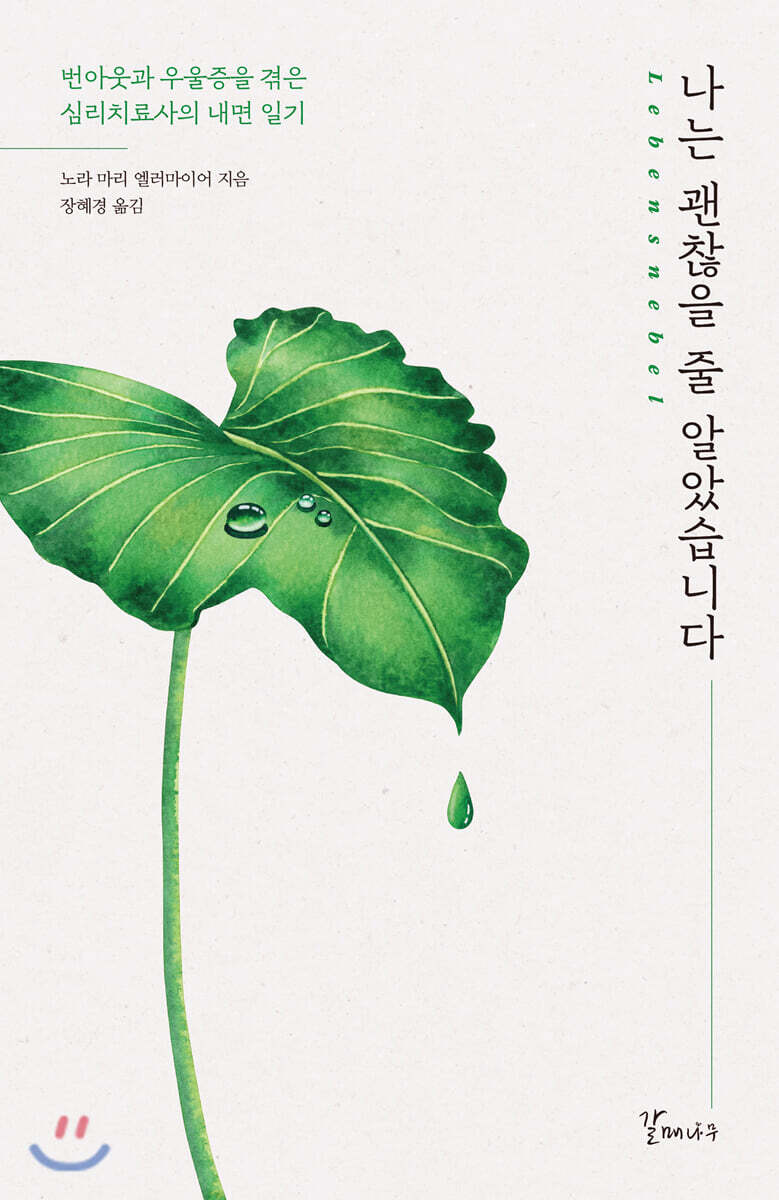

![[생각의 여름, 글이 되는 노래] 삶이라는 책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2/a/9/7/2a97139965faef7f2a3aaf7bd3ee3b1a.jpg)
![[생각의 여름, 글이 되는 노래] 개와 나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2/5/3/e/253e2ce3f6cd8000d6b7d5a607a41fff.jpg)


![[김미래의 만화절경] 어제 뭐 먹었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27-5031a641.png)
![[이상하고 아름다운 책] 우정 읽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30-c0b54c6c.jpg)


![[큐레이션] 몸을 다루는 법, 근데 이제 마음가짐을 곁들인](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10-63e14e5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