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신인의 안부가 궁금해지는 편지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버리지 못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나는 버리지 못하는 자다. 회사를 다니기 전에는 이사의 경험이 한 손에 꼽을 정도였기에 실감 없이 살았는데, (그렇다. 방에 쌓인 그 물건들을 보면서도 실감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버리지 못하는 자의 반박 불가한 특징 아니겠는가.) 사무실 자리 이동을 수차례 하면서 정확히 알았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그것이 좋거나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저 사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싶어도 다들 그 나름의 이유는 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대규모 이사를 앞두고 괜히 뜨끔한 것도 있다. 흠흠.)
내가 소유한 물건들을 떠올려보면,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의 카테고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듯하다. 이걸 버려 말아 하는 갈등의 순간을 가장 많이 겪는 물건들인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버리지 못하는 자는 장고 끝에 ‘말아’를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예를 들면 알맹이를 다 쓰고 남은 예쁘고 유용해보이는(!) 상자와 각종 껍데기들. 실제로 후에 그것을 잘 쓰게 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지만, 나를 크게 압박할 왠지 모를 아쉬움과 불안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그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진짜다.
다음으로는 ‘버리기엔 조금 애매한’ 카테고리다. 대표적인 것이 청첩장이다. 버린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쓰레기통에 넣는 행위를 말하는데, 뭐랄까, 선뜻 쓰레기로 분류하기가 난감하다. 신경이 쓰인다. 물론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건 영영 보관하기에도 곤란한 것들이라 대청소를 통해 한번씩 정리하기는 한다. 버리지 못하는 자의 숙명을 벗어나는 데서 오는 찝찝함이 있지만 이제 그 정도는 감당 해야지.
마지막으로 ‘추억은 저장: 잊지 마 사라지지 마’ 카테고리가 있겠다. 이런 거다. 한때 영화 팜플렛 모으기에 취미를 붙였던 덕에 커다란 서랍 하나가 그것들로 가득 찼고, 또 언젠가는 엽서를 그렇게 사들여 보관함 몇개를 만들었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현지에서 수집한 온갖 것들이 박스와 박스가 되어 쌓인다. 세상 쓸모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이건 생각보다 유용하다. 좋은 방향으로 정신을 환기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단순한 추억팔이용은 아니다. 그만큼 좋았던 언젠가로 순간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딱딱하거나 너덜너덜해진 마음이 잠깐이나마 말랑하고 보드라워진다는 것, 이것은 여력이 있는 한 앞으로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건 기본적으로는 물건에 대한 소유욕, 욕심 때문인 걸까. 부인하기 힘든 부분이긴 하다. 버리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뭘 자꾸 사니까. 또는 물성에 대한 집착이라 할 수도 있겠다. 가상의 무엇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사물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 아니면 그냥 미련일 지도. 미련하게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 어쩌면 나는 인격화한 미련인가보다.
‘왜 이럴까’를 생각하면서 그 문제의 박스들을 열어 보다가 알았다. 나는 이 버리지 못하는 버릇 역시 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록달록 크고 작은 편지들을 아주 오랜만에 꺼내 읽었다. 발신인들의 안부가 궁금해진다. 저 아래에서부터 훈훈하고 촉촉한 기분이 번져온다. 역시 남긴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 긴 시간을 넘어 다시 전해 받은 마음에 답장을 해야겠다. 지난 겨울 버리지도 부치지도 못한 편지를 전해야겠다.
내일 아침빛이 들면
나에게 있어 가장 연한 것들을
당신에게 내어보일 것입니다.
한참 보고 나서
잘 접어두었다가도
자꾸만 다시 펴보게 되는
마음이 여럿이었으면 합니다.
- 박준,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83쪽, 「답서」
-
<p style="padding: 0px; line-height: 1.8;">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박준 저 | 난다
‘시인 박준’이라는 ‘사람’을 정통으로 관통하는 글이다. 총 4부로 나누긴 하였지만 그런 나눔에 상관없이 아무 페이지나 살살 넘겨봐도 또 아무 대목이나 슬슬 읽어봐도 우리 몸의 피돌기처럼 그 이야기의 편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출판사 | 난다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출판사 | 난다

박형욱(도서 PD)
책을 읽고 고르고 사고 팝니다. 아직은 ‘역시’ 보다는 ‘정말?’을 많이 듣고 싶은데 이번 생에는 글렀습니다. 그것대로의 좋은 점을 찾으며 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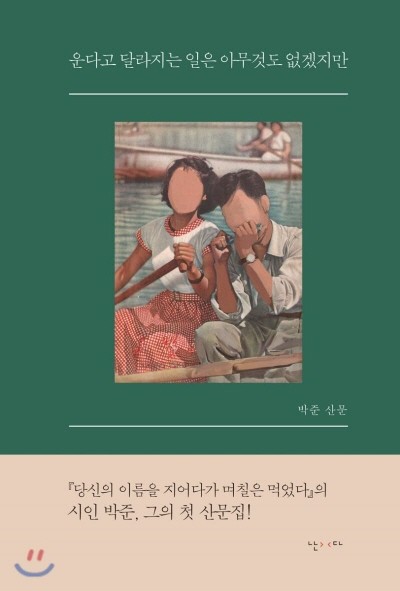





![[비움을 시작합니다] 정서적 ‘비움’을 찾고 싶은 사람들에게 ②](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9-7789ced1.jpg)
![[김승일의 시 수업] 마지막 문장 슬프게 하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14-4fe25cbb.png)


![[큐레이션] 혼술하며 읽는 시집](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6-5cb76b9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