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생에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한 동네에서 자랐다. 운이 좋은 일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셈이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그 동네와 가까운 덕분에 가끔 나는 ‘우리 동네’까지 가보곤 한다. 주택 밀집 지역이고 덕분에 학교가 많아서인지 별다른 개발 없이 ‘우리 동네’는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골목이 많은 우리 동네. 그곳에 가게 되면 나는 말을 잊고 구석구석 살피게 되는 것이다. 어디선가 불쑥, 어린 내가 뛰어나올 것만 같아서. 물론 그런 일은 없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에 나는 온기 있는 쓸쓸함을 느끼곤 한다.
추억의 기점은 가게들이 마련한다. 수십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거나, 그사이 사라진 가게들. 아직도 있다니. 하고 깜짝 놀라거나, 언제 사라졌지, 하고 아쉬워하면서 걸음을 멈춘다. 저곳에서, 저쯤에서 나는 팽이를 샀고, 떡볶이와 핫도그를 먹었고, 스케이트를 탔다. 카세트 테이프와 시디를, 시집과 소설책을 집어 들며 설렜다. 매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억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 어떤 가정, ‘이를 테면 그곳은 여기쯤이었을 텐데’라고 중얼거리게 되는, 앞에서 나는 몹시 불안해진다.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 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시간은 돌이킬 수 없으며, 그럼에도 나는 거기 있었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에도 나는 어떤 일로 ‘우리 동네’에 닿았다. 일부러 찾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작정하고 골목골목을 살피며 다녔다. 그러다 작은 서점 앞에 멈춰서 버렸다. 어릴 적 나와 내 동생과 아래층 정준이가 세뱃돈을 들고 길창덕 화백의 만화책을 사러왔던 곳. 단 한 권을 골라야 했기에 우리는 저 구석에 웅크리고 꽤 오랜 시간을 보냈었다. 차마 들어가진 못하고 내부를 살핀다. 이렇게 작았었나. 모든 것이 그대로 있다. 아니 이제는 일반 단행본은 없고 문제집뿐이다. 유리창 앞 진열대엔 하얗게 바래 제목마저 알아볼 수 없는 책들이 듬성듬성 꽂혀 있고 언제 적 것인지 알 수 없는 도서 홍보물이 질서 없이 흩어져 있다. 주인아저씨의 뒷모습이 보인다. 어릴 적 그분이실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허연 형광등빛 아래 모든 것이 적나라하다.
감정도 아니고 상념이라고 할 수도 없는 어떤 것이 목구멍 뒤쪽을 콱 막아버렸다. 이 가게, 내가 인수를 하고 싶다. 꾸미고 가꿔서 어릴 적 나의 서점으로 돌려놓고 싶다. 그러려면 부자가 되어야겠지. 주인아저씨의 뒷모습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 그는 다 알고 있는 것만 같다. 이 가게는 그의 생활이고, 그의 몫. 사람들이 동네 서점을 이용하던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흘러왔을 것이다. 누구나 그러하듯. 그러니까 이 서점은 늙은 것도 낡은 것도 아니며, 필요한 만큼 변해 여기 있는 것이겠지. 그리고 어떤 이는 이 서점을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기억할 것이다.

나의 서점으로 한 커플이 찾아왔다. 그들은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변화한 것과 여전한 것을 알아보려 노력하고 있었다. 얼굴이 마스크로 가려져 있으니 또렷이 알아볼 수는 없으나, 아주 익숙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흥미 있게 지켜보고 있자니, 내게로 와서 인사를 전했다. 시인 이훤의 애독자인 그들은 우리 서점에서 있었던 그의 낭독회에서 처음 만났고 곧 결혼을 한다고 했다. “부탁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저희의 청첩장에 넣을 사진을 서점 앞에서 찍고 싶습니다. 잊을 수 없는 장소니까요.” 신기하고 반가운 일이며, 단번에 동의할 일이고 축하와 동의를 전했지만 한편으로, 나는 ‘우리 동네’에서 만난 작은 서점을 떠올렸다. 무엇이든 흘러가고 그것들이 쌓여가고 있다. 어쩔 수 없는 힘으로. 어느덧 4년이다. “아이가 태어나 걸음도 말도 배우고 이제 다 컸네”, 소리를 듣게 되는 만큼의 시간. 고백하자면 많은 부분에서 무뎌지고 있다. 쉽게 동요하지 않는 만큼 기쁨도 적어지고 때론 모른 척 눈감고 넘어가는 일도 잦다. 뜨고 지길 반복하는 햇빛에 바래져버린 책의 표지처럼,
창 너머로 곧 부부가 될 두 사람이 보인다. 무엇이 그리 좋은지 깔깔대며 웃다가 눈이 마주치자 꾸벅 인사를 한다. 덩달아 나도 허리를 굽히면서, 바보 같은 생각을 했다 싶어지는 거였다. 저렇게 새로 태어나는 것들이 있는걸. 내어주고 들어서면서 세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예전 그 서점이 없었다면 ‘위트 앤 시니컬’도 없었을 것이다. 서점이 좋지 않았다면 서점을 운영하진 않았을 테니까. 그리고, 어찌될지는 끝에 가봐야 아는 법이기도 하지 않은가. 다 변한다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혼자 냉탕과 온탕 사이를 드나들다가 기진맥진해진 사이. 저녁이 되었다. 혜화동 로터리, 이 유서 깊은 동네의 저녁은, 사람의 등처럼 애틋한 데가 있다. “빛 가라앉을 즈음/ 고요히 착지하는// 그리움의 등짝”* 같은. 서점의 간판에 반짝, 불이 들었다.
* 이훤, 『너는 내가 버리지 못한 유일한 문장이다』 (문학의전당, 2016)
-
<p style="padding: 0px; line-height: 1.8;">너는 내가 버리지 못한 유일한 문장이다
이훤 저 | 문학의전당
조지아공대 출신으로서 문화 월간지 에디터를 거쳐 사진작가이자 칼럼니스트, 시인으로서의 삶을 아우르고 있는 그의 문학과 예술, 사회에 대한 총체적이면서도 깊고 열정적이면서도 내밀한 사유를 엿볼 수 있는 시집이다.

유희경(시인)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예술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했다. 2007년 신작희곡페스티벌에 「별을 가두다」가, 200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티셔츠에 목을 넣을 때 생각한다」가 당선되며 극작가와 시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시집으로 『오늘 아침 단어』, 『우리에게 잠시 신이었던』이 있으며 현재 시집 서점 위트 앤 시니컬을 운영하고 있다. 시 동인 ‘작란’의 한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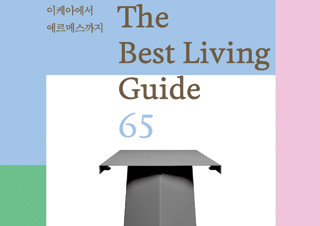


![[김승일의 시 수업] 마지막 문장 슬프게 하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14-4fe25cbb.png)
![[추천핑] 국경을 넘는 한국 문학](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3-ab42d6ee.png)
![[큐레이션] 겨울에도 시집은 제철입니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07-8cedd5c0.jpg)
![[큐레이션] 혼술하며 읽는 시집](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6-5cb76b90.jpg)



찻잎미경
20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