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곳에 머물러 맞이하는 입장이 되어서야 떠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세상 모든 장소들과 같이 서점에도 떠나는 이들이 있다. 알게 때론 모르게. 거리가 마음이 멀어져서. 불가피하게 자연스럽게. 떠나게 된 사람들은 돌아오기도 하고 여태 돌아오지 않기도 한다. 여기 남아 있는 나는 나의 서점은 그저 그들의 안녕을 궁금해하고 바라고 짐작할 뿐이며 어쩔 도리가 없으니 잘 있다가 그들이 돌아오면 환대를 해주어야겠다 다짐한다. 매일매일 다짐을 다지면서 어제도 오늘도 아마 내일도 이 자리에 있고 있을 것이다.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오래 어쩌면 내내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해주는 독자를 꼼꼼히 살펴본다. 종종 찾아왔다는 그를 나는 기억해내지 못한다. 기억도 못하면서 섭섭하다. 섭섭한 것이 이상하다. 어디서든 잘 지내면 되는 그런 사이가 분명한데도. 언제든 찾아오라는 인사로 그이를 떠나보내고 앉아 생각해본다. 어쩌면 이것은 물방울 하나의 일. 그 작은 것에 양동이 속 물이 넘칠 수 있는 것처럼 그간의 중중첩첩한 수많은 헤어짐이 한꺼번에 찾아온 것은 아닐까. 보고 픈 얼굴과 이름들로 속내가 흥건해진다. 한편으론 영영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은 것이다. 때로 떠남은 반가운 재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머물러 삼 년을 넘게 보내는 동안 배우기도 했었다. 이를 테면 커플인 ㄱ와 ㄴ. 두 사람은 아주 오랜 단골이다. 어느 날 눈이 퉁퉁 부은 ㄱ과 딱딱한 표정인 ㄴ이 찾아왔다. ㄴ이 먼 나라로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되었다는 거였다. ㄱ이 걱정되기도 했거니와 당장 내가 아쉽고 속상해 웃어주질 못하였다. 그렇게 반년쯤. 나는 가끔 그들을 생각했고, 어쩌면 다신 못 볼 거라고도 생각했으나 ㄱ과 ㄴ은 여전히 보기 좋은 연인 사이. 방학이 되면 어김없이 ㄴ은 돌아오고 그들은 다정히 ‘위트 앤 시니컬’에 찾아온다.
사실 자주 보던 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걱정이 앞선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음악을 바꾸다가 불현듯 떠오르는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생기는 이러한 불안을 냉큼 구겨 던져버리지만, 오래지 않아 그중 누군가가 찾아오게 되면 은근 심통이란 것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다. 때론 나는 나도 모르게 책망을 하곤 한다. 그럴 때. 물론 그도 무안하겠으나 나 역시 제풀에 놀라고 만다. 서점은 그저 책을 ‘판매’하는 ‘가게’라는 것을, 그들은 내킬 때 찾아오는 손님이며 서로는 서로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잊기도 하는 것이겠지. 아마 나는 서점에는 무언가 특별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요 며칠 독자가 뜸하다. 나라 안팎으로 우환이 있으며, 각종 뉴스가 넘쳐나고 있는 때이니 이럴 법도 하다고 여기면서도 슬쩍 내 탓으로 돌려 서점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한다. 이럴 때 아니면 할 수 없을 독서를 해보기도 하지만 내용이 눈에 들 리 만무하다. 책을 내려놓고 버티는 마음을 생각한다. 떠남이 있음에서 비롯된다면 돌아옴은 버팀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닐는지. 그러니 잘 버티는 것에 대해 연구를 해보지만, 이러한 일에는 별다른 요령이 없는 것 같다. 그냥 있는 것. 어떻게든 있는 것 말고는. 나는 나의 서점은 어떻게 있을 것인가. 알면서도 모를 일이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당장을 즐겁게 만들어 나를 다독여보면 되는 일이 아닐까. 하여 요즘 나는 즐거움을 찾는 방법에 대해 열심히 궁리하고 있다.
자주 찾아오는 독자가 유심히 내 얼굴을 살핀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느냐고 조심조심 물어오는 그에게 그냥 한 번 웃어주면 될 것을 떠남에 대해 버팀에 대해 여물지 못한 풋 생각들을 쏟아내고 만다. 그렇게 말이라도 하고 나면 괜찮을 것처럼. 그런 말과 생각이 그에게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뒤늦게 찾아온다. 번쩍 정신이 들었지만 너무 늦어버렸다. 허기가 깊어 헛소리를 하는 모양이라고 눙치며 그를 보낸 뒤 늦은 밤처럼 깜깜한 후회를 하는 중이다.

어찌되었든 서점 문을 닫을 시간. 손이 없이도 이렇게 기진할 수 있구나, 놀라면서도 오늘 몫의 버팀이 끝났다는 안도를 맞이하는 것은 사람이니까 그래. 사람이니까 사람이어서 겪는 이 부침을 의연히 대해 보기로 한다. 매일 밤 내가 이 서점을 떠나고 다음 날이 되면 되찾아오는 것처럼 지금을 무사히 보내면 되돌아오는 것들이 생길 것이다. 누가 서점 문을 빼꼼 열고 나를 부른다. 한탄을 들어준 그 독자다. 그가 내민 종이컵을 받는다. 지칠 때 마시면 좋다는 말을 남기고 잰걸음으로 사라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눈으로 좇다가, 한 모금 마셔본다. 달다. 엄청 달다. 이래도 되나 싶게. “잠시 가라앉아 있던 이름”들이 “전부 떠오를 것도 같았다.”*
* 조해주, 『우리 다른 이야기하자』(아침달, 2018)
-
우리 다른 이야기 하자조해주 저 | 아침달
조해주는 일상에 산재한 드라마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대신에 거리를 두고 지켜본다. 넘치지 않는 정확한 온도를 지키는 말과 정서가 요즘 시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많은 이들의 허기를 이 시집이 달래주기를 바란다.
우리 다른 이야기 하자
출판사 | 아침달

유희경(시인)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예술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했다. 2007년 신작희곡페스티벌에 「별을 가두다」가, 200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티셔츠에 목을 넣을 때 생각한다」가 당선되며 극작가와 시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시집으로 『오늘 아침 단어』, 『우리에게 잠시 신이었던』이 있으며 현재 시집 서점 위트 앤 시니컬을 운영하고 있다. 시 동인 ‘작란’의 한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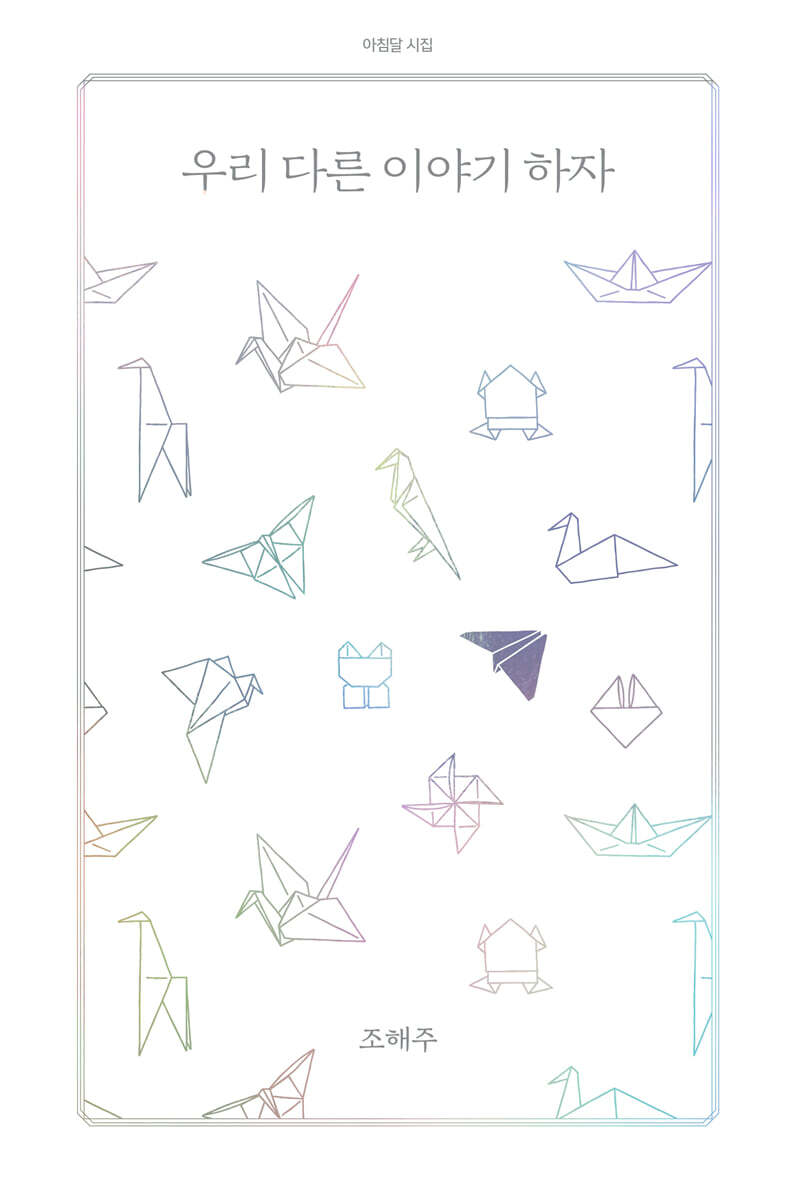




![[비움을 시작합니다] 정서적 ‘비움’을 찾고 싶은 사람들에게 ②](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9-7789ced1.jpg)
![[송섬별 칼럼] 우리가 다 같이 해낸 이 일](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7-885dcdc7.jpg)

![[송섬별 칼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몽땅 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07-df966cd9.png)
![[송섬별 칼럼] · · · - - - · · ·](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4-efbfaa92.png)



봄봄봄
2020.02.13
동글
2020.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