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스플래쉬
베를린에 온 지 열 이틀 째. 어쩌면 가장 사치스러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여행지에서 ‘목숨 걸고 구경하지 않을 자유’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무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허둥대긴 싫었다. 내가 원한 것은 단 하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놓여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거의’ 성공했다.
나는 이곳에서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찾아 먹고(저녁은 대개 생략), 적게 움직이고, 아주 많이 잤다.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풍경을 질릴 때까지 보았다. 심심하면 책을 읽었다(자주 심심해서, 책을 많이 읽었다). 땡볕 더위를 피해, 잠깐 잠깐 걸었다. 자수정 귀걸이 한 쌍, 미국 작가의 사진집 한 권, 다홍색 원피스 한 벌을 샀을 뿐 쇼핑도 거의 하지 않았다. 딱히 살 게 없었다. 베를린의 명소, 박물관, 유명한 거리, 꼭 가봐야 한다는 식당에는 하나도 가지 않았다. 지하철도 버스도 타지 않았다. 열이틀 동안 숙소가 있는 미떼(Mitte) 거리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 지나다 들른 책방과 공원, 일요일의 벼룩시장 정도가 전부다(마음이 동하면 내일 즈음, 동물원에는 가볼 생각이다).
잠을 너무 자서 저절로 눈이 떠진 새벽엔 창밖에서 들리는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Buena Vista Social Club)’ 음악에 귀 기울이며 글을 썼다. 화이트와인 한 병을 닷새 동안 조금씩 나눠 마셨다. 얼굴이 불콰해지면 책을 좀 읽다 다시 잤다. 잠에서 깨면 등을 둥글게 말고 시를 쓰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다(그는 시를 여러 편 쓰고, ‘창피하게도’ 이따금 공원에서 이상한 춤을 췄고, 나만큼이나 많이 잤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니 피로할 일이 없었다. 조금이라도 피로하면 바로 호텔로 돌아와 세네 시간씩 낮잠을 잤다. 밤이 되면 또 잤고, 새벽에 잠깐 책을 읽다 또 잤다. 그 동안의 피로가 복수라도 하듯, 잠이, 밀려왔다.
한낮에는 기온이 34도까지 올랐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했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를 틀어놓은 곳도 거의 없었다. 어떤 곳도 지나치게 덥거나 춥지 않았다. 윤리적인 여름, 양심이 있는 여름이랄까. 한국은 냉방이 잘 되는 곳이 많지만 내겐 늘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웠다(잡히지 않는 ‘현상수배범’처럼, 악명만 높아진 내 조국의 여름이여). 오후엔 슬렁슬렁 공원에 나가 키 큰 나무들 곁에서 물놀이하는 아이들을 구경했다. ‘이토록 거대한 부채가 또 있을까’, 나무를 보며 생각했다. 바람을 일으키고 나르는 이파리들, 빛의 거름망인 나무들이 좋았다. 나무는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빛을 쬐고 바람을 맞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비를 맞고, 꽃 피길 원하는 봉오리에겐 열릴 자유를 준다. 나무는 한 곳에서 가만히, 모든 것을 한다.
물놀이하는 아이들은 자유로워 보였다.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발가벗은 채 공원을 뛰어다녔다(꽤 큰 여자아이들도 맨몸으로 자유분방하게 뛰어 놀게 하는 것,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시선이 부러웠다). 사람이 자연과 가장 비슷한 시기가 있다면 유년시절일 것이다. 아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노는 법을 알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아이는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요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서 중요한 사업을 도모하거나 칼로리를 소모하려 부러 운동을 하거나 택시를 잡아타고 어딘가를 가지 않는다. 아이에겐 꼭 해야 할 일도,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없다.
별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좋은 곳을 찾아 다니지도 않았는데, 베를린에서 시간은 ‘이상할 정도로’ 만족스러웠다. 어쩌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얻기 위해(내 의지대로 시간을 쓰기 위해) 평생을 전전긍긍하며 사는 게 아닐까? 특별한 일이나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얻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뜻이다. 용기이며 선택이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건 두려움 때문이다. 잃을 것과 얻을 것 사이에서 시소를 타며, 이 시소에서 내려오기를 두려워하니까.
사흘 뒤엔 한국에 있을 것이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요리하고 청소하고 일할 것이다. 아마도 무언가를 잘 하려고 애쓸 것이다. 마감일마다 허덕이며 써야 할 원고와 씨름할 것이다. 달라질 건 없을 테지만, 완전히 똑같은 것도 없으리라. 시간은 어떤 식으로든, 내 몸에 스미니까.
창밖에선 아직도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다. 누군가는 춤출 것이다. 내가 춤추지 않는 순간에도. 이 음악이 끊이지 않으면 좋겠다.

박연준(시인)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나 동덕여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2004년 중앙신인문학상에 시 '얼음을 주세요'가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시집『속눈썹이 지르는 비명』『아버지는 나를 처제, 하고 불렀다』가 있고, 산문집『소란』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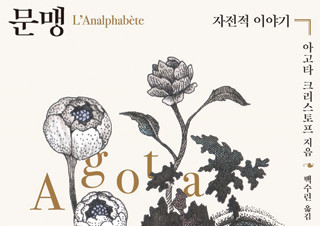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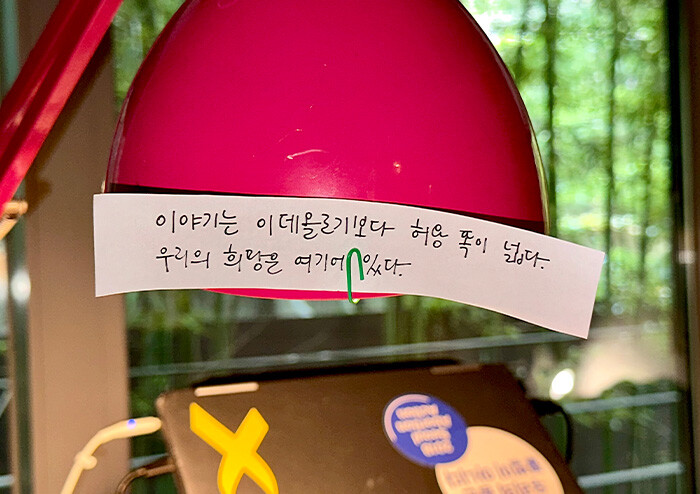
![[큐레이션] 봄이 이끄는 방향으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11-144c5c78.jpg)

![10월 3주 채널예스 선정 신간 [가정살림/어린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b/0/0/d/b00dfa4a009f8f91a3d3f53b118b3dc6.jpg)
![[둘이서] 서윤후X최다정 - 내 방 의자에 앉아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04-45d9afd5.png)


찻잎미경
2018.08.10
참으로 부러운 삶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