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라마 <비밀의 숲> 의 한 장면
발단은 드라마였다. 숨을 참아가면서 집중해 보던 드라마에 포장마차 장면이 나와도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다.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던 주인공이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흘린 장소.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나는 그곳이 ‘포장마차’ 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주인공이 먹은 우동이 너무 짰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즈음 장마가 시작됐다. 창문 너머로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를 보다가 포장마차가 떠올랐다. 웃을 일이 하나 없어도 거기에 가면 왠지 드라마 주인공처럼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나올 것만 같은 느낌. 같은 드라마를 즐겨보던 친구를 호출했다. “오늘, 콜?” “완전, 콜!”

비오는 포장마차
비가 들리고 비가 보이지만, 비에 젖지는 않는다. 방공호에 숨어 있는 기분이다. 타닥타닥- 비닐 천장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기가 막히다. 듣고 있기만 해도 술이 술술 넘어간다. 이토록 공감각적인 안주가 또 있을까. 비 오는 포장마차에선 자잘한 인생의 고민들이 꿀떡 잘도 삼켜진다. 입이 점점 귀에 가까워진다. 내 안에 웃음이 이렇게나 많았었나. 여기가 천국이라며 들뜬 친구와 낄낄거리면서 본격적으로 즐겁기 시작한다. “이모님~ 어쩜 이렇게 맛있어요? 1병 더 주세요~” 케찹 뿌린 계란후라이가 서비스로 등장한다. 얼떨결에 나온 애교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라면과 소주
술꾼은 모든 음식을 안주로 일체화시킨다. 그래서 말인데 옛날 허름한 술집 문이나 벽에 붙어 있던 ‘안주 일체’라는 손글씨는 이 땅의 주정뱅이들에게 그 얼마나 간결한 진리의 메뉴였던가. (중략)
이 책 제목인 『오늘 뭐 먹지?』 에도 당연히 안주란 말이 생략되어 있다.
“오늘 안주 뭐 먹지?”
고작 두 글자 첨가했을 뿐인데 문장에 생기가 돌고 윤기가 흐르고 훅 치고 들어오는 힘이 느껴지지 않는가.
- 권여선, 『오늘 뭐 먹지?』 1 0쪽
비 오는 날은 당연히 라면이다. 라면을 기다리는 동안 기본 찬으로 나오는 단무지와 오이를 안주 삼아 마시는 술은 특히 더 맛있다. 고춧가루가 들어가 칼칼한 라면 국물을 한 숟가락 떠 넣으면 세상 누구도 부럽지가 않다. “뭐니 뭐니 해도 소주”라던 아버지의 마음을 직장인 10년 차에 접어 들어 비로소 알게 됐다.
삶이 너무 고단하고 괴로울 땐 숨이 찰 때까지 달리거나 이가 시릴 정도로 단 것을 먹거나 엉엉 소리 내어 우는 것도 방법이지만, 잔만 부딪혀도 마음을 알아주는 속 깊은 알코올 친구와 기울이는 소주 한 잔에 비할 바는 아니다.
장마철이 왔다. 마음이 통했는지 알코올 친구에게 먼저 연락이 왔다.
“오늘, 콜?” “완전, 콜!”
타닥타닥 천장에 닿는 빗소리를 안주 삼아,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테라피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
오늘 뭐 먹지?권여선 저 | 한겨레출판
제철 재료를 고르고, 공들여 손질을 하고, 조리하고 먹는 과정까지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그야말로 최고의 음식을 먹었을 때의 만족감을, 쾌감에 가까운 모국어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최지혜
좋은 건 좋다고 꼭 말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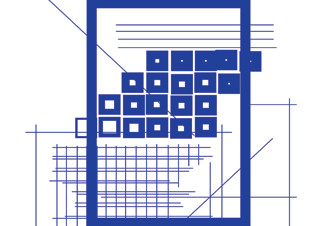
![[큐레이션] 독주회 맨 앞줄에 앉은 기분을 선사하는 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10-a343a9af.png)
![[큐레이션] 여름 기억 레시피](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29-cc89be0e.jpg)


![[큐레이션] 혼술하며 읽는 시집](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6-5cb76b90.jpg)





penpen97
201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