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는 다니던 회사를 ‘유리 도서관’이라고 말했다. (정확한지는 자신이 없다. 너무 오래된 일이다) 유리로 된 좋은 건물에서 일했다. 휴대폰을 파는 일을 했다고 기억한다. 그리고 그녀는 6학년인 아들을 ‘육학년’이라고 불렀다. 그녀가 엄마면서 시인이면서 동시에 회사원이라는 사실이 나한테는 참으로 소중했다. 어쩌면 여상을 나왔고 20살부터 직장생활을 했고, 뒤늦게 대학에 들어가 문학을 공부했다는 그녀의 이력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다. 그녀의 시가 활어처럼 싱싱한데다 교교(效效와 皎皎 둘 다 해당된다)한 아름다움이 배여 나오는 독특한 맛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녀의 시에 회사원이라는 정체성이 올올하게 새겨져 있는데, 그 올올함이 내게는 참으로 얼얼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오늘은
비굴을 잔굴, 석화, 홍굴, 보살굴, 석사처럼
영양이 듬뿍 들어 있는 굴의 한 종류로 읽고 싶다
생각컨대 한순간도 비굴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으므로
비굴을 나를 시 쓰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체하게 하고
이별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당신을 향한 뼈 없는 마음을 간직하게 하고
그 마음이 뼈 없는 몸이 되어 비굴이 된 것이니
그러니까 내일 당도할 오늘도
나는 비굴하고 비굴하다
팔팔 끓인 뼈 없는 마음과 몸인
비굴을 당신이 맛있게 먹어준다면
- 안현미, ‘비굴 레시피’ 부분, 시집 『곰곰』(문예중앙)
직장이 시에 들어와 있고, 엄마가 시에 들어와 있다
직장인과 시인을 병행한다는 것. 직장인과 엄마를 병행한다는 것. 시인과 엄마를 병행한다는 것. 이 세 가지의 나열 중에 한 가지만 잘해내도 참으로 훌륭한 일인데, 그녀는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모두를 잘한다. 어떻게 잘하는지를 게다가 시를 통해 다 보여준다. 직장이 시에 들어와 있고, 엄마가 시에 들어와 있고, 시가 직장에 스며 있고, 시가 엄마에 스며 있다는 걸 그녀는 시를 통해 다 보여준다.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그녀의 시가 증명을 해낸다.
치망마이의 북쪽 마을 빠이에서, 더 북쪽의 시골에다 방을 얻어 지낼 때였다. 매일매일 열리는 빠이의 야시장 골목을 읍내 마실을 나가듯이 저녁이면 드나들었는데, 그때 그 골목에서 몇 번을 마주친 시인이 있었다. 순정한 예술가였고 가인이며 기인(?)에 가까운 매력 넘치는 한 젊은 남자사람인 그 시인을 마지막 마주친 그 저녁에 나는 그 시인을 못 본 척하게 됐다.
그는 집으로 돌아갈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고, 고산족 사람들의 옷감으로 만든 아기 옷가게에서 아기 옷을 이것저것 고르고 있었는데, 아기 옷을 고르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나는 모른 척을 하게 됐다. 그 풋풋한 가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만 아기 옷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된통 얼얼한 심정이 되어서 외면해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내 방으로 돌아와 그 장면에 대하여 그녀에게 엽서를 썼고 구겨버렸다. 그러곤 다른 내용으로 엽서를 써서 그녀에게 부쳤는지 아닌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하여튼, 누군가의 사소하디 사소한 모습 하나로 된통 얼얼해지는 일을 겪을 때마다 그녀 생각이 퍼뜩 나곤 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언젠가 그녀와 내가 나란히 술자리에 앉아 있을 때였다. 아마도 그녀와 둘이서 제대로 된 대화를 처음 해본 날이었지 싶다. 그녀는 괄괄하게 웃으며 나에게 물었다.
“언니네 집 냉장고 문, (두 팔을 뻗어 잡아당기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여는 거야?”
“아니, (오른손으로 잡아당기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여는 건데, 왜?”
그녀는 내 대답을 무척이나 반가워했다. 양문형 냉장고를 쓰지 않는다는 데에 그녀와 나는 첫 번째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녀는 나에게 잘하고 있다고 등을 두드려주었다. 그녀의 마음을 알 것도 같아서, 20년 가까이 새 것으로 바꾸지 않고 사용해온 나의 냉장고가 자랑스러워 졌다. 그 이후로, 손잡이가 부서져버린 냉장고에 청테이프를 감아 고쳐두고 사용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녀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나만의 자랑이 되었다.
“그저 얼얼하다 삶이”(안현미,’내간체’ 부분, 시집 『사랑은 어느날 수리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으며, 말해야만 옳은, 말할 자격이 있는 시인을 딱 한 명을 꼽으라면 나는 안현미를 꼽겠다. “거짓말을 타전”하던 아현동에서부터 연희동에서 “투명 고양이”가 될 때까지, 그 자격을 얻기 위하여 살아왔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출근을 하며. 매일매일 새벽밥을 해 아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며. 매일매일 “불면의 뒤란”에서 “쓰는 모든 시들이 유서 같다가 그것들이 모두 연서임을 깨닫는 새벽이 도착”(시집 『이별의 재구성』)하는 것을 견디며. 내가 안현미를 꼽는 데에는 실은 이러저러한 사연 때문은 아니다. 어쩌면 유일한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 『사랑은 어느날 수리된다』에 수록된 ‘투명 고양이’ 같은 시편에서, 안현미가 날것인 언어들을 검박하게 부려놓은 그 자리에다 불현듯 깜찍하고 지혜롭고 섹시한 언어들을, 그야말로 效效하고 皎皎한 맛으로 부려놓는 그 솜씨. 그런 솜씨는 삶이 선물해준 솜씨라는 것을 안현미는 우리로 하여금 알아채게 만든다. 삶에게 선물 받은 그 솜씨를 목격할 때마다 거듭 얼얼해지는 것이 나는 시를 읽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이별의 재구성 안현미 저 | 창비
활달한 상상력과 탄탄한 언어감각으로 개성있는 시세계를 펼쳐 보이며 독자와 평단의 주목을 끈 안현미 시인의 두번째 시집. 경쾌한 말놀이와 감각적인 환상은 독특하고, 그 안에 담긴 누추한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은 묵직하며, 그 바탕에서 우러나는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은 간절하다. 불편한가 하면 따뜻한, 매혹적인 시집이다.

- 사랑은 어느날 수리된다 안현미 저 | 창비
“새로운 감수성과 삶의 힘을 감싸안는 웅숭깊은 서정”과 “진솔함의 미덕과 상상력의 힘을 합체하는 타고난 언어감각”(박형준)으로 2010년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한 『이별의 재구성』(창비 2009) 이후 5년 만에 펴내는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어둠속의 불우한 현실을 감싸안으며 시와 삶을 아우르는 진지한 성찰의 세계를 보여준다. 감각적인 언어유희가 도드라지는 가운데 삶과 사람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거름으로 하여 삶의 밀도 있는 체험이 눅진하게 녹아든 시편들이 먹먹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우리의 감성을 따뜻하게 위로한다.
[추천 기사]
- 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 한동안 나만의 보물1호 『벼랑에서 살다』
-미술해설가 윤운중, 10년 단위로 다른 인생 산다
- 고전평론가 고미숙 “평생 동안 읽어도 좋은 책인가”

김소연
시인. 시집 『극에 달하다』, 『빛들의 피곤이 밤을 끌어당긴다』, 『눈물이라는 뼈』, 『수학자의 아침』, 『i에게』, 『촉진하는 밤』과 산문집 『마음사전』, 『시옷의 세계』, 『한 글자 사전』, 『나를 뺀 세상의 전부』,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 『그 좋았던 시간에』, 『어금니 깨물기』 『생활체육과 시』를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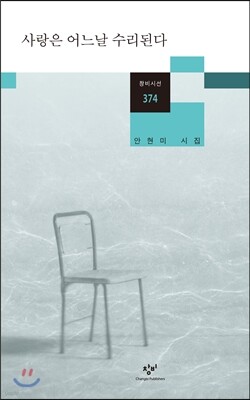
![[이상하고 아름다운 책] 우정 읽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30-c0b54c6c.jpg)

![[더뮤지컬] 애정으로 읽어낸 여성 캐릭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04-e1e5d480.jpg)
![[더뮤지컬] 2025 라인업② - 시선 끄는 연극 기대작](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10-f22ebd56.jpg)
![[둘이서] 김사월X이훤 - 두 번째 편지](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03-4cab7b4b.jpg)



책읽는낭만푸우
2014.07.05
안 그래도 김소연 시인이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의 서』를 추천했길래 반가웠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비슷한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닮은 사람이 좋아요.
소개해주는 작가들 모두 저도 좋아하는 분들이라, 김소연 시인에 대한 마음도 애틋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참 좋아하는 시인이라 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탐이기도 하구요. ^^
김민희
2014.07.01
자목련
201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