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살람 알라이꿈(안녕하세요). 원고 마감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최민석입니다. 아랍어로 인사를 드린 건, 제가 지금 아랍 여행중이기 때문입니다. 숙소 예약은 하지 않더라도, 원고 마감은 칼 같이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아부다비에서도 허겁지겁 카페를 찾아 뛰어 왔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찾는 심정으로, 이곳에서도 ‘탁자와 무선 인터넷’을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카페에 자리를 잡으니, 중동이라 그런지 머리카락을 태울듯이 햇볕이 내려쬡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카페 한 구석에 야외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탓인지 저는 지금 글을 쓰고 있지만, 저를 제외한 손님들은 썬탠을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쥬스를 마시며 각자의 망중한을 즐기고 있습니다. 기행문을 쓰는 것도 아니면서 눈 앞의 풍경을 소상히 전해드린 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영화에 대해 쓴다는 게 몹시 모순적이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번주 영화는 중국영화 <천주정>입니다. 자, 그럼 존댓말을 접고 본격적으로 이번회 영사기를 돌립니다. 영차.

영화 <천주정> 포스터
세상에는 나처럼 일단 마감이라도 지키는 게 목표인 작가도 있지만, 주제를 중히 여기는 작가, 이야기를 중히 여기는 작가, 문장의 품격과 분위기를 중히 여기는 작가 등, 실로 다양한 유형의 작가들이 존재한다. 하나의 직군일 뿐인 작가도 이 정도인데, 관찰 범위를 인간 전체로 확대하면 그 유형은 언급불가능할 정도로 다채로울 것이다. 물론, 그 유형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의 다양함 역시 두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어떤 인생은 내 눈 앞에 있는 것처럼, 원래는 사막이었던 한 도시의 수영장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독서를 하고, 어떤 인생은 그 생 자체가 사막이어서 물 한모금 마시기 벅찬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부인하고 싶지만, 영화 <천주정>은 이처럼 잔인하도록 다양한 인생 중에서 가장 처참한 일상들만 따로 모아 놓은 것 같다. <천주정>에서 지아 장커 감독은 중국이 아니라면, 너무나 황당하여, 개연성도, 몰입도도 떨어질 만한 이야기들만 다룬다.
영화에는 절박한 일상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네 인물이 등장한다. 이 네 명의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전개되어 서로 이어지지 않은 듯하면서도, 모두 고난에 대한 해결책으로 폭력을 선택했다는 점에서는(아니, 폭력을 택할 수 밖에 없도록 상황에 떠밀렸다는 점에서는) 한치의 다름도 없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며 ‘지아 장커 감독이 중국인이 아니었다면 탄생할수 없는 영화’라 생각했다. 현실적으로 지아 장커 감독을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당연히 물어볼 수도 없지만, 나는 어쩌면 그가 이 아픈 이야기를 다루며 ‘혼자만의 은밀한 기쁨’을 느꼈을 지도 모른다고 추정했다.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은 자신의 눈 앞에 펼쳐진 현실이 이율배반적일수록, 모순적일수록, 삶의 격차가 클 수록 어쩔 수 없이 이끌린다. 적어도 나는 그렇다. 세상의 한 구석에는 <천주정>에 나오는 인물처럼 처참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또 다른 한 구석에는 지금 내 눈 앞에서 각자의 휴가를 즐기는 이들이 있다. 말하자면, 이 ‘같지만 다른 세상’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이끌리는 것이다. 고백하자면, ‘혹시 내가 인도나 레바논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몇 번 해보았다.
 ]
]
영화<천주정>스틸컷
영화 <그을린 사랑>을 보았을 때도, <슬럼독 밀리어네어>를 보았을 때도, 살만 루시디의 소설을 볼 때도, ‘작가에게 등장인물들의 피가 흐르지 않는 한 쓸 수 없는 이야기’라고 느꼈다. 다양한 종교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한 사회 내에 계급이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어 그 계급에 얽힌 웃음과 눈물의 이야기만으로도 대하소설이 가능한 현실, 작가는 이러한 현실이 아픔임을 알면서도, 아니 잘 알기에, 더욱더 인간 존재 자체가 위협당하는 이야기에 몰입하고 탐닉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작가는 이기적인 존재다. 시대의 고통과 눈물이 자신에게는 더 없이 훌륭한 이야기거리가 되어 쉴 새 없이 손가락을 움직이며 자판을 두드릴 때, 심정적으로는 고통을 느끼지만 자신도 모르게 엔돌핀이 뇌를 흠뻑 적시는 경험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는 지아장커 감독 역시 당연히 모국이 처한 상황에 울분과 슬픔을 느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야기를 창조해내며 어쩔 수 없는 기쁨을 느꼈을 거라 생각한다. 누군가의 슬픔을 재료로 이야기를 제조하는 작가들은 이율배반적인 현실만큼이나, 이율배반적인 감정을 느낄 것이다. 이성으로는 이해조차 불가능한 슬픔이 일상에 병풍처럼 깔려있는 시대에 작가는 자신도 모르게 눈동자가 커지고, 손가락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누가 듣더라도 흥분하고, 울분을 토하게 되는 시대적 아픔이 낳은 이야기의 보고에 태성적으로 끌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달리보면, 그게 바로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굴레이자, 이야기를 쓰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작가는 시대의 눈물에 빚지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물론, 내 생각일뿐이지만 말이다.
그럼 저를 제외한 훌륭한 작가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로 세상에 진 빚을 멋지게 갚아주시기 바랍니다(저는 일단 원고 마감이나… 아흑).
[관련 기사]
- 영화로왔던 시간들 <일대종사(一代宗師)>
- 생경한 일탈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최민석(소설가)
단편소설 ‘시티투어버스를 탈취하라’로 제10회 창비신인소설상(2010년)을 받으며 등단했다. 장편소설 <능력자> 제36회 오늘의 작가상(2012년)을 수상했고, 에세이집 <청춘, 방황, 좌절, 그리고 눈물의 대서사시>를 썼다. 60ㆍ70년대 지방캠퍼스 록밴드 ‘시와 바람’에서 보컬로도 활동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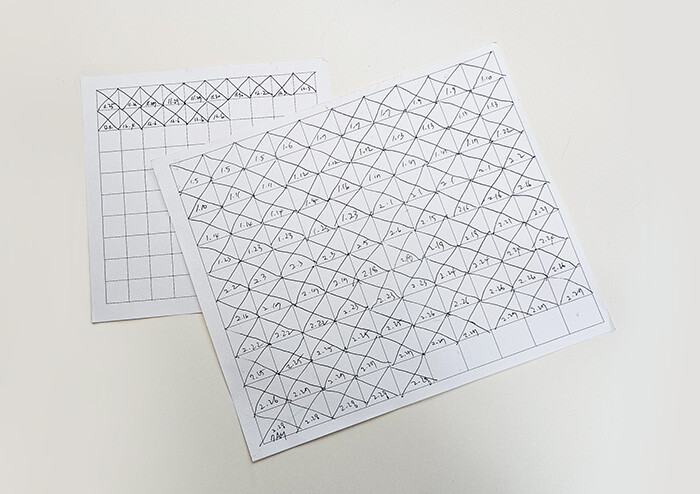

![[더뮤지컬] 2025 라인업② - 시선 끄는 연극 기대작](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10-f22ebd56.jpg)




뚱이
2014.04.13
서유당
2014.04.13
osasuna
2014.04.12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