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이자 번역가인 황유원 작가에게 번역은 곧 '혼자서 추는 춤'입니다. 번역을 통해, 세계 곳곳을 누비고 먼바다를 항해합니다. 번역가의 충실한 가이드를 따라 다채로운 세계 문학 이야기에 빠져 보세요. |
 언스플래쉬
언스플래쉬
출렁이는 찻잔을 들고 오다가 서두른 나머지 차를 쏟은 적이 있다. 찻잔을 받침 접시, 그러니까 소서(saucer)에 올려서 들고 왔기 때문에 책상에 흘리진 않았지만, 대신 소서가 흥건히 젖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봤던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서였더라? 그래, 『폭풍의 언덕』에서였다. 『폭풍의 언덕』에서의 그 기이한 장면들.
옛날 소설을 읽고 옮기다 보면 종종 그런 기이한 장면과 마주칠 때가 있다. 내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장면들. 『폭풍의 언덕』에도 종종 그런 순간이 있었다. 아무리 배경이 산간벽지여도 역시 영국은 영국인지라 차를 마시는 장면이 줄기차게 등장하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차를 찻잔이 아닌 소서에 따르는 게 아닌가?
처음 그 문장들을 읽었을 때는 내 눈을 (그리고 내 영어 문해력을) 의심했었다. 아니, 왜 멀쩡한 찻잔을 놔두고 소서로 차를 마시는 거지? 내가 뭘 잘못 이해했나? 지금 누가 이러면 아마 부모님이 장난치지 말라며 혼낼 게 분명한데, 애들도 아닌 이들이 대체 왜?
처음으로 그런 놀라움을 선사한 이는 소설이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등장하는 헤어턴이었다. 헤어턴은 차를 대접(basin)으로 마셔서 소설의 화자이자 도시 사람인 록우드에게 크게 무시당하는데, 처음 읽었을 때만 해도 나는 그게 헤어턴이 단순히 야만적인 인물이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읽어 나가다 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듯했다. 제1권 제10장에서는 에드거가 소서에 차를 찰랑거릴 만큼 따라둔 장면이 나오고, 제2권 제5장에서는 캐시가 자기 소서에 차를 따라서 린턴에게 주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이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게 분명했다.
그래서 차와 관련된 이런저런 책들을 뒤적여 보다가, 예전 영국에서는 뜨거운 차를 식히기 위해 소서에 조금씩 따라 마시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그것을 묘사한 그림들이 재미난데, 궁금한 분들은 이소부치 다케시의 『홍차의 세계사, 그림으로 읽다』를 읽어보시길) 차가 처음 중국에서 네덜란드로 전해졌다가 다시 영국으로 전해졌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찻잔에 손잡이가 달려 있지 않아서 뜨거운 찻잔을 손으로 들기 어려웠고, 그래서 차를 널찍한 소서에 조금씩 덜어서 마시기도 했다고.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치 우리가 뜨거운 콩나물 해장국을 앞접시에 조금씩 덜어 먹는 것처럼.
이런 사실을 모르면 'made a slop in (his) saucer.'를 '소서에 차를 찰랑거릴 만큼 따랐다.'가 아니라 '소서에 차를 엎질렀다.'로 옮기기 십상이다. 본문에 부연 설명이 전혀 나오지 않는 데다가, 'slop'은 보통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면 번역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느끼는데, 한편으로는 번역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을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묘해지기도 한다.
어쨌든 그래서 나는 가끔 멀쩡하게 찻잔에 담긴 차를 소서에 따라서 마셔보곤 한다. 기분이 어떠냐고? 글쎄, 어쩐지 국물을 들이마시는 기분이랄까. 게다가 음료의 맛은 잔에서 입이 닿는 부분, 즉 '구연부'의 성질에도 크게 좌우되는데, 소서의 뭉툭한 느낌이 전해주는 맛이란... 그래도 가끔 이러고 놀면 재미있다. 나처럼 집에서만 노는 번역가가 달리 어디서 재미를 찾겠는가.
어제는 힘겹게 작업했던 『노인과 바다』가 출간되어 집에 도착했고, 그래서 그 기념으로 찬장에 있던 '코코넛 밀크' 깡통을 비웠다.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과 소년이 '이른 아침에 어부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가게로 가서 연유 깡통에 따라 주는 커피를' 마시는 장면을 따라 해보기 위해서였다. 그 부분을 읽은 후로 나는 그 맛이 늘 궁금했었다.
맛이 어땠냐고? 이상하리만치 쇠 맛이 강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인가 했는데, 그러다 그만 슬퍼지고 말았다. 『노인과 바다』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 그러니까 노인이 소설 후반부에서 피 같은 것을 뱉어내고는 '들척지근한 구리 맛'을 느끼고 두려움에 휩싸이던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깡통으로 먹는 커피 맛이 딱 그러했다.
어쨌거나 『폭풍의 언덕』과도, 『노인과 바다』와도 이제는 이별해야 할 텐데, 아무래도 그러질 못하고 있는 듯하다. 『노인과 바다』 이후로 다른 책을 두 권이나 더 번역했으면서 이 칼럼의 2회와 3회에 이어 4회에도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걸 보면 말이다. 하지만 책들과는 이별해도, 가끔 차를 소서에 따라 마시거나 커피를 깡통에 따라 마시는 일과는 이별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데 그러면 자연히 다시 책이 떠오르지 않겠느냐고? 과연 그렇겠군. 아무래도 이별하긴 글러먹은 것 같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홍차의 세계사, 그림으로 읽다
출판사 | 글항아리
폭풍의 언덕
출판사 | 휴머니스트
폭풍의 언덕
출판사 | 휴머니스트
노인과 바다
출판사 | 휴머니스트
노인과 바다
출판사 | 휴머니스트

황유원
시인, 번역가. 김수영문학상, 현대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초자연적 3D 프린팅』, 『세상의 모든 최대화』, 옮긴 책으로 『모비 딕』, 『바닷가에서』, 『폭풍의 언덕』, 『밤의 해변에서 혼자』, 『짧은 이야기들』, 『유리, 아이러니 그리고 신』, 『시인 X』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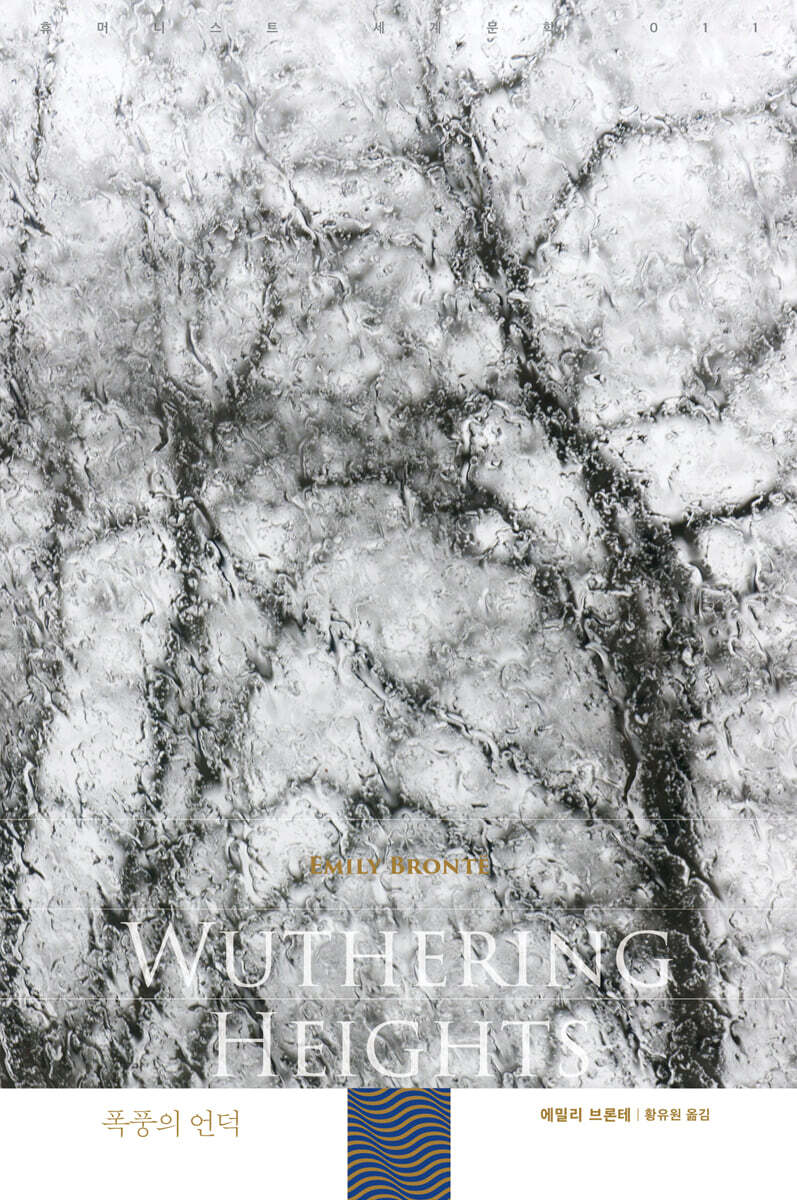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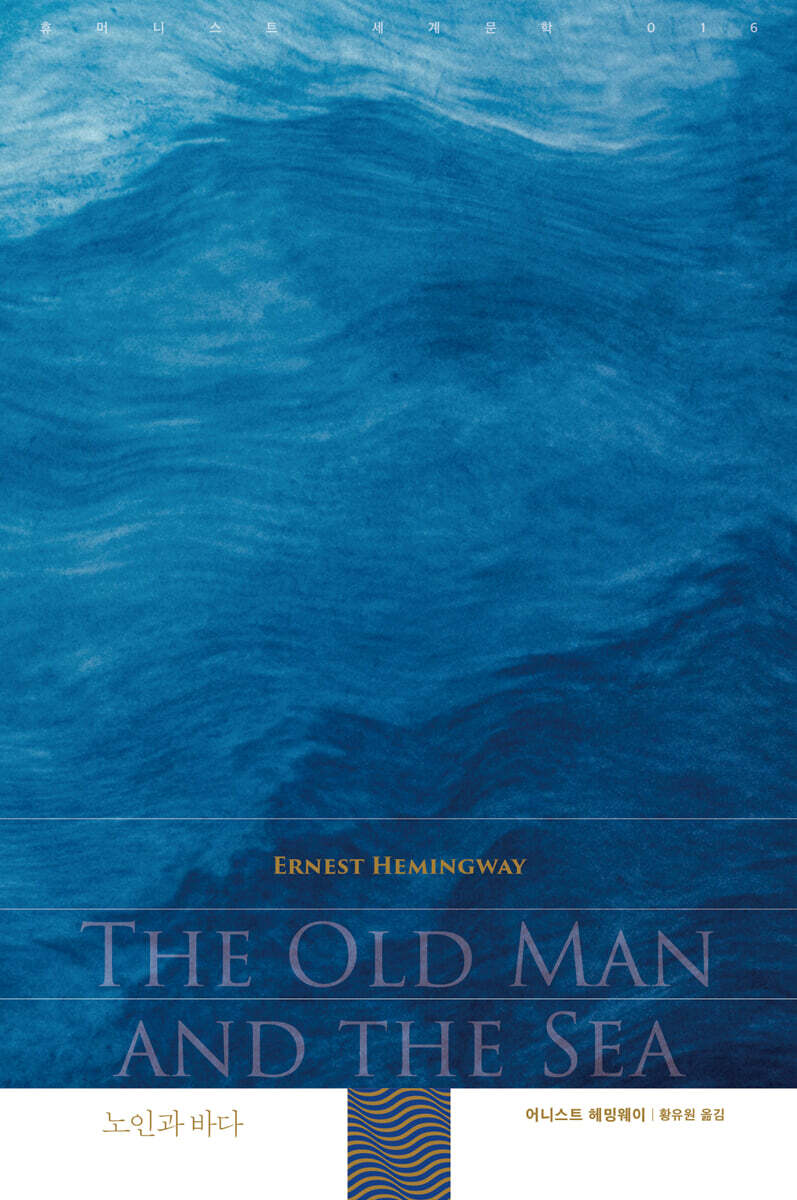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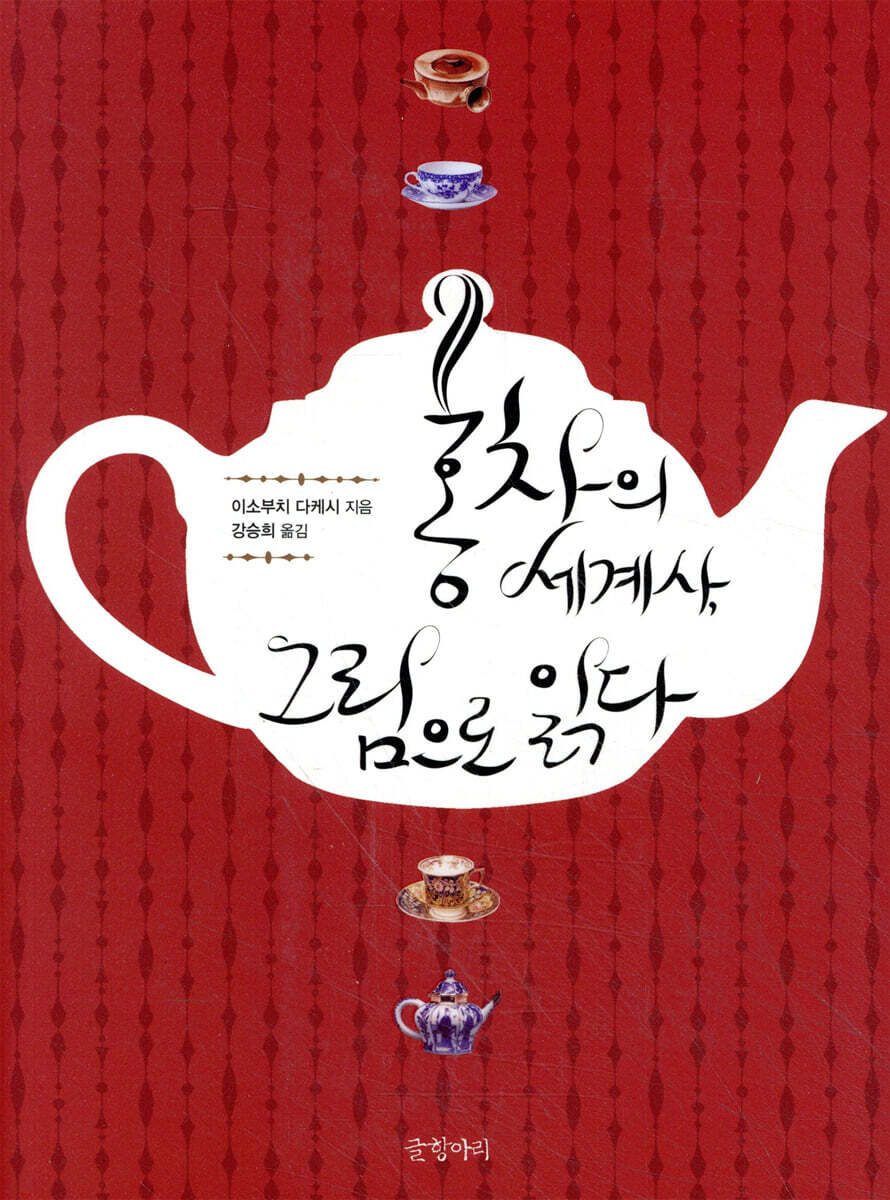
![[황유원의 혼자서 추는 춤] 그러니까 이것은 '본격 먹방 소설'입니다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e/5/3/7/e53722dd998a354da060e66ff98c6fe5.jpg)
![[황유원의 혼자서 추는 춤] 폭풍의 언덕 후폭풍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3/c/b/7/3cb78187c29642e6caaccd5606575c3d.jpg)
![[황유원의 혼자서 추는 춤] 나는 어쩌다 '바다 사나이'가 되었나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b/3/2/2/b322df9239c4503f8c15d8ddac883358.jpg)



![[문화 나들이] 봄 내음이 살랑살랑 느껴지는 문화생활 4가지](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07-47efbb8f.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