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예스>에서 격주 화요일 영화감독 박지완의 '다음으로 가는 마음'을 연재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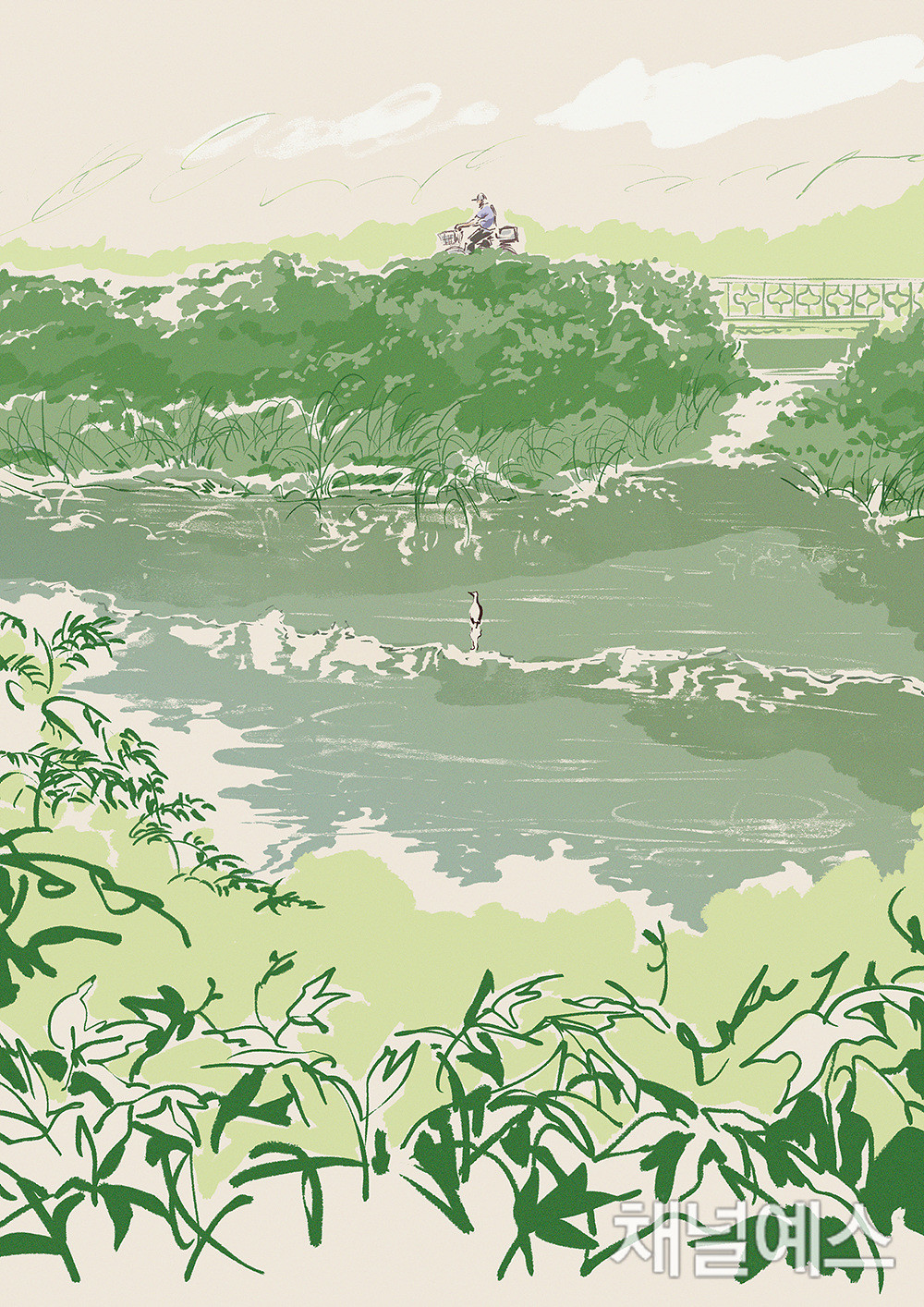 일러스트_박은현
일러스트_박은현
예전부터 어디든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강아지와 함께 걷는 것은 조금 다르다.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강아지 두 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 강아지와 걸을 때에는 배변 봉투와 간식, 그리고 접히는 물그릇이 담긴 작은 가방을 메고 나간다. 두 마리 중 늦게 입양한 강아지가 실외 배변만 하는 강아지인데, 입양 당시 이미 4살 추정의 성견이라 갑작스러운 실내 배변 훈련이 우리 집에 적응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 좀 더 지켜보자 하며 3년이 흘렀다. 지금은 최대한 자주 나가고 최소 하루 두 번의 산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맑은 날 기준으로 보통 해가 있을 때 한번, 해가 졌을 때 한 번이다.
낮 산책은 최대한 느긋하게 하려고 한다. 특히,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해가 있을 때 그나마 오래 돌아다닐 수 있다.(밤에는 동상의 우려가 있어서 짧게 하는 것을 권장한다) 아스팔트 속을 걸어도 낮에 걸으면 지금 어떤 계절에 머물러 있는지, 다음 계절은 어떤 속도로 올 것인지 알 수 있다. 길가의 나무들, 걸어가는 사람들의 옷차림, 지나가는 바람까지 매일이 다르다.
강아지와 산책을 한다는 것은 길에 뭔가 떨어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놀랍게도 길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떨어져 있다. 당연하게도 감나무 밑에는 감이 떨어져 있고 동백나무 아래는 동백꽃이 떨어져 있다. 문제는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무엇이거나, 혹은 길가 풀숲에 살짝 숨겨진 음식물인데, 강아지는 후각이 뛰어난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눈치채기도 전에 집어삼킬 수 있다. 삼킨 후에는 어떤 것도 알아낼 수 없다. 나의 재빠른 호통으로 입에 물었다가 뱉어낸 것에는 진미채로 추정되는 오징어류, 누군가 먹다가 버린 소시지와 껍질, 강아지에게는 치명적인 초콜릿도 있었다. 가끔 살이 잘 발려진 치킨 뼈를 발견할 때도 있는데, 설마 걸어가면서 먹다가 버렸을까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최근 동네 까마귀들이 뭔가를 물고 날아올랐다가 후드득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나니 수수께끼가 풀린 것 같기도 하다.
두 강아지가 각자 다르게 배변의 징후를 보이는 몸짓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채는 것도 중요한 과정 중 하나다. 두 강아지가 선호하는 땅의 상태가 있다는 게 보호자로서는 흥미로운 지점이지만 길게 설명하진 않겠다.
강아지 똥을 줍는 것, 그리고 그 상태를 들여다보는 일은 보호자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똥을 줍지 않는 보호자들도 존재한다. 사실 그런 인간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주워가지 않은 강아지 똥은 많이 본다. 왜 줍지 않는가,를 오래 고민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나. 요즘은 부디 안 줍는 사람들이 다른 강아지 똥을 밟기를 바랄 뿐이다.
어린이들이 모두 학교에 간 시간, 텅 빈 놀이터를 지나가기도 하고 운이 좋으면 강아지를 반겨주는 어린이들을 만나기도 한다.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어린이들은 다행히도 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나는 일부러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서 강아지와 내가 아주 가까이 붙은 채로 어린이 쪽에서 최대 멀리 떨어져서 아무렇지 않은 척 얼른 지나간다. 그러면 종종 그 어린이들은 강아지가 나에게 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아보고는 무서워하지만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는 표시를 꼭 해준다. 강아지가 귀엽다, 라든지 나에게 들리게 칭찬을 건넨다.
세상에, 이렇게 다정하고 소중한 마음이라니.
유난히 매번 깨진 병 조각이 있는 전봇대를 지나가게 되는 일도 있고, 어떤 집 안에 묶여서 지나가는 누군가를 향해 내내 짖기만 하는 강아지의 소리를 듣기도 하면서, 낮 산책은 늘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길게 하게 된다.
밤의 산책은 좀 더 집중을 요한다.
5, 6 킬로그램대의 (내 기준에서) 그리 크지 않음에도 두 마리 모두 검정 강아지라서 밤에 예상치 못하게 만나면 사람들이 놀랄 수도 있어서 최대한 산책만 집중해서 하는 편이다. 게다가 강아지의 사회성은 사람인 내가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 어떤 날은 다른 강아지를 만나도 반갑게 인사하거나 혹은 무시하고 지나치지만 어떤 날은 아주 작당한 듯 크게 짖기도 해서 주변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또 산책이라는 것이 매우 집중된 상태로만 진행되지는 않아서 덕분에 나는 강아지의 발걸음을 따라 밤에만 발견되는 것들을 찾아낸다.
밤의 놀이터에는 언제나 벤치에 누군가가 두고 간 물건이 있다. 다른 곳이라면 술 취한 사람들이 놓고 갔나 할 텐데 누가 봐도 어린이의 물건으로 보이는 것들이 놓여 있다. 책가방이 통째로 놓여있는 경우도 있고, 실내화 두 짝, 혹은 한 짝, 물통, 잠바 등 결코 쓰레기는 아닌 어떤 어린이의 소중한 물건이 놓여 있는데, 이는 정말 즐거운 놀이 때문에 깜박 잊혀진 것이다. 내일 낮에 찾으러 올 어린이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 물건들은 다음 날엔 사라져 있다.
또, 누군가 공을 들여 만든 것이 분명한 비슷한 크기의 돌멩이와 풀, 꽃이 나뭇잎 그릇 속에 예쁘게 놓여있다. 이것은 어린이가 차린 밥상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무엇이었을까.
어린이용 그네를 진지하게 타는 커다란 남학생이 늘 비슷한 시간에 있었는데, 아마도 고3이었는지 작년 가을 이후로 보이지 않는다. 처음에는 자기 덩치도 모르고 아이들 그네를 타는 건가 한심해하기도 했는데, 매일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남학생도 자라는 중이겠지, 그네를 타면서 다스릴 마음이 있나 보다 하게 되었다.
부디 소망하는 것을 이루었기를, 못 이루었더라도 길게 슬퍼하진 않았기를.
여기까지 적은 것만 보면 내가 몹시 너그러운 사람 같지만 사실은 산책 중에 만나는 흡연자(제발 서서 피워주세요, 제가 지나갈게요), 노상방뇨하는 취객(풀숲에 숨었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잘 보입니다), 맥주와 과자를 벤치에서 먹고 그대로 쓰레기를 두고 가는 사람(낭만적인 시간이었겠지, 이 비도덕한 인간들아), 아무리 공터여도 차도 옆인데 목줄을 풀어주는 강아지 보호자(미쳤나 봐!) 등등으로 인해 화를 내려고만 하면 내내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산책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워 매력적인 것이고 운이 좋은 날도, 나쁜 날도 있는 것이다.
그냥 원하는 산책을 매일매일 할 수 있다는 것,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아, 제일 중요한 사실. 강아지도 나처럼 산책을 무척 좋아한다. 왜 아니겠나.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새롭고 익숙한 냄새를 맡고 자신의 존재를 표시하는 일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예외 없이 필요하다. 그것은 운이 좋고 나쁜 것에 기댈 일이 아니다.
2023년이 밝았고 우리는 서로의 복을 빌어준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은 좋고 나쁜 일들이 섞여 있겠으나 그 사이에 작더라도 괜찮은 행운, 그러니까 복이 있어 무탈하게 하루하루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작년부터 전장연(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무심하고 싶어도 서울 교통공사에서 계속해서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주어 모르기가 어렵다. 내가 지금 두 다리로 걷는다는 행운으로, 아직 휠체어를 타지 않았다는 이유로 쉽게 지하철을, 버스를, 택시를 탈 수 있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불공평하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비장애인이 그러하듯 장애인이 이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한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이 다같이 마음을 모아 바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리 없다고 믿는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박지완(영화감독)
단편 영화 <여고생이다>, 장편 영화 <내가 죽던 날>을 만들었다.

박은현(일러스트)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박지완의 다음으로 가는 마음] 욕망이라는 이름의 친구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a/1/d/b/a1db039af32c804c807f866ecd6e229a.jpg)
![[박지완의 다음으로 가는 마음] 탐정과 나 : 추리소설을 읽는 마음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1/7/d/1/17d16313493c8edf27f46d530a2715ef.jpg)
![[박지완의 다음으로 가는 마음] 책과 나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c/4/7/e/c47edf625323517d002842439366f971.jpg)

![[송섬별 칼럼] 살아 있는 채로, 기쁨.](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16-8c669f3f.jpg)

![[이벤트 종료] 새로워진 채널예스 기대평을 작성해주세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6-81642dcc.jpg)

![10월 3주 채널예스 선정 신간 [가정살림/어린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b/0/0/d/b00dfa4a009f8f91a3d3f53b118b3dc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