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가 쓴 작품에 편집자가 어디까지 손댈 수 있나요?” 문학 편집자로 일하며 종종 받는 질문 중 하나이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문학 편집자가 갖는 기본적인 대전제는 ‘작품은 작가의 것이다.’ ‘편집자는 작가가 쓰고자 하는 것을 잘 쓸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일 것이다. 편집자가 가진 전문가로서의 감식안은 어디까지나 작가가 쓴 작품 안에서 작동한다. 잘못된 표현이나 비문부터 작품 전체 핍진성의 문제까지 ‘나라면 이렇게 썼을 텐데.’라고 생각하며 고치는 편집자는 없다.
그러므로 레이먼드 카버와 그의 편집자 고든 리시의 기묘한 관계는 독자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나 같은 편집자에게도 구미가 당기는 이야깃거리다. 레이먼드 카버(1938~1988)가 누구인가.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은 단편 소설 작가가 아닌가. 내가 처음 카버의 작품을 읽은 것은 십 대 후반, 집사재에서 나온 『숏컷』이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카버의 작품들을 번역해 일본에 소개했다는 사실, 『숏컷』에 실려 있던 하루키의 해설 때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소설이 여기서 끝난다고?’ 당황스러워하며 읽었다. 단순한 문장과 절제된 감정들 앞에서는 ‘이것이 미니멀리즘이구나….’ 이해는 잘 안 됐지만 배우는 자세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 앞날개에 실린 저자 사진은 그런 심증을 굳히기에 충분했다. 매서운 눈, 걷어붙인 팔뚝과 손등에 부푼 핏줄들, 냉정하고 강인한 인상이 작품을 대변한다고 느끼기까지 했다.
카버 작품의 시그너처인 미니멀리즘이 편집자인 고든 리시에 의해 많은 부분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미국 출판계에서도 반향이 엄청났다. 2007년 <뉴욕타임스>에 의해서였고, 카버의 초기작이 고든 리시에 의해 많게는 70% 이상 삭제되었으며 개작에 가까울 정도의 편집 과정을 거쳐 책으로 묶였다는 내용이었다. 카버의 두번째 부인인 테스 갤러거에 의해 리시가 손대기 전의 ‘오리지널’ 버전으로 카버의 두 번째 소설집이 출간되기까지 했는데, 리시가 편집한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어판 기준 248쪽, 오리지널 버전인 『풋내기들』은 456쪽에 달한다. 카버는 내가 만든 거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편집자와, 작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맞불을 지른 아내. 죽은 자는 말이 없나니, 카버는 이 스캔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계기는 얄궂지만 자신의 작품이 온전히 복원되어 기뻤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 스캔들을 미국 출판계의 이례적인 에피소드 정도로 여겼다. ‘별일 다 있네. 그렇지만 결국 카버가 동의했으니 책으로 나온 걸 테고 그 책으로 성공했으니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었을지 몰라.’ 하고.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그의 시집 『우리 모두』 편집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카버는 시인이기도 했다(그의 묘비에는 ‘시인, 단편 소설 작가, 에세이스트’라고 적혀 있다). 카버는 작가 인생 초반부터 단편 소설과 시를 썼다. 『대성당』이 큰 성공을 거둔 뒤 말년에는 시 쓰기에 전념했고, 『우리 모두』는 그의 시집 다섯 권을 합친 책이다. 시적 화자가 시인과 동일 인물일 수 없지만 카버의 경우에는 작가의 삶이 고스란히 시에 투영돼 시 속의 ‘나’를 카버로 읽어도 과한 오독은 아니라 생각되었는데, 300편이 넘는 시를 연대순으로 읽다 보니 소설을 읽으면서는 느끼지 못했던 카버의 복잡한 심사가 너무나 가까이 와닿았다.
카버는 “사랑하지 않는 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일”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한 / 두려움. 너무 오래 사는 일에 대한 / 두려움”에 몸서리쳤다(「두려움」). “강을 사랑하는 일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 노래하기도 했다(「물이 다른 물과 합쳐지는 곳」). 제대로 된 문학 교육을 받지 못한 십 대 시절의 어느 날 <시>라는 잡지를 우연히 발견해 “저 넓은 세상 어딘가에는, 세상에, 시 전문 월간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눈앞에 계시가 펼쳐지는 것 같았”다 회상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이 시작되었다.”고(「시에 관한 약간의 산문」).
이번에 출간된 시집의 표지 앞날개에도 예의 그 작가 사진이 들어갔다. 이제는 그 사진을 보면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떠오른다. 당장 작품을 발표할 지면이 소중했고, 지긋지긋한 알코올 중독과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미니멀리스트라는 호칭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쨌든 좋은 작품을 쓰고 싶었고, 사랑받고 또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 불안함도 두려움도 많았던 사람. 편집자의 개입에 어느 면 타협한 뒤 『대성당』처럼 더 좋은 작품을 씀으로써 어쩌면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는 데 긴 이야기가 필요한 건 아니구나.’ 새삼 생각하며, 그가 마지막으로 쓴 시― 공교롭게도 제목이 「말엽의 단편(斷片)」이다 ― 를 일부러 더 천천히 읽었다.
어쨌거나, 이번 생에서 원하던 걸 / 얻긴 했나? / 그랬지. / 그게 뭐였지? / 스스로를 사랑받은 자라고 일컫는 것, 내가 / 이 지상에서 사랑받았다고 느끼는 것.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강윤정(문학 편집자, 유튜브 채널 <편집자K> 운영자)
『문학책 만드는 법』을 썼고 유튜브 채널 <편집자 K>를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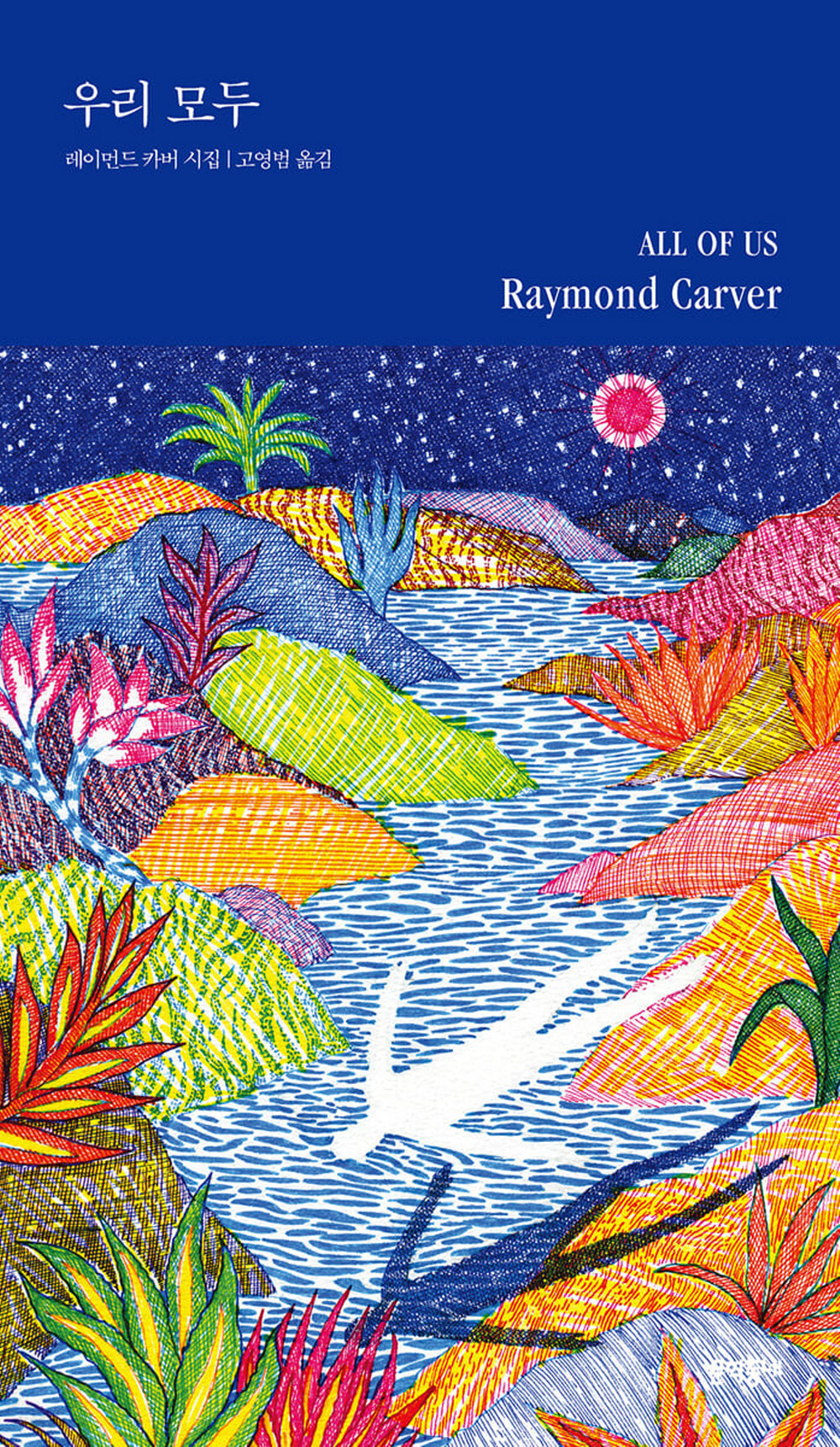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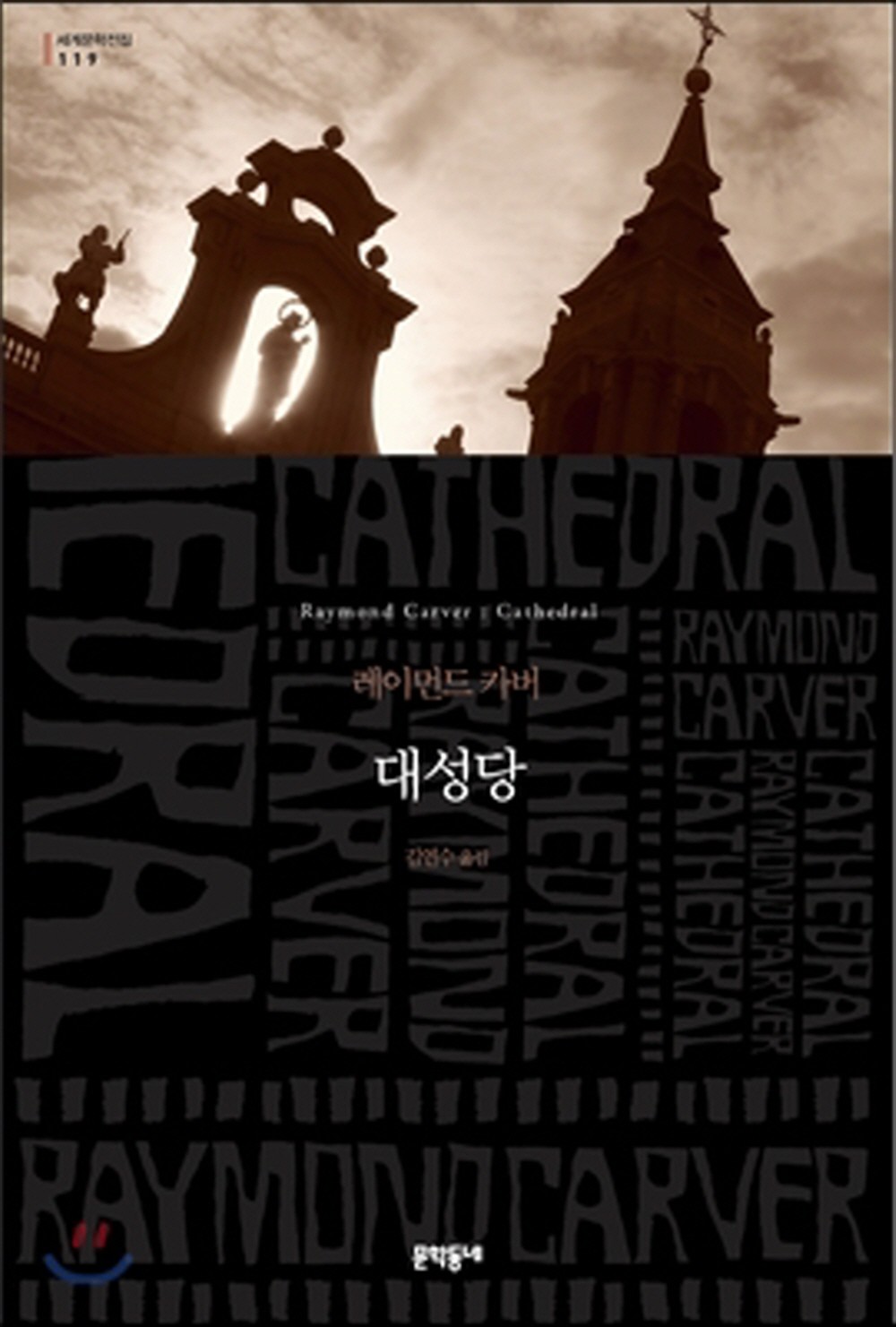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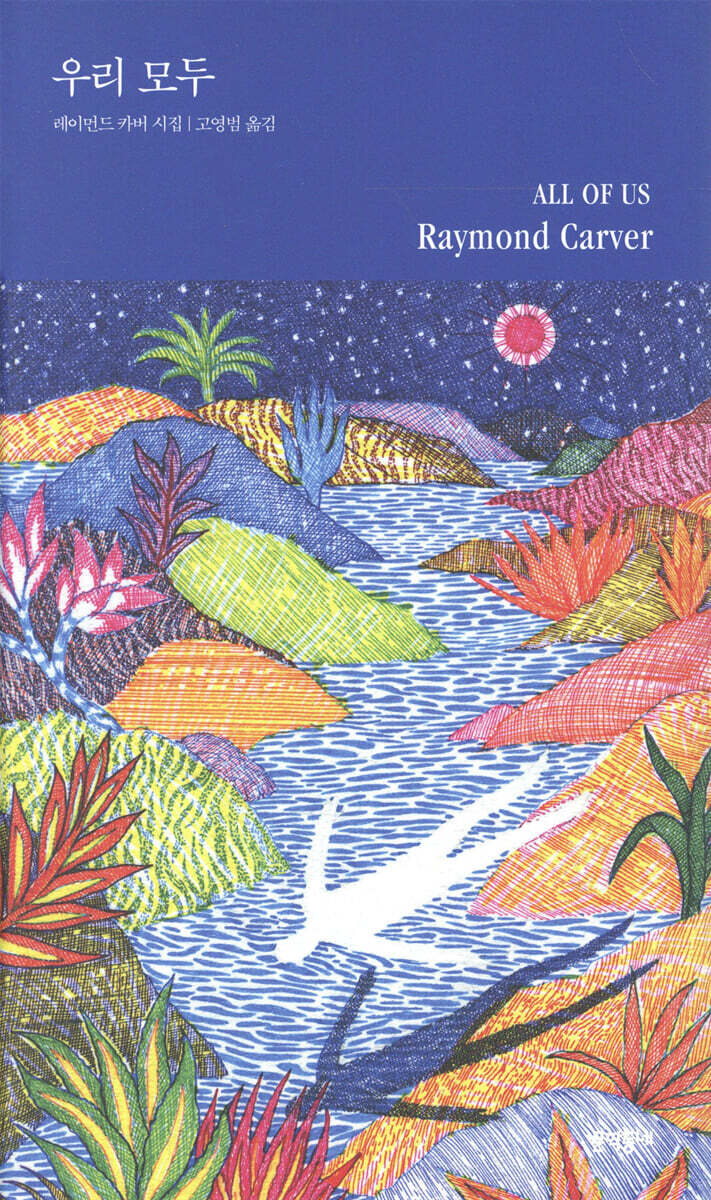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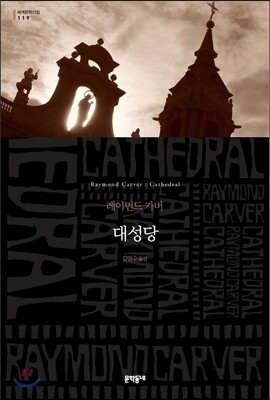
![[편집자K의 반쯤 빈 서재] 자가 격리 중에 읽은 책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c/3/9/9/c3994fc4a3d1acf9a1cbfa8e8b6c932c.jpg)
![[편집자K의 반쯤 빈 서재] 어느 날 서점의 문이 열리고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1/f/d/3/1fd387e1569f8938cc21a4617211aa16.jpg)
![[편집자K의 반쯤 빈 서재] 북튜버로 3년 살아보니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f/1/c/6/f1c629c456b32169746cb3bdf435b5c1.jpg)




![[취미 발견 프로젝트] 독서하고 싶은 공간 만들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26-346177ac.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