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스플래쉬
언스플래쉬
“회사 관둘 수 있어?”
모든 것은 남편의 짧은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그럼,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관둘 수 있지.” 별생각 없이 대답했는데, 며칠 뒤 남편은 덜컥 주재원 발령을 받아 버렸다. 그렇게 내 나이 35살, 어리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나이에 갑자기 백수가 되어 ‘베이징’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살게 됐다. ‘졸업-취업-결혼-육아-워킹맘’이라는 안정적인 굴레 속에서 무난하고 평범하게 생활해 오던 내게는 너무나 크고 무서운 변화의 소용돌이였다. 그것도 한자 ‘7(七)’과 ‘9(九)’가 헷갈려서 스스로를 ‘한자 바보’라고 칭해오던 나에게 베이징은 너무나 낯선 언어의 도시가 아닌가. 물건 하나 제대로 살 수 없는 내가 타국에서 아이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무엇이든 쉽게 사랑에 빠지는 ‘쉽사빠’인 나였지만 베이징은 쉽지 않았다. 자욱한 미세먼지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어, 위생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 거리의 화장실들은 생각보다 참혹했다. 중국과 중국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도 조금씩 쌓여 갔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모든 것들을 여행자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우리는 여행지에서는 조금은 더 너그러워지니까. 유한한 시간 속에 있는 여행지에서는 하나라도 더 보려고 한껏 영혼을 깨우고 반짝거리는 눈망울로 걷지 않았던가. 그날 이후 나는 도시와 일상을 탐험하는 '도시 산책자'이자 ‘생활 여행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매일 아침 아이를 학교 버스에 태워 보내고 바로 시내로 나와 매일 베이징을 걸었다. 걷는 행위가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그간의 믿음을 발판 삼아 생활 여행자 역시 응당 그래야 한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다. 별다른 정보도 없이 매일 4-5시간씩 걷다가 집으로 돌아와 그날 봤던 공간들을 다시 찾아보는 행위를 반복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니 비로소 이 도시를 조금 알게 됐고, 알고 보니 사랑하게 됐다. 그 즈음, 김신지 작가의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책이 운명적으로 다가왔다. 원래 ‘적자생존’이라는 단어를 ‘적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기록하는 것을 사랑하는 나였지만 바쁜 워킹맘 생활에 쫓겨 그 즐거움을 잊고 살았다. 기록에 관한 남다른 철학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던 책을 덮으며 생각했다. 그래, 다시 ‘프로기록러’가 되어 도시 산책의 기록들을 촘촘히 남겨 보겠어.
이후 나의 이방인 생활은 180도로 변했다. 매일 잠들기 전 바이두 지도 APP을 열어 걷고 싶은 길을 찾아 하루의 산책 스케줄을 짜고, 좁은 골목인 후통(胡同)과 공간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를 찾아서 읽었다. 중국어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내고 낯선 문을 열고, 낯선 이에게 말을 걸어보는 엄청난 용기를 내기도 했다. 모두 기록하기로 마음먹자 생긴 변화들이다. 기록하는 행위는 마주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촘촘하게 바라보고 더 다정한 시선으로 다가가게 했고, 순간순간에 몰입하게 해주었다. 그러니 기록, 아니 기록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느 장소에서건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운 셈이다. 그러자 하루하루의 평범한 시간들이 무척 특별해지기 시작했다. 작가의 표현처럼 ‘하루하루가 낱알처럼 살아’ 있었다. 더 큰 수확은 낯선 도시를 걷고, 기록하는 시간에 정작 잊고 지냈던 스스로의 ‘진짜 마음(眞心)’을 더 잘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렇게 도시와 마음 사이, 오해와 이해의 중간에서 매일 헤매다 보니 도시의 지도와 내 마음의 지도가 조금씩 겹쳐지고 선명해졌다. ‘매일 기록하는 사람은 하루도 자신을 잊지 않고 잃지 않는다’는 작가의 말이 살아 움직이는 날들이었다.
활자 중독자라서 매일 책을 읽는다. 만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되지 않은 이 책을 ‘내 인생 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책이 내 삶을 드라마틱 하게 바꿨기 때문이다. 좋은 문장들을 가진 책들은 많았지만 내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준 책은 없었다. 『책은 도끼다』의 박웅현 작가의 말처럼 ‘이 책이 도끼처럼 나의 얼어붙은 감성을 깨트리고 잠자던 세포를 깨웠다. 도끼 자국들은 내 머릿속에 선명한 흔적을 남겼’다. 선명한 흔적을 따라 거리의 숨겨져 있는 작은 기쁨들을 찾아서 열심히 걸은 셈이다.
기록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늘어났다. 열광하면서 먹고 마셨던 중국 과자와 맥주, 미니멀하게 살기 위해 매일 비우는 물건 리스트, 매일 나를 찾아오는 새로운 중국산 콘텐츠, 언젠가 너무나 소중해질 할머니와 엄마, 아빠를 담은 영상, 밑줄 긋고 싶은 책 속의 문장, 나를 빵 터지게 하는 아이의 농담과 나에게 닿은 사소한 칭찬까지 모두 기록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이런 나를 지켜보며 자극을 받은 가족과 친구들도 무언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남편은 5년간의 주재원 생활에서 얻게 된 중국 디지털 산업 지식들을 적어 내려갔고, 아홉 살 아이는 5년의 하루가 한 장에 담기는 ‘5년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다. 친오빠도, 가장 친한 친구와도 무엇을 적어야 의미 있고 행복한 기록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기록의 이유와 쓸모는 기록하지 않으면 곧 잊게 될 것이 분명한 내 짧은 기억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것이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순간을, 하루를 그리고 삶을 더 잘 살아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쌓여 가는 취향과 일상의 기록들은 어제보다 조금 더 즐거운 '오늘의 나'로 만들어 주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끊임없이 내게 말을 건다. 그러니 나는 앞으로도 계속 기록할 것이다. 내가 걷는 세상의 풍경들과 거기서 만난 사람들의 마음, 우리를 조금 덜 울게 하는 칭찬들과 아이의 농담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심예원 매일 조금씩 걷고, 매일 조금씩 쓰는 도시 산책가 |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심예원(나도, 에세이스트)
매일 조금씩 걷고, 매일 조금씩 쓰는 도시 산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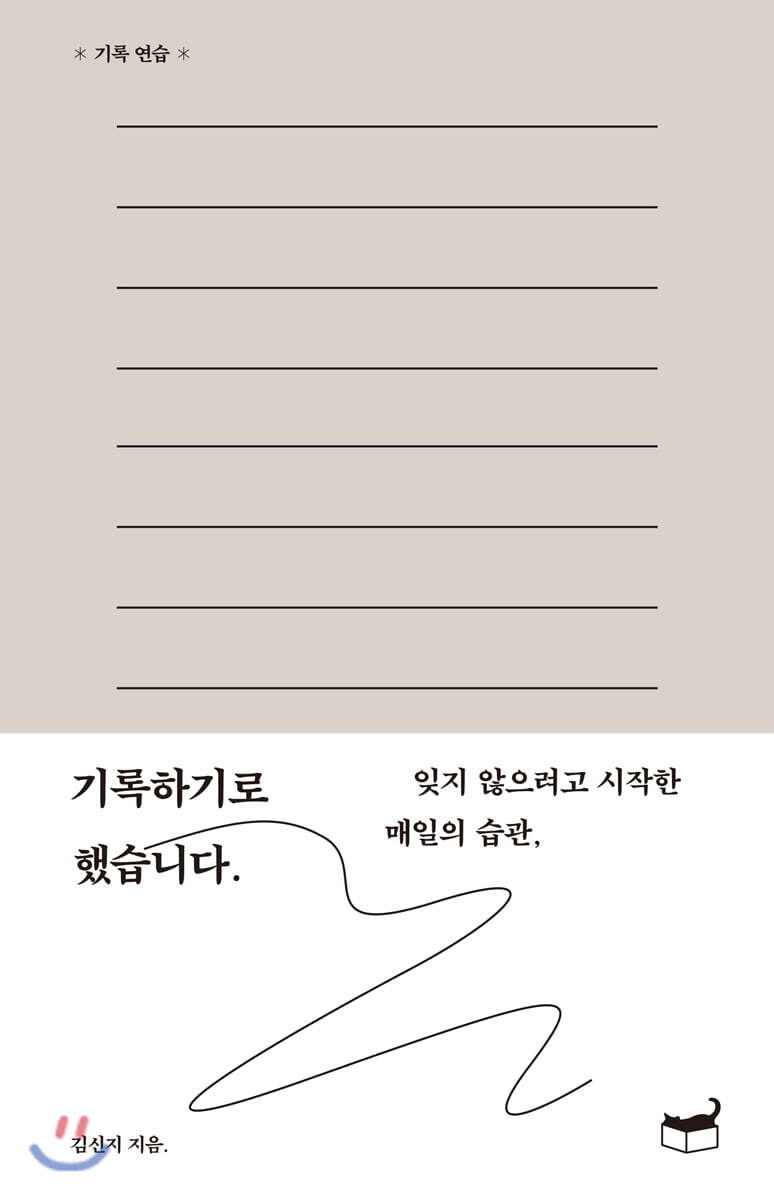
![[나도, 에세이스트] 12월 우수상 - 딩동, 에너지가 충전되었습니다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6/2/a/8/62a8402a3f2db53bbd9d0b2a790af382.jpg)
![[나도, 에세이스트] 12월 우수상 - 내 첫 번째 어른 책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5/0/4/6/50469b2e6d795effdbb590434d174d12.jpg)
![[나도, 에세이스트] 12월 우수상 - 친구가 건넨 자존감 한 권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1/d/7/6/1d76c14ebf454ae750deedae915b6449.jpg)


![[큐레이션] 추천하지 못했던 책들을 고백합니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6-fea78c13.jpg)


![[더뮤지컬] "할머니의 삶에서 소녀가 보여"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프레스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18-9cc1935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