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스플래쉬
언스플래쉬
동네에 사는 동료 번역가에게 일감을 소개받았을 때만 해도, 기존 작업 중에 잠깐씩 짬을 내어 용돈이나 벌어볼까 하는 심산이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어린이용으로 출간한 동식물 그림책 시리즈를 국내 출판사에서 영한대역으로 낸다는데, 시리즈 A, B, C 30권은 다른 분이 번역하여 이미 출간됐고, 나는 시리즈 D, E, F 30권을 맡기로 했다. 일전에 래리 고닉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미국사』(궁리, 2018), 제이 호슬러의 『어메이징 샌드워커』(궁리, 2018), 맷 업슨 외의 『어메이징 인포메이션』(궁리, 2017) 등 학습 만화를 여러 권 번역한 경험도 있고 해서 식은 죽 먹기일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웬걸,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숨어 있었다.
우선 이 책들은 어린이책답게 아이들이 미처 모를 법한 과학 용어를 설명하는데(이를테면 ‘포식자’, ‘갈기’, ‘비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꽤 되더라는 것이다. “Male giraffes are called bulls. Females are called cows.”라는 문장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영어권에서는 수컷 기린을 ‘불’이라고 부르고 암컷 기린을 ‘카우’라고 부를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컷 기린은 ‘수컷 기린’이고 암컷 기린은 ‘암컷 기린’일 뿐이다(설마 ‘수키린’과 ‘암키린’이려나?).
문화 차이도 극복해야 할 난관이었다. “Eucalyptus leaves smell like cough drops.”라는 문장에서 ‘cough drops’는 우리말로 ‘진해·거담제 사탕’이나 ‘진해정’쯤 될 텐데,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이 단어를 알까? 약국에 가서 둘러보니 가래를 없애준다는 사탕들은 모과나 허브향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문득 롯데제과에서 1988년에 출시한 특정 과일향 사탕이 떠오르는데, 이 제품을 보통명사 격으로 써도 괜찮을까?
“불운은 혼자 오지 않는다”라는 옛말처럼, 위의 두 난관을 더한 다음 문장을 만났다. “A baby koala is called a joey. A joey is the size of a jelly bean at birth.” ‘jelly bean’은 콩 모양 젤리라는데, 내가 아는 ‘젤리빈’은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 4.1, 4.2, 4.3의 별명이 전부다. 우리나라에서도 젤리빈을 파는지 궁금해서 작업실 아래층 슈퍼마켓에 내려가 물어보니 콩 모양 젤리는 없다고 했다. 대부분 마이구미 같은 과일 모양이나 하리보 같은 곰 모양 젤리였다. 요즘 어린이들은 서양 문물에 친숙하니까 ‘젤리빈’도 먹어본 적 있으려나?
게다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양이 달라진다. 내가 최근에 번역한 버락 오바마의 『약속의 땅』(웅진, 2021)은 영어판이 751쪽인데 반해 한국어판은 919쪽이나 된다. 글자 크기와 줄 간격이 달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약속의 땅』의 경우 판형은 대동소이했다― 숫자만 놓고 보자면 분량이 1.2배로 증가한 것이다. 글자만 있는 책이야 쪽수를 늘리면 그만이지만, 그림책은 정해진 공간 안에 문장을 욱여넣어야 하기 때문에 마치 영화 자막처럼 영어와 한국어의 글자 수를 맞춰야 한다. 이런 탓에 내가 애정하는 옮긴이 주를 하나도 쓸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물론 그랬다면 어린이 독자들의 원성이 자자했겠지만― 애매한 구절을 자세히 풀어 쓸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은 약과였으니, 가장 고약한 것은 책마다 서너 개씩 실려 있는 난센스 퀴즈였다. “Q. Why did the koala cross the road? A. Because it was the chicken’s day off.”의 언어유희를 어떻게 번역하란 말인가? 이것은 일종의 허무 개그로, 본디 “닭이 왜 길을 건널까? (상대방: 어리둥절 묵묵부답.) 건너편에 가려고.”라는 (18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 깊은 유머에 빗댄 퀴즈다. 이 위기를 넘어설 방법은 검색뿐. 구글에 들어가 ‘코알라 유머’를 찾아봤으나 나오는 건 지면에 옮기기 민망한 19금 유머밖에 없었다. 어린이책이 내게 무력감과 자괴감을 선사할 줄이야.
그렇다고 해서 시리즈의 첫 열 권을 번역하는 동안 마냥 고달프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지금껏 말의 리듬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웠는데, 이번에 원 없이 구사할 수 있었다. 어린이책 번역의 묘미는 리듬감에 있다. 아이가 혼자 눈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소리 내어 읽어줄 수도 있기에, 입에 착착 붙게 번역하는 게 중요하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지루하니 어휘와 어미에도 변화를 줘야 한다. 흡족하게 번역된 문장을 보고 있노라면 구연동화 선생님이 내 귀에 대고 읽어주는 듯한 환청이 들리기도 한다.
또, 번역은 독자를 저자에게 데려가는 직역과 저자를 독자에게 데려오는 의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번역가 모모 씨의 일일』(세종서적, 2018) 39쪽 참조!], 어린이책 번역은 철저히 저자를 데려오는 번역이어야 한다. 이를테면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개념과 원리는 미국 초등학교가 아니라 한국 초등학교의 교과과정에 부합해야 한다. 나의 평소 번역 스타일과 달리, 이번 번역의 목표는 어린이 독자가 이 책이 번역서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읽게 하는 것이었다. 주의 집중 시간이 짧은 아이들이 책을 끝까지 읽게 만들려면 어떤 장애물도 없이 동식물의 세계에 빠져들도록 해줘야 할 테니까.
번역은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성인 남녀에게 말을 걸었지만 이번에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어쩌면 그보다 어린 아이들을 떠올리며 작업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나의 다른 번역서들도 읽게 될 거라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린다. 얘들아! 책 맨 뒤에 판권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아저씨 이름을 찾아서 기억해줘. 다음에 또 만나자!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번역가 모모 씨의 일일
출판사 | 세종서적
번역가 모모 씨의 일일
출판사 | 세종서적

노승영(번역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지과학 협동과정을 수료했다. 컴퓨터 회사에서 번역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환경 단체에서 일했다. 『번역가 모모 씨의 일일』을 썼으며, 『제임스 글릭의 타임 트래블』, 『당신의 머리 밖 세상』, 『헤겔』, 『마르크스』, 『자본가의 탄생』 등을 번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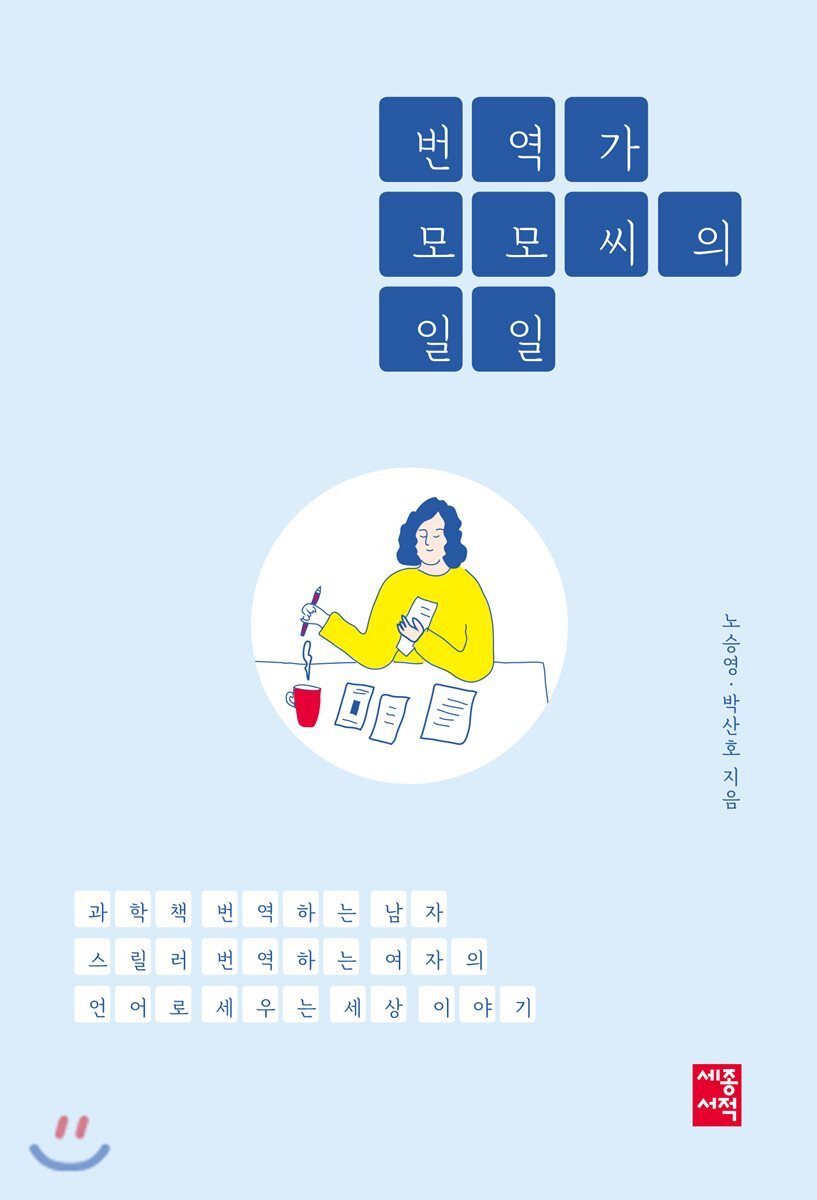
![[노승영의 멸종 위기의 나날들] 닌자와 번역가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f/8/7/7/f877eb1acabd898e538b09f1fa70b31d.jpg)
![[노승영의 멸종 위기의 나날들] 단편 소설 「예술원에 드리는 보고」에 대한 서평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a/d/6/a/ad6a039effde01a0a06fe8b843bf70d4.jpg)
![[노승영의 멸종 위기의 나날들] 유레카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5/c/3/5/5c3590858ed803bfe05d747583229bec.jpg)

![[큐레이션] 방문을 굳게 잠그고 읽어야 하는 시집](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10-700ed945.jpg)
![[인터뷰] 조예은 “소외되거나 경계 밖에 있는 존재들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게 이야기의 의무라고 생각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05-6c7f6d08.jpg)


![[더뮤지컬] 황석희 번역가, <원스>의 항해를 함께하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01-58dae1e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