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스플래쉬
언스플래쉬
어렵게 공공기관에 입사했다.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으로 이어지는 한 세트를 열 번은 넘게 반복했다. 필기시험이나 면접에 이르지도 못한 이른 낙방까지 헤아린다면 백번은 더 됐다. 특히나 최종 합격한 기관은 입사 전년도에 마지막 면접에서 낙방하고 다음 해 재도전해서 붙은 곳이었다. 컴퓨터에서 합격 소식을 확인했을 때 우리 가족은 한 덩이가 되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첫 발령은 창원이었다. 부산 집에서 출퇴근은 힘들었지만, 합격의 기쁨으로 터질 것 같은 마음에 그건 고민거리도 못되었다.
오십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창원지사에 배정받은 신입직원은 나 혼자였다. 팽팽한 줄처럼 한껏 잡아당겨진 ‘잘 보여야 한다’라는 긴장감으로 첫 한 달을 보냈다. 큰 무리 없이 회사에 적응했고 나의 바람처럼 튀지 않고 분위기에 잘 녹아들고 있다고 생각했다.
입사 두 달쯤 지나고 전 직원 회식이 열렸다. 직원 수가 오십이 넘다 보니 전체 인원을 한날 한자리에 모아 회식을 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일 년에 한두 번 있는 큰 자리라고 했고, 신입환영회를 겸하니, 기대하라고 했다. 겨우 직장이 편해질 만할 때 그런 이벤트가 열린다고 하니 다시 긴장이 몰려왔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에 술도 일절 못하는데 전 직원이 모인 신입환영회라니.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그날 반차를 쓸까, 쓴다면 어떤 핑계를 대나, 몸 어느 구석 아픈 데 없나, 말도 안 되는 고민을 꽤 진지하게 했다.
그날이 왔다. 삼겹살 집 하나를 통째로 빌려 전 직원이 앉았다. 지사장님의 말씀, 각 부서 부장님과 차장님의 건배사가 이어지고 나는 열심히 삼겹살을 굽고 직원들은 즐겁게 먹고 마시고. 이대로 유일한 신입사원인 내 존재가 운이 좋게 잊히고 있는 듯했다.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술이 올라 얼굴이 벌게진 과장님이 내 앞자리에 앉았다. 우리 지사에는 유구하고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고 했다. 전체회식이 열리면 그해에 들어온 신입사원은 꼭 무반주 노래를 한다는 것이다. 전혀 유구하지도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는 전통이었는데, 그 전통의 정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반주 없이 부를 수 있는 가사를 아는 노래가 뭐 있나 온 머리를 헤집기 시작했다. 딱 하나 생각나는 노래가 있었는데, 나의 이성은 절대 그 노래는 안된다고 외치고 있었다.
사직야구장에서 주야장천 불러댔던 응원가 부산갈매기였다. 하지만 이곳은 창원이었다. 부산과 창원의 야구팀은 낙동강더비라 불리며 라이벌, 혹은 천적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나의 머리는 절대 이곳에서 부산갈매기를 불러선 안 된다고, 평화롭게 안착해가던 나의 사회생활을 망칠지도 모른다고 외쳤다. 술에는 쥐약이니 이미 마셔버린 한두 잔의 술에 정신은 몽롱해서 부산 갈매기에 한 번 꽂히니 다른 노래는 더욱 생각나지 않았다. 나에게 유구한 전통을 알려준 과장님은 이미 삼겹살집 중앙에 서서 내 소개를 하고 있었다. 술기운이 올라 불콰해진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다른 이유로 얼굴이 벌게진 나는 주춤대며 다닥다닥 붙은 테이블을 지나서 앉은 사람들의 등과 엉덩이와 가방을 건너 중앙으로 나갔다. 우물쭈물하자 사람들은 노래를 청하는 주문처럼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를 외쳐댔다.
지금은 그 어디서 옛 생각 잊었는가. 꽃처럼 어여쁜 그 이름은 고왔던 순이 순이야.
입을 떼자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아, 하지만 쏟아져버린 노래였다.
파도치는 부둣가에 지나간 일들이 가슴에 남았는데.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정녕 나를 잊었나.
될 대로 대라는 생각으로 노래를 내질렀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빠빠바빠바밤, 빠빠바빠바밤, 빠빠바바밤.” 창원 야구 홈팀이 생기며 그동안 응원하던 부산 야구팀에서 멀어진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불과 이삼 년 전까진 경남권을 통틀어 하나밖에 없는 부산 야구팀을 함께 응원하던 사이였다. 자칫 얼음처럼 냉각될 수 있었던 회식 자리는 부산갈매기를 부르짖으며 마무리됐다.
적진의 고장에서 부산갈매기를 외쳐댄, 얌전해 보이던 신입사원의 무반주 노래는 회사에서 길이길이 화자 되었다. 그리고 이 년 후 정기 인사이동으로 내가 서울로 옮겨갈 때까지 나는 종종 부산갈매기로 불렸다. 귀하게 얻은 직장에서 튀지 말고 자리보전만 잘하자던 나의 다짐은 오래가지 못한 셈이다. 지금은 코로나로 회식이야 언감생심이 돼버렸는데, 본래가 유흥을 좋아하지 않던 내게는 어쩜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평생에 다시 얻지 못할 별명을 선사하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나에 관해 잊히지 않을 이미지 하나 선사해준 그 날의 부산갈매기가 요즘은 더욱 그립다. 야구장이든 회식 자리든 다시 부를 기회가 온다면 더없이 신나게 불러제낄 것이다.
한지형 끼룩끼룩 지금은 서울에 사는 부산갈매기입니다.
* 나도, 에세이스트 공모전 페이지 바로가기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한지형(나도, 에세이스트)
끼룩끼룩 지금은 서울에 사는 부산갈매기입니다.






![[나도, 에세이스트] 8월 우수상 - 엄마의 엄마가 준 사랑을 기억하렴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c/b/c/8/cbc80e68725fe0a9d616795bda2974c2.jpg)
![[나도, 에세이스트] 8월 우수상 - 먹지 못한 콩국수와 빨간 얼굴 아기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f/a/e/9/fae9cf1efedf26aa41a1a6ac3d3dd175.jpg)
![[나도, 에세이스트] 8월 우수상 - 여름, 네가 내게 온 계절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b/a/f/d/bafde720d222698c712e71738e20b11f.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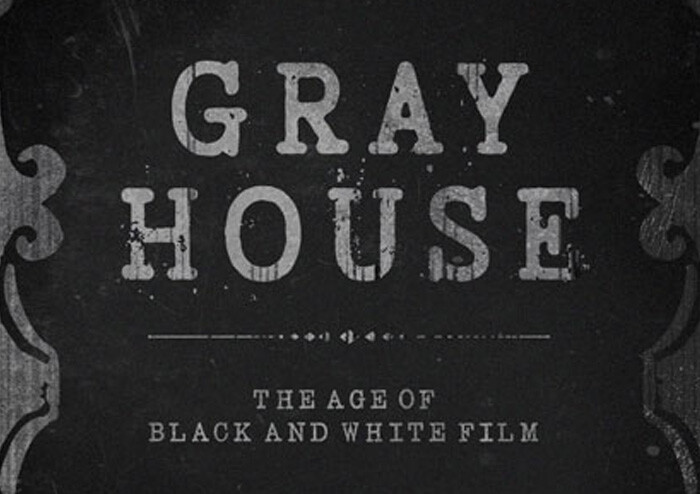
![[더뮤지컬] <외쳐, 조선!> 박정혁, 30퍼센트의 성장](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05-af51576f.jpg)





봄봄봄
20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