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돌멩이>의 한 장면
영화 <돌멩이>의 한 장면
성인 남성과 소녀가 짝을 이뤘다. 뻔한 조합이란 생각이 든다. 인물의 설정만 보고도 성인 남성이 가진 일종의 원죄를 소녀를 통해 씻는다는 주제의 영화들이 생각난다. 굳이 이 영화들의 제목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돌멩이>는 조금 다른 접근으로 이 주제를 변주하려 한다. 성인 남성이 인간 병기도 아니고 폭력을 자유자재로 휘두르지도 않는다. 신체는 성인이지만, 지능은 8살에 머물러 있다.
석구(김대명)는 홀로 정미소를 운영한다. 갓 수확한 쌀을 받아 기계를 돌려 도정하는 몸놀림이 익숙해 보여도 어딘가 불안하다. 대화하는 요량이 어눌하고 계산법이 빠르지 않아서다. 저러다 사기라도 당하는 게 아닐까 걱정스럽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워낙 석구를 잘 챙겨 별 사고 없이 살고 있다. 14살 소녀 은지(전채은)가 나타나면서 잔잔했던 수면 위에 돌멩이를 튕긴 듯 석구의 마음에, 그리고 마을 곳곳에 파문이 인다.
주변과 융화하지 않는 은지는 마을 잔치에서 소매치기로 오해받는다. 석구가 진범을 잡으면서 둘은 각별한 사이로 발전한다. 석구는 아빠 찾아 삼만리 가출한 은지를 부모처럼 보호하고, 엄마도 양육을 포기해 혼자가 익숙한 은지는 석구를 친구로 받아들인다. 이들의 아지트는 석구의 정미소. 은지가 물 묻은 손으로 두꺼비집을 만져 쓰러지자 당황한 석구가 다급하게 살핀다. 이를 목격한 청소년 쉼터의 김 선생(송윤아)은 석구의 의도를 오해해 경찰에 신고한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돌멩이>는 카메라의 시선을 유심히 살펴야 하는 영화다. 영화가 석구와 은지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관객에게 부여하려는 시선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서다. 은지가 마을에 나타나 석구의 눈에 처음 들어오는 순간부터 관객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석구의 친구들이 석구를 노래방에 데려가 성적으로 짓궂게 장난치는 장면을 그 전에 목격한 상황에서 영화의 의도대로 관음적인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다.
김 선생이 정미소에서의 석구의 태도를 오해한 것처럼 관객 또한 석구의 행동을 잘못 해석하게 하려는 영화의 의도가 반영된 시선이다. 이럴 때 시선의 주체는 누구인가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장면이 있다. 석구가 모로 누운 상태에서 은지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화면 중심에 놓이는 건 은지의 드러난 다리다. 석구의 시선 같아도 실은 석구의 어깨높이에 위치한 카메라, 즉 창작자의 시선이 ‘오해’라는 알리바이를 가지고 은지의 신체를 바라본다.
오해의 시선으로 영화가 구축하는 건 석구의 수난사다. 스스로 변호하거나 방어할 수 없어 유무형의 폭력을 견디는 석구의 처지를 이리 구르고 저리 굴러 표면이 깎여나가면서도 단단함을 잃지 않는 ‘돌멩이’에 비유한다. 영화가 주제곡으로 삼은 김추자의 <꽃잎> 중 ‘꽃잎이 피고 또 질 때면 그날이 또다시 생각나 못 견디겠네’의 가사는 오해가 빚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일상을 이어가는 석구에게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휴머니즘을 끌어낸다.
 영화 <돌멩이>의 포스터
영화 <돌멩이>의 포스터
석구를 구원하려 영화적으로 애쓰는 동안 <돌멩이>가 정작 놓치는 건 은지의 서사다. 은지는 극 중 사건의 (원치 않은) 제공자이면서 석구를 더 큰 수렁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악역을 자처하는, 수난의 도구이자 구원의 수단이다. 관객의 이목이 쏠리는 시기의 한국 영화 중에는 신체 건장한 남성이 가진 죄(의식)의 방면을 위해 여성, 특히 소녀의 피해를 주변에 배치하는 작품이 꽤 된다. 영화의 사회 반영적인 측면에서 퇴행의 징후다.
여성 서사, 여성을 도구화하지 않고, 여성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작품에 대한 요구가 높다. 사회적으로도 그동안 외면해온, 인정하지 않았던 여성의 삶과 권리를 남성 수준으로 복권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와 다르게 한국 영화는 성인 남성과 소녀가 짝을 이룬 서사의 갖가지 변주로 사회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영화는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영화 <돌멩이> 예매하러 가기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허남웅(영화평론가)
영화에 대해 글을 쓰고 말을 한다. 요즘에는 동생 허남준이 거기에 대해 그림도 그려준다. 영화를 영화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려고 다양한 시선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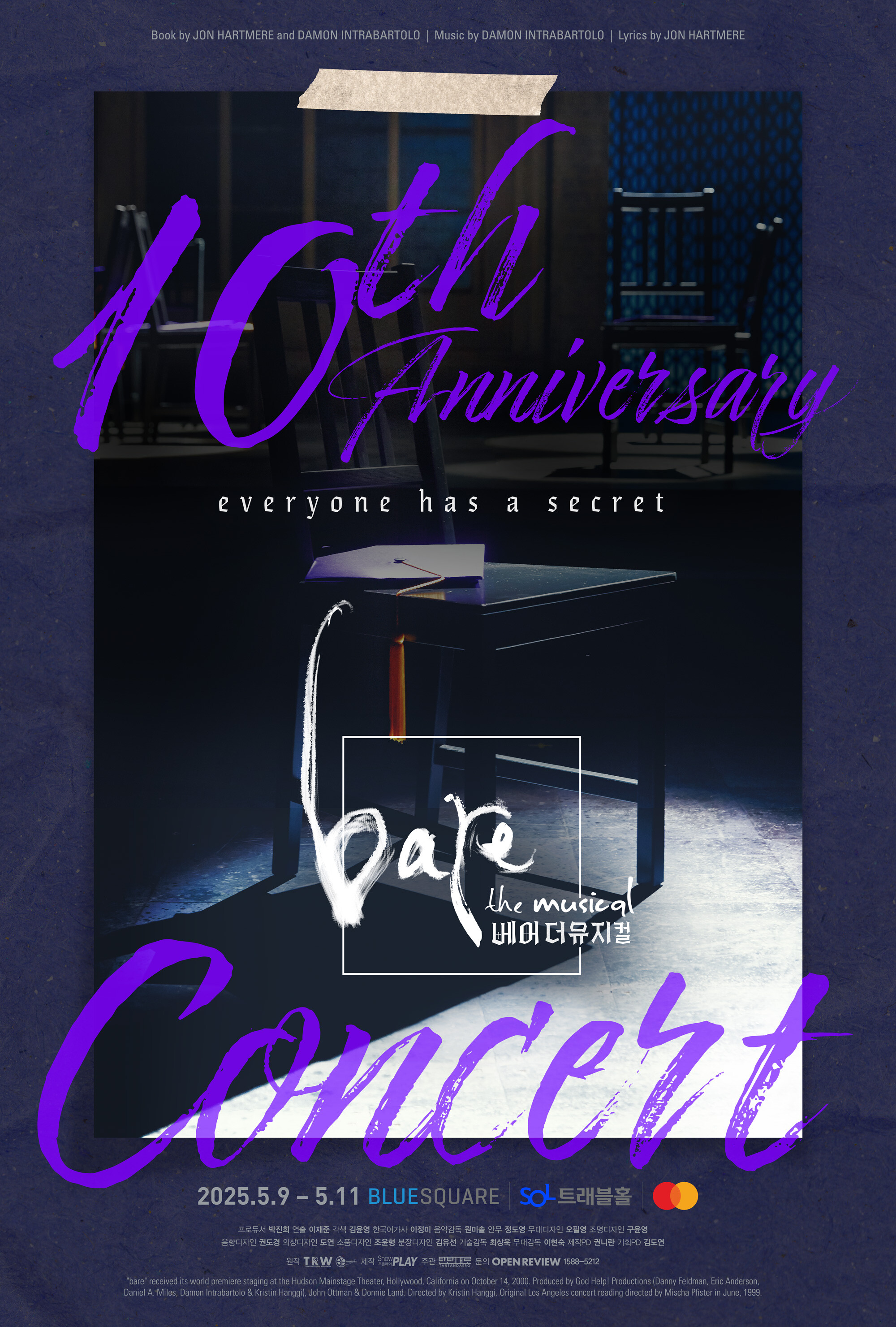
![[더뮤지컬] <애나엑스> 김도연, Trust Your Gut](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27-84a03876.jpg)
![[취미 발견 프로젝트] 독서하고 싶은 공간 만들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26-346177ac.png)
![[더뮤지컬] "할머니의 삶에서 소녀가 보여"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프레스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18-9cc1935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