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스플래쉬
밤 열한 시면 손이 바빠진다. 당일 배송 금액을 채우기 위한 마지막 아이템을 고민하다가, 결국 썩 필요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말린 무화과를 고른다. 필요하거나 좋아하는 상품은 언제나 너무 많거나 너무 비싸다. 열두 시를 넘기기 전에 결제 탭으로 넘어가야 한다. (앞으로는 절대 어떤 애인과의 기념일로도 비밀번호를 만들지 않으리라 결심하며) 서둘러 간편 결제 비밀번호를 누른다. 이건 콘서트 티켓팅도 수강신청도 아니다. 온라인 쇼핑으로 장을 보는 독립생활자의 사투다.
한 온라인쇼핑몰에 따르면, 하루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하는 시간은 밤 열한 시라고 한다. 다들 비슷한가 보다. 당장 나만 해도 잠들기 전 휴대폰으로 주문하면서 다음 날 택배 상자를 받을 즐거운 상상을 하며 잠에 드는 때가 많다. 출근보다도 퇴근을 먼저 생각한다. 그 편이 보다 유쾌하니까.
시간 권력을 타인에게 뺏기면, 빼앗길 시간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거나 내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든다. 당일 배송 택배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완벽하게 만족시킨다. 상품이 당장 필요하냐 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는데 굳이 느리게 오라고 할 이유는 없다. 집에 오는 길, 온종일 기대했으면서도 막상 경비실에 놓인 택배를 보면 새삼 놀란다. 주문할 때는 자연스럽지만 받을 때는 또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일 배송 서비스다.
예스24도 당일 배송이 주력 서비스인 만큼, 신입이라면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있다. 다양한 책이 모여 있는 물류 센터다. 신입 사원은 교육 기간에 물류 센터에서 고객이 주문한 책을 모아 하나의 상자에 담고 포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해 본다. 사무실에 앉아 모니터 속 숫자를 보기 전에 직접 책을 만지고 나름으로써 물리적인 시스템과 흐름을 알기 위해서이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일은 주문 도서를 모으는 집책. 시작과 함께 당일 배송과 일반 배송으로 나뉜 주문서를 받는다. 그때부터 ‘보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공기를 휘어잡는다. (물론 여기서 ‘보내야 한다’는 궁서체다. 마음의 눈으로 읽어주세요.) 당일 배송 마감 시간을 알리는 알람 방송이 나오자, 남은 목록을 보는 내 발걸음이 빨라진다.
물류 교육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마음에 가장 길게 남은 건 내일도 출근해서 집책할 사람들이었다. 시간 권력을 빼앗긴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시간에 쫓길 마음들. 그 후 당분간은 당일 배송을 시키지 못했다.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보지 못한 과정을 상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곳저곳에 산재한 상품을 모아 포장한 후 열 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여러 대의 트럭을 타고 우리 집에 도착하는 여정에 숨겨진 수고를. 내가 유쾌하자고 그들의 불안을 눙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몇 개월 지나서는 다시 잠자리에서 처음 묘사한 장면을 반복했다. 당일 배송을 선택할 필요도 없었다. 자동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 전, 배송이 지연된다는 안내 문자와 함께 택배 기사 파업 소식을 들었다. 배송 전 분류 작업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루 7시간 무급 노동. 마음이 덜컹거렸다. 당일 배송을 앞세운 다른 업체의 악습도 함께 언급되었다. 하루 안에 배송하기 위해 무리하게 달리다 사고를 당해도 수리비는 온전히 기사의 몫이라고 했다.
왜 다시 당일과 일반 배송 앞에서 고민 없이 편리를 택하고 말았을까. 택배 기사가 정당한 대우를 받길 바라면서도 파업 때문에 상태가 변경되지 않는 송장 번호를 보며 마음이 달았다. 시간의 제로섬 게임에 빠진 기분이었다.
“하찮은 것에 간절해지지 말자는 말을 하찮은 것에 간절해지는 나를 향해 주문처럼 하곤 했다. 그것이 내가 세상을 견디고 혐오스러운 나를 견디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하든 나는 세상에 붙들려 있었고, 세상과 어울려 있었고, 세상의 일부였고, 그러니까 세상을 견딘다는 것은 나를 견딘다는 뜻이기도 했다.”
- 이승우, 『모르는 사람들』 중

영화 <옥자>
봉준호 감독은 영화 <옥자>를 만들기 위해 관련 다큐멘터리를 섭렵하고 도축 시설을 견학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옥자> 촬영 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페스코(해산물까지 먹는 채식) 식단으로 바꿨다. 신념 때문이 아니라 도축장에서 보고 맡은 피 냄새 등의 감각 때문에. 나도 <옥자>를 계기로 식단을 채식 위주로 바꾸었다. 그렇다고 육식이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다만 옥자를 향한 연민과 함께, 감각이 표백된 상품을 소비하고 있다는 뒤늦은 두려움과 죄책감이 몰려왔다. 스티로폼 접시 위의 정육이 도축 당했을 과정이 떠올라 도저히 손이 가지 않았다. 산 채로 고통스럽게 살 찌워졌을 동물이 그려졌다. 우습게도 전에는 몰랐다. 아니, 모른 척할 수 있었다.
만화 『은수저』 의 도시 소년 하이켄 유고는 농업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소가 고기로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함께한다. 언뜻 들으면 잔인하지만, 실제로 읽으면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보살핀 소를 자신의 손으로 요리하는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습에서 묘한 감동을 받는다. 어떤 과정도 생략하지 않고 곧게 마주하는 모습.
과정을 생략하면, 편리한 세상이 더욱 쉬워진다. 하루 만에 상품을 받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맛있는 고기를 잔뜩 먹을 수 있다. (심지어 즐겁게!) 하지만 편안할 수는 없었다. 나 또한 살아온 시간이 생략된 채로 해석되고 거래되리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편리를 적극적으로 불편해하기로 한다. 실제로 불편하기도 하다. 윤리적인 환경에서 키워진 달걀만 사려다가 이주일 넘게 달걀을 못 먹기도 하고, 노동자를 배려하지 않는 기업을 피하려다 장 보러 멀리 나가기도 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은 비싸서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그래도 전보다 내가 견딜 만하고, 세상이 견딜 만하다. 즉각적인 쾌 없이도 편안하게 잠든다. 더디더라도 조금씩 안전해진다.

이정연(도서MD)
대체로 와식인간으로 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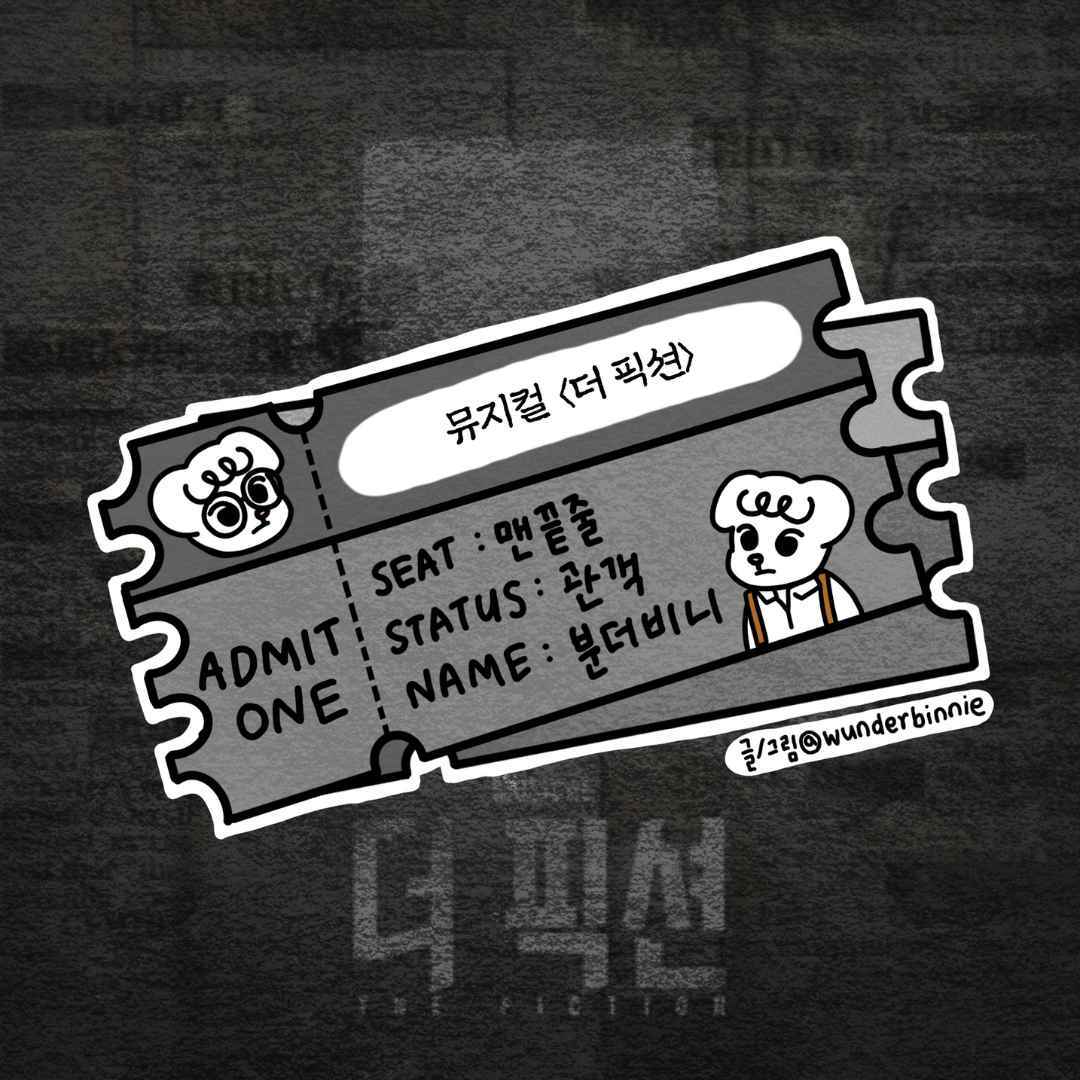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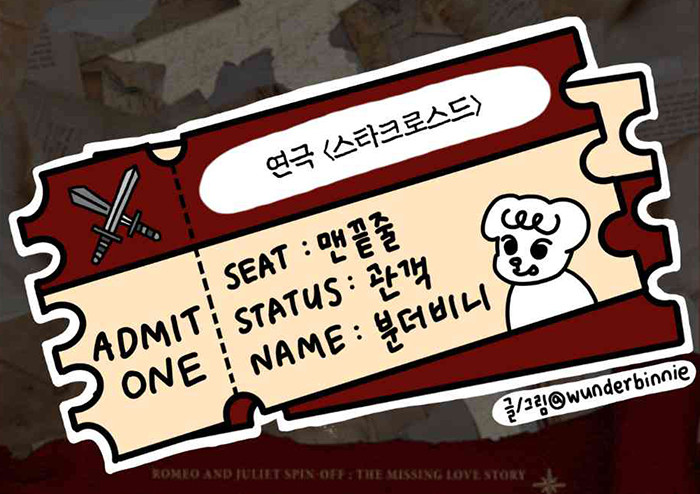





오우아
2018.07.25
장수하늘소
2018.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