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아직도 그 도토리 같은 녀석을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한다. 스물서넛쯤 되었던 그 녀석은 정말 도토리 같이 매끌매끌한 얼굴을 하고선 나에게 쭈볏거리며 다가왔다. 제 몸집 반 만한 배낭을 메고, 또 제 키 반 만한 트렁크를 끌고서였다. 녀석이 나에게 내민 건 시드니 교민잡지였다. 방을 구하고 있던 도토리는 빽빽하게 쓰인 광고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보였다.
“버우드 동네…… 여기로 가고 싶은데…… 잘 못 찾겠어요.”
나는 어이가 없어 웃지도 못했다.
“여긴 브리즈번이거든요. 그쪽이 든 건 시드니 잡지고요.”
도토리는 너무 놀라 눈을 끔뻑거렸다.
가까운 백패커호텔이나 알려줄까 했는데 도토리의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었다. 사실 제 짐은 배낭 하나였다는데 인천공항에서 만난 여자아이가 짐이 적은 도토리에게 트렁크 하나를 맡겼단다. 그러마고 끄덕끄덕 그녀의 트렁크를 맡았는데 둘은 그 비행기가 브리즈번을 경유해 시드니로 간다는 걸 몰랐다. 그러니까 도토리는 브리즈번에서 내려야 하고 여자아이는 시드니로 가는 거였다. 녀석은 여자아이의 이름도, 연락처도 알지 못한 채 그녀의 트렁크를 들고 내렸고 세관에서 걸렸다. 트렁크 안 깍두기 봉지는 다 터져 냄새가 말도 못했고 세관원은 노란 유리병의 정체를 물었다. 알 리 없었던 도토리는 유리병을 살펴보다 맛을 보았다. 매실액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뜯어도 매실액이 영어로 뭔지 알 수가 없었다. 녀석은 세관에서 몇 시간을 붙잡혀 있어야 했다. 김치냄새 풀풀 풍기며 남의 트렁크를 들고 선 도토리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다. 오지랖대마왕 나는 녀석을 일단 집으로 데려갔다. 영어 한 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현금 200만원과 워킹홀리데이 비자만 달랑 들고 떠나온 도토리의 호주 생활 첫날이었다.
도토리는 아무데서나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다운타운의 식당에서도 일했다가 빌딩 청소도 했다. 일을 마친 후에는 동네 꼬마들이나 길거리 노숙자와 종알종알 노닥거렸다. 도토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방식이었다.
“와, 진짜 누나! 세 살짜리한테 계속 파든(Pardon)? 쏘리(Sorry)? 이러기가 얼마나 미안한 줄 알아? 세 살짜리가 나보다 단어를 더 많이 알아!”
브리즈번의 일거리가 동이 나 시드니로 떠날 때에는 녀석을 배웅하면서 눈물이 찔끔 나기도 했다. 나는 조금 지루한 회사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퇴근 후에 도토리와 맥주 한 잔 하고 또 된장찌개도 끓여먹는 재미가 쏠쏠했기 때문이었다. 언제건 전화만 하면 불 나간 전구도 고쳐주고 무거운 화분도 번쩍번쩍 옮겨주던 녀석이었는데.
도토리는 두어 달 후에 다시 돌아왔다. 그동안 빵공장에서 일을 했다며 우쭐한 얼굴로 내 주머니에 100달러 지폐를 쓱 넣어주었다. 그동안 맥주도 함께 마셔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도토리의 이름이 쓰인 100달러 지폐를 아주 오래도록 간직했다. 참, 시드니의 도심거리를 걷다가 깍두기 트렁크의 여자아이와 우연히 마주쳤다고 했다. 그래서 무사히 돌려주었단다. 물론 깍두기는 우리가 다 먹었고 매실액은 세관에게 빼앗겼지만. (도대체 매실액을 왜 호주까지 챙겨갔을까, 그녀는.)
“이제 농장엘 가려고. 파신을 만날 거야. 나도 주천을 달성해야지.”
“파신? 그게 뭐야? 주천은 또 뭐고?”
브리즈번 근교에 있는 파 농장엘 가면 하루 종일 파를 뽑는 일을 해야 하는데, 파를 너무 잘 뽑아 ‘파신’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한국인 여자가 있다고 했다. 그녀는 주천, 그러니까 주당 1000달러를 벌고 있단다. 파신은 한국인 워홀러들에게 신적인 존재라고 했다. 공부는 안 하고 파나 뽑겠다는 도토리의 등짝을 나는 철썩철썩 때렸다.
20대 초반 도토리는 이제 십여 년이 지나 아들 둘을 키우는 아빠가 되었다. 고작 길거리에서 영어를 주워들었는데도 녀석은 반도체 회사의 해외영업팀에서 일을 하며 온 나라들을 뛰어다니는 중이다. 몇 년 전 만나 서울에서 술잔을 기울이다 내가 100달러 지폐 이야기를 꺼냈더니 녀석은 나 몰래 내 지갑에다 다시 100달러 지폐를 넣어두었다. 다음날에야 그걸 발견하고 나는 그만 코끝이 찡해지고 말았다. 끝끝내 귀여운 녀석.
 |
 |
장강명의 『한국이 싫어서』를 읽었을 때, 나는 까르르 많이도 웃었다. 그래, 나 이거 알아. 이런 마음 잘 알아. 그때 그곳에서 만났던 친구들은 나에게 왜 호주 이야기를 소설로 쓰지 않느냐고 자주 물었다. 그럴 때면 내가 대답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실감나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난 그것만큼 눈물나게 잘 쓸 자신이 없어.”
나는 종종 그곳에 두고 온 내 어설픈 청춘에 대해 돌아보곤 한다. 잘 있을까, 그 시절의 나는 그곳에서 아직 잘 지낼까. 장강명은 그런 나에게 대답을 해준 것 같았다. 잘 있다고, 당신의 청춘은 여기 그 모습 그대로, 파드닥파드닥 건강하다고.

-
한국이 싫어서장강명 저 | 민음사
『한국이 싫어서』는 20대 후반의 여성이 회사를 그만두고 호주로 이민 간 사정을 대화 형식으로 들려주는 소설이다. 모든 부분에서 평균 혹은 그 이하의 수준으로 살아가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꿈꾸지 못하는 주인공이 이민이라는 모험을 통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가는 과정을 담았다.
한국이 싫어서
출판사 | 민음사

김서령(소설가)
1974년생. 2003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소설집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라』, 『어디로 갈까요』와 장편소설 『티타티타』, 그리고 산문집 『우리에겐 일요일이 필요해』를 출간했으며 번역한 책으로 『빨강 머리 앤』이 있다.










![[인터뷰] 조예은 “소외되거나 경계 밖에 있는 존재들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게 이야기의 의무라고 생각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05-6c7f6d08.jpg)
![[리뷰] 우리 마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3-e55e0e7e.jpg)
![[여성의 날] 도착하지 못하는 편지는 사라지는가?](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05-cb50d7a2.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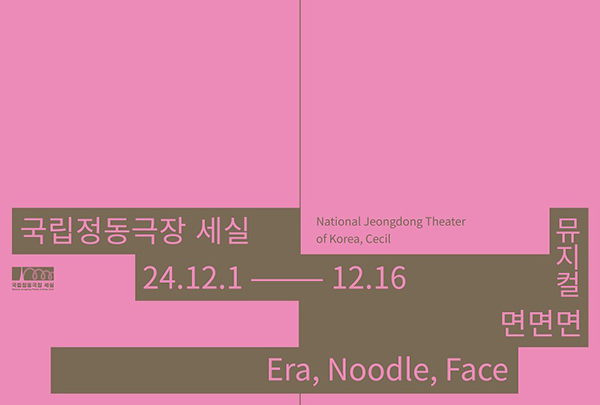
![[Do you know? 황석영] 살아있는 한국 현대사](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4/d/9/8/4d98feddee96d5c0d564cb961340f6b6.jpg)




공룡엄마
2016.08.23
important
2016.08.11
jeyfree
2016.08.10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