눕기의 기술을 다룬 책이라고? 눕는 데 무슨 기술이 필요해? 그건 배우지 않고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냐? 이 책을 집어들었을 때 스친 생각들이다. 브루너는 눕기, 인류의 익숙한 관습으로 굳어진 이 수평 자세, 누워서 자고 꿈꾸고 사랑하는 눕기의 문화사를 엮는다. 눕기와 관련된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국면들에 대한 고찰은 물론이거니와 눕기의 고고학, 눕기의 동양적 뿌리, 침실과 눕는 습관의 현장 연구, 여행 중에 눕기, 낯선 사람과 함께 자기 따위 시시콜콜한 측면들을 야심만만한 시선으로 더듬는다. 브루너는 침대와 수면에 대한 연구와 눕기의 여러 측면들과 올바르게 눕기에 대한 숙고를 거쳐 문명이 눕기에 덧씌운 부당한 의심들을 벗겨내고 눕기를 옹호하는 기발한 책을 써낸 것이다.
이 책은 눕기에 대한 내 최초의 독서다. 눕지 않는 사람은 없다. 부지런한 사람이더라도 하루 중 일부는 잠을 자려고 눕는다. 불면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 그럼에도 이 분야의 책이 없었던 것은 눕기가 숙고를 자극하지 않는 탓이다. 눕기는 숙고가 필요 없는 행위다. 책을 보기 전까지 나도 그랬다. 책을 본 뒤 생각을 고쳐 먹었다. 눕기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국면들이 누운 자세에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솔한 짓이다. 탄생, 성교, 죽음. 이것들은 누운 자세에서 치르는 인생의 중요한 의례들이다. 눕기는 뜻밖에도 복잡한 생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사람들은 잠자려고 침상이나 바닥에 눕는다. 밤마다 눈꺼풀에 쏟아지는 잠. 사람들은 제 인생의 3분의 1을 누워서 보낸다.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며 굳이 이걸 줄이려는 시도가 없지는 않다. 누운 자세는 한 마디로 어깨뼈, 척추, 골반, 발꿈치를 지면에 수평으로 대고 몸을 이완하는 자세다. 식사를 할 때, 누군가와 계약을 하고 서명을 할 때, 도구를 들고 일할 때, 대개는 척추를 꼿꼿하게 세워야 한다. 누운 자세는 노동과 과업들을 다 마친 뒤 휴식과 잠을 취하려 할 때의 자세다. 누운 자세는 신체 에너지 소모가 가장 작은 자세다. 서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힘을 써야 하고 신체의 균형을 잡기 위해 긴장한다. 서 있는 것은 끊임없이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는 자세인 것이다.
누운 자세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다. “누운 자세는 가장 원초적인 자세이며, 우리로 하여금 원시적 존재로서의 생활 방식을 떠올리게 한다.”(16쪽) 눕는 것은 활동적 삶과는 반대되는 자세다. 눕기는 잠과 휴식을 위한 비활동적인 자세로 흔히 “피곤, 냉담, 의욕 결여, 게으름, 어정쩡함, 수동성, 휴식” 같은 낱말들과 연관된다.(85쪽) 눕기의 기술은 머묾의 기술이다. 사람이 누우려면 행동이나 하던 일을 멈추고, 정동(靜動) 속에 웅크려야만 한다. 대개는 잠을 자려는 자, 아픈 자, 피로한 자들이 눕는다. 사지를 뻗고 편안하게 누움으로써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고 탈진된 신체와 자아에 새로운 힘을 충전시키려 한다.
누운 자세로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누운 사람은 대개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누운 자들은 게으름과 나태에 빠진 사람으로 오인되는 까닭에 눈총을 받는다. 그것은 누운 자세가 “해이하고 유약하며 의욕이 부족한 것”으로 비치고, 누워서 보내는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19쪽). “측정 가능한 성과를 중시하고, 순발력 있는 행동으로 결단력을 보여줘야 하며, 책상이나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걸로 근면함을 입증해야 하는 우리 사회에서 누운 자세는 푸대접 받기 일쑤다. 누운 자세는 게으름의 표현이자,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무능력의 소산으로 여겨진다.”(10쪽) 예전이나 지금이나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빈둥거리는 시간을 그다지 명예로운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나태하거나 무능력자로 낙인 찍힌다.
침대는 인류가 눕기 위해 고안한 도구다. 침대는 탄생과 죽음 사이의 여러 국면들에서 도피와 휴식, 그리고 잠을 위해 꼭 필요한 물건이다. 침대는 “존재의 무의식적 차원으로 퇴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소”(128쪽)이자, 잠을 자는데 필요한 도구다. 어디 그뿐인가! 그것은 누워서 시작하고 누워서 끝내는 인생의 동반자다. 인생을 진지하게 궁구하는 자라면 침대에 대한 숙고는 당연하다. 삶이 죽음을 대가로 얻는 것이라면 잠은 깨어 있음을 대가로 지불하고 얻는 소득이다. 적당량의 수면은 최상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다. 브루너는 지구자기장과 신경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머리를 북쪽에 두고 다리는 남쪽으로 두고 자는 게 좋은 자세라고 안내한다. 그래야만 자기력이 머리에서 다리 방향으로 지나간다는 것이다. 양질의 잠은 생기를 북돋우고, 강건한 삶의 필요 조건이다. 분산된 생각과 쪼개진 내면을 다독이고 봉합하는 잠을 잘 수 없다면 심신의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쾌적하고 충만한 삶도 불가능하다.
눕는 것은 신체에 쌓인 피로를 씻어내거나, 기분 전환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다. 사람은 때때로 기분 전환을 필요로 한다. 결국 눕기에 대한 숙고는 죽음에까지 뻗어간다. 직립보행을 하던 사람들은 죽은 뒤 아무 말없이 관 속에 수평 자세로 얌전하게 눕는다. 눕는 것은 죽은 자의 일이다. 무덤 속에는 얼마나 많은 자들이 누워 있는가! 눕기의 기술은 존재의 여러 기술들과 합쳐진다. “무위의 기술, 겸손의 기술, 누림의 기술, 휴식의 기술, 또한 그 유명한 사랑의 기술과 말이다.”(206쪽) 눕기의 기술이 그 심오함을 얻는 것은 그것이 다른 것들과 겹쳐지며 존재의 기술로 전환할 때다.
슬라보예 지젝이나 페터 슬로터다이크 같은 철학자들은 눕기의 태만성에 숨겨진 효용성을 우리가 생각지 못한 국면에서 찾아낸다. 눕기는 만연한 성과주의에 대한 태업이다. 침대에 가능한 한 오래 머물러 있으라. 스스로를 성과기계로 내몰아 자발적인 자기 착취에 나서도록 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음모에 속지 마라. “신자유주의적 체제는 자신의 강제 구조를 개개인이 누리는 가상의 자유 뒤로 숨긴다.”(한병철, 『에로스의 종말』, 31쪽)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간계에 쉽게 속는다.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 자리에 벌러덩 누워라. 눕기는 피착취자를 착취자로 둔갑시키는 이 기괴한 음모, 착종된 폭력에 맞서 싸우는 유력한 방식이다.

-
눕기의 기술베른트 브루너 저/유영미 역 | 현암사
대체 왜 이렇게 구구절절 변명을 덧붙이는 걸까? 아무 일 없이 눕는 것은 게으름의 상징이며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일일까? “나는 눕고 싶어서 누웠을 뿐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걸까? 『눕기의 기술』은 바로 이런 물음에서 탄생했다. 저자는 인간에게 수평 자세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역사, 철학, 문학, 과학, 인문학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며 지적인 탐색을 거듭한다. 어떤 방향으로 누워야 할지, 고대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잠자리를 마련했는지, 어떻게 누워야 잘 누웠다고 소문날지… 인류 탄생 이후부터 이어진 다양한 눕기에 대한 유쾌한 읽을거리가 가득한 책이다.
[추천 기사]
- [IT 특집] 정말로 IT판 뒤흔드는 클라우드
- 기시미 이치로 “지금을 즐기는 것이 살아가는 것!”
- 간혹 보이는 빈틈은 매력적이다
- [출판계 사람들] 지속 가능한 일을 하고 싶었다
- 『오베라는 남자』 프레드릭 배크만, 내가 소설을 쓰게 된 이유

장석주(시인, 『일상의 인문학』저자)
『일상의 인문학』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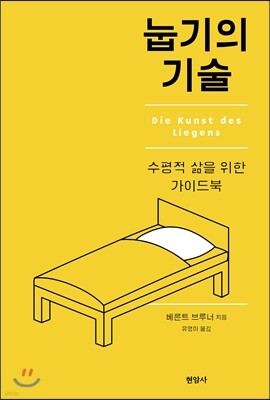

![[취미 발견 프로젝트] 몸 속부터 구석구석 건강하게 채우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26-198e08d9.jpg)



![[취미 발견 프로젝트] 잘 가 2024년, 어서 와 2025년!](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7-077b205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