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울음을 찾아서
내가 태어났을 때, 왜 그렇게 울었나 몰라. 엄마가 너무 예뻐서였을까, 아님 나를 바라보며 울고 있어서였을까. 어쩌면 내가 먼저 울었고 엄마가 따라 울고 그래서 내가 더 울고. 아무튼 나는 엄마처럼 울었다. 아닌가, 엄마가 나처럼 울었을까. 너무 심하게 울어서 엄마는 아이가 연탄을 잘못 마셨나 생각했을 정도였다. 귀신이 씐 건지도 모른다고까지. 그 정도로 울면 여러 사람에게 폐를 끼치기 마련이다. 옆집 개마저 나를 싫어할 정도였다.
결국 굿판을 벌였다. 귀신을 믿은 것이다. 귀신이라니, 나 원 참. 색동옷을 입은 무당이 우렁차게 울고 있는 갓난 애기 앞에서 무슨 말을 했을지 상상이 안 간다. 훠이 물러가라. 죽은 자는 저승으로 산 자는 이승으로. 뭐 이런 구호가 아니었겠나.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신명나는 굿을 펼쳤을 테지만 전혀 기억하지 못해 못내 아쉬울 따름이다. 구름이 한 곳으로 모이고, 새들이 지저귐을 멈추며, 풀벌레가 숨을 죽였다. 무당이 나를 중심에 두고 강강술래 동작으로 십여 바퀴를 미친 듯이 돌자, 나는 거짓말처럼 울음을 뚝 그쳤다고 한다. 정말이다, 참 나 원. 내가 나라를 잃은 사람처럼 목 놓아 울었기 때문에 편도에는 작은 알맹이가 생겼다. 나는 학창 시절 내내 목이 쉬어 지냈다. 그럼에도 밴드부와 합창부에서 열성을 보였다. 나는 탁한 목소리로 포효하듯 노래 불렀다. 나는 이름 없는 밴드의 철지난 보컬이자 유일한 관객이자 밤하늘의 슈퍼스타. 그런데, 내 울음은 어디로 간 거지. 내가 불렀던 모든 노래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 내 목은 아직도 쉬어 있는데.
최초의 울음을 찾고 싶다. 처음으로 빛을 본 그 순간에의 울음을. 그 울음은 어디로 스며든 걸까, 완전히 소멸된 걸까. 어딘가에 있다면 그곳은 영도일 것만 같다. 부산의 섬, 나의 고향 영도. 영도의 본 이름은 절영도(絶影島)다. 절영이란 것은 그림자가 끊어진다는 뜻인데, 영도는 조선시대에 말을 키우던 목도(牧島)였다. 이 섬에서 기르는 말들은 바다를 가로질러 천마산(天馬山. 부산 서구 남부민동과 사하구 감천동의 경계에 솟아 있는 산)으로 대마도(對馬島)로 뛰어다녔다.(바다를 가로질렀다니 날아다녔다는 표현이 옳겠다) 말이 얼마나 빨랐기에 그림자가 끊어진다는 이름이 붙었을까. 그렇다면, 주인을 잃은 그림자는 어디로 가버린 거지. 절(絶)이라는 글자와 함께 사라져 버린 것일까. 달리는 말은, 나의 울음과 그 시절의 빛과 바람과 냄새와 모든 게, 어디로.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지. 흐르는 것은 바다이며, 남은 것은 섬이다.
영도로 들어가는 모든 길

영도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면 된다. 부산역에서 혹은 그 반대방향이라도 영도로 가는 버스는 많다. 내가 아는 번호만 해도 거의 스무 개나 된다. 어떤 버스를 타든지, 영도다리나 부산대교를 거치게 된다. 영도다리와 부산대교는 남포동과 중앙동으로 각각 이어져 있다. 두 개의 다리는 거뜬하게 수십 대의 버스를 버텨낸다. 정말이지 이 두 개의 다리는 육지로 발을 뻗은, 사람의 다리 같기도 하다. 가랑이처럼 두 갈레로 쭉 뻗어 나가는. 다리 밑에서 나를 주워왔대도 좋다. 틀린 말은 아니니까.
1934년 준공된 영도다리는 옛 모습을 되찾아 하루에 15분 동안 도개교의 위용을 자랑하게 되었다. 80년 만에 영도대교로 개명까지 했다. 영도다리는 피난민의 상처가 남은 자리다. 상처는 옅어지고 흐려졌지만 잊히지 않았다. 딱딱한 굳은살로 남아 하나의 역사가 되었다. 그래서일까, 하늘로 치솟은 다리의 중심이, 그려진 갈매기의 비상이 더욱 힘차게 보인다. 부산대교 역시 개항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은 다리로 순수한 우리 기술에 의한 것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어느 다리에 서건, 밤바다는 술을 부른다. 바람에 실린 바다 냄새는 공짜 안주다.
영도로 통하는 다리는 아직 두 개나 더 남았다. 송도를 잇는 남항대교와 남구 감만동과 연결하는 부산항대교가 그것이다. 하지만 승용차는 영 내키지 않는다.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지하철을 기대하며 영도로 여행을 떠나온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영도는 여의도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색적인 방법으로 영도를 방문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영도로 들어가는 단 하나의 길

결국 선택한 것은 자전거였다. 자전거의 체인에 기름을 두르고 바퀴를 돌렸다. 덜커덩거리며 체인이 꼬이는가 싶더니, 이내 태엽처럼 맞물리며 바퀴를 굴렸다. 브레이크를 확인하고, 페달을 밟았다. 자전거를 선택한 이유는 태양 때문이었다. 『이방인』의 뫼르소도 아니고, 태양 때문이라니. 그런 날이 있다. 모든 게 태양 때문인 것만 같은. 그런 날에는 자전거를 타야 한다. 아무리 힘차게 페달을 밟아도 자전거의 속력은 그림자를 끊어내지 못했다. 그림자는 끈질기게 뒤따라왔다. 절영도라 불렸을 땐, 말이 그림자를 끊어놓을 정도로 빨랐다는데. 그건 거짓말일 것이다. 무당의 신력으로 나의 울음을 멈췄다는데. 그것도 거짓말일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런 거짓말이 좋다. 그렇다면 거짓을 하나 더 보태야겠다. 영도는 시간이 멈춘 섬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론 진실이다. 내가 살던 동네와 골목과 주변의 표지판들이 여전히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십년이, 이십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 것들이 영도엔 있다. 학교 앞의 간판 없는 비빔라면 집은 여전히 달콤하고, 오백 원짜리 시장 파전은 여전히 고소하며, 바다는 늘 짜다. 장선우 감독이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을 찍었을 때, 나는 우연히도 촬영을 진행하는 부둣가를 산책하고 있었다. 주인공인 신비소녀 임은경 씨는 한창 인기몰이를 하던 신인이었다. 나는 달려들어 자세히 보려 했지만 스텝에 가로 막혀서 차창 안만 들여다볼 수 있을 뿐이었다. 지미짚 카메라와 차량을 통제하던 스텝과 검은색 차와 그 안에 있던 한 연예인과 그 밤. 그로부터 십년이 훌쩍 넘어선 시간, 나는 자전거로 그 길을 달렸다.
내가 살았던 집으로 가는 골목을 걸었다.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기도 힘든 좁은 골목에선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곳엔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다. 어린 시절 그 구멍가게는 친구들과 나의 아지트였다. 마스코트라는 고무인형의 종류가 가장 많은 가게였는데, 친구들은 이백 원에 네 개를 사면서 몰래 하나씩 더 가져오곤 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아는지 모르는지 파리채만 들고 있었는데, 나는 그 파리채가 무서워서 제값을 치르고 나왔다. 우리는 슈퍼 옆 벽에 한 줄로 서 있었다. 마스코트를 벽에 던져서 가장 멀리 튕기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것 때문에 슈퍼 옆 벽에, 페인트칠이 벗겨지곤 했다.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마스코트의 상태였지, 벽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칠이 벗겨진 벽이었으며, 더 이상 이 좁은 골목에서 마스코트를 던질 수 없을 정도로 커버린 내가 있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슬퍼졌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다. 나는 그 미묘한 감정 속에 서 있었다.
어디에선가, 소리가 들려왔다. 내게 익숙한 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까진 시간이 걸렸다. 그것은 골목을 호령하던 친구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였다. 어디선가 방역 할아버지의 방구소리도 들려왔다. 우리는 하얀 연기를 내뿜는 할아버지를 뒤따라 행진했다. 더 이전의 소리도 들려왔다. 재첩국 할머니가 골목사이를 돌며 새벽을 알리고 있었다. 곤히 자고 있던 나는 눈을 부릅뜨곤 또다시 울어댔겠지. 어머니는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로 나를 달래고, 옆집 개는 짖어대고. 파도와 겹쳐져 들려오는 섬의 소리, 그곳의 노래. 그건 섬 안에서 일어난 모든 소리이자, 동시에 누구도 아닌 그저 섬의 목소리였다.
모든 울음은 역사가 된다. 역사는 하나의 울음에서 비롯된다. 이제 막 태어날 아이의 울음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기게 될 것인가. 그 울음은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다. 소년이 남자가 되는 이야기는 흔해빠졌다. 남자가 소년이 되는 순간,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된다. 나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이야기를 믿고 있다. 과연 영도에 살았던 남자는 소년이 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는 바다가 될 것이다. 아니면 그는 영도가 되겠지. 나는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관련 기사]
- 저녁이 아름다운 섬, 통영 추도 미조 포구
- 프랑스 깐느의 밤의 연주회
- 프랑스 니스 해변을 사랑한 당신들
- 어란 여인과 해남 땅끝 포구
- 호주 시드니, 이국과 바다라는 모국 1

오성은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
씨네필
문학청년
어쿠스틱 밴드 'Brujimao'의 리더.






![[정기현 칼럼] 잠깐 있다 가는 공룡 발자국](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16-cd2340f4.jpg)
![[리뷰] 몸보다 오래 살아남은 기억에 관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9-2d5391b0.jpg)
![[큐레이션] 사랑을 들려주는 동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8-0e17604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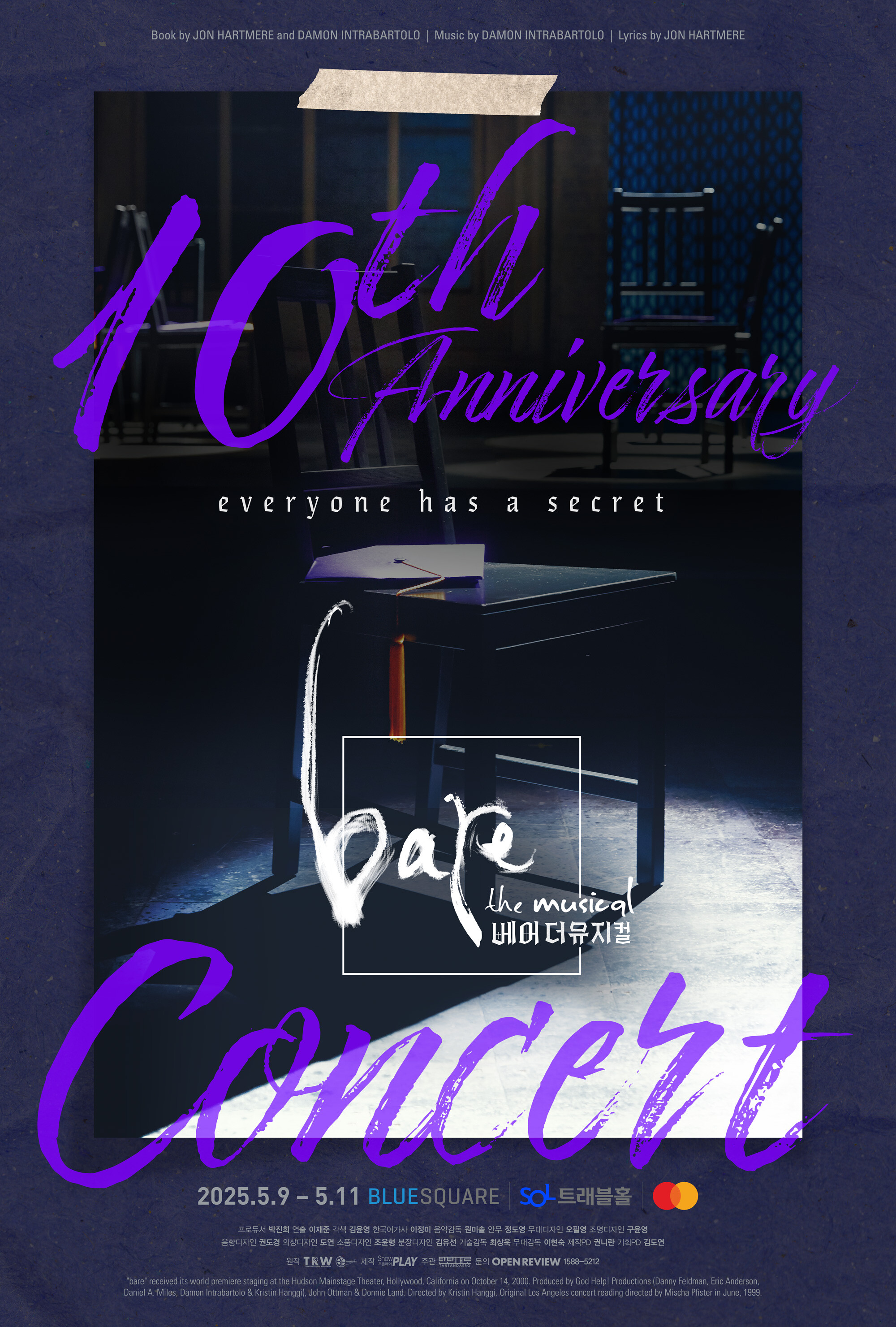





서유당
2014.05.22
inee78
201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