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남들의 감성 발라드, 이번에는 봄 노래! - 투에이엠, 스트록스, 스트라입스
투에이엠은 참 기복이 없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음악으로 많은 팬 층의 사랑을 받아 왔죠. 그러나 이번 앨범은 인디 뮤지션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접근을 꾀했다고 하는데요. 발매 당시인 3월 초보다도, 요즘 같은 ‘진짜’ 봄에 더 어울리는 음반이기도 합니다.
2013.04.11
투에이엠은 참 기복이 없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음악으로 많은 팬 층의 사랑을 받아 왔죠. 그러나 이번 앨범은 인디 뮤지션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접근을 꾀했다고 하는데요. 발매 당시인 3월 초보다도, 요즘 같은 ‘진짜’ 봄에 더 어울리는 음반이기도 합니다. 줄리안 카사블랑카스의 지속적인 모험이 계속되는 스트록스의 신보와 평균 15살의 나이로 초기 1950년대의 리듬 앤 블루스를 들려주며 음악 신에 ‘갑툭튀’한 스트라입스의 신보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투 에이엠(2AM) < 어느 봄날 >
3년만의 정규 앨범은 봄의 색으로 가득하다. 여타의 아이돌들과 달리 새벽 두 시의 감성을 노래하겠다는 자신들의 기치에 봄을 덧입혀 이전과는 또 다른 느낌을 만들어냈다. 멤버들의 목소리는 보다 여유로워졌으며, 그리움과 아련함, 설렘과 같은 감정들은 그 안에서 자연스레 흘러간다.
정규 1집과 비교해보면 앨범의 빛깔은 한층 다양해졌다. 우선 인디 신과의 만남이 돋보인다. 에피톤 프로젝트와 노리플라이 권순관의 참여는 이 앨범에 일반적인 아이돌 앨범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력을 더했다. 여기에 이루마와 2FACE가 결성한 작곡가 팀 마인드 테일러, 타이틀 곡 「어떤 봄날」의 김도훈을 비롯하여 많은 작사, 작곡가진이 힘을 보탰으며, 멤버인 이창민도 자작곡을 실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근거림과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겹쳐지는 봄의 감성에 딱 맞게, 앨범을 끌어가는 감정의 두 축은 그리움과 설렘이다. 「너를 읽어보다」, 「어떤 봄날」, 「그때」, 「그대를 잊고」 등에서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려진 그리움을 느껴볼 수 있다. 에피톤 프로젝트 특유의 애잔한 감성이 돋보이는 「너를 읽어보다」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임슬옹의 감미로운 보컬이 곡의 분위기와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빛을 발한다.
타이틀 곡 「어떤 봄날」에서는 새 봄의 이사 풍경과 지나간 날의 추억을 중첩시킨 가사가 인상적이다. 피아노 선율과 현악 스트링이 빚어내는 따스한 사운드 위에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며 점차 고조되는 곡의 감정은 ‘괜찮아, 모두 다 여기 놓고 가면 돼. 추억들 흔적들 모두.’ 라는 가사에서 극에 달함과 동시에 애잔함을 남기며 정리된다.
한편 「Sunshine」, 「내게로 온다」 등은 말 그대로 ‘봄 노래’다. ‘My sunshine 매일 꿈을 꾸는듯해 Like a sunshine 내겐 보석 같은 너이기에 난 이렇게 약속해 사랑해’(Sunshine), ‘내게도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찾아 올 것만 같아서 느낌이 좋은걸 더 이상 아픔은 없다 그저 웃는다’(내게로 온다)와 같은 가사에서도 느껴지듯, 기분 좋은 ‘달달함’과 두근거림이 두 곡을 채우고 있다.
이처럼 대비되는 양 극의 감정을 넘나들면서도 자신들의 색깔과 ‘봄’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앨범의 흐름을 통일성 있게 유지해낸다. 무난하게 대중의 취향에 부합하는 음악을 해야 하는 아이돌로써의 본분도 이로써 성취된다. 화려함으로 무장하지 않더라도 방향성이 확실하면 아이돌로서 충분히 생명력을 지닐 수 있음을 증명해보이며 자신들만의 입지를 다시 한 번 굳건히 했다.
스트록스(Strokes, The) < Comedown Machine >
호불호가 갈릴 앨범이다. 전작 < Angles >까지 이어지는 밴드의 변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면 이번 앨범 역시 만족스럽게 다가오겠지만, 가죽점퍼와 스니커즈를 착용하고 「Soma」나 「Barely legal」, 「Someday」를 부르는 뉴 밀레니엄의 CBGB 뉴욕 밴드 < Is This It? > 시절을 품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번에도 불만을 표할 공산이 크다. 이 말은, 스트록스(The Strokes)의 모든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줄리안 카사블랑카스(Julian Casablancas)가 여전히 모험을 하고 있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2년 전 음반 < Angles >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데뷔작 < Is This It? >부터 세 번째 작품 < First Impression Of Earth >까지 앨범 크레디트에 명시된 송 라이터의 권력은 모두 줄리안 카사블랑카스에게 집중되어있었다. 일임 구조가 바뀐 것은 < Angles >부터였다. 당시 부클릿에는 전 트랙 작곡, 편곡자가 밴드 스트록스로 올라있었고 늘 실려 있던 프론트 맨 혼자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독단의 체제가 옅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문제는 ‘옅어지는 것처럼 보였다’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당시의 리드 싱글 「Under cover of darkness」만 해도 초기의 사운드가 다시 돌아오는 듯 했다. 그런데 웬걸, 앨범 속 실상은 실로 기상천외했다. < First Impression Of Earth >에서도 물론 어느 정도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지만 이 시기에 비할 데는 아니었다. 첫 트랙 「Machu Picchu」는 앨범의 포문을 엶과 동시에 ‘예상 밖’이라는 복선을 깔아두었고 「You're so right」와 「Game」에 닿아서는 당혹스러운 펀치를 날렸다. 2009년의 솔로 앨범 < Phrazes For The Young >을 통해 줄리안 카사블랑카스가 뉴웨이브와 신스 팝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인 줄은 예상할 수 없었다.
올해 1월 비공식 싱글로 발표한 「One way trigger」에는 큰 의미가 담겨있다. 우선 스트록스라는 밴드에게는 프론트 맨 중심의 변화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공표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아하(A-ha)의 히트 싱글 「Take on me」를 연상시키는 멜로디 라인이 곡 전체를 지배했고 루 리드(Lou Reed)를 닮은 중저음 보컬은 팔세토의 단계로 올라있었다. 무엇보다도 신디사이저 톤이 강하게 밴 사운드는 개러지로 빚은 거친 이미지를 적잖이 무디게 했으니 스트록스 팬들을 포함한 음악 애호가들에게는 혼선을 일으키기 충분했다.
첫 공식 싱글 「All The Time」에 밴드 특유의 멜로디컬한 이미지를 잘 담아냈다 해도 「One way trigger」의 잔상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다. 리드 싱글을 언급하면서 「One way trigger」 이야기는 계속해서 따라붙었고, 십여 년 전으로의 회귀보다는 여전히 기대 밖의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월 말, 막 꺼내 본 신보의 알맹이에는 앞서 드러낸 밴드의 예고와 이를 통해 바라본 팬들의 예상이 대부분 일치했다. 펑크(funk) 리듬을 기반으로 드라마틱한 전개를 펼친 첫 트랙 「Tap out」과 「Welcome to Japan」은 물론이거니와 「50/50」, 「Partners in crime」과 같은 곡들에서도 뉴웨이브의 흔적이 묻어났다.
그러나 이번 앨범을 높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변칙을 담은 트랙들과 기존의 사운드를 구현한 트랙들이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 있다. 「Tap out」과 「One way trigger」가 어슷한 진행 속에서도 선율을 잃지 않는다면, 속도감이 돋보이는 「80's comedown machine」과 「Chances」와 같은 로큰롤 넘버에서는 앨범 전반에 칠해진 모노톤의 컬러도 같이 느껴진다. 특히 「Snow animals」는 양립하는 이러한 두 특성을 적절히 중재시킨 곡으로 불규칙한 리듬과 구조를 기반으로 감각적인 멜로디를 동시에 살려내 이목을 잡아끈다. 곡사이의 간극이나 마찰이 쉽사리 느껴지지 않는다.
닉 발렌시(Nick Valensi)와 알버트 해먼드 주니어(Albert Hammond Jr.)의 기타 연주도, 저음과 고음을 원활히 오가는 줄리안 카사블랑카스의 보컬도 앨범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인들이나 프로듀서 거스 오버그(Gug Oberg)의 역할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알버트 해먼드 주니어의 독집들을 프로듀싱하며 이미 밴드의 사운드를 적잖이 이해한 그는 한 차례 큰 변화를 가졌던 < Angles >에서도 믹싱 콘솔 앞의 조율자로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 이번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칫하면 산만해질 수도 있는 결과물들 사이에서 집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데에는 밴드의 재능만큼이나 프로듀서의 역량도 주효했다.
내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 Comedown Machine >은 분명 수작이나 앞서 언급했던 호불호가 갈린다는 외적인 특성이 앨범의 발목을 잡는다. 스트록스 디스코그래피를 훑어오며 변해가는 추이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수긍하며 넘길 수 있는 음반이나 개러지의 깃발에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역시나 마음에 들지 않을 작품이다.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의 입장에도 십분 고개를 끄덕이지만 대중에게 모습을 선보이는 자리에 있다면 사람들의 수요도 어느 정도 이해해야하지 않던가. 팝 예술가의 역할론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하는 지점이다.
점수를 어느 정도 거두어 가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 자리한다. 프론트 맨 중심의 매커니즘은 실로 성과율이 높다. 독단이 크게 과격해지지만 않는다면 여러 방향으로 쉬이 치우치지도 않을 뿐더러 일정 무게를 유지한 채로 완성도 높은 결과물들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허나 그 중심에서의 욕심이 과해질 시에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온다. 시스템의 원동력 자체를 부정하며 이번 작품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아니다. 스트록스의 다섯 번째 앨범은 훌륭하기 그지없다. 다만 균형 있는 스탠스에 대한 아쉬움이 공존할 뿐이다.
스트라입스(Strypes, The) < Blue Collar Jane > (EP)
스트라입스(The Strypes)의 음악은 초기 리듬 앤 블루스다. 댄서블한 비트를 타는 블루스 코드의 사운드 속에서는 그 옛날 척 베리(Chuck Berry)의 로큰롤을 떠올릴 수 있고 1960년대 초반에 보여주었던 롤링 스톤스(The Rolling Stones)의 데뷔 시절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새천년을 기점으로 컨템포러리 블루스 뮤지션들이 등장하는 추세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잭 화이트(Jack White)나 존 메이어(John Mayer), 개리 클락 주니어(Gary Clark Jr.) 같은 솔로 뮤지션들은 물론, 블랙 키스(The Black Keys)처럼 밴드로 나서 리바이벌 프로젝트에 가담하는 이들이 결코 적지 않으니 말이다.
문제는 이러한 판도에 10대 청소년들도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기타와 베이스를 각각 잡은 조쉬 맥클로이(Josh McClorey)와 피트 오핸런(Pete O'Hanlon), 드럼의 에반 월시(Evan Walsh)와 보컬 로스 퍼렐리(Ross Farrelly)가 결성한 4인조 아일랜드 밴드 스트라입스는 멤버 모두가 약관도 채 안 된 그야말로 ‘어린’ 그룹이다. 물론 팝 역사에서 틴에이지 아티스트의 데뷔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비슷한 연령대에서 신고식을 치렀던 뮤지션들은 일찍부터 자리했으며 팝 시장에 선봉으로 나서는 케이스도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다. 이들의 시선이 리듬 앤 블루스라는 루츠 음악으로 향해있다는 사실이다. 따라하는 정도였다면 그저 흥밋거리의 하나로 넘겼겠지만 밴드는 로큰롤의 이름으로 리듬 앤 블루스가 확산되던 그 시점의 사운드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앨범 발매에 앞서 블루스의 명인 윌리 딕슨(Willie Dixon)의 곡을 커버한 「You can't judge a book by cover」를 들어보자. 생동감 있는 원곡의 흥취가 스트라입스 버전에서도 그대로 살아있다. 이들의 모습에서 1960년대 중후반 영국을 기점으로 퍼져나갔던 브리티쉬 블루스의 대표주자 롤링 스톤스나 닥터 필굿(Dr. Feelgood)을 느낄 수 있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어린 뮤지션들의 강점은 앞선 음악을 불러 세우는 단순한 복각 작업에만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스트라입스는 옛 사운드를 과거의 소리로 남겨두지 않는 영민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앨범의 타이틀 곡 「Blue collar Jane」에서 드러나는 블루지한 톤이나 로큰롤 리듬, 「I wish you would」에서 주요하게 쓰인 하모니카 소리와 같은 지난 사운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동시에 댄서블한 드럼 비트를 구성해 현대적인 감각도 함께 부여했다. 눅눅하게 다가올 수 있는 1960년대의 재료이건만 그 한계점으로부터 이들은 확실히 탈피했다.
신선하다는 대부분의 반응도, 엘튼 존(Elton Jon)과 제프 벡(Jeff Beck) 같은 유수한 아티스트들이 팬을 자처한 것도 이러한 특성과 맥을 같이한다. 재기어린 이들의 음악에는 쉽사리 눈을 뗄 수 없게 하는 흡인력이 존재한다. 2013년에 나온 작품임에도 반세기 전의 시대와 어울리며 반대로 반세기 전에 가져왔다 해도 수긍이 갈만한 결과물이다. 더불어 10대 청소년이라는 요소 역시 마케팅 전략으로 충분히 구미를 당긴다. 팝 스타들이 즐비한 메이저 레이블 머큐리 레코드 사(Mercury Records)가 이들에게 투자를 선언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충분한 자질이 보인다. 갖가지 음악 차트에서 스트라입스의 이름을 확인할 날이 그리 멀어보이진 않는다.
투 에이엠(2AM) < 어느 봄날 >
3년만의 정규 앨범은 봄의 색으로 가득하다. 여타의 아이돌들과 달리 새벽 두 시의 감성을 노래하겠다는 자신들의 기치에 봄을 덧입혀 이전과는 또 다른 느낌을 만들어냈다. 멤버들의 목소리는 보다 여유로워졌으며, 그리움과 아련함, 설렘과 같은 감정들은 그 안에서 자연스레 흘러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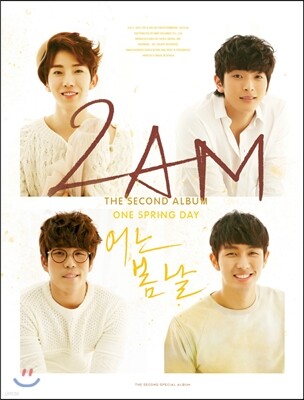 |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근거림과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겹쳐지는 봄의 감성에 딱 맞게, 앨범을 끌어가는 감정의 두 축은 그리움과 설렘이다. 「너를 읽어보다」, 「어떤 봄날」, 「그때」, 「그대를 잊고」 등에서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려진 그리움을 느껴볼 수 있다. 에피톤 프로젝트 특유의 애잔한 감성이 돋보이는 「너를 읽어보다」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임슬옹의 감미로운 보컬이 곡의 분위기와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빛을 발한다.
타이틀 곡 「어떤 봄날」에서는 새 봄의 이사 풍경과 지나간 날의 추억을 중첩시킨 가사가 인상적이다. 피아노 선율과 현악 스트링이 빚어내는 따스한 사운드 위에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며 점차 고조되는 곡의 감정은 ‘괜찮아, 모두 다 여기 놓고 가면 돼. 추억들 흔적들 모두.’ 라는 가사에서 극에 달함과 동시에 애잔함을 남기며 정리된다.
한편 「Sunshine」, 「내게로 온다」 등은 말 그대로 ‘봄 노래’다. ‘My sunshine 매일 꿈을 꾸는듯해 Like a sunshine 내겐 보석 같은 너이기에 난 이렇게 약속해 사랑해’(Sunshine), ‘내게도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찾아 올 것만 같아서 느낌이 좋은걸 더 이상 아픔은 없다 그저 웃는다’(내게로 온다)와 같은 가사에서도 느껴지듯, 기분 좋은 ‘달달함’과 두근거림이 두 곡을 채우고 있다.
이처럼 대비되는 양 극의 감정을 넘나들면서도 자신들의 색깔과 ‘봄’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앨범의 흐름을 통일성 있게 유지해낸다. 무난하게 대중의 취향에 부합하는 음악을 해야 하는 아이돌로써의 본분도 이로써 성취된다. 화려함으로 무장하지 않더라도 방향성이 확실하면 아이돌로서 충분히 생명력을 지닐 수 있음을 증명해보이며 자신들만의 입지를 다시 한 번 굳건히 했다.
글/ 위수지(sujiism@naver.com)
스트록스(Strokes, The) < Comedown Machine >
호불호가 갈릴 앨범이다. 전작 < Angles >까지 이어지는 밴드의 변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면 이번 앨범 역시 만족스럽게 다가오겠지만, 가죽점퍼와 스니커즈를 착용하고 「Soma」나 「Barely legal」, 「Someday」를 부르는 뉴 밀레니엄의 CBGB 뉴욕 밴드 < Is This It? > 시절을 품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번에도 불만을 표할 공산이 크다. 이 말은, 스트록스(The Strokes)의 모든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줄리안 카사블랑카스(Julian Casablancas)가 여전히 모험을 하고 있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2년 전 음반 < Angles >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데뷔작 < Is This It? >부터 세 번째 작품 < First Impression Of Earth >까지 앨범 크레디트에 명시된 송 라이터의 권력은 모두 줄리안 카사블랑카스에게 집중되어있었다. 일임 구조가 바뀐 것은 < Angles >부터였다. 당시 부클릿에는 전 트랙 작곡, 편곡자가 밴드 스트록스로 올라있었고 늘 실려 있던 프론트 맨 혼자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독단의 체제가 옅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문제는 ‘옅어지는 것처럼 보였다’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당시의 리드 싱글 「Under cover of darkness」만 해도 초기의 사운드가 다시 돌아오는 듯 했다. 그런데 웬걸, 앨범 속 실상은 실로 기상천외했다. < First Impression Of Earth >에서도 물론 어느 정도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지만 이 시기에 비할 데는 아니었다. 첫 트랙 「Machu Picchu」는 앨범의 포문을 엶과 동시에 ‘예상 밖’이라는 복선을 깔아두었고 「You're so right」와 「Game」에 닿아서는 당혹스러운 펀치를 날렸다. 2009년의 솔로 앨범 < Phrazes For The Young >을 통해 줄리안 카사블랑카스가 뉴웨이브와 신스 팝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인 줄은 예상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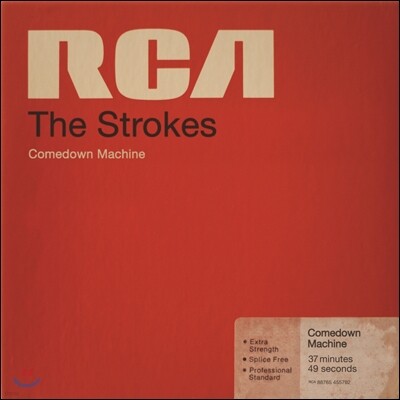 |
첫 공식 싱글 「All The Time」에 밴드 특유의 멜로디컬한 이미지를 잘 담아냈다 해도 「One way trigger」의 잔상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다. 리드 싱글을 언급하면서 「One way trigger」 이야기는 계속해서 따라붙었고, 십여 년 전으로의 회귀보다는 여전히 기대 밖의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월 말, 막 꺼내 본 신보의 알맹이에는 앞서 드러낸 밴드의 예고와 이를 통해 바라본 팬들의 예상이 대부분 일치했다. 펑크(funk) 리듬을 기반으로 드라마틱한 전개를 펼친 첫 트랙 「Tap out」과 「Welcome to Japan」은 물론이거니와 「50/50」, 「Partners in crime」과 같은 곡들에서도 뉴웨이브의 흔적이 묻어났다.
그러나 이번 앨범을 높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변칙을 담은 트랙들과 기존의 사운드를 구현한 트랙들이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 있다. 「Tap out」과 「One way trigger」가 어슷한 진행 속에서도 선율을 잃지 않는다면, 속도감이 돋보이는 「80's comedown machine」과 「Chances」와 같은 로큰롤 넘버에서는 앨범 전반에 칠해진 모노톤의 컬러도 같이 느껴진다. 특히 「Snow animals」는 양립하는 이러한 두 특성을 적절히 중재시킨 곡으로 불규칙한 리듬과 구조를 기반으로 감각적인 멜로디를 동시에 살려내 이목을 잡아끈다. 곡사이의 간극이나 마찰이 쉽사리 느껴지지 않는다.
닉 발렌시(Nick Valensi)와 알버트 해먼드 주니어(Albert Hammond Jr.)의 기타 연주도, 저음과 고음을 원활히 오가는 줄리안 카사블랑카스의 보컬도 앨범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인들이나 프로듀서 거스 오버그(Gug Oberg)의 역할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알버트 해먼드 주니어의 독집들을 프로듀싱하며 이미 밴드의 사운드를 적잖이 이해한 그는 한 차례 큰 변화를 가졌던 < Angles >에서도 믹싱 콘솔 앞의 조율자로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 이번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칫하면 산만해질 수도 있는 결과물들 사이에서 집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데에는 밴드의 재능만큼이나 프로듀서의 역량도 주효했다.
내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 Comedown Machine >은 분명 수작이나 앞서 언급했던 호불호가 갈린다는 외적인 특성이 앨범의 발목을 잡는다. 스트록스 디스코그래피를 훑어오며 변해가는 추이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수긍하며 넘길 수 있는 음반이나 개러지의 깃발에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역시나 마음에 들지 않을 작품이다.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의 입장에도 십분 고개를 끄덕이지만 대중에게 모습을 선보이는 자리에 있다면 사람들의 수요도 어느 정도 이해해야하지 않던가. 팝 예술가의 역할론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하는 지점이다.
점수를 어느 정도 거두어 가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 자리한다. 프론트 맨 중심의 매커니즘은 실로 성과율이 높다. 독단이 크게 과격해지지만 않는다면 여러 방향으로 쉬이 치우치지도 않을 뿐더러 일정 무게를 유지한 채로 완성도 높은 결과물들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허나 그 중심에서의 욕심이 과해질 시에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온다. 시스템의 원동력 자체를 부정하며 이번 작품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아니다. 스트록스의 다섯 번째 앨범은 훌륭하기 그지없다. 다만 균형 있는 스탠스에 대한 아쉬움이 공존할 뿐이다.
글/ 이수호 (howard19@naver.com)
스트라입스(Strypes, The) < Blue Collar Jane > (EP)
스트라입스(The Strypes)의 음악은 초기 리듬 앤 블루스다. 댄서블한 비트를 타는 블루스 코드의 사운드 속에서는 그 옛날 척 베리(Chuck Berry)의 로큰롤을 떠올릴 수 있고 1960년대 초반에 보여주었던 롤링 스톤스(The Rolling Stones)의 데뷔 시절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새천년을 기점으로 컨템포러리 블루스 뮤지션들이 등장하는 추세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잭 화이트(Jack White)나 존 메이어(John Mayer), 개리 클락 주니어(Gary Clark Jr.) 같은 솔로 뮤지션들은 물론, 블랙 키스(The Black Keys)처럼 밴드로 나서 리바이벌 프로젝트에 가담하는 이들이 결코 적지 않으니 말이다.
문제는 이러한 판도에 10대 청소년들도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기타와 베이스를 각각 잡은 조쉬 맥클로이(Josh McClorey)와 피트 오핸런(Pete O'Hanlon), 드럼의 에반 월시(Evan Walsh)와 보컬 로스 퍼렐리(Ross Farrelly)가 결성한 4인조 아일랜드 밴드 스트라입스는 멤버 모두가 약관도 채 안 된 그야말로 ‘어린’ 그룹이다. 물론 팝 역사에서 틴에이지 아티스트의 데뷔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비슷한 연령대에서 신고식을 치렀던 뮤지션들은 일찍부터 자리했으며 팝 시장에 선봉으로 나서는 케이스도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다. 이들의 시선이 리듬 앤 블루스라는 루츠 음악으로 향해있다는 사실이다. 따라하는 정도였다면 그저 흥밋거리의 하나로 넘겼겠지만 밴드는 로큰롤의 이름으로 리듬 앤 블루스가 확산되던 그 시점의 사운드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앨범 발매에 앞서 블루스의 명인 윌리 딕슨(Willie Dixon)의 곡을 커버한 「You can't judge a book by cover」를 들어보자. 생동감 있는 원곡의 흥취가 스트라입스 버전에서도 그대로 살아있다. 이들의 모습에서 1960년대 중후반 영국을 기점으로 퍼져나갔던 브리티쉬 블루스의 대표주자 롤링 스톤스나 닥터 필굿(Dr. Feelgood)을 느낄 수 있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어린 뮤지션들의 강점은 앞선 음악을 불러 세우는 단순한 복각 작업에만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스트라입스는 옛 사운드를 과거의 소리로 남겨두지 않는 영민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앨범의 타이틀 곡 「Blue collar Jane」에서 드러나는 블루지한 톤이나 로큰롤 리듬, 「I wish you would」에서 주요하게 쓰인 하모니카 소리와 같은 지난 사운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동시에 댄서블한 드럼 비트를 구성해 현대적인 감각도 함께 부여했다. 눅눅하게 다가올 수 있는 1960년대의 재료이건만 그 한계점으로부터 이들은 확실히 탈피했다.
신선하다는 대부분의 반응도, 엘튼 존(Elton Jon)과 제프 벡(Jeff Beck) 같은 유수한 아티스트들이 팬을 자처한 것도 이러한 특성과 맥을 같이한다. 재기어린 이들의 음악에는 쉽사리 눈을 뗄 수 없게 하는 흡인력이 존재한다. 2013년에 나온 작품임에도 반세기 전의 시대와 어울리며 반대로 반세기 전에 가져왔다 해도 수긍이 갈만한 결과물이다. 더불어 10대 청소년이라는 요소 역시 마케팅 전략으로 충분히 구미를 당긴다. 팝 스타들이 즐비한 메이저 레이블 머큐리 레코드 사(Mercury Records)가 이들에게 투자를 선언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충분한 자질이 보인다. 갖가지 음악 차트에서 스트라입스의 이름을 확인할 날이 그리 멀어보이진 않는다.
글/ 이수호 (howard19@naver.com)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2개의 댓글
추천 기사
추천 상품
필자

이즘
이즘(www.izm.co.kr)은 음악 평론가 임진모를 주축으로 운영되는 대중음악 웹진이다. 2001년 8월에 오픈한 이래로 매주 가요, 팝, 영화음악에 대한 리뷰를 게재해 오고 있다. 초기에는 한국의 ‘올뮤직가이드’를 목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썼으나 지금은 인터뷰와 리뷰 중심의 웹진에 비중을 두고 있다. 풍부한 자료가 구비된 음악 라이브러리와 필자 개개인의 관점이 살아 있는 비평 사이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더뮤지컬] "책임감∙감사함 공존하는 무대" 뮤지컬 <마리 퀴리>의 네 번째 시즌](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12-8a5c3a02.jpg)

![[클래식] ‘신동(Child Prodigy)’이라 불린 사람들의 음악](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21-f8091a25.png)

![[더뮤지컬] <시지프스> 윤지우의 연습 일지](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10-9292ae65.jpg)










heliokjh
2013.05.29
did826
201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