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잊지 않기 위해 시를 쓰는 미자의 이야기
실재란, 경험이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의미한가.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은 그래서 살아 있는 순간의 온갖 찰나를 징후로 예감한다. 그래서일까. 들뢰즈는 진정한 삶이란 “죽음을 향한 역동”이라고 주장한다.
2010.10.04
|
귀환하는 죽음
실재란, 경험이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의미한가.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은 그래서 살아 있는 순간의 온갖 찰나를 징후로 예감한다. 그래서일까. 들뢰즈는 진정한 삶이란 “죽음을 향한 역동”이라고 주장한다. 즉 살아 있는 것들이 정말 살아 있는 실감 가운데 있기 위해서 매 순간 인지해야 할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다. 살아 있는 것들의 감동은 유한성의 거울에 비쳐진 세계를 발견할 때뿐이다. 영화 <시>는 바로 이 죽음을 잊지 않기 위해 시를 쓰려고 하는 미자의 이야기다.
볼프강 보르헤르트의 희곡 「문밖에서」란 작품에 한 쌍의 연인들에 대한 묘사가 등장한다. ‘태초의 물고기 한 쌍처럼’이 바로 그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태초’란 시간과 공간이 태어나던 바로 그 동시적 순간을 지칭한다. 물론 물리적 사실이기 이전에 인류가 발명한 독특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이다. 모든 존재의 첫 출발지점을 우리는 태초라 부르지만 이 태초란 지극히 편리한 언표일 뿐 입증이 가능하지도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다. 죽음은 시간과 공간이 정지되는 순간이다. 천둥의 끝자락 어림 어디쯤 더 이상 생성됨이 없는 기억으로의 환원이 일어나는 어디쯤이 바로 죽음의 거처인 셈이다. 결국 살아 있는 모든 존재에게 ‘지금 이곳 이 순간’은 그저 ‘태초’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모든 순간은 다 태초인 것이다. 한 번도 반복된 적이 없는 비인과적 절대성이 살아 있는 순간을 채우며 ‘최초의 사건’을 만든다. 그래서 사람은 흐르는 물의 순간처럼 비반복적이고 매 순간 고유하다. 지구의 밖을 경험한 우주인들이 지구로 귀환한 뒤 종교에 귀의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은 그들이 자신의 존재에 내재된 규정불가의 태초성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이, 시작과 끝이 동시적이며 서로 등을 맞댄 채 보이고 보이지 않는 차원을 구성하는 순간들을 탐험하는 일은 그래서 살아 있는 것들의 본능이 되었다.
다시 영화 <시>의 일상으로 돌아가보자. 중소도시의 제법 먹고살 만한 자영업자들인 아이들의 ‘아버지’들은 돈으로 자살한 여학생의 죽음을 무마하는 데 성공한 후 부동산 사무실에 모여 자축하는 술자리를 갖는다. 오직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에게 닥친 곤혹스런 현실적인 딜레마가 해결되었다는 기쁨이 그들을 기쁘게 한다.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미자는 견딜 수 없어 자리를 뜬다. 그들은 금기와 쾌락의 이항대립구조 속에 펼쳐지는 오이디푸스의 아버지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미 저질러진 죄악과 그로 인한 죄의식 따위에 아무런 억압도 느끼지 않는 ‘다른 어떤 곳’의 사람들이다. 물론 다른 어떤 곳은 다름아닌 ‘지금 이곳의 우리 현실’이며 익숙하게 마주치는 일상적인 인물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정말 이들의 법률적 윤리적 위기는 사라진 것일까.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 할 만큼 상처를 주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들, 임지현이 『우리 안의 파시즘』(삼인, 2000)에서 입증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자발적 동의’ 아니 ‘비자각적 폭력’은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삶의 기율을 코드화하고 있다. 돈으로 딜레마를 해결하는 아버지들의 ‘현실’은 철저하게 죽음을 비껴간다. 기만적으로 은폐된 해결(돈으로 자살에 이르게 한 행위가 무마되는)은 딜레마의 해소로 인한 안도감과 위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살아 움직이되 이미 살아 있는 것들의 광휘와 실감이 사라진 사람들이 허깨비처럼 웃고 떠들며 음식과 술을 마신다.
|
이제 이 중소도시의 일상은 살아 있는 죽음으로 가득 채워진 안락한 현실이 된다. 위기는 해소된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들의 귀환’으로 심화되어 삶을 한없이 그로테스크하게 만들어버린다. 히치콕의 잘 짜여진 플롯 속에서 돌발적으로 마주치는 공포가 아니라 공포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마비된 황폐가 도시를 채우고 있다. 아버지들도 아이들도 죽은 아이의 엄마조차도 모두 자살에 이른 죽음의 상처를 기억하지 않는다. 도대체 이 도시에 살아서 아픔을 느끼는 존재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영화 <시>에 등장하는 이들의 평범한 얼굴은 그래서 시체들처럼 그로테스크하다. 카메라에 클로즈업되는 산 사람들의 얼굴에서 오히려 귀기서린 섬뜩함이 배어나온다. 이 죽음의 도시 안에 유일하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미자뿐이다. 미자는 치매로 사라져가는 기억에 침식당하면서 ‘시’를 쓴다. 시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지만 살아 있는 것들이 들려주는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아픔과 슬픔을 감싸안는 세계의 기척들을 수첩에 써내려간다. 미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고통을 고통으로 수락하는 것이다. 이유는 오직 미자가 살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영화 <시>는 옳고 그름이나 추하고 아름다운 것들의 구분과 차이가 아니라 그저 정직하게 감당해야 할 것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사람의 사소한 일상과 진실을 쓰는 것이 <시>이며 그것이 인생이라고, 그래서 자살에도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셈이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죽은 여학생이 투신하는 강 상류의 다리와 다리 위에 서서 우리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얼굴을 보여준다. 강물에 둥둥 떠 흘러오던 시신이 시간을 거슬러올라와 소리 없이 말한다. ‘나는 죽은 자이다’라고. 자살과 시 그리고 죽음에 관한 기억은 거울처럼 우리의 살아 있음을 비춘다. 그래서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한 한 사람의 얼굴이 여학생의 얼굴과 오버랩된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에 이른 수많은 익명의 얼굴들까지. ‘천 개의 목소리가 모여서 이루는 유일하고도 같은 하나의 함성’, 다수성에서 일의성을 오가는 시의 음성이 들려온다.
(계속)
0개의 댓글
추천 기사
추천 상품
필자

채널예스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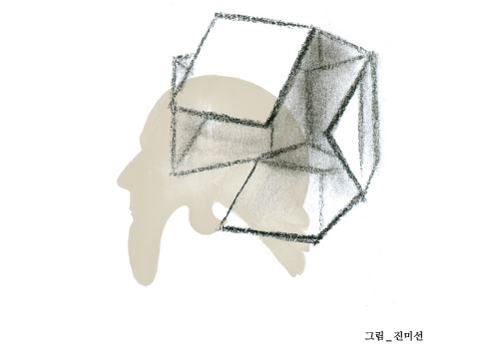


![[김승일의 시 수업] 내가 쓴 시를 책임지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23-5219395c.jpg)
![[김승일의 시 수업] 김승일이 여러분 앞에서 퇴고함](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28-14e0a917.png)
![[김승일의 시 수업] 에필로그로서의 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30-218f8487.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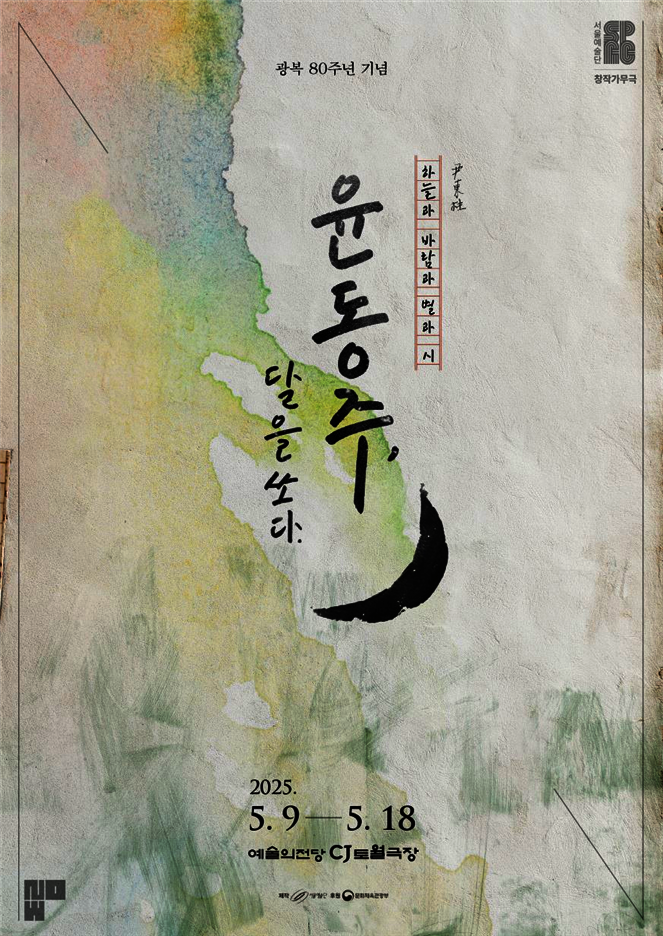
![자음과 모음 R (격월간) : 2010년 9·10월 [2010년]](https://image.yes24.com/goods/4185065?104x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