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긋한 북살롱]영화감독 송일곤, 쿠바의 낭만에 이끌리다 - 『낭만 쿠바』 송일곤
아트 영화 취향이 아님 혹은 아니었음을 고백하면서, 그전에 이 감독의 영화를 보지 못한 채 북살롱에 갔기 때문에 그야말로 백지 같은 상태로 송일곤 감독의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보았다. 그게 나빴느냐, 그렇지 않다.
2010.07.29
아트 영화 취향이 아님 혹은 아니었음을 고백하면서, 그전에 이 감독의 영화를 보지 못한 채 북살롱에 갔기 때문에 그야말로 백지 같은 상태로 송일곤 감독의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보았다. 그게 나빴느냐, 그렇지 않다. 송일곤 감독이 쓰고 사진 찍어서 엮은 『낭만 쿠바』는 책만으로도 낭만적이었지만 감독의 이야기와 영상이 곁들여지자 더 낭만적이 되었다. 세상이 각박해짐에 따라 희석돼 가는 낭만이 아쉬운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은 자리였다.
아주 까마득한 젊은 날, 떼로 미팅을 하러 갔다가 나중에 가수가 된 어느 복학생과 짝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 그가 농촌 풍경은 낭만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푸르름과 여과 없는 햇살, 아래 흰옷 입은 농부가 낭만이 아닐 수, 물론 있다. 그러나 그 풍경이 노스탤지어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나 혼자만의 낭만으로 삼지 않을 이유 또한 없다. 그런 의미로 이 책의 쿠바는 정말 낭만적이다. 그 역사에 핏빛이 깃들었다고 해도, 그곳 지하수에는 눈물이 섞여 흐른다 해도.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 쿠바
7월 12일 저녁 상상마당. 유기견 관련하여 <동물과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옴니버스 영화를 촬영하다 왔다는 송 감독은 다소 지쳐 보였지만, 원래 조근조근한 성격이 아닐까 싶을 만큼 흥분감 없이 차분한 분위기가 감독 자신과 잘 어울렸다. 책의 프롤로그에서 “한때 시집들을 외투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p.12)고 한 것도 예사롭지 않았다. 책에서 받은 인상으로 그는 영화에서 시를 추구하는 경향을 가졌지 않을까 했는데, 영화를 보면서 틀리지 않았구나 싶었다. 사실 일종의 에세이집이라 할 이 책도 상당히 시적이다.
#01 나의 시간은 꿈꾼다
나는 쿠바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당신처럼 체 게바라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고 쿠바의 음악을 좋아했다. 체 게바라는 자신의 조국 아르헨티나가 아닌 다른 나라, 쿠바의 혁명을 위해 피델 카스트로와 목숨을 걸고 싸웠고 기적처럼 혁명에 성공했다. 그리고 얼마 후 볼리비아에서 또 다른 혁명을 위해 게릴라의 일원으로 총을 들고 싸우다가 처형당했다.
그는 사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근현대 역사에서 가장 완벽한 인간이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완벽한 죽음, 체 게바라. 나는 최소한 그가 목숨을 걸었던 그 신면이 5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쿠바에서 이루어졌는지 궁금했다. 체 게바라와 쿠바, 쿠바와 한인들, 이 두 개의 전혀 다른 이미지 혹은 단어. 나는 매혹을 느꼈다. 나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으로 쿠바로 가기로 결심했다.(p.14)
왜 쿠바로 갔으며, ‘왜 책을 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책의 첫 번째 꼭지에서 짐작됐다. 그래도 경비가 드는 여행인지라 이런저런 실용적이며 직업적인 이유도 덧붙여졌다.
“2009년 4~5월 사이에 쿠바에 다녀왔어요. 낭만적인 멜로 영화를 찍고 싶었죠. 정신과 의사인 뉴요커가 작파하고 쿠바에 갔다가 한국계 쿠바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뭔가 쿠바? 대해서는 동경 같은 것이 있었죠. 마지막 사회주의 국가의 느낌, 여전히 살아 있는 카스트로 같은 요소들. 직접 쿠바에 다녀와서 피부로 느낀 공기와 온도 등을 기억하며 시나리오를 쓰려고 했어요. 그러나 단순한 여행은 갈 형편이 아니고 하여 자료 조사라는 명목으로 다큐를 찍기로 한 겁니다. 그게 오늘 소개할 영화예요.”
함께 간 친구는 이미 봤다고 하는 영화 <시간의 춤>이었다. 이국의 바닷가, 검은 실루엣으로 춤추는 여자가 인상적으로 스며들었다. 뭔가 다른 느낌의 영화였다. 이미지로만 남아 있는 저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과 닮은 느낌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야기는 주로 영화를 보다가, 잠깐 끊고, 또 보다가 잠깐 끊고 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대개는 영화 속에 있고, 책 속에 있는 이야기들. 그러나 감독의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느낌이 또 달랐다. 그건 그의 조근조근한 어조와도 무관치 않지만, 더 많이 상상하게 했다.
나쁜 남자는 얼마나 매력적인가! 차차차
남편에 의해 팔린, 달아나다 배에 숨어들어 상자 속에서 쿠바로 흘러간 ‘상자의 여자’ 박영희 할머니가 화면에 비쳤다.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곳에서 보낸 그들의 삶이 영화에서 느릿느릿 지나갔다. 산테리아의 주술사인 디모데오는 어머니가 마야인이고 아버지는 한국인인데, 3번 결혼해 16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그 아이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에게도 시간은 똑같은 속도로 느릿느릿 흘러갔을 것이다. 고즈넉한 영상에 조근조근한 이야기, 그 와중에 필자는 ‘케세라세라’를 속으로 읊조렸다. 그리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혹은 ‘한오백년’ 같은 오래된 가락이 속에서 스멀스멀 기어 다녔다.
우리는 쿠바에서 무슨 광경을 보기를 기대했던 걸까? 가난? 통제? 불행? 역사적 고통? 하지만, 감독은 쿠바에서도 똑같이 흐르는 시간을 담아왔다. 그곳 한인들에게는 혹은 한인의 후예들에게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리움과 에네켄에 긁힌 깊은 상처도 들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시간을 타고 흘렀다. 그리고 쿠바의 음악도!!
세실리오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쿠바인 음악가다. “어린 시절 형에게 처음 기타를 배웠고 ‘Los Coreanos’라는 한국인이 주축이 된 밴드의 일원이었고 네 명의 여자와 결혼한 남자. 나는 바라데로의 레스토랑에서 세실리오를 만났다. 세실리오는 자신의 밴드 친구 두 명과 함께 나타났다. 삼인조 밴드였다. 세실리오는 기타를 치며 함께 노래했고 나는 그의 음악을 녹음했다.”(p.214)
사람 좋아 보이는 세실리오가 동료와 함께 부르는 「나쁜 남자 차차차」는 독자를 웃게 했고, 그러면서도 노래에 빠져들게 했다.
나쁜 남자, 나쁜 남자는 얼마나 매력적인가! / 차차차, 차차차는 얼마나 매력적인가! / 혼혈아에겐 애정을 줘야 한다. / 중국 여자에게는 터프하게 대해야 한다. / 금발에게는 뽀뽀를 해줘야 한다. / 어쨌든 모든 여자들은 나쁜 남자와 즐긴다.(후략)
사해의 모든 여자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 내용의 가사가 나른하고 동시에 흥겹게 흘렀다. 맞는 말이다. 착한 남자는 안전하고, 나쁜 남자는 모험적이라서 모든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나쁜 남자에 끌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저러나, 어쩌면 저렇게나 골고루 좋아해 주는지, 나쁜 남자는! 순간적으로 쿠바 음악에 빠져들게 한, 감독에 따르면 다소 뻥이 있는 세실리오 아저씨가 두고두고 기억날 것 같았다.
상처 있어도 가능한 ‘행복의 비밀’
쿠바는 주지하듯 상처가 많은 나라다.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에 그야말로 짓밟혔다. 세월이 흘러 카스트로 집권 후 수십 년이 되었고, 그동안 쿠바 경제는 그리 나아지지 않았고, 젊은이들은 미국 달러에 목을 맨다고 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일상의 시간이 해안선을 따라 나열된 것. 매혹이라 부를 수 밖에”(p.26)없는 말레콘 해변이 있고, “진한 쿠바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신기루 같은 풍경을 보”(p.26)는 낭만이 있다. 감독은 그곳에서 잠시 한국을 잊고 카메라 곳곳에 튄 포말을 닦은 다음, 빈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모히토 한잔을 주문한다고 책에 썼다. 그러면 갑자기 “시간이 멈추고, 잠시의 안식”(p.26)이 찾아온다고 했다. 그리고 북살롱에서도 또다시 말했다.
“맨눈으로는 견딜 수 없는 강렬한 햇볕 아래 선글라스를 쓴 채 해변을 걷고 들어와 모히토를 한 잔 마시고, 쿠바 시가를 입에 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돈 벌어서 아이폰을 사야 하나? 4가 그렇게 중요한가?(웃음)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는 게 맞는 표현일 거예요.”
피가 흐르는 쿠바, 눈물이 흥건한 쿠바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법하지만, 감독은 “보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죠. 상처를 부각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나는 그들이 시간을 춤처럼 살아와 오늘에 이르렀다고 느꼈어요. 90세의 노인께 물었어요. 살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느냐고. 그분은 ‘지금 이 순간’이라고 했어요. 누군가 찾아와 자신을 인터뷰해주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게 행복의 비밀이 아닌가 해요.”라고 말했다. 공감됐다.
사실 감독은 책이 나왔을 때 기분이 참 이상했다고 한다. 영화와는 또 다르게, 책을 받아든 순간 피부로 감각하는 느낌을 받았고, 또 다르게 소중해서 떨렸다고 했다. 그리고 독자와 만나는 자리도 그렇다고 했다. ‘첫 경험’이라고 했던가. 그리고 소설을 써보고 싶다고도 했다. 소설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다고 했다. “시도해 보고 싶다”라고 했다. 현실을 비껴가지 않으면서 낭만적인, 그래서 휴식 같은 느낌을 주는 소설, 써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감독의 최초의 장편 다큐멘터리 <시간의 춤>, 쿠바로 돌아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영화를 제대로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
아주 까마득한 젊은 날, 떼로 미팅을 하러 갔다가 나중에 가수가 된 어느 복학생과 짝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 그가 농촌 풍경은 낭만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푸르름과 여과 없는 햇살, 아래 흰옷 입은 농부가 낭만이 아닐 수, 물론 있다. 그러나 그 풍경이 노스탤지어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나 혼자만의 낭만으로 삼지 않을 이유 또한 없다. 그런 의미로 이 책의 쿠바는 정말 낭만적이다. 그 역사에 핏빛이 깃들었다고 해도, 그곳 지하수에는 눈물이 섞여 흐른다 해도.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 쿠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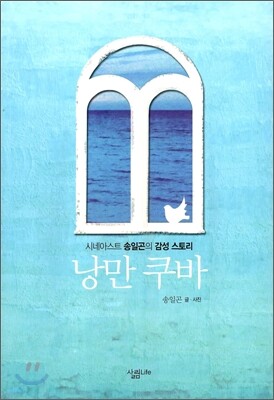 |
 |
#01 나의 시간은 꿈꾼다
나는 쿠바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당신처럼 체 게바라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고 쿠바의 음악을 좋아했다. 체 게바라는 자신의 조국 아르헨티나가 아닌 다른 나라, 쿠바의 혁명을 위해 피델 카스트로와 목숨을 걸고 싸웠고 기적처럼 혁명에 성공했다. 그리고 얼마 후 볼리비아에서 또 다른 혁명을 위해 게릴라의 일원으로 총을 들고 싸우다가 처형당했다.
그는 사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근현대 역사에서 가장 완벽한 인간이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완벽한 죽음, 체 게바라. 나는 최소한 그가 목숨을 걸었던 그 신면이 5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쿠바에서 이루어졌는지 궁금했다. 체 게바라와 쿠바, 쿠바와 한인들, 이 두 개의 전혀 다른 이미지 혹은 단어. 나는 매혹을 느꼈다. 나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으로 쿠바로 가기로 결심했다.(p.14)
왜 쿠바로 갔으며, ‘왜 책을 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책의 첫 번째 꼭지에서 짐작됐다. 그래도 경비가 드는 여행인지라 이런저런 실용적이며 직업적인 이유도 덧붙여졌다.
“2009년 4~5월 사이에 쿠바에 다녀왔어요. 낭만적인 멜로 영화를 찍고 싶었죠. 정신과 의사인 뉴요커가 작파하고 쿠바에 갔다가 한국계 쿠바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뭔가 쿠바? 대해서는 동경 같은 것이 있었죠. 마지막 사회주의 국가의 느낌, 여전히 살아 있는 카스트로 같은 요소들. 직접 쿠바에 다녀와서 피부로 느낀 공기와 온도 등을 기억하며 시나리오를 쓰려고 했어요. 그러나 단순한 여행은 갈 형편이 아니고 하여 자료 조사라는 명목으로 다큐를 찍기로 한 겁니다. 그게 오늘 소개할 영화예요.”
함께 간 친구는 이미 봤다고 하는 영화 <시간의 춤>이었다. 이국의 바닷가, 검은 실루엣으로 춤추는 여자가 인상적으로 스며들었다. 뭔가 다른 느낌의 영화였다. 이미지로만 남아 있는 저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과 닮은 느낌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야기는 주로 영화를 보다가, 잠깐 끊고, 또 보다가 잠깐 끊고 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대개는 영화 속에 있고, 책 속에 있는 이야기들. 그러나 감독의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느낌이 또 달랐다. 그건 그의 조근조근한 어조와도 무관치 않지만, 더 많이 상상하게 했다.
|
나쁜 남자는 얼마나 매력적인가! 차차차
남편에 의해 팔린, 달아나다 배에 숨어들어 상자 속에서 쿠바로 흘러간 ‘상자의 여자’ 박영희 할머니가 화면에 비쳤다.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곳에서 보낸 그들의 삶이 영화에서 느릿느릿 지나갔다. 산테리아의 주술사인 디모데오는 어머니가 마야인이고 아버지는 한국인인데, 3번 결혼해 16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그 아이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에게도 시간은 똑같은 속도로 느릿느릿 흘러갔을 것이다. 고즈넉한 영상에 조근조근한 이야기, 그 와중에 필자는 ‘케세라세라’를 속으로 읊조렸다. 그리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혹은 ‘한오백년’ 같은 오래된 가락이 속에서 스멀스멀 기어 다녔다.
우리는 쿠바에서 무슨 광경을 보기를 기대했던 걸까? 가난? 통제? 불행? 역사적 고통? 하지만, 감독은 쿠바에서도 똑같이 흐르는 시간을 담아왔다. 그곳 한인들에게는 혹은 한인의 후예들에게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리움과 에네켄에 긁힌 깊은 상처도 들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시간을 타고 흘렀다. 그리고 쿠바의 음악도!!
세실리오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쿠바인 음악가다. “어린 시절 형에게 처음 기타를 배웠고 ‘Los Coreanos’라는 한국인이 주축이 된 밴드의 일원이었고 네 명의 여자와 결혼한 남자. 나는 바라데로의 레스토랑에서 세실리오를 만났다. 세실리오는 자신의 밴드 친구 두 명과 함께 나타났다. 삼인조 밴드였다. 세실리오는 기타를 치며 함께 노래했고 나는 그의 음악을 녹음했다.”(p.214)
사람 좋아 보이는 세실리오가 동료와 함께 부르는 「나쁜 남자 차차차」는 독자를 웃게 했고, 그러면서도 노래에 빠져들게 했다.
나쁜 남자, 나쁜 남자는 얼마나 매력적인가! / 차차차, 차차차는 얼마나 매력적인가! / 혼혈아에겐 애정을 줘야 한다. / 중국 여자에게는 터프하게 대해야 한다. / 금발에게는 뽀뽀를 해줘야 한다. / 어쨌든 모든 여자들은 나쁜 남자와 즐긴다.(후략)
사해의 모든 여자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 내용의 가사가 나른하고 동시에 흥겹게 흘렀다. 맞는 말이다. 착한 남자는 안전하고, 나쁜 남자는 모험적이라서 모든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나쁜 남자에 끌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저러나, 어쩌면 저렇게나 골고루 좋아해 주는지, 나쁜 남자는! 순간적으로 쿠바 음악에 빠져들게 한, 감독에 따르면 다소 뻥이 있는 세실리오 아저씨가 두고두고 기억날 것 같았다.
|
상처 있어도 가능한 ‘행복의 비밀’
쿠바는 주지하듯 상처가 많은 나라다.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에 그야말로 짓밟혔다. 세월이 흘러 카스트로 집권 후 수십 년이 되었고, 그동안 쿠바 경제는 그리 나아지지 않았고, 젊은이들은 미국 달러에 목을 맨다고 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일상의 시간이 해안선을 따라 나열된 것. 매혹이라 부를 수 밖에”(p.26)없는 말레콘 해변이 있고, “진한 쿠바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신기루 같은 풍경을 보”(p.26)는 낭만이 있다. 감독은 그곳에서 잠시 한국을 잊고 카메라 곳곳에 튄 포말을 닦은 다음, 빈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모히토 한잔을 주문한다고 책에 썼다. 그러면 갑자기 “시간이 멈추고, 잠시의 안식”(p.26)이 찾아온다고 했다. 그리고 북살롱에서도 또다시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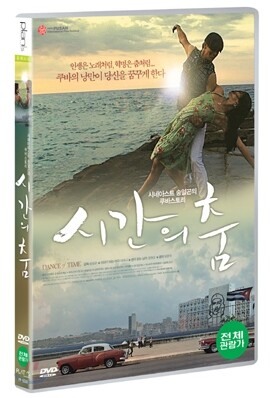 |
 |
피가 흐르는 쿠바, 눈물이 흥건한 쿠바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법하지만, 감독은 “보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죠. 상처를 부각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나는 그들이 시간을 춤처럼 살아와 오늘에 이르렀다고 느꼈어요. 90세의 노인께 물었어요. 살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느냐고. 그분은 ‘지금 이 순간’이라고 했어요. 누군가 찾아와 자신을 인터뷰해주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게 행복의 비밀이 아닌가 해요.”라고 말했다. 공감됐다.
사실 감독은 책이 나왔을 때 기분이 참 이상했다고 한다. 영화와는 또 다르게, 책을 받아든 순간 피부로 감각하는 느낌을 받았고, 또 다르게 소중해서 떨렸다고 했다. 그리고 독자와 만나는 자리도 그렇다고 했다. ‘첫 경험’이라고 했던가. 그리고 소설을 써보고 싶다고도 했다. 소설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다고 했다. “시도해 보고 싶다”라고 했다. 현실을 비껴가지 않으면서 낭만적인, 그래서 휴식 같은 느낌을 주는 소설, 써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감독의 최초의 장편 다큐멘터리 <시간의 춤>, 쿠바로 돌아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영화를 제대로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4개의 댓글
추천 기사
추천 상품
필자

채널예스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큐레이션] 독주회 맨 앞줄에 앉은 기분을 선사하는 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10-a343a9af.png)

![[추천핑] 국경을 넘는 한국 문학](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3-ab42d6ee.png)







skidoo9
2018.12.24
prognose
2012.06.03
앙ㅋ
2012.03.13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