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구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무너지는 산처럼 음악이 쏟아지고 있었다.
도망치듯 안으로 들어갔다.
평소라면 오지 않을 술집에 온 건 친구의 생일 파티 때문이었다. 조명 아래 손이 다홍색으로 보였다. 오렌지를 반으로 잘라 그 안에 건물을 지었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
다들 상기되어 보였다.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몇 잔씩 마신 상태였다. 떠들썩한 이들 사이에서 나만 혼자 수도승처럼 작게 말했다. 그럴 때 알게 된다. 아, 나 집사람이지.(집을 애호하는 모두를 집사람이라 부르기로 했다)
에너지를 끌어올린다. 생일 맞은 친구를 실망시키지 말자고 다짐해 본다.
동석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수줍어지거나 지나치게 말이 많아진다. 일정 수를 넘어가면 사회적인 자아가 삐걱대기 시작한다. 컨디션에 따라 상한선은 다르지만, 보통 네 명 이하로 만날 때 가장 나인 것 같다.
이 파티엔 마흔 명 정도가 모였다.
기다란 테이블에서 칭찬 위주의 인사가 오간다. 그 말들은 공중에서 기포처럼 사라진다. 화기애애하지만 누구도 누구와 만나지 않는 것 같다. 어디로도 가지 않는 대화가 나는 견디기 어렵다.
이미 아는 사람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도 있다. 생일 주인공인 친구가 화장실에 간다. 사람들은 그가 없는 자리에서 대화를 시도한다. 바람 빠진 농구공처럼 스몰 토크가 바닥에 떨어진다. 침묵이 한차례 지나간다. 요란한 음악보다 이 침묵이 더 시끄럽다. 속으로 중얼거린다.
이 침묵이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해 봐.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해 봐.
나도 이 어색함에 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자리에서 혼자 상상하곤 한다. 슈퍼히어로가 날아들어 새빨간 장갑을 끼고 테이블 위 침묵을 납땜하는. 모두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보는 동안 아무 말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잠시 안도하는.
왜 어떤 사람과는 처음인데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경직될까. 친구들을 떠올리면 친근해진 이유가 너무 많은데. 맞춤법에 연연하기 때문에, 돌발 행동 때문에, 이상한 유머 때문에, 울보이기 때문에... 온갖 이유로 각별해지는데, 왜 누군가와는 애를 써도 그게 잘 안될까.
의지의 문제일까?
대화가 잘 흐르려면 적어도 몇 명의 주인이 필요하다. 많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지탱하는 사람들 있잖나. 고갯짓으로, 시선과 손짓으로. 질문 없이 앉아 있는 손님들만으로는 파티가 파티일 수 없다.
친구가 돌아왔지만 거대한 오렌지 속 어색한 기운은 여전하고 괜히 더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나무라는 농담이나 건넨다. 내향적인 나라도 힘을 더 보태야 할까. 물론 시끄럽다고 외향적인 건 아니다. 액션을 취하는 쪽이 늘 사교적인 거라고 우리는 오해한다. 많이 말하지 않고도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나는 듣는 게 더 편하다. 경청하다 가끔 말하는 참석자에 가깝다. 그러다 누구도 나서지 않는 자리에서는 대화를 주도할 때도 있다. 책임감 때문이다. 오늘은 먼저 그러지 않기로 한다. 귀갓길에 허한 마음이 찾아올 걸 안다. 꼭 우러나는 자리에서만 마음을 쓰고 싶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기로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
친구의 친구와 합석할 때는 더 외향적이고 사회적인 모습이어야 할 것만 같다. 친구의 멋짐까지가 내 일부인 것 같고 그를 더 멋진 친구로 만들어주어야 할 것 같은 이상한 부채감이 생긴다. 친구가 파티에 있던 지인에게 나를 소개했다.
"얘는 내 친한 친구. 시인이고 사진가야. 미국에 오래 살다 왔어."
파티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내게 말했다.
"지금 너무 신기해요. 저 태어나서 시인 처음 만나봐요. 그리고 래퍼 더 콰이엇 닮으셨어요."
태어나서 시인을 처음 만나볼 수 있다. 그게 신기할 수 있다. 나도 우주 조종사를 만나본 적 없고, 고대학자를 만나본 적 없으며, 과자 MD를 만나본 적 없으니까. 만나면 신기할 거다. 근데 단지 턱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나는 초면에 더콰이엇 닮은 사람이 되고... 물론 더 콰이엇은 멋지지만 우리 사이는 오해로 시작된다.
"아 네... 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외모 이야기를 악의 없이 건네던 시절이 있었다. 내가 싫으니까 남들도 싫겠다고 생각할 즈음 그만두었다. '결례'라는 단어를 빌리지 않아도 어떤 반복은 변화를 가져온다. 왜 우리는 처음 만나면 직업과 외모로 서로를 소개할까. 우리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게 외관과 커리어는 아닐 텐데. 대안은 무엇일까? 좀 더 자연스러운 소개는? 파티에서 내 친구를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되나?
'얘는 약간 강박이 있어. 성가실 만큼은 아니지만 직업적으로 도움이 될 만큼은 강박적이야. 그래서 일도 그래픽 디자인을 해. 집에 가보면 컵부터 식기까지 다 각 맞춰 정리하고 청소기도 하루 두 번씩 돌려. 쉴 때는 뜨개질을 하는데 변태처럼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한다. 그래도 타인에게는 너그러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거든.'
나의 생일 파티라면 어떻게 소개했을까. 그동안 친구와 친구를 어떻게 만나게 해왔지. 하지만 나는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지 않는다. 나는... 조촐한 생일 파티에 늘 마음이 간다.
친구의 파티에서 오 분 동안 열두 명과 인사했다. 그들은 내 이름을 기억할까. 너무 빠른 만남은 나를 느리게 만든다. 안 그래도 느린데, 더 느리게 만든다.
하고 싶지 않은 대화는 가능하면 피하며 살고 싶다. 어른이니까 하기 싫은 일도 씩씩하게 해내야 한다고 하던데. 어른이 되었으므로 가능하면 있고 싶지 않은 자릴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다. 미안해하며 머무는 대신 욕망하는 일에 시간을 쓰고 싶다.
십오 분 만에 나는 친구에게 역시 집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파트너가 기다린다고. 사실 파트너는 나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 주므로 괜찮다. 이미 나를 잘 아는 친구와 미안하고 고마운 눈빛을 주고받고 서둘러 나온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괜찮다. 집으로 돌아갈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밖에 나와 숨을 두어 번 들이마시고 택시를 탄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폭설을 마주친다.
택시 기사님은 빨리 퇴근하고 싶으신가 보다. 나를 태우고 달린 속도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리는 거의 날아왔다고 볼 수 있다. 두어 번 아주 위험했다. 곧장 후생으로 갈 뻔했다. 요즘 택시를 탈 때마다 집에 무사히 도착했음에 감사하게 된다. 조금만 불안하면 나도 모르게 안전벨트를 맨다. 어렸을 땐 그렇게 귀찮았는데. 요즘은 오래 살고 싶다. 안 다치고 싶다.
눈이 너무 많이 와 택시에서 일찌감치 내린다. 언덕이 가팔라서다. 왁자지껄한 술집이 보인다. 누군가는 추운 날 고립되기 싫어 모임을 갖기로 했을 거다. 머뭇거리지 않고 경사가 진 언덕을 계속 오른다.
집이다. 아침 열 시에 나왔고 지금은 밤 열 시 반이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온 것 같지. 반겨주는 사람과 포옹한다. 젖은 외투를 옷걸이에 건다. 눈송이가 달라붙은 목도리를 털고 얼어붙은 안경도 닦는다. 자리를 바꾸며 치르는 의식이다. 돌아오자마자 정리하는 순간이 나는 좋다. 장갑, 반지, 이어 커프 등 제자리에 물건을 두는 동안 바깥에서 감긴 태엽이 서서히 풀린다.
맞다, 난 집을 좋아한다. 이 공간에 있을 때 가장 안심한다.
책상에 앉는다. 헤드폰을 쓰고 음악을 켠다. 복잡한 구성의 곡이다. 아까 술집에서 나오던 노래와 리듬이 비슷하다. 유사한 풍의 곡이지만 나는 매우 고요해진다.
몸이 오늘 감당하지 못한 소음을 짜내는 것 같다. 몸에서 짜낸 소음이 바닥에 흘러내렸는지 고양이들이 날 보며 운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이훤
시인. 사진가. 장면을 만들고 잇는 사람. 두 언어를 오가며 생겨나는 뉘앙스와 작은 죽음에 매료되어 시를 쓰기 시작했다. 시집 『양눈잡이』 『우리 너무 절박해지지 말아요』, 시산문집 『청년이 시를 믿게 하였다』, 산문집 『고상하고 천박하게』 『눈에 덜 띄는』 『아무튼, 당근마켓』 등 여덟 권의 책을 쓰고 찍었다. ≪공중 뿌리≫ ≪We Meet in the Past Tense≫ 등의 전시를 가졌으며, 『정확한 사랑의 실험』 『벨 자』 『끝내주는 인생』 등의 출판물에 사진으로 함께했다. 조지아공대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시카고예술대학에서 사진학 석사를 마쳤다. 아침마다 잡초 뽑고 고양이 똥을 치우고 아내의 소설을 번역한다. PoetHwon.com, @__LeeHwon









![[이훤의 한 발 느린 집사람] 당신의 영역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8/f/8/2/8f8240331eda329a4fb00788504d9f08.jpg)
![[근하의 칸으로 소개하기]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c/c/8/2/cc82866ec19019f30f23ed0cf2205829.jpg)
![[신간을 기다립니다] 앙꼬 작가님께 - 정원 만화가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b/2/d/7/b2d78c764c28c0ba59b11a4c4d9da374.jpg)

![[더뮤지컬] 뮤지컬 <빨래> 20주년 기념 콘서트, 우린 지치지 않을 거야](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14-19956f5e.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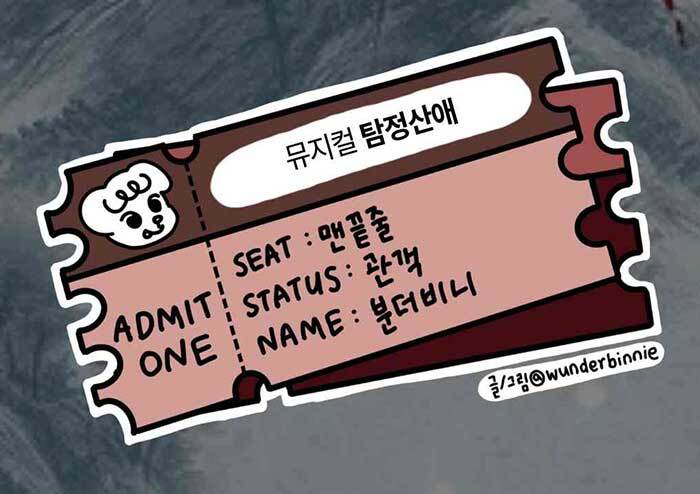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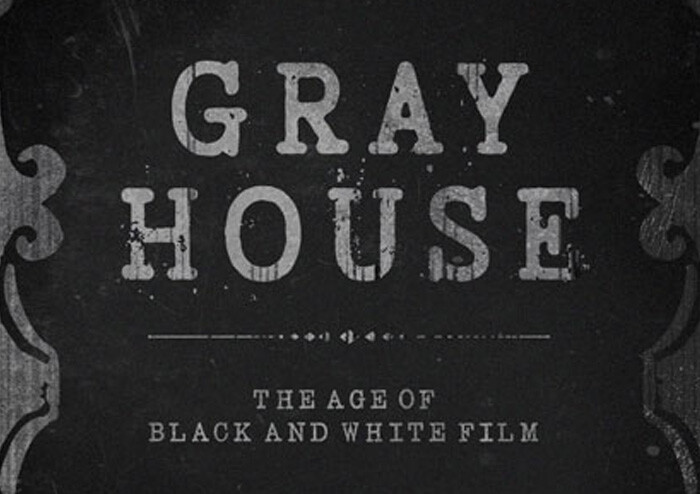
![[더뮤지컬] "할머니의 삶에서 소녀가 보여"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프레스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18-9cc1935b.jpg)
![[둘이서] 김사월X이훤 – 마지막 편지](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31-bb9a96f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