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를 박고 너는 나의 살 냄새를 맡고 있다. 뾰족한 귀로 모든 미물을 엿들으며. 헤이, 밤새 얼마나 많은 소리를 모았는지 너는 알지 못할 거야. 괜찮은 꿈을 꿨니? 꿈에서 무엇을 모았어? 말하며.
뜨겁고 긴 몸이 올라온다. 아직 눈 감은 내 얼굴을 보더니 슬그머니 허벅지에 저를 얇게 말아 밀착시킨다.
동물을 들이는 건 낮밤의 온도와 소리가 뒤바뀌는 걸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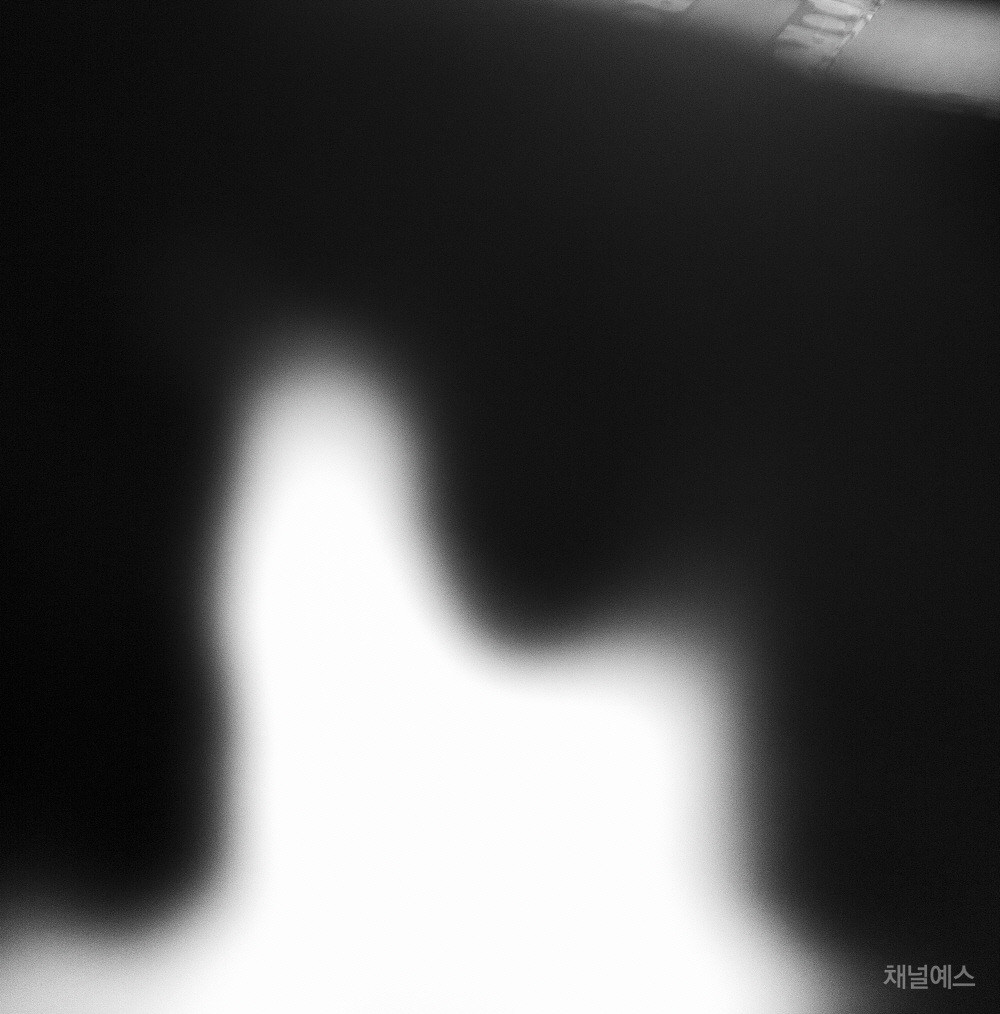
눈을 뜨려 애쓴다. 실금만큼 동공이 열린다. 익숙하고 웃기게 생긴 형체와 눈이 마주친다. 겨우 윤곽만 알아볼 수 있지만 귀여운 생명체임에 틀림없다. 새벽 여섯 시부터 널 지켜봤어, 이제 깨어나다니, 반가워, 몸만 컸지 사냥도 못 하는 너를 식구로서 좋아하지만 이렇게까지 식사를 기다리게 하면 정말 안달 나, 보고 있지만 말고 얼른 뺨이랑 턱을 만져줘. 이 모든 말을 몇 음절로 한다.
ㅁ-야-아-아-엉
그들에게는 한 문장일지도 모른다.


인간과 고양이가 함께 생활하는 이 풍경이 얼마큼 경이로운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고양이는 삵에서 시작된 종이다. 먹기 위해, 사냥하고 먹히지 않기 위해, 발톱을 세워 늘 경계해야 한다. 포식자인 것이다. 집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리를 찾고 영역에 들어오는 모든 타자와 맞서야 한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모든 생명과 소리를 경계해야 한다. 늘 곤두서 있지 않으면 빼앗길 수도 있다. 얼굴 절반만큼이나 귀가 크고 깊은 것도 그 이유에서일 거다. 살아남기 위해서.
고양이가 영역을 내어주는 건, 그런 점에서 꽤나 큰 신뢰를 의미한다. 타자에게 서툴고 대체로 자기중심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인간과 함께 살다니. 고양이에게 인간은 건물 만큼 커다랄 것이다. 인간이 사는 주택은 자신이 모르는 너무 많은 사물과 소리로 가득할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의 생활 양식에 적응해 주기로 하다니. 그리하며 귀여움을 잃지 않다니. 우리가 고양이 세계에 투입되었다면 아마 못 그랬을 거다.
아침에 특히 그들의 사회성에 감탄하곤 하는데, 잠결에 부스럭대도 말 안 걸다가 진짜 일어나면 귀신처럼 알고 와서 인사한다. 잠을 이해하는 거다. 깨지 말고 더 자라고, 배려해 주고. 그런 생각을 하며 자는 우릴 지켜볼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 고맙다. 서로에게 중요한 것을 알아주고 침범 않으려 애쓰는 게 작은 사회 아니고 무엇일까.

숙희와 남희도 가끔 바깥을 꿈꿀까?

어느 오후 숙희가 사라졌다. 손님이 문을 열어 둔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
집 나간 고양이를 다시 만나지 못해 일 년이 지난 지금까지 찾는 친구의 이야기가 화살처럼 뇌리에 박혀 있다. 겁이 나서 실내용 슬리퍼를 신고 뛰어나가 배회하기 시작했다. 숙희야. 어디로 갔니. 제발. 네가 돌아온다면 참치 열 통도 줄 수 있어. 간식도 주고 낚시 놀이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네 시간씩 하고 말이야. 숙희야. 종일 그것만 하자.
돌아오는 건 이미 어둑해진 마을의 고요와 경적 소리뿐이었다.
숙희야~ 숙희야.
여기저기 이름을 부르고 괜찮지 않은 얼굴로 파트너에게 괜찮다고 말하는데, 집에서 조금 떨어진 집 담장 너머에서 익숙한 소리를 들었다. 낮이고 밤이고 놀아달라고 조르던 목소리였다. 격앙되어 있었다. 바깥세상을 걸으며 들어차는 호기심과 너무 많은 새 길, 새 나무, 새 냄새, 새 동물의 출현 때문에 느끼는 너무 많은 감정이 뒤섞여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았다. 많이 만나고 많이 가질수록 기쁨의 면적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숙희가 그걸 알았으면 했다. 아니지. 숙희의 기쁨은 다를 수 있다. 숙희의 지혜는 다를 수 있다.
울음은 멀어졌다가 젖었다가 가끔 가까워졌다. 담장을 넘나드는 숙희를 지켜보다 깊은 밤이 되었다. 그리고 이내 숙희는 사라졌다.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었는데. 왜.
숙희에게 우리가 함께 사는 이곳은 그럼 집이 아니었을까. 일시적이고 잠시 머무는 곳처럼 여겼던 걸까. 나에게 숙희는 귀가를 알리는 첫 얼굴이었는데. 방에 있다가도 대답 없으면 불안해지는 집의 좌표 같았는데. 역시 걱정됐다. 임시 보호소에서 태어난 숙희는 실내밖에 알지 못했는데, 밖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미리 절망할 준비를 마쳤다.
엉덩이를 붙이려 애쓰다가 몇 분 안 지나 다시 밖에 나가고 이름 부르고 들어오길 몇 차례. 면사포처럼 슬픔이 내 낯을 덮는데, 창밖에서 익숙한 얼굴이 그 낯을 보고 있다. 무구한 눈망울로 볼 위의 두 점이 아직 거기 있는 숙희가 꼬리를 바짝 올리고 문 앞에 서 있는 거다.
그리고 덤덤히 들어왔다. 조금 원망스럽고 너무 기뻐 다 괜찮아졌다. 여기가 나의 집인데 왜 걱정하냐는 듯 다리에 몸을 비비며 깨끗한 눈으로 한참 위로 올려보면서.
고양이들은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 번 간 곳은 전부 자신의 영역이자 집이라 여긴다고 들었다. 매일 그곳을 확인하고 싶고 그리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가정에서 자란 고양이에게 산책이 이롭지 않은 이유다. 바깥에서 질병을 옮아 무지개다리를 건너기도 하고.
외출했던 그 주에는 문 앞에서 가끔 울었다. 열어달라고. 확인할 게 있다고. 나갔을 때 거닌 예닐곱의 마당을 전부 집이라 생각하는 거다. 좋겠다. 이제 집이 일곱 채라서. 그리고 안 좋겠다. 집이 너무 쉽게 생기고 또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며칠 지나니 더 이상 울지 않는다.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은 저가 만든 집이 확고해질수록 옅어지는 걸까. 나에게 어떤 얼굴들 집이듯, 그들에게도 오늘 내가 그러할까.

숙희는 목제 스크래처 위에서 발을 둥글게 오므린 채 배가 다 보이게 누워 있다. 자기 향을 골고루 묻히며. 누운 채 눈을 깜빡이며. 그러고는 책상에서 이 글을 쓰는 나를 응시한다. 걸어와 다리에 얼굴을 비빈다. 숙희에게 내가 한 번 더 집이 되는 순간이다. 나에게 숙희가 한 번 더 집이 되는 순간이다.
집에 있어도 집은 여러 번 다시 시작된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이훤
시인. 사진가. 장면을 만들고 잇는 사람. 두 언어를 오가며 생겨나는 뉘앙스와 작은 죽음에 매료되어 시를 쓰기 시작했다. 시집 『양눈잡이』 『우리 너무 절박해지지 말아요』, 시산문집 『청년이 시를 믿게 하였다』, 산문집 『고상하고 천박하게』 『눈에 덜 띄는』 『아무튼, 당근마켓』 등 여덟 권의 책을 쓰고 찍었다. ≪공중 뿌리≫ ≪We Meet in the Past Tense≫ 등의 전시를 가졌으며, 『정확한 사랑의 실험』 『벨 자』 『끝내주는 인생』 등의 출판물에 사진으로 함께했다. 조지아공대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시카고예술대학에서 사진학 석사를 마쳤다. 아침마다 잡초 뽑고 고양이 똥을 치우고 아내의 소설을 번역한다. PoetHwon.com, @__LeeHwon






![[쓰는 동안, 입은요?] 아무 곳에서나!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3/2/9/f/329f05f609090d6cfb598db3fce45662.jpg)
![[쓰는 동안, 입은요?] 제철 음식, 제철 원고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7/a/7/8/7a788fc1bedc8506892597df87ce9464.jpg)
![[쓰는 동안, 입은요?] 파이팅... 파이팅...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d/d/1/9/dd19b9b2b6db66494e1d2d0146703d5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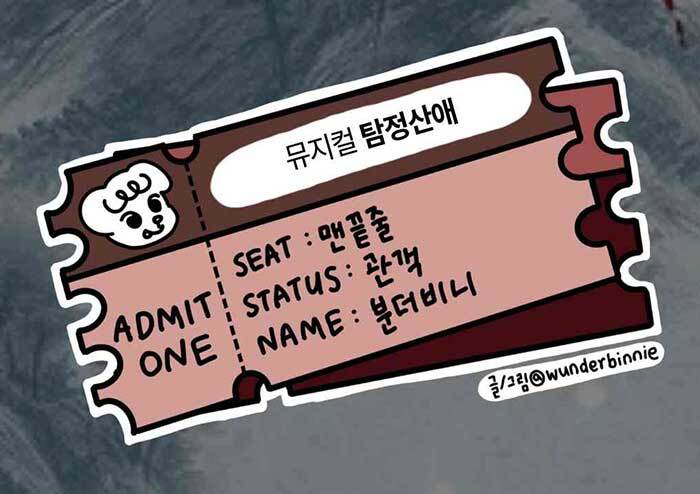



![[큐레이션] 고만고만한 책을 뛰어 넘는 법](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2-b5b7e1c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