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를 앞두고 문장을 기다린다. 연말연시에 사주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돋이를 보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장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일종의 의식, 리추얼인 셈. 사주나 해돋이를 보는 일은 다가올 날들에 기대감을 갖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의식이다. 평소 앞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곱씹는 사람이 있고, 나는 후자이다. 그렇다고 내가 미련과 후회를 삶의 방식으로 택한 것은 아니다. 과거는 흘러가버리는 게 아니라 고인 채 늘 거기 있고, 그 속에 가능성 혹은 전망의 실마리가 담겨 있다고 믿는달까. 내 미래는 내 과거에 있다고 말이다.
다시 문장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나에게는 지난 한 해 읽은 책 속 특정 문장을 새해의 지침으로 삼는 습관이 있다. 그 문장을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건 아니다. 때가 되면 그 문장이 나에게 오는 것에 가깝다. ‘때가 되면’이라 함은 ‘한 해를 어느 정도 살아내고 나면’이란 뜻. 어떤 날들이었느냐에 따라 발견되는 문장의 톤이나 메시지가 다를 수밖에 없다. 뭔가를 읽어야 문장이 발견되므로 그 문장은 ‘발견되는’ 것이자 ‘발견하는’ 것일 테다. 두루뭉술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은 사주나 띠별 운세와 달리, 문장을 발견하는 데에는 이렇듯 나의 의지와 맥락이 반영된다. 같은 사주나 띠를 가진 수많은 사람과 구별되는 나만의 것이기도 하다.
2021년 내가 의지한 문장은 이것이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자의 심정이 아니라, 욕망하지 않는 것과의 연결을 끊은 자가 확보한 자유다.”
김홍중의 『은둔기계』의 한 구절이다. 최근 몇 년, 주중에는 편집자로 일하며 짬짬이 SNS를 관리하고, 주말에는 ‘편집자K’라는 부캐로 유튜브에서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며 바삐 살았다. 그러면서 느낀 일종의 피로감이랄까, ‘과잉연결감’을 경계해야겠다 생각했다. 구독자/팔로워가 느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숫자를 좇는 것보다 중요한 건 좋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몸과 정신을 만드는 것이라고. 요컨대 이 문장을 손에 쥔 데에는 더 오래, 더 잘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고독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나의 깨달음이 반영되었다.
2020년의 문장은 메리 올리버의 『긴 호흡』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메리 올리버의 책들은 반복해 읽으며 종종 마음을 기대곤 하는데, 그날은 그의 책들 가운데 ‘완벽한 날들’ ‘휘파람 부는 사람’을 지나 이 제목, ‘긴 호흡’에 눈이 갔다. 서가에서 꺼내 찬찬히 훑었다. 인생에 낭만이 줄고 쓸모와 성과에 대한 강박이 지배적이던 때였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중이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전과 달리 이 문장에 숨이 턱 막혔던 것이리라 생각한다.
“내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언젠가 비통한 마음 없이 그걸 야생의 잡초 우거진 모래언덕에 돌려주는 것.”
그러고 보니 2020년, 2021년의 문장 모두 삶의 균형과 연관되어 있다. 그때그때 내 삶에서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문장들은 나에게 왔을 것이다.
그 이전의 문장들을 모두 모아 이어보면 어떨까. 그게 바로 지금까지의 내 인생이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근사한 문장들의 컬렉션으로 보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그때 바로 그 문장이어야 했던 이유가 읽힌다. 나의 관심사나 화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였는지,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무릅쓰거나 감당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모두 ‘나’라는 책을 써나간다. 내가 흠모하는 작가의 문장과 나의 문장이 엮여 그 책이 쓰이고 있다는 상상을 하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은밀히 기쁘기도 하다. 끝내 불완전할 삶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문장으로 채우고 싶어지고 그 문장들처럼 살아가고 싶어지기도 한다면 너무 과한 걸까.
얼마 전 2022년의 문장을 만났다. 가을이 저물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내가 만든 정지돈 작가의 산문집 『당신을 위한 것이나 당신의 것은 아닌』을 출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원고를 읽고 편집하는 내내 큰 자극이 되었던 책이다. 글뿐만 아니라 작가도 그랬는데, 정지돈 작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닮고 싶다고 생각한 면이 있었다. 관계를 맺는 방식이랄까,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고 관대하고 늘 여유 있어 보이는 작가의 모습이 좋았다.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였다는 것. 그게 참 쉽지 않지 않나. 사실 당시에는 막연히 생각한 것이었다.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활자화된 적은 없었다. 그러다 정지돈 작가가 최근 『릿터』에 발표한 경장편 「…스크롤!」에서 내가 생각한 바로 그것을 문장으로 발견했다. 소설 속 인물이 자신의 원칙이라며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에게 친절하라. 그러나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는 말라.” 그 문장이 가슴에 쿡 박히는 것을 느끼며 엇, 이것이었다, 하고 깨달았다. 관계를 잘 맺고 그 안에서 나를 지키는 법, 그 해답에 가까운 문장을 찾은 것 같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오해받고 싶지 않고, 많은 관계를 잘 유지해나가고 싶다. 여기에 매달리다보면 감정 소모가 커지고 피로도도 높아지고, 어떨 땐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한다. 2022년 올해도 관계 속에서 휘청이는 날들 숱할 테지. 그럴 때마다 나는 이 문장을 꺼내어 들여다보려 한다.
우리는 매 순간 많은 것에 영향 받는다. 어떤 것들에 영향을 받을지 조금 더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선택이 쌓여 다가올 날들을 만들 것이므로. 한 달에 한 번 쓸 이 에세이의 타이틀을 ‘편집자K의 반쯤 빈 서재’로 정해보았다. 마침 새 마음 새 인생을 도모하며 실제로 서재를 비우고 있기도 하다. 새로이 존재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 반쯤 빈 이곳을 앞으로 무엇으로 채우게 될지 기대가 된다. 해피 뉴 이어.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강윤정(문학 편집자, 유튜브 채널 <편집자K> 운영자)
『문학책 만드는 법』을 썼고 유튜브 채널 <편집자 K>를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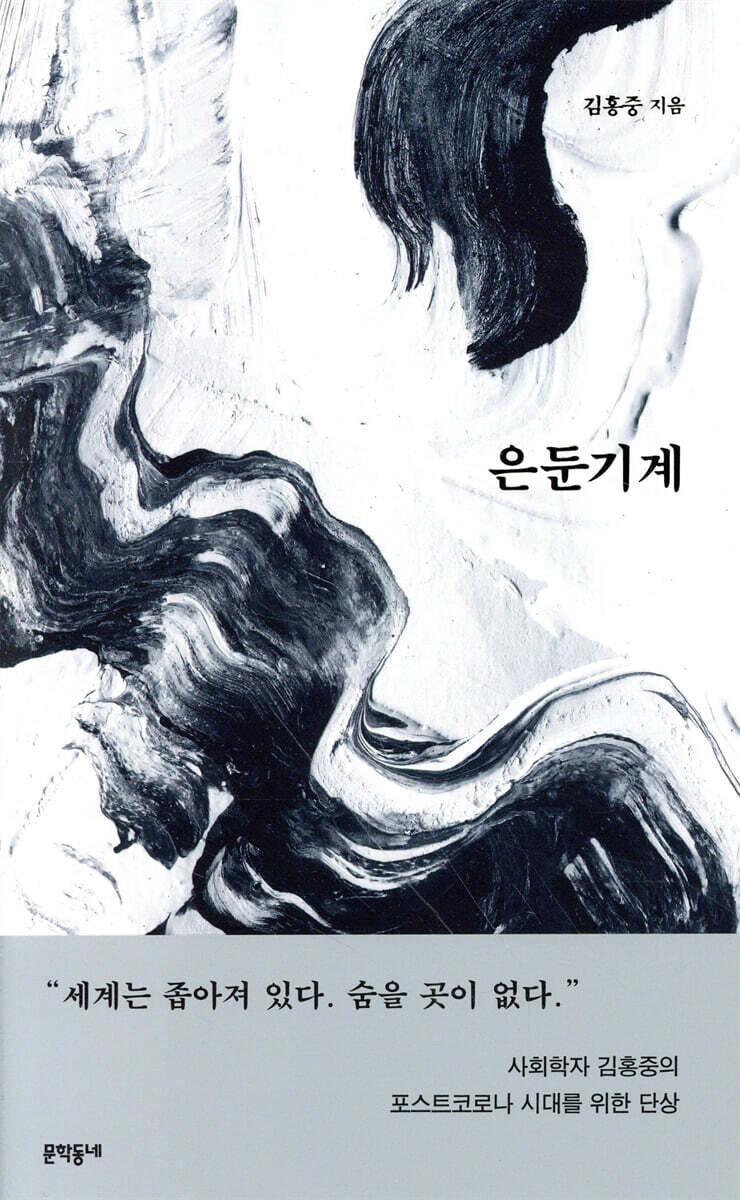

![[양지훈의 리걸 마인드] 법률사무소와 책방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d/5/8/8/d588a2f94202d38b968b0609e90e1a01.jpg)
![[문지애의 그림책 읽는 시간] 정직하게 삶을 관통한 책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8/7/f/2/87f24b9061f81c9db6891c2029b708f8.jpg)
![[정용준의 짧은 소설] 돌멩이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5/6/8/1/568164e6c1203685005932697c27250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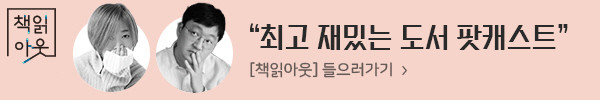













인위적위험
2022.03.11
bluemarin
2022.03.01
뚱아
2022.01.29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