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림엔터테인먼트 제공
울림엔터테인먼트 제공
연말을 보내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밤마다 파티를 벌이며 화려하게 일 년을 결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리게 점멸하는 크리스마스 전구 아래 열두 달이 남기고 간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차분히 돌아보려는 사람도 있다. 시국 덕분에 전자(아마도 E)가 모니터 앞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해하는 사이, 후자(아마도 I)는 너무나 여유로운 표정으로 으레 그렇듯 준비된 노트를 펴는 그런 연말이다. 일 년 365일간 나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희로애락과 사람들 사이, 미처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못한 이름들이 눈에 띈다. 그 가운데, 러블리즈가 있다.
러블리즈는 지난 2021년 11월 16일 계약 만료 소식을 전했다. 2014년 11월에 데뷔했으니 표준계약서 7년을 꼬박 채운 셈이다. 그렇게 따지고 보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섭섭지 않은 이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대상이 러블리즈라는 걸 떠올리면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진다. 괜한 기분 탓만은 아니다. 팀의 가장 큰 히트곡 ‘Ah-Choo’만 생각한다면 재채기처럼 참기 힘든 첫사랑에 푹 빠진 상큼한 여자아이의 모습만이 떠오르겠지만, 사실 러블리즈가 가진 개성 가운데 무엇보다 돋보인 건 ‘애틋함’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짝사랑 전문’이라는 눈물 어린 별명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러블리즈는 타이틀곡에서 수록곡까지 수없이 많은 노래에서 혼자 사랑하고 혼자 아파했다. 전반적으로 밝은 분위기 속에 갑작스레 그림자를 드리우는 브릿지 파트나 ‘Destiny(나의 지구)’, ‘찾아가세요’처럼 처연한 구석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 타이틀 곡의 면면까지, 러블리즈의 노래에는 언제나 물기 어린 시간이 서려 있었다. ‘어제처럼 굿나잇’이나 ‘Rewind’ 같은, 아이돌 앨범에서 의무방어전처럼 사용되기 마련인 발라드 트랙들이 자연스러운 설득력을 가졌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러한 섬세한 감성의 세공에 작곡가 윤상의 공을 빼놓을 수는 없다.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웰메이드 가요를 대표하는 이름이자 일찌감치 전자음악에 눈뜬 선구자로 유명한 그는, 자신을 ‘러블리즈의 아버지’로 부르며 이들의 데뷔곡 ‘Candy Jelly Love’를 시작으로 한동안 그룹의 프로듀싱을 전담했다. 그 문에 윤상과 작곡팀 원피스(1Piece)와의 호흡이 러블리즈의 모든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러블리즈의 7년을 띄엄띄엄 본 사람의 섣부른 판단일 뿐이다.
자신들을 ‘프로듀서로서 완성도 높은 신스팝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오브젝트’라고 소개하기도 했던 일급 프로듀서의 손 아래 무럭무럭 성장한 러블리즈는, 그가 남기고 간 자양분 위에서 자신들만의 열매를 꾸준히 일궈냈다. 스페이스 카우보이, 다빈크, 스타더스트, 정호현(e.one), 영광의 얼굴들 등 다양한 작곡가들은 러블리즈와 함께 지나온 시간만큼 조심스레 이들만의 서늘하고 신비한 기운이 도는 정원을 가꾸고 또 채웠다.
 울림엔터테인먼트 제공
울림엔터테인먼트 제공
무엇보다 누구와 함께해도 ‘러블리즈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데에는 잘 모인 만큼 잘 벼려진 러블리즈 여덟 멤버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화사하지만 서늘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지만 누구보다 강한, 마치 얼음꽃 같은 이들의 목소리가 그려내는 풍경은 그 자체로 러블리즈의 정체성이자 가능성이었다. 그래서 정형화된 소녀나 청순한 이미지로 오래 비쳐 온 시간이, 활동 후반 예상보다 길어진 공백기가, 이들과의, 어쩌면 정해져 있던 이별의 순간이 이렇게 더 아쉽게 느껴지는 지도 모르겠다.
‘Cameo’나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를 잘 부를 수 있는 그룹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 노래들을 러블리즈처럼 부를 수 있는 그룹은 아마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러블리즈를 떠올리며 무심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이별이 남아 있을까 생각해 본다. 케이팝 팬들 사이 자조적으로 이야기하는 ‘슬픔의 케이팝’이라는 말에는 이런 정해진 이별의 날이 주는 슬픔도 조금쯤 녹아 있지 않을까? ‘작별 하나, 작별 둘’을 세며 올해의 노트를 덮는다.
안녕, 2021년. 안녕, 러블리즈.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김윤하(대중음악평론가)
대중음악평론가.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 케이팝부터 인디까지 다양한 음악에 대해 쓰고 이야기한다. <시사IN>, <씨네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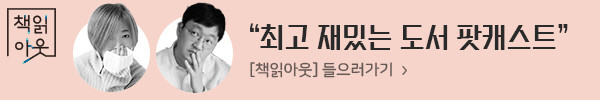
![[더뮤지컬] "두렵지만 용기 내" 전소민·윤시윤, 연극 첫 도전…<사의 찬미> 프레스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17-f28062ae.jpg)
![[추천핑] 국경을 넘는 한국 문학](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3-ab42d6e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