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세이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 살아온 대로, 경험한 만큼 쓰이는 글이 에세이다. 삶이 불러 주는 이야기를 기억 속에서 숙성시켰다가 작가의 손이 자연스레 받아쓰는 글이 에세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렇게 붓 가는 대로, 살아온 대로 쓰일지라도, 에세이를 편집하는 사람은 결코 책의 꼴과 운명이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 에세이 시장은 이를 테면 ‘진정성’의 전쟁터이다. 어느 에세이나 저자가 다 직접 해 본 이야기이고 유일한 경험담이며 간절한 인생 스토리이다. 이 전쟁통에서 불량품이 아닌 뇌관을 준비하고 재미와 감동이라는 도화선을 독자의 마음에 정확하게 연결해 불꽃을 터트리는 일은, 결국 편집자의 몫이다.
이연실 작가의 책 『에세이 만드는 법』 속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인터뷰 – 이연실 편집자 편>
오늘 모신 분은 “좋은 에세이가 될 사람들을 부지런히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완성”하는 편집자입니다. 『부지런한 사랑』, 『라면을 끓이며』, 『김이나의 작사법』, 『걷는 사람, 하정우』,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이 책들이 다 이 분의 손을 거쳐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탁월한 책을 탄생시키셨죠. 『에세이 만드는 법』을 쓰신 이연실 편집자 님입니다.
김하나 : 첫 책입니다. 처음으로 편집자를 상대역으로 만나서 함께 일을 해보면서 새롭게 느낀 점이나 알게 되신 점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이연실 : 배운 게 굉장히 많은데요. 느낀 것도 많고. 일단은, 저자님들이 같이 일하면서 저한테 ‘편집자가 너무나 중요하다, 고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직접 쓰면서 보니까 ‘정말 편집자의 신뢰와 애정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이번 책을) 쓰면서 내용은 즐겁지만 되게 어려웠거든요. ‘너무 TMI가 아닌가, 내 자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의 편집자님이 유유 출판사의 사공영 편집자님인데요. 중간에는 이 분을 향해서 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사공영 편집자님이 출근하시기 전에 한 편씩을 보낸다는 생각으로 항상 글을 보냈었던 것 같고요.
김하나 : 사공영 편집자님 출근 전에 글을 한 편씩 보낸다는 계획은 쭉 지켜졌나요?
이연실 : 사실은 안 지켜졌기 때문에(웃음), 사공형 편집자님이 중간중간에 마감일을 주시다가 나중에는 한 편씩 언제까지 보내라고...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몇 개월 동안 마감을 거의 안 지켰거든요. 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씀은 쭉 드리다가 ‘이제 더 이상 죄송한 일을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정말로 ‘편집자님이 출근하시기 전에 뭐라도 보낸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김하나 : 글 모양은 돼서 가긴 했나요? (웃음)
이연실 : 네. 그리고 제가 편집자이기도 하지만 사공영 편집자님이 너무 탁월하신 게 제가 쓴 글보다 더 많은 피드백과 용기를 주실 때가 많았어요. 정말 너무 멋진 편지를 보내 주셔가지고 편집자님한테 글을 보내고 그 피드백을 들은 날은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 끝나면 ‘내일 또 하나 보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제가 편집자로 일할 때는 작가의 말에서 ‘편집자 누구누구에게 감사한다’ 이런 말을 항상 뺐거든요. 철저하게 뺐어요.
김하나 : 아, 그러면 이연실 편집자님이 편집하신 책에는 ‘이연실 편집자께 감사드린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군요.
이연실 : 네. 왜냐하면 저는 작가의 말이나 프롤로그, 에필로그 같은 건 꼭 필요한 말들만 독자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고, 제 이름은 판권에 있으니까 중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의 마음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책이 나오고서 마지막 에필로그를 쓰는데 정말 생각나는 게 사공영 편집자님밖에 없더라고요. 판권에 있더라도 편집자님의 이름을 내 문장으로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쓰기도 했는데요. 그런 것도 좀 달라졌던 부분 같아요.
김하나 : 『에세이 만드는 법』에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공영 편집자님의 한 말씀이 있습니다. 명언이죠. 이연실 저자님이 ‘아, 제가 무슨 대작을 쓴다고 이렇게 끙끙 내고 있을까요’라고 했더니, 편집자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연실 : ‘이미 저에겐 대작입니다’라고 하셨었어요.
김하나 : 아니, 이보다 힘이 나는 말이 있겠습니까?
이연실 : 정말 그것이 농담 투가 아니었고, 그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편집자님도 제 책을 만드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제 글을 한 편씩을 받을 때마다 비타민 같았고 용기가 됐고 힘이 됐다는 얘기를 너무나 진심으로 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힘으로 완성을 했던 것 같아요.
김하나 : 이 책은 저에게도 대작입니다. 유유 출판사에서 ‘~하는 법’ 시리즈가 나오는데 저는 그 시리지를 늘 즐겁게 읽고 있지만, 이 책은 에세이를 만드는 법에 대한 너무나 훌륭한 실용서이기도 하지만 이 자체로 너무나 훌륭한 에세이이기도 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책에 보면 이연실 저자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여러분, 15년 차 에세이 편집자가 에세이 만드는 법에 대해서 쓴 책의 첫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난 에세이가 싫었다.” (웃음) 이렇게 시작하면서 사실 나는 뼛속까지 문학도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문학을 좋아하셨나요?
이연실 : 네.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 문예반이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백일장 키드였고 소설만 썼었고. 예전에 소설 쓰는 분들 사이에서 ‘에세이는 잡문이어서 쓰면 에너지가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김하나 : 그러면 습작을 많이 하셨나요?
이연실 : 열심히 했는데요. 대학교 와서는 국문과에 들어가서 소설 동아리에 있었는데, 그때는 등단을 하고 작가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신춘문예나 작가 공모에 (작품을) 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쓰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즐겁게 쓰지 않았더라고요.
김하나 : ‘이게 뭐야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 너무 힘들게...
이연실 : 맞아요.
김하나 : 쓸 때 즐겁지 않았기 때문에 소설 쓰는 것은 좀 보류하고, 하지만 나는 뼛속까지 문학도이기 때문에 문학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연실 : 네.
김하나 : 문학동네에서 소설 쪽의 편집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비소설 쪽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때 어떠셨어요?
이연실 : 그때 입사한 지 한 두 달도 안 됐을 거예요. 그것도 없던 팀이 새로 생기는 거였는데 이름이 ‘비소설 팀’이었고, 그때 정말 ‘아, 다른 데를 가야 되나’... 그런데 뭘 배운 것도 없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김하나 : 그렇죠.
이연실 : 그런데 사실 제가 ‘문학동네에 들어와서 소설을 열심히 만들겠다’라고 작정하고 입사를 했던 건또 거짓말이거든요.
김하나 : 아, 그래요?
이연실 : 보니까 출판사 초봉 중에 문학동네가 제일 많기에 ‘1년 연봉을 갖고 나는 튀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했었어요. (웃음) 그리고 ‘1년 연봉을 모아서 (회사를) 나와서 다시 소설을 쓴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김하나 : 아, 처음에는요?
이연실 : 네, 정말 그 생각이었어요.
김하나 : 그러나 14년이 흘렀습니다. (웃음)
이연실 : (웃음)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 주 안 지나서 연봉을 갖고 튀겠다는 생각이 싹 사라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학동네를 들어갔는데 4층에 각자 이 책의 작은 부분에 매달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디자이너는 쪽 번호 하나에 어떻게 예쁘게 보일까 (고민하고) 한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고심을 하고, 마케터들은 한 권 한 권 어떻게 팔아야 될까 계속 머리를 싸매고, 제가 몰랐던 책의 뒷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다 알고 싶었어요. 다 친해지고 싶었고. 이들이 책에 갖는 마음들을 제가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작가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이 뒷면에 있는 사람들처럼 책의 뒷모습까지 다 알고 싶고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김하나 : 이 말씀이 너무 좋네요. 책의 뒷면에 있는 사람들이 책의 아주 작은 부분을 놓고 고심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부분을 보면서 매력에 점점 빠져들게 된 거로군요.
이연실 : 네.
김하나 : 다시 비소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소설 팀으로 갔을 때는 일단 탐탁치는 않으셨어요.
이연실 : 네, 사실 ‘입사하자마자 좌천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웃음)
김하나 : (웃음) 사실 좌천을 할 만큼 뭔가를 하지도 못했는데.
이연실 : 맞아요. 전화 몇 통 받았는데 갑자기 다른 팀으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웃음)
김하나 : (웃음) 그랬는데 선배님한테 생각이 바뀌는 한마디를 들으셨죠. 어떤 말씀이었죠?
이연실 :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문학 동네는 소설의 메인 아닌가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계신 저희 오동규 실장님이 ‘비소설은 뭐든 다 할 수 있다, 네가 여기서 이걸 잘 만들어내면 나중에 네가 좋아하는 사람과 네가 좋아하는 글들이 다 책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좋아하는 게 다 책이 된다고?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나가고 싶지도 않았고요. 문학동네라는 공간 자체는 너무 좋았고. 그런데 사실은 옮겨가면서도 ‘내가 여기에서 열심히 하면 나중에 소설을 만들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하나 : 다시 한 번 이 말을 하게 되네요. 14년이 흘렀습니다.
이연실 : (웃음)
김하나 : 그 14년 동안 ‘이제 비소설 만드는 것의 재미에 대해서 좀 알았고 책도 좀 만들어 본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만들고 싶은 건 소설이야. 소설로 옮겨가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어요?
이연실 :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임편집을 하고서 비소설 만드는 재미에 금방 푹 빠졌던 것 같아요.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았고요. 비소설 할 때는 문인 분들도 물론 있었지만 다른 분들도 있었고, 심지어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신입이니까 사실은 대작이나 큰 작가님 책은 책임편집을 맡을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누구도 그 책에 뭘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 책읽아웃 오디오클립 바로 듣기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임나리
그저 우리 사는 이야기면 족합니다.

김하나(작가)
브랜딩, 카피라이팅, 네이밍, 브랜드 스토리, 광고, 퍼블리싱까지 종횡무진 활약중이다. 『힘 빼기의 기술』,『15도』,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등을 썼고 예스24 팟캐스트 <책읽아웃>을 진행 중이다.

이지원 PD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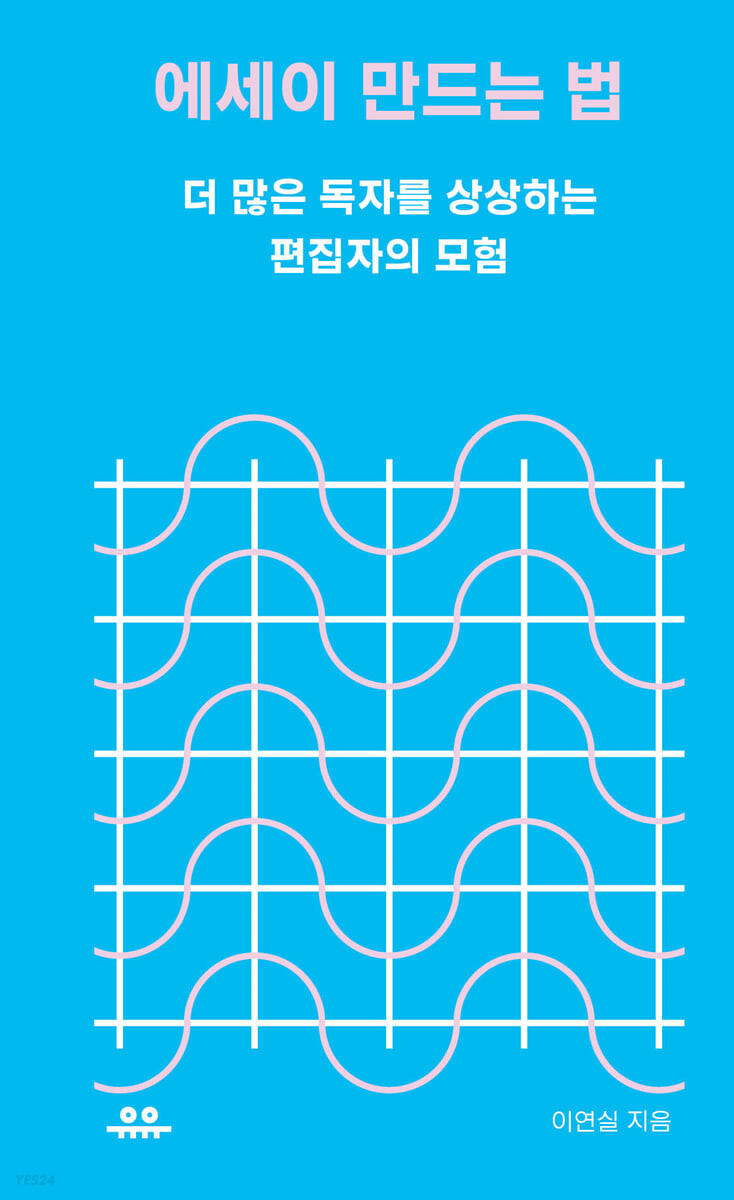

![[책읽아웃] 어린 시절의 나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a/e/2/8/ae280c58045a44ff47a8aa9019e35ead.jpg)
![[책읽아웃] 3보 이상은 바이크를 탔어요 (G. 김꽃비 배우)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1/5/a/e/15ae7425ef0eda4a26affd57390323bc.jpg)
![[책읽아웃] 그림 속에 어린아이 한 사람 살고 있네요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5/0/b/7/50b749a83653793cbd1c3ebdb7c5331a.jpg)


![[젊은 작가 특집] 예소연 “소설이 저를 자꾸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e92deffa.jpg)
![[추천핑] 국경을 넘는 한국 문학](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3-ab42d6ee.png)

![[큐레이션] 요리책도 책이다, 실용적이고 재밌는 레시피북 추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f/d/9/8/fd9893cf8ced7e5d5043247ca6e3021b.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