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캐 특집] 행운아였다고 생각해요 - 번역가 김현우
<월간 채널예스> 2020년 10월호
운이 좋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수시로 나를 돌아봐야 하는 일을 두 가지나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의 경계를 넓혀주는 문장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2020.10.13)
- 글 | 정다운, 문일완
- 사진 | 이혜련(아더스튜디오)

김현우의 ‘본캐’ 탐색을 위해 그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김연수의 열하일기>를 봤다.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할 때마다 길 위의 사람들이 『열하일기』 속 문장을 낭송했다. 그러나 정작 기억에 남는 것은 낭송 전, 혹은 후에 그들이 한 행동이나 말이었다. “괜찮아요?” 하고 묻거나 가래침을 뱉어 목청을 돋우던. “거기까지가 그 사람이니까요.” 다큐멘터리 PD 김현우와 번역가 김현우, 둘 중 무엇이 ‘부캐’인지는 말하기 힘들다. 대학원 시절부터 번역을 했고, EBS에 입사해서 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행운아』, 『G』, 『A가 X에게』를 비롯해 다수의 존 버거 책을 번역했으며 니콜 크라우스와 리베카 솔닛의 대표작도 그의 손을 거쳐 한국어로 출간됐다. 그사이 EBS ‘다큐 프라임’ <성장통>, <생명, 40억 년의 비밀>, <학교의 고백> 등을 연출했다. 스스로는 누차 “두 개의 트랙을 달리는 일”이라고 밝혔으나, 두 트랙은 때때로 상대의 영역에 간섭하지 않았을까? “존 버거의 『행운아』에 “풍경은 기만적일 수 있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썼죠. “종종 풍경은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펼쳐지는 무대라기보다는 하나의 커튼처럼 보인다. 그 뒤에서 사람들의 투쟁, 성취, 그리고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커튼….” 이런 문장이 머릿속에 있으니,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부캐’인지와 무관한 김현우도 있다.
번역가를 바라보는 보통의 시선은 ‘홀로 책의 감옥에 갇혀서 고요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닐까요? 반면 다큐멘터리 PD는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요. 김현우는 둘 중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일까요?
‘무엇을 할 때 더 편한가?’라는 질문이라면 아무래도 전자입니다. 번역가로 일할 때는 온전히 개인으로 작업하므로 좋지 않은 결과나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도 저 혼자 받아들이면 되죠. 하지만 PD로 일할 때는 사람들을 친밀하게만 대할 수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엔딩 크레디트에 나오는 모든 사람과 상황을 조정하는 것이 PD의 일이니까요.
‘부캐’ 트렌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20년 가까이 두 개의 트랙을 달리면서 터득한 기술도 있을 것 같고요.
제 경우에는 대단한 행운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가지 모습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닐 텐데, 한 가지 모습을 주로 꺼내 쓰게 되죠. 물론 그 도구가 반드시 직업일 필요는 없지만, 해보니 나를 보다 온전히 사용할 수 있더군요. 기술은 딱히 없고요.(웃음) 좋은 점은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고민한다고 어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쪽 작업에 몰두합니다. 문제를 ‘잠시 잊는’ 것이죠.
<김연수의 열하일기>를 보면서 문득문득 번역가 김현우가 느껴지기도 했어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이건 번역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반대로 번역을 하면서 ‘이건 내가 PD가 아니라면 나오지 않았을 문장이다’라고 의식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 다큐멘터리에서 문학적 요소가 느껴진다면, 그건 순전히 독서에 사용한 시간 덕일 겁니다. 다만 2018년에 방송한 <내 운동화는 몇 명인가>는 혼자 하는 작업에‘도’ 익숙한 김현우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네요. 기획부터 완성까지 제 뜻대로 한 작업이었어요.
번역으로 진입하는 루틴이 있을까요? 번역가 김현우의 작업 공간은 어떤 모습인가요?
주말의 거실이 제 번역 작업장입니다. 지루하다 싶으면 동네 카페에 가서 두어 시간 작업하고 돌아와서 다시 거실 책상에 앉습니다. 주말로 해결이 안 될 때는 휴가를 내고 몰아서 작업합니다. 이럴 때는 집을 떠나 지방으로 갑니다. 주문을 거는 거죠. ‘나는 일하러 온 거야’ 하고.
지금까지 두 개의 트랙을 병행한 이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번역의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알아본 것’을 전하는 즐거움이 아닐까요? 실은 얼마 전 다른 잡지에서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든 생각이 ‘번역은 연주다’였어요. 같은 곡이라도 연주자마다 ‘알아본 것’이 다르고 저마다 다른 연주를 하죠. 번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근 작업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존 버거 사후에 나오게 된 두 작품(소설 삼부작 『그들의 노동에』와 『결혼식 가는 길』) 모두 이미 한국어판이 있는 상황에서 작업했습니다.
곧 출간될 『결혼식 가는 길』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영국에서 어학 연수하던 시절 ‘신간’ 『To the Wedding』을 만났죠. 몇 해 후에 국내에 번역본이 출간됐는데 제목이 『결혼을 위하여』이더군요. 작가의 의도와는 다른 제목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결혼식 가는 길』로 고쳐 달았습니다.
아직 출간 전입니다. 번역가의 추천사를 먼저 들을 수 있을까요?
연인이 에이즈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청혼하는 신랑이 있고, 그 남자의 진심을 알아보고 함께 질병에 맞서는 신부가 있습니다. 살면서 절망스러운 일과 마주하지만,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않고, 그 조건을 그대로 안은 채 충실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일. 그것이 사랑의 힘이라고 말하는 소설입니다.
두 개의 트랙에서 일해온 시간은 행복했나요?
운이 좋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수시로 나를 돌아봐야 하는 일을 두 가지나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의 경계를 넓혀주는 문장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 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행운이 아니죠.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관련태그: 채널예스 인터뷰, 채널예스10월호, 월간 채널예스, 번역가 김현우, 예스24

- 글 | 정다운, 문일완
PYCHYESWEB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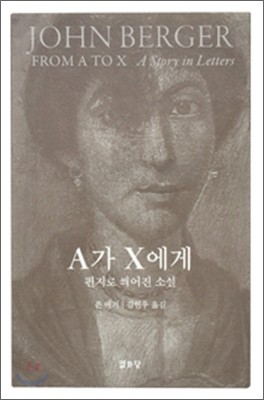
![[부캐 특집]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 영화감독 이길보라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7/2/1/7/7217099471bbe90058ae4df54be8e257.jpg)
![[부캐 특집] 온 우주만큼 부캐가 되어라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3/6/a/8/36a88e4546efc6815de7b5a71c75c123.jpg)
![[역주행 베스트셀러의 이유] 20만 부 팔린 ‘존리’ 재테크 책, 비결은?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2/8/2/7/28271e3fda972cb09d028369579a7e70.jpg)













 + 1%
+ 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