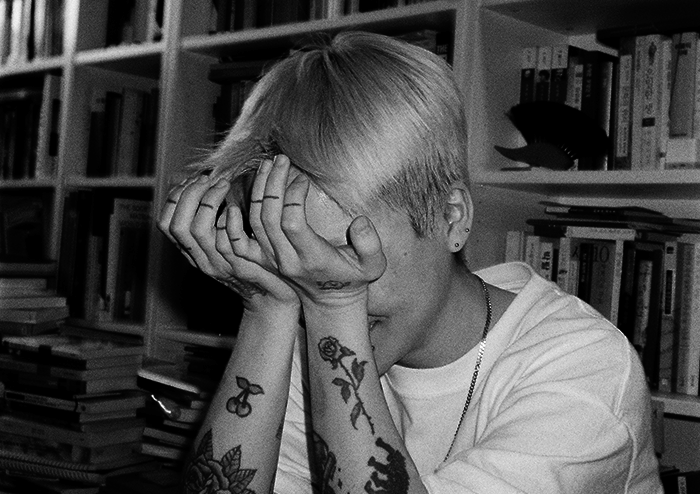영화 <반도>의 한 장면
영화 <반도>의 한 장면
한국 문화 매체에 있어 ‘좀비’는 이제 주력 콘텐츠다. 이를 이끈 작품은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2006)이다. 한국영화사에서 좀비물이 블록버스터로 제작된 최초의 영화이면서 천만 관객을 넘긴 첫 번째 작품이었다. 이후로 한국문화 콘텐츠는 좀비 바이러스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다. 연상호 또한 <부산행>의 프리퀄 <서울역>(2016)을 애니메이션으로 선보였고 이번에는 <부산행> 이후 4년 후를 다룬 <반도>를 작업했다.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지 단 하루 만에 국가 기능이 마비된 한국은 이제 야만 사회가 되었다. 좀비가 점령한 낮 거리에는 살아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어둠에 약한 좀비를 피해 밤이 되어야만 식량을 확보하려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마저도 생존 경쟁이 붙어 무장하지 않으면 목숨을 보전할 수가 없다. 힘과 무기와 쪽수의 논리가 이성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가장 강한 이는 군인이고, 가장 강력한 집단은 민간 부대다.
군인 출신의 정석(강동원)은 홍콩에 있다가 인천항을 통해 한국으로 밀입국한다. 서울의 오목교 쪽에서 자취를 감춘 수십만 달러의 돈을 찾기 위해서다. 위험한 임무인 줄은 알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복잡한 사연이 있는 가족 때문이다. 쉽게 돈을 구하는가 싶었는데 좀비보다 더 무섭고 악랄한 631부대를 만나 위기에 처했다가 민정(이정현) 가족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다. 이제 정석은 민정 가족과 함께 다시 돈을 손에 넣어 한국을 탈출할 생각이다.
우리가 생활하고 익숙하게 보아왔던 서울 목동의 오목교와 같은 장소를 아포칼립스의 주요한 무대로 목격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다. “폐허가 된 세상을 신선한 이미지로 그려내는 데 중점을 뒀다”는 연상호의 연출 의도처럼 죽음의 도시가 된 수도권 지역을 보는 재미(?) 외에 한국 영화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대규모 카체이싱 장면은 비주얼적으로 엄청난 쾌감을 선사하며 이를 구현하려는 기술에 있어 <반도>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가늠하게 한다.
애니메이션으로 연출 경력을 시작한 연상호의 장기가 제대로 판을 벌였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한편으로 뛰어난 스토리텔러로서의 재능은 제작비의 규모와 타협했다는 혐의가 짙다. “‘<부산행> 이후의 한국은 어떨까’라는 상상에서 시작되었다.”는 <반도>에 관해 연상호는 “야만성이 내재하여 있는 세계에 사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인간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다시 한번 살아남아라’ <반도>의 헤드 카피처럼 절박한 생존 의지로 드러나는 인간의 민낯은 631 부대원과 같은 극도의 폭력성과 그에 맞서 인간성을 사수하려는 정석과 민정 가족의 사랑, 즉 가족애로 대비된다. 선악의 극단적 대립, 신파로 극대화하는 가족애의 감정 등의 요소는 연상호의 세계관을 설명하기보다 거대한 볼거리를 앞세워 가족 관객을 겨냥한 한국형 블록버스터를 정의하는 키워드에 가깝다.
 영화 <반도>의 포스터
영화 <반도>의 포스터
<부산행>이 한국형 블록버스터이면서 새롭게 다가왔던 건 산더미처럼 달려드는 좀비의 파괴적인 이미지도 그렇거니와 당시 한국 사회를 지배하던 ’헬조선’의 신음하는 목소리를 영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설정이 작품에 현실감을 불어넣어 입체성을 획득했던 탓이다. 그것이야말로 연상호 감독이 스토리텔러로서 <돼지의 왕>(2011) 때부터 뛰어나게 내재하고 있던 작가의 정체성이었다.
규모를 키우고 비주얼을 강화했지만, 지금 한국사회의 현실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이야기는 그래서 <반도>를 성공한 전편의 전형적인 속편으로 보게끔 한다. 여름 극장가의,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침체되어 있던 극장가에 킬러콘텐츠로 즐길 거리가 확실한 작품이지만, 연상호의 세계관을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아쉬움이 크게 느껴진다.
영화 <반도> 예매하러 가기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허남웅(영화평론가)
영화에 대해 글을 쓰고 말을 한다. 요즘에는 동생 허남준이 거기에 대해 그림도 그려준다. 영화를 영화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려고 다양한 시선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손희정의 더 페이보릿] 여름 햇살 아래 소년은 푸르다 ? 안주영 감독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7/8/1/b/781b6ccff4324d70c3e6dcfd7ca4ced5.jpg)

![[황석희 칼럼] 영화 재번역과 고대 유물 발굴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3/6/5/9/3659ee51eb183e3aead699d23818445c.jpg)
![[추천핑] 어쩔 수 없이 밀려남에 고하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19-727bd620.jpg)
![[취미 발견 프로젝트] 집 사랑꾼을 위한 여름 바캉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29-c9b8f183.jpg)
![[리뷰] 나쁜 플라스틱은 무엇일까? 왜 나쁠까?](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28-926f865f.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