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우는 일이란 얼마나 어려운가. 그저 다 부수어 덜어내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은 비움이 아니구나. 비움은 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고 맞이하기 직전의 단계이기도 하겠다. 서점을 넓히기 위해 공사해나가던 중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더디고 더뎌서, 아니 마음의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아직 다 비워놓기도 전에 지쳐버렸으나 이런 생각으로 견디고 있다.
옆 가게의 임대 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임대인을 구한다는 공지가 건물 앞에 붙었을 때, 나는 그 가게가 가지고 있는 로터리 방향 창문과 내 통장의 잔고를 나란히 놓아두고 한껏 슬퍼하였다. 아침나절의 빛과 로터리의 생기 넘치는 풍경을 얻기 위해서 금전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야. 스스로를 달래보기도 했으나, 어쩌면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금전을 지불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소비가 아닌가 싶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나는 그런 소비를 하게 된 셈이고, 이제나저제나 완공을 기다리며 피가 말라가는 중이다. 공사는 나의 친척 형이 맡아주었다. 도와달라는 전화 한 통에 곧장 달려온 그는 공간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말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어찌나 듬직하던지, 나는 나중에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말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형은 천천히 나의 서점을 둘러보다가 오은 시인의 시집을 들고 말했다. “나는 이런 것을 모르겠어. 왼손이야 아플 수 있지. 그런데 마음이 아픈 건 뭘까. 시인들에겐 왼손에도 마음이 있어?”* 일리 있는 지적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공간을 하나로 합치다 보니 나무판을 박아 가림막을 해놓고 공사를 하지만 그래도 먼지가 날려 하루에도 몇 번씩 청소를 하고 있다. 온종일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하는 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 하는 자조에 혼자 웃고 있다. 한편 청소를 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생각지도 않게 시집을 몽땅 끄집어내 먼지를 털어야 한다던가, 가구들을 이리저리 움직여 그간 가려졌던 곳들을 닦아내는 것은 이런 기회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뜻밖의 수확도 있다. 동전을 줍거나, 잃어버렸던 부품들을 발견한다던가 하는 것. 책장 뒤로 넘어갔으나 몰랐던 시집 두어 권도 발견했다. 그리고, 구석구석 추억들이 묻어 있다. 어쩌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선물 받았나. 이제 더는 찾아오지 않는 이들의 안부까지 하나하나 물어가며 쓸고 닦는다.

마침내 가림막이 치워져, 서점에 볕이 들었을 때의 어색함을, 어색함 뒤에 따라오는 기쁨을 잊지 못한다. 여태껏 나의 서점 자리는, 그러니까 십수 년은 족히 되었을 텐데, 볕을 맞이해본 적이 없었겠지. 비록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지만, 이것만으로도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어서 봄이 되고, 가로수들마다 파릇한 이파리들을 달았으면 좋겠다. 한여름이 되어 우거진 초록을 보아도 근사하겠다. 낙엽들이 떨어지는 광경은 또 얼마나 쓸쓸할 것인가. 이제 나의 서점은 네 개의 창밖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책을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상념에 빠질 것이다. 시적인 순간이다. 그렇지 않을 수 없다.
가구를 만들어주기로 한 남머루 목수의 SNS에는 이 공간에 들일 가구 사진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그중 하나에 그의 아이가 작업실에서 놀고 있는 사진이 껴 있다. 육아 당번인 모양이다. 미안함이 몸 이곳저곳에서 물결친다. 댓글을 단다. ‘목수님. 다음엔 아이를 서점에 보내줘요. 내가 돌볼게요.’ 곧장 댓글이 달린다. ‘좋은 생각이야.’ 나는 농담인데, 그는 진심인 것 같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 그 와중에 책상은, 책장은 또 왜 그리 예쁜 것인지. 다 어떻게 갚으려고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사가독서賜暇讀書’. 독서를 위해 여가를 준다는 뜻이다. 세종대왕이 신하들을 위해 만든 독서 휴가 제도라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책 읽을 시간은 참으로 부족하구나. 이 제도의 명칭을 새로 만들어가고 있는 공간의 이름으로 빌려오기로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놓기엔 너무 많은 이들을 괴롭혔다는 죄책감이 밀려오지만) 책 읽는 사람들로 채워가겠다는 의지이기도 하고, 그것이 여가 혹은 휴가이길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다. 어느 한쪽에선 책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겠으나, 다른 한쪽에서는 마음 느긋한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는 후자 쪽을 위하고 싶다. 이름을 정하고 나자, 일단락된 것만 같은 기분이 되었다.
마지막 공정은 바닥이다. 시멘트를 발라놓고 마르기까지 기다린다. 3일이 걸린다고 했다. 마르는 과정을 ‘양생’이라 한다. 나는 나의 기다림도 양생 중이라고 여긴다. 그러면서 커다랗게, ‘시멘트 양생 중/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붙여놓는다. ‘아직은’이라는 부사구는 부러 빼버렸다. 안달이 날 것만 같아서. 무엇이든 무르익기까지는 조금 더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정말이지 혹독한 겨울의 말미였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병을 피해 은둔해 있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리라. 때마침 어제는 봄비가 내렸고, 바깥은 춥지 않고 “코트를 입을 수 있을 만큼”*** 쌀쌀하다. 무언가 끝이 났고, 늘 그러하듯 그것은 시작. “길가의 잔해들을 한옆으로 밀어내”고 “대들보를 운반하고,/ 창에 유리를 끼우고,/ 경첩에 문을”** 새로이 다는 기분으로 가구들을 들이고 독자들을 맞이할 것이다.
*오은, 『왼손은 마음이 아파』(현대문학 2019)
** 비스와바 쉼보르스카, 『끝과 시작』(최성은 역, 문학과지성사 2007)
*** 모월 모일 서점을 방문한 한 독자에게 바깥 날씨가 좀 춥지 않느냐고 묻자 이러한 대답이 돌아왔다.
-
끝과 시작비스와바 쉼보르스카 저/최성은 역 | 문학과지성사
쉼보르스카는 1945년 데뷔 이래 6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실존 철학과 접목한 시를 꾸준히 발표하면서 대시인의 반열에 올랐으며, 1996년 여성으로서는 아홉번째, 여성 시인으로서는 세번째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끝과 시작
출판사 | 문학과지성사

유희경(시인)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예술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했다. 2007년 신작희곡페스티벌에 「별을 가두다」가, 200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티셔츠에 목을 넣을 때 생각한다」가 당선되며 극작가와 시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시집으로 『오늘 아침 단어』, 『우리에게 잠시 신이었던』이 있으며 현재 시집 서점 위트 앤 시니컬을 운영하고 있다. 시 동인 ‘작란’의 한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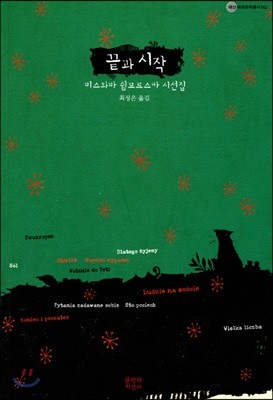





![[젊은 작가 특집] 설재인 “내가 쓰는 것의 백 배 정도 되는 분량을 먼저 읽을 것”](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b6c4e0bc.png)
![[젊은 작가 특집] 돌기민 "그때만큼 자유롭게 휘갈기듯 소설을 쓴 적은 없을 겁니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53cc095a.png)
![[젊은 작가 특집] 김화진 “언제나 서슴없이 ‘좋아해요’라고 말하는 분들께 고맙습니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597192ae.png)
![[젊은 작가 특집] 김지연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면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5b0f5351.png)



viijo
2020.03.15
가까운 거리에 좋은 서점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밖에서도 공사가 진행되는게 느껴져요. 새로운 공간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